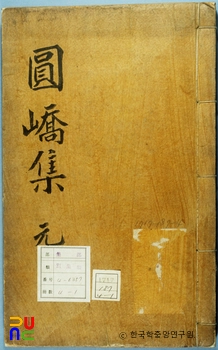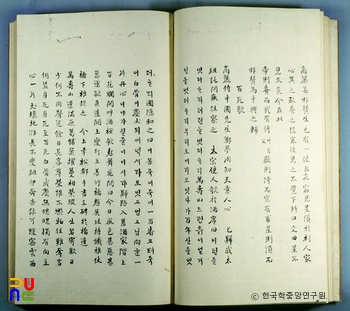원교집 ()
10권 4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다. 이 책은 규장각에 함께 있는, 편차가 정해지지 않은 ≪두남집 斗南集≫ 4책의 초고를 후인이 편차를 정하여 편집, 필사한 정초본(定草本)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도 있다.
권1에 동국악부(東國樂府) 30편, 권2·3에 시 100수, 권4에 잡저 7편, 권5에 서(書) 2편, 권6에 제문, 권7에 비(碑)·지(誌)·명(銘)·표(表), 권8에 잡문 12편, 권9는 행장 4편, 권10에 서결(書訣), 그리고 끝에 부록의 묘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동국악부>는 <태백단 太白檀>·<황하가 黃河歌>·<성모사 聖母祠>·<임중계 林中鷄>·<우식곡 憂息曲>·<치술령 鵄述嶺>·<황창무 黃昌舞>·<양산가 陽山歌>·<파경합 破鏡合>·<두문동 杜門洞> 등 30편의 우리 나라 전래 악(樂)을 모아놓은 것이다. 매편마다 간략한 해제를 붙이고 가사를 한자(漢字)로 적어놓았다.
그 중 <백사가 百死歌> 1편은 해제에 이방원(李芳遠)의 <하여가 何如歌>와 정몽주(鄭夢周)의 <단심가 丹心歌>를 인용하면서 한글로 적어놓았다. 이는 우리 나라 전통 음악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잡저 중 <독법화경 讀法華經>은 서양에서 새로 들어온 지리 개념을 들어, ≪법화경≫에서 논한 동방(東方) 1만 8,000세계, 18계(界) 등이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불비주소왕시인 辨佛非周昭王時人>에서는 불타(佛陀)가 탄생한 것이 주(周)나라 초기가 아니라 서한 말(西漢末)쯤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교의 교리가 몹시 허황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따져서 배척하였다.
서(書)의 <답아논문서 答兒論文書>는 중국 사서(史書)들을 예로 들면서 문장을 논한 것이다. <답재종자충익서 答再從子忠翊書>는 ≪법화경≫ 등에 나타난 불교의 허황됨을 설명하는 편지이다.
잡문의 <오음정서 五音正序>는 사람의 성음이 후(喉)·설(舌)·치(齒)·순(脣)·아(牙) 등 다섯 곳에서 나오는 까닭에 오음이라 하며, 오행과도 자연적으로 합치된다고 설명한 오음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서결>은 7,254자에 이르는 서법(書法)에 관한 논문이다. 이론과 실제에 입각하여 중국과 우리 나라의 서법사(書法史)를 상호 비교하고 우리 나라 특유의 서법을 밝히는 한편, 자신의 서체 이론을 전개한 서도(書道)의 지침서이다.
그는 서법의 이론을 전개한 다음 ‘一, 丶, ㅣ, 刀, 丿’ 등의 일곱가지 획을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는 원교체(圓嶠體)라는 자신의 특유한 서체를 이룩한 경지에서 서법의 이론과 실기를 상세히 논급한 것이므로, 서법에 있어서의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