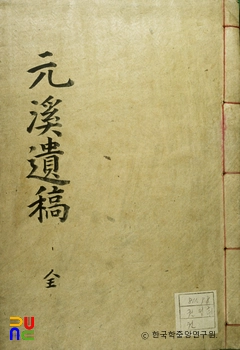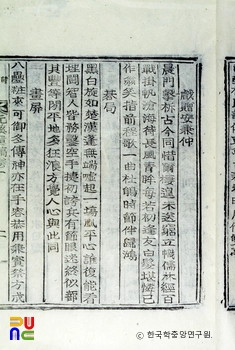원계유고 ()
1904년 권정휘의 현손 권영수(權寧銖)와 권영호(權寧鎬)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안명언(安明彦)과 권창현(權昌鉉)의 서문이, 권말에 권영수의 발문이 있다.
3권 1책. 목활자본. 연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108수, 서(書) 4편, 잡저 5편, 기 8편, 상량문 1편, 제문 1편, 행장 1편, 권3에 부록으로 기 1편, 시 15수, 가장 1편, 행록 1편, 묘문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근대적인 추세에 맞추어 개괄적인 제영(題詠)에서 직설적이고 사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국(碁局)」은 선비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쓸모없는 유희로 울분을 달래면서 세월을 허송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화병(畵屛)」은 그림의 화려함보다는 그림 속에 그려진 동물처럼 제한된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묘사하여 제도의 엄중함과 자연의 광대함이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등영남루(登嶺南樓)」와 「풍락정(豊樂亭)」은 지방의 명승지를 소개한 것이다.
「친상위문답장(親喪慰問答狀)」에서는 상례 중의 일부인 위문을 이미 지정된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데 노력하였고, 비판적인 면모도 찾아볼 수 있다. 「완계서원품목(浣溪書院稟目)」에서는 충신의 예우가 국가의 기본으로 충효를 권장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원에서 제향(祭享)하는 김식(金湜) 등은 학계와 국가에 유공한 사람들인데, 일반 세제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면을 호소하였다.
「대읍유정본부장(代邑儒呈本府狀)」은 시장의 이전에 대한 건의이다. 시장이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도천에서 읍소재지로 이전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복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상전라도금구관장(上全羅道金溝官狀)」은 묘송에 관한 것으로, 당시 묘를 중요하게 취급하던 사실을 보여주는 글이다.
이 밖에도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우고도 응분의 대가를 받지 못한 권세춘(權世春)에게 공로에 상응하는 작위를 하사할 것을 청한 「상순상장(上巡相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