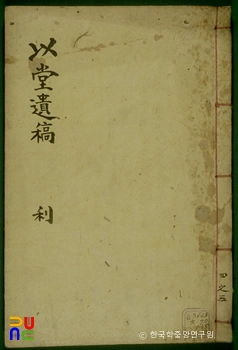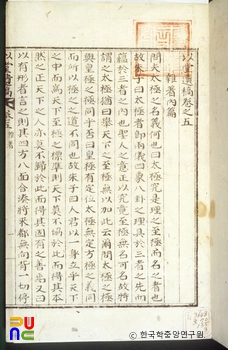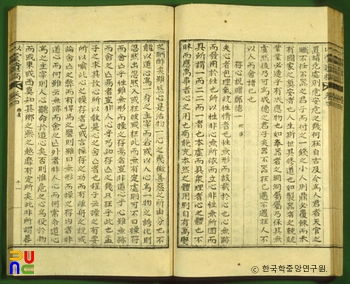이당유고 ()
1948년 정경원의 문인 정진원(鄭溱源)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말에 정진원의 발문이 있다.
8권 4책. 석인본. 국립중앙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부(賦) 1편, 시 517수, 권3∼6에 잡저 56편, 권7·8에 서(序) 6편, 기(記) 26편, 발(跋) 3편, 찬(贊) 1편, 명(銘) 1편, 잠(箴) 1편, 사(辭) 8편, 상량문 5편, 축문 3편, 제문 7편, 비음기(碑陰記) 3편, 묘갈명 6편, 행장 11편, 가장 3편, 행록 4편, 실적(實蹟) 2편, 전(傳) 8편, 부록으로 가장·행장·묘갈명 각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망국의 한을 담은 비분강개를 담고 있다. 「병후(病後)」·「상시음(傷時吟)」·「민원(民怨)」 등에서는 나라 잃은 슬픔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야좌(夜坐)」·「자서(自敍)」·「유거 幽居」 등에서는 현실에서 멀리 도망하고 싶은 염세적인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서(書)의 「상면암선생(上勉菴先生)」은 최익현(崔益鉉)에게 올린 것이다. 11차에 걸쳐 학문과 의례 등을 논하면서 기울어가는 국운을 만회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여윤추당(與尹秋塘)」·「여항식(與恒植)」은 성리(性理)와 주역(周易)·가례(家禮) 등에 대한 것이다.
「존양설(尊攘說)」은 나라가 망하자 양이(攘夷)의 뜻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자녀와 조카와 제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기구·월력(月曆)·기(旗)·말·약·돈 등을 쓰지 말 것과 그들의 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등 16개항에 달하는 세밀한 지시를 하여 나라는 빼앗겨도 민심은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
잡저는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편에서는 태극(太極)의 원리와 성리(性理)에 대해 논하였다. 이(理)와 기(氣)가 본래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인간의 심(心)과 성(性)도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理)는 물(物)의 주인이므로 하나이지 둘이 아니고, 기는 이를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둘이지 하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하늘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칙천설(則天說)」, 성인을 배워야 한다는 「성학설(聖學說)」, 모든 것은 마음에 두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존심설(存心說)」, 자기 수양에 근간이 되는 「세심설(洗心說)」·「경책설(警策說)」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