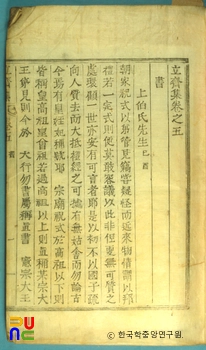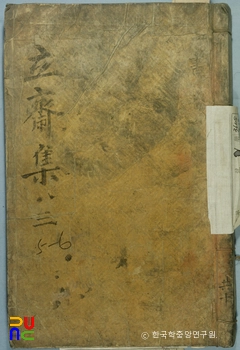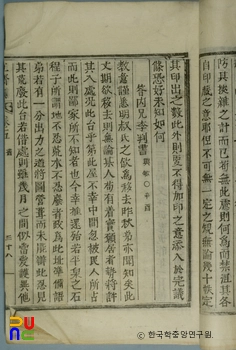입재집 ()
20권 10책. 활자본. 서문과 발문이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권3에 소차, 권4에 소차·계(啓)·헌의(獻議), 권5∼8에 서(書), 권9∼11에 잡저, 권12에 서(序)·기(記), 권13에 발(跋)·명(銘)·찬(贊)·전(箋)·옥책문(玉冊文)·혼서·상량문, 권14에 축문·제문, 권15에 묘갈명·묘지명, 권16에 묘지·묘표, 권17에 묘표, 권18∼20에 행장,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는 사직소가 많다. 계와 의(議)는 시국과 정치에 관한 자신의 방안을 피력하여 임금에게 고한 글이다. 서(書)는 시사와 경전의 문난(問難) 및 성리학에 대한 논변과 문답이 있다.
잡저 가운데 「삼정설(三政說)」에서는, 삼정은 국가의 대병(大柄)이라고 전제하고, 건국의 뜻이 백성과 나라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오늘날 온갖 폐단이 생겨나서 생민(生民)이 날마다 도탄에 빠져 있는 원인은 모두 삼정의 문란에 기인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삼정이 문란하게 된 동기는 탐관과 간리(奸吏)가 발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재의 등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개혁이 보다 시급하며, 주희(朱熹)의 사창 제도를 채택하고 이이(李珥)의 향약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천군향약설(沃川郡鄕約說)」에서는 친구인 박중거가 이이가 해주에서 시행한 것과 같이 향약을 시행하고자 저자에게 상의해 왔음을 밝히면서 다음 조약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1조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언충신(言忠信)·행독경(行篤敬)하자는 상권(相勸), 제2조는 남을 속이는 따위를 규제하는 상규(相規), 제3조는 나아가고 물러가는 데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상교(相交), 제4조는 수재와 화난(火難) 같은 것을 당했을 때 서로 구원하는 상휼(相恤)로,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鄕約)」의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