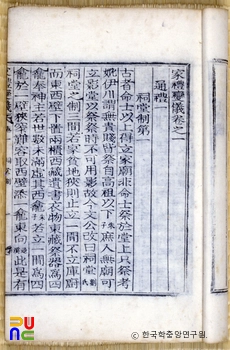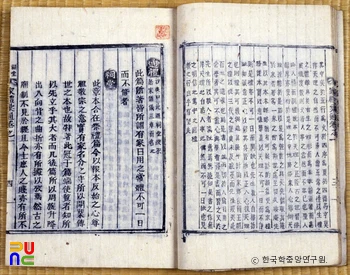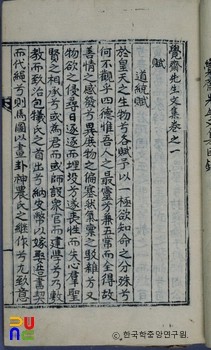행재소 ()
행궁(行宮) 또는 이궁(離宮)이라고도 한다.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국가 어느 곳이든 임시거처로 정할 수가 있었다.
임금이 상주하는 곳은 수도였고, 수도 안에서 상주하였던 곳이 궁궐이다. 그러나 임금도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나 사사로운 일로 궁궐을 떠나 각지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행재소라 불렀다.
임금이 지방에 순행을 할 때는 남여(籃輿) 또는 채련(彩輦)을 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말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임시 머무르는 곳이 일정하지 않을 때 그 거처는 보통 당시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장소에 따라 막사(幕舍)를 새로이 지어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지방의 관서에 머무르는 수도 있으며, 그 지역 부호의 집을 빌려 머무르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곳은 모두 행재소가 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내를 순행하는 것은 지방의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다니는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재앙을 당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니는 경우가 있다.
또, 국내의 반란을 징벌하기 위하여 친정하는 경우와 전란으로 외침의 예봉을 피하여 도성을 떠나 피난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왕조에 있어서는 민정의 시찰 또는 위문이나 친정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드물었으나 피난의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또, 사사로이 선조들의 능소(陵所)로 능행(陵行)을 떠나는 일과 신병치료차 수양을 떠나는 임금들이 조선시대에는 가끔 있었다. 일례로 세종은 만년에 안질이 있어 온양에 행궁을 정하여 놓고 자주 내왕하였다 한다.
한편, 행재소에 있을 때 왕은 주로 그 지방출신 중 저명한 학자를 초치하여 국사에 대한 의견과 여론을 수집하여 국정에 반영하였으며, 초치된 학자는 능력에 따라 정부관료로 등용하기도 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마련된 행재소의 규정을 보면, 행재소에서 왕이 내린 전교를 ‘휘음(徽音)’이라 하였다. 행재소 주위에 군사를 지키게 하고 군문을 만들어 무단출입의 소요와 간도(奸徒)의 잠입을 봉쇄하였다.
따라서, 이 행재소의 출입도 ‘표신(標信)’이라는 신분증이 없으면 허락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행재소로는 세종의 온양행재소, 문종의 천안행재소, 세조의 오대산상원암행재소와 보은의 법주사행재소, 선조의 용만행재소, 인조의 전주·강화·남한산성행재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