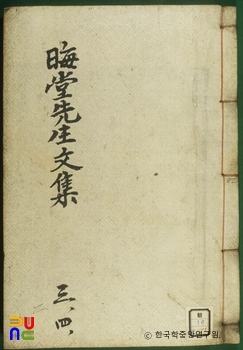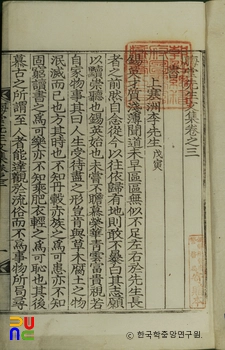회당문집 ()
1932년 장석영의 후손 장익원(張益遠)이 편집·간행하였다.
43권 21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영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504수, 권3∼18에 서(書) 681편, 권19∼21에 잡저 8편, 권22∼30에 문(文) 1편, 변(辨) 5편, 설(說) 16편, 사(辭) 3편, 계(戒) 1편, 학규 1편, 서(序) 110편, 기(記) 132편, 발(跋) 57편, 잠(箴) 9편, 명(銘) 25편, 찬(贊) 13편, 권31·32에 상량문 16편, 송(頌) 8편, 축문 24편, 제문 36편, 초혼문(招魂文) 2편, 애사 5편, 권33∼41에 비명 21편, 묘지명 29편, 묘갈명 187편, 권42·43에 행장 30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기울어가는 나라의 형세를 바로잡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불우의 한을 표현하고 있다. 「야회(夜會)」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다정하고 즐겁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경계하는 마음마저 생기므로 이를 애써 잊으려 한다고 하였다. 「도한강(渡漢江)」과 「송경회고(松京懷古)」 5절에는 나라를 잃은 슬픔이 절실하게 묘사되어 있다.
서(書)의 「상한주선생(上寒洲先生)」·「상허후산(上許后山)」은 선배인 이진상(李震相)과 허유(許愈)에게 학문의 방법을 질의한 것이다. 「답이계도(答李啓道)」·「답이공윤(答李公允)」은 경전·성리·예절·시사 등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자세히 답한 글이다.
「소학강회시발문(小學講會時發問)」은 고산서당에서 『소학』을 강의할 때 어려웠던 대목을 골라 스승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고산강회(高山講會)」·「동락강회(東洛講會)」는 서당에서 강의한 경전의 내용을 발췌하고, 질의한 사람의 성명과 질문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한중질서(閒中疾書)」는 한가롭게 지내던 중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정자논성설해(程子論性說解)」와 「주자대전기의략(朱子大全記疑略)」은 송대(宋代)의 대학자 정이(程頤)와 주희(朱熹)의 성리학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보충하여 설명한 것이다. 「호락설변(湖洛說辨)」은 당시 성리학에 대한 호당과 낙당의 논쟁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와 심즉기(心則氣), 미발했을 때 기질성의 유무,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등 두 당의 견해 차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면서 절충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변사교설(辨邪敎說)」에서는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고 포교하는 천주교를 반박하며 아비도 임금도 없는 오랑캐의 무리라고 배척하였다. 이밖에 지구가 둥글며 회전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변지구원전설(辨地球圓轉說)」과 성(性)은 스승이고 마음은 제자라고 한 말을 변론한 「성사심제변(性師心弟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