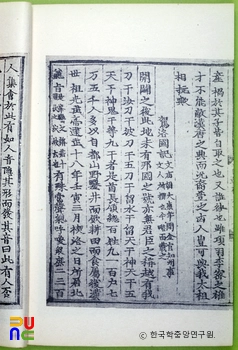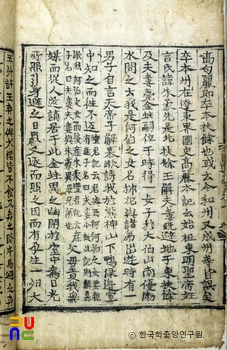신명 ()
ecstasy(憑依)나 orgiasticstate(난장상태)라는 서구적 표현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신지핌은 보통 떨림으로 나타난다. 대(신대, 神竿)를 잡은 사람의 손과 팔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것이 신지핌의 중요한 징표이다. 그러면서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파랗게 질리는 사람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예외의 경우를 빼고 나면 신지핌은 ‘뜨거운 떨림’을 그 징표로 가지고 있다. 이 떨림이 이미 예비적 흥분이고 도취이며, 예비적인 발산이다. 신지핌의 떨림이 가지고 있는 이 예비적 징표가 본격화되어 정점을 향하여 치닫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신바람이고 신명이다.
신지핌을 기대하면서 집중하고 엉겨 있던 마음이, 그리고 육체가 신지핌에서 예비적으로 풀리게 되고 이어서 신명과 신바람에서 본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다.
신지핌에 이은 신바람이 힘이나 정열의 형태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인적인 힘, 무서운 신비로운 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붙잡는 많은 사람들을 떨쳐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산등성이를 향하여 신대를 받든 채 치닫는 것은 그 신비로운 힘이 육체적으로 발휘되는 경우이겠으나, 자신도 모르는 신령의 목소리를 받아 공수를 주고 점을 치고 하는 것은, 그 신비로운 힘이 언어를 통하여 지적으로 발휘되는 경우이다.
신지핌은 흔히 접신(接神) 또는 빙의상태(憑依狀態)라고 한다. 신령이 인간육신에 옮아붙거나, 육신 속에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다.‘possession’이라는 말이 그렇듯, 신령에 의하여 인간 육신이 소유당하고 있음도 물론 함축할 수 있다.
동시에 ‘obsession’이 그렇듯이 신령에 의하여 점유당한 결과 옴쭉달싹 못하게 그것에 의하여 얽매여 있거나 통어되어 있는 상태도 함축할 수 있다.
물론, 접신하고도 신령을 부릴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른 무당으로부터 이 빙의(憑依, obsession)며 소유당한(possession) 상태를 일방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신지핌은 ‘아무개가 신에게 지폈다’는 서술체로 쓰이고 있다. 그 밖에 ‘신에 들렸다’, ‘신이 붙었다’, ‘신령에 실렸다’, ‘신이 올랐다’ 등이 쓰이고 ‘신이 내렸다’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언어표현 가운데 ‘신이 내렸다’는 신령과 인간을 상(上) · 하(下), 천(天) · 지(地)의 대립으로 포착하고 있다. 하늘 높은 데서 신령이 인간에게 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는 셈이다.
≪삼국유사≫<가락국기 駕洛國記>는 가장 오래된 신내림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건무 18년 임인 3월 계욕일(禊浴日)에 그곳 북쪽 구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마을사람 200∼300명이 이곳에 모이니, 사람의 소리는 나는 듯하되 그 형상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났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구간(九干)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구지(龜旨)입니다.’, ‘황천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 하였으므로, 이곳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 산봉우리를 파서 흙을 모으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날뛸 것이다.’ 구간 등이 그 말대로 모두 즐겁게 노래하면서 춤추었다.”(李丙燾 譯)
여기서 분명하게 “……이곳에 내려왔으니……(爲玆故降矣)”라는 표현을 보게 된다. 이는 하늘에서 신이 내림을 명시하고 있다. 환웅(桓雄)과 수로(首露), 그리고 혁거세(赫居世)의 강림(降臨)이 이와 동궤(同軌)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가락국기>의 기록에 따르면 신령이 먼저 수상성기(殊常聲氣)로 소리하여 사람들이 그에 응하여 그곳에 모여들었다. 신비로운 신의 소리가 먼저 있고 난 뒤 인간은 거기에 피동적으로 응하고 있다. 이어서 다시 신령이 사람의 목소리로 먼저 물음을 던지고 사람들이 이에 응답하고 있다.
여기까지에서 신령은 능동적 · 적극적으로 작용을 끼치고 인간은 피동적 · 소극적으로 그에 응하고 있다. 신과 인간은 ‘능동 · 적극’과 ‘피동 · 소극’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를 기호화하면 G · A:H · P={{T62075_00.gif}}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G와 H는 신과 인간을, 그리고 A와 P는 각기 능동과 피동을 가리킨다.
이어서 신령은 본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말하자면 공수[神託]를 준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피동적으로 그 공수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신의 공수를 따른 이 춤과 노래는 신의 출현을 촉진하면서 신의 뜻을 현실화하고 있다. 말하자면 춤과 노래는 이 경우 오히려 능동적이고 신의 출현은 그에 따라 실현되어 있다.
춤과 노래는 공수받음의 피동을 능동화하면서 신의 출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G · A:H · P:: H · A:G · P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공수받음과 춤과 노래로써 피동과 능동을 겸하게 됨으로써 신탁(神託)과 신현(神現)을 중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을 마란다(Maranda)의 정식에 대입하면 Qₛ:{{%260}}:: Fₛ:{{%262}}로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Qₛ는 의사(擬似) 또는 임시해결 내지 단서이고 {{%260}}은 그 결과이다. 이에 비하여 Fₛ는 최종적 · 종국적 해결 내지 단서이고 {{%262}}은 그 결과이다. 공수내림이 Qₛ이고 공수받음이 {{%260}}이다.
이와는 달리 춤과 노래는 Fₛ이고 신의 출현이 곧 {{%262}}이다. 이 정식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가락국기>에서 인간들은 공수를 받아 신내림을 구현화하는 구실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수라는 의사단서(擬似端緖)는 인간들의 춤과 노래를 내용으로 하는 종국적 단서를 거쳐서 비로소 종국적 결과인 강신과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락국기>의 영신(迎神) 부분은 G · A:H · P……G · A:H · P……G · A:H · P:: H · A:G · P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피동성이 우세하고 신령의 능동성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신지핌은 그만큼 피동적으로 인간이 신령을 영접하는 현상임을 일러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H · P:: H · A={{%260}}::Fₛ의 정식 속에서 신의 의지와 신의 출현 사이의 매체가 되어 그만큼의 능동성을 신내림에서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이 영신부가 전체적으로 신이 자율적인 의지를 실현하고 신이 주체가 되어 그의 뜻을 관철하는 과정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은 신의 소리를 따라 모여들었을 때부터 이미 의도적이 아니었다. 이에 비해 신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불러들이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신의 부름을 받아 그 부림을 받으면서 비로소 그 능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피동성 속의 능동성인 셈이다.
이것은 무당의 접신상태의 이중성에 대응하고 있다. 접신상태에서 무당인 신에 의해 부림을 당하면서 동시에 신을 부리기도 하는 것이다. 신의 뜻을 받들어 피동성 속에서 능동성을 발휘함으로써 인간들은 신내림을 받았고 그 결과 환희용약(歡喜踴躍)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가락국기> 영신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내림의 순간이고 신명이 깃들인 상황이다.
춤과 노래로써 신내림을 받는 기쁨과 그 날뜀이 곧 신명인 것이다. 신의 공수를 받아 그것에 따르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춤과 노래로써 신내림을 가능하게 하고 그 신내림을 받아내는 것이 또한 크나큰 기쁨인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하면 신을 맞는 ‘환희용약’과 ‘함흔(咸忻)’을 더불은 춤과 노래가 곧 신명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한국인이 누린 신비체험의 내용이기도 하다. 신비현현(神秘顯現, theophany)에 직접 참여하는 춤과 노래, 그리고 그에 따르는 환희용약이 곧 신명이자 신비체험인 것이다.
동맹(東盟) · 무천(舞天) · 영고(迎鼓) 등에 관한 기록에 보이고 있는 군취가무(群聚歌舞)나 희락(喜樂) 등의 표현이 <가락국기>의 신비체험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가락국기>의 신비체험은 무당의 개입 없이 주민들이 직접 영신(迎神)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직접적이고도 집단적인 신명 내지 신비체험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영신에 참여한 200∼300의 중서(衆庶)가 구간(九干)을 중심으로 하여 마치 무당이기나 하듯이 직접 · 집단으로 신내림을 받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의 기록은 매우 특이하다. 오늘날 경상북도 안동지방의 어느 마을굿에서 무당 없이 마을의 당주(堂主) 후보자가 직접 신내림을 받은 사례가 이에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인 <가락국기>에 내재된 Qₛ:{{%260}}:: Fₛ:{{%262}}가 이미 그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민은 {{%260}}:: Fₛ 양쪽에 걸쳐 있음으로 하여 신의 의지와 신의 출현 사이의 매체, 말하자면 영매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정적 · 일시적 무당이라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집단적이고도 직접적인 신비경험 속에서 주민들은 신성한 징후를 몸소 듣고 나아가 신과의 직접적 · 현장적 접촉을 갖게 되면서 신을 받들어 신의(神意)를 실현하고 있다. 그들의 춤과 노래는 신체현현(神軆顯現)의 촉매이다.
오늘날의 마을굿에서는 무당 개인을 통해 당주에게 내린 신명이 마을 안 전체에 감염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같은 ‘간접적 집단신명’과 <가락국기>의 ‘직접적 집단신명’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들 사례와는 달리 ‘직접적인 개인 신명’의 사례를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다. “왕이 포석정에 행행(行幸)하였을 때 남산의 신이 현형(現形)하여 어전에서 춤을 추었는데 좌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왕에게만 홀로 보이었다. 사람이 앞에 나타나 춤을 추고 왕 자신도 춤을 추어 그 형상을 보이었다. 신의 이름을 혹은 상심(祥審)이라 하였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이 이 춤을 전하여 어무상심(御舞祥審) 또는 어무산신(御舞山神)이라 전하다. 혹설에는 신이 이미 나와 춤을 추자 그 모양을 살펴 공인(工人)에게 명하여 모각(○刻)시켜 후세에 보이게 하였으므로, 상심(象審)이라 하였다 하고 혹은 상염무(霜髥舞)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형상에 따라 지은 것이다.”(處容郎 望海寺條, 李丙燾 譯)
이 같은 신무(神舞)를 춘 헌강왕은 아주 특이한 왕이다. 그는 이 기록처럼 신의 출현을 직접 보고 그것을 본떠서 춤추는 신비체험을 갖게 되기 이전에 이미 동해용왕이 칠자(七子)를 이끌고 헌무주악(獻舞奏樂)하는 것을 친히 목격하는 신비체험을 겪었다.
그로써 보면 처용랑 망해사조에서 처용과 그 아내 신이의 사건을 빼고 나면 일관되게 헌강왕의 ‘모습찾기(vision-quest)’에 관련된 비슷한 가사가 몇 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헌강왕이 신체현현을 직접 목도하는 기록의 연쇄가 곧 망해사조이다. 이것이 왕의 특이한 개인적 성격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자충(慈充)이 곧 왕이자 무당을 의미하던 신라 왕통의 일례인지를 가름하기는 힘들다.
이 기록은 <가락국기>와는 달리, 특정한 개인이 혼자서만 신의 출현 곧 신체현현을 직접 보게 되고 그 결과 신의 춤을 본떠 신춤을 추어 남들에게 보여주었음을 일러주고 있다. 직접적 개인 신명 또는 신비체험이다.
이 경우 왕은 신과 인간 사이의 매체 노릇을 하고 있다. 신이 춤추는 것(Qₛ)을 왕이 혼자서 본 것({{%260}})에 이어 왕이 그 춤을 그대로 재현하자(Fₛ) 비로소 사람들에게 신춤이 알려지게 된 것({{%262}})이다.
{{T62075_01.gif}}
이 정식에서 왕이 신과 인간의 매개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왕은 무당과 같은 자리에 있다. <가락국기>가 신의 의지와 신체현현의 사이에 매개가 된 인간들의 춤과 노래에 신명과 신비체험이 걸려 있었다면, 처용랑 망해사조에서는 신체현현과 타인 사이의 매개가 된 인간의 춤에 신명과 신비체험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두 기록에서 신명 내지 신비체험은 그만한 대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후자의 신명에서 공동체에 속하였거나 현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만 신체현현을 보게 되고 따라서 역시 간접적 신비체험을 갖게 되는 셈이다. 오늘날 무당굿의 신비체험은 후자의 범주에 들게 될 것이다.
<가락국기>의 신비체험과 처용랑 망해사조의 신비체험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은 전자에서는 신비체가 신격적인 신령이요, 후자에서는 인격화된 자연신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인이 갖는 신비체험이 사령(死靈)이라는 인격영혼(人格靈魂)이나 자연신을 신비체로 하여 이루어져 있는 좋은 선례들이 될 것이다.
한편 두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신비체험의 공통점으로는 신명이 공수나 예언과 더불어 주어진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말하자면 신비체험이 신비체 목도(神秘體目睹)라는 형식을 취할 때라도 예언이나 공수가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무당굿에서 신내림을 받고서야 공수와 점복(占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상 두 가지 기록에서 볼 때, 한국인의 신비체험, 즉 신명은 직접 집단화되거나 간접적으로 집단화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가락국기>에서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신명에 걸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그것을 굳이 무속적 상황 안에 한정된 신명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차원을 넓혀 민속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신명이라고 보아도 좋은 근거를 얻게 된다. 말하자면 신명이 무당만의 것이 아니고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몫일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서 헤아리게 되는 것이다.
비록 무속적 원리가 개재되어 있기는 하나 무당 없이도 공동체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신내림을 받아 신명에 지필 수 있다는 것은 그 현상이 무속의 차원에 속하면서도 민속 일반의 차원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별신굿에서 무당은 자신에게 내린 신명을 마을사람들에게 감염시켜 나간다. ‘집단적 · 간접 신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T62075_02.gif}}
이 정식에서 무당이 다하는 구실이 영매(靈媒)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때,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무당이 중성적(中性的) 내지 중립적 매체인 경우와, 다른 하나는 무당이 참여자적인 매체인 경우이다.
전자에서 무당은 자신은 신내림을 받음이 없이 신내림과 마을주민 사이의 중개자 구실을 다하고, 후자에서는 일단 자신이 받은 신내림을 마을사람들에게 중개하는 것이다.
대를 잡은 마을주민(가령, 당주와 같은)을 옆에 세우거나 앉히고 무당 자신이 춤추고 노래하고 기축(祈祝)하면서 신내림을 중개하여 마침내 대잡이로 하여금 신내림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무당은 혼자서 굿을 할 때 신지핀 순간의 전형적인 징후들, 말하자면 떡시루를 입으로 물고 들어올린다거나 하는 징후를 보이게 된다.
대잡이가 당집을 떠나 신을 모시고 마을 안으로 되돌아오면서 마을굿은 열기를 더하고 본격화된다. 이후 영신을 뺀 나머지 굿거리가 다시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거기에 더불어 참례한다.
이 굿판도 한국의 다른 판놀음이 그렇듯, 연행자인 무당과 관중 사이의 거리는 무당의 굿을 노는 솜씨에 의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동안 긴장과 이완, 가속과 지연 등의 기교가 동원되고 그것에 앙분(昻奮)과 진정, 불안과 해소,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관중들의 마음은 기복과 명암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초점은 아무래도 연행자와 관중이 한판이 되어 어울리는 데 있다. 감정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굿거리 진행이라는 연행자의 중핵(中核)이다.
한국의 판놀음의 전형이 이 굿판에서 벌어진다. 굿판에서 무당은 이 감정의 융합을 조절, 촉진시키는 연행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신을 돌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돌리는 것이다. 그의 신명으로 스스로 놀면서 사람들의 신명을 부추겨 자신의 신명을 나누어 더불어 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굿판의 무당이다. 무당은 보이면서 놀되 사람들이 끼여들게 놀고, 관중은 그에 따라 보면서 놀되 끼여들면서 노는 것이다. 이것이 굿판이라는 연행 현장이다. 무당은 보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는 사람을 더불어 놀게 한다. 이 현장을 연행의 교응성(交應性) 내지 상호침윤성(相互浸潤性)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굿판의 이 교응성(신에 이미 지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핌을 전해주는) 속에서 신명이 바야흐로 마을 안에 두루두루 퍼져간다. 이것이 신지핌의 감염이요 신명의 감염이다. 신명이 공동체 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다. 세속사회가 물러가고 굿판의 분위기가 마을 안에 스며든다.
마을은 이때 확대된, ‘확연(擴延)된 굿판’이 된다. 이제 주민들은 간접적이나마 스스로 신을 놀고 신명을 피운다.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의사무당(擬似巫堂)이 되는 것이다. 확연된 굿판이자 놀이판이 된 마을 안에 난장이 벌어진다. 이른바 제의적 광란, 제의적 혼돈이 빚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신명의 역설이 드러난다. 신이 지피는 인간의 성화(聖化)를 의미한다. 거룩해지고 받들어질 만한 존재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인간들의 ‘리비도’, 심층적 충동이 분출된다. 이것은 신명이 프로이드적인 ‘에고(ego)’ 기제(機制)를 완전히 걷어내 버리는 구실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심층적 자아로서 신과 만난다. 심화된 융기단적인 의미의 에고가 자아와의 합일을 통하여 지양되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신에 안기면서 신에 취하는 것이다. 신명은 인간들로 하여금 원시적이고 야성적인 충동을 회복하게 한다. 원시성의 재생, 그것이 신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난장판 그 자체와 난장에 모여든 광대, 재인, 품팔이하는 여인들, 술주정꾼, 투전꾼……이들은 모두 원시적 에고의 객관적 투영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신명은 원시적 · 야성적인 자유를 갈망한다.
이 같은 마을의 신명이 지닌 역설적 조직은 굿판에서 무당 혼자만이 시현하는 신명에 대응하고 있다. 무당은 신이 지핀 것을, 말하자면 그의 육신을 통한 신성현현(神聖顯現)을 갖가지 곡예적 트릭으로 나타내 보인다. 작두를 타고 떡시루를 입으로 물어 올리고, 불을 삼키고 토한다. 무당은 대단한 곡예사가 되고 광대가 된다.
그러나 이 곡예적 놀이야말로 신지핌의 구체적 표현인 것이다. 그것마저도 신성현현인 것이다. 그러고도 굿판에 모인 사람을 독재자적인 위원(威願)으로 대할 수 있고 아울러 갖은 외설한 몸짓이나 시늉도 사양하지 않는다.
이때도 접신은 무당에게서 에고를 제거하고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이다. 무당의 카리스마는 이것을 통해서도 곧잘 표현된다.
무당의 신명이 당주와 굿판을 거쳐 마을사람들에게 널리 감염되었을 때, 이미 민속 일반으로 확대된 무속원리를 증언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당 개인의 신명이 지닌 구조와 마을사람들이 향유하는 신명이 가진 구조가 대비될 때도 역시 같은 명제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민속과 무당의 관계는 이때 광(光)의 확산과 렌즈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산된 광 속에 <가락국기>가 지닌 신명이 지닌 잔영이 끼쳐져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흔히 신명풀이라는 말이 쓰이고 ‘신바람 피운다’가 이와 동의어로 쓰이며 ‘신바람 낸다’ 또는 ‘신바람난다’도 쓰이고 있다.
‘풀이’가 ‘맺힘[結]’과 대립하면서 무엇인가가 해결되고 해소된 상태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 ‘맺힘’이 ‘꼬임’ · ‘얽힘’ · ‘옹이’ · ‘막힘’ · ‘답답함’ · ‘체(滯)’ 등과 연쇄되고 있듯이, ‘맺힘’의 반대인 ‘풀이’가 ‘열림’ · ‘뚫림’ · ‘내림’ · ‘바로잡힘’ · ‘시원함’ 등과 같이 무엇인가 호전되는 것과 연쇄될 수 있다.
‘신명풀이’가 ‘신바람 피운다’와 겹쳐질 때, 이 말들은 앙분 · 경쾌 · 부동(浮動), 그리고 발산 · 해방 등을 의미하게 된다. 호전됨에 따라 앙분된 발산 그것이 곧 ‘신명풀이’요 ‘신바람 피움’이라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판소리 장단이면 휘머리와 자진머리가 이에 해당될 듯하다.
민속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신명풀이’와 ‘신바람 피움’이라는 말들에서 그 신과 관련된 원천적인 종교적 함축성이 현저하게 뒤로 물러서고, 이 호전에 따라 앙분된 발산이라는 함축성이 겉으로 크게 부각된다는 느낌이 없지도 않다.
최근까지 별신굿에서 이 같이 이해될 수 있는 신명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효용성을 발휘하였다. 난장판과 더불어 피워진 신명은 잠재되거나 억눌린 계층간의 갈등을 겉으로 노출시켜 육체화하고 발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갈등의 해결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도 맺힘이나 응어리에 신명이 맞서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유보(留保)된 전략(戰略)’의 발휘이다. 물론, 이것은 서민들 쪽에 중점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감정의’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평소 유보했던 비장의 전략이 신명을 빌려 발휘됨으로써 늘 맺히고 응어리졌던 감정이 낭비 없이 경제성 있게, 또 효율성 있게 집중적으로 발산되어 가는 현장이 곧 별신굿이다. 그리고 유보된 전략과 감정의가 가장 잘 형식화되어 극적으로 구현되는 현장 또는 놀이가 곧 탈춤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무속의 신명과 민속으로 일반화된 신명, 그리고 사회적 효용 등을 동일선상에서 조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무속의 신명이 민속화된 신명이며, 난장판과 탈춤의 기본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무당 개인에게 있어 입무(入巫)의 경험, 곧 내림굿에서 접신하고 신이 지펴서 신을 겪게 되는 신명이라는 경험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생의 파탄, 가정의 파국, 그리고 사회적 소외 등에 걸친 마음의 맺힘, 곧 한(恨)을 풀어 준다. 그는 카리스마로 굿판에 군림하고 여태껏 그를 깔보던 사람들을 질책한다. 이것이 무당 개인에 있어서 발휘되는 ‘유보된 전략’이요 ‘감정의’임은 말할 나위 없다.
여기서 거듭 무속 내의 신명이 지닌 사회적인 효능과 별신굿판에서 주민의 민속으로서 피워지는 신명이 지닌 사회적 효능 사이의 대비성을 강조할 수 있다. 무당에 있어서 입무의 효능은 ‘바리데기’ 분석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발산이나 해소의 차원에서만 신바람 내지 신명의 기능 또는 효능이 살펴지는 것은 아니다.
‘신지핌’, ‘신을 싣다’, ‘신이 오르다’ 등의 표현은 신령과 인간의 합일을 의미하고 있다. 이 합일화 또는 합일화작용이 내향적 · 구심적 마음의 움직임이라면, 발산이나 해소는 외향적이고도 원심적인 마음의 움직임이다.
신명이 지닌 이 상반되는 심성을 신명의 이중구조라 부를 수도 있다. 한 사물의 원운동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상호 견제 내지 동시적 작용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명 쪽에 옮겨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 신명의 합일감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신령과 인간의 합일이다. 이것을 종교적 합일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신령을 ‘몸주’로 몸 속에 지니고 그 몸주와 뜻을 함께하는 상태이다. 신명 또는 신바람이라 표현되는 한국인이 지닌 신비체험의 핵심이다. 접신된 무당은 이때 신령 그 자체와 동일시된다.
그는 그가 몸에 실은 신령이듯이 말하고 발림을 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춤춘다. 공수를 주고 예언을 하고 때로는 죽은 이의 말투로 넋두리와 푸념을 펼쳐 놓기도 한다.
그러다가 정신이 깨고 난 뒤에, 공수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가 예언한 말귀를 스스로 재현하지 못한다. 신령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라고 무당들은 스스로 주장한다.
무당은 접신하면 그 당장의 즉흥적인 시인이 되고 춤꾼이 되고 그리고 광대가 된다. 신바람의 합일작용은 결코 신령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락국기>에서 보여주듯이, 군신일체(君臣一體), 왕과 백성의 일체감도 촉구한다.
<가락국기>의 경우는 군왕이 곧 신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령과의 합일과 왕과의 합일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신 사이의 합일감은 사회적 차원의 합일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적 신바람의 경우는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합일감의 경지로 사회적 차원의 합일감이 확대된다. 더불어 신명을 피우면서 하나의 신령이 한꺼번에 같이 지핀 상태를 나타낸다. 마을 안의 너와 나의 구별보다는 우리로서의 공질감, 동일체 의식이 우세하게 되어 누구나 우리로서 존재한다.
신바람이 공동체 전원에 걸쳐 용광로처럼 뜨겁게 피워지는 현장이 바로 ‘난장’이다. 때로 ‘난장판’이라 하기도 한다. ‘제의적 광란’이라는 보편성 있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난장은 신바람이 사회화되어 구성원 사이의 공질감을 높여주나, 동시에 공질감의 파괴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해도, 사회계층간의 질서가 무너지는가 하면 윤리의식이 허물어지고 동시에 사회적 규범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을 위협하는 듯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외현상의 것에 머무른다. 제의적 광란의 난장 전체가 ‘제의적 반란’이나 ‘제의적인 갈등’인 것과 같이, 계층간의 일시적 질서붕괴(말하자면 양반과 상민 사이의 갈등의 표출과 같은)는 오히려 사회의 생리적 정상상태(호미오스타시스)의 회복 기능을 다하는 잠정적인 병리현상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질병이 낫고 나면 오히려 보다 진전된 건강상태를 되돌이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평소 상민들 가슴에 응어리지고 맺혀 있는 저항의식 · 대항의식이 언제까지나 억압된 상태로 막혀 있는 것은 상민들만이 아니라, 양반까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정신적 · 심리적 위기를 야기하게 된다. 이것이 맺힘의 상태라면 그것은 풀어져야 한다.
이 같은 풀이를 위한 일정한 기간에 걸친 특수한 장치나 제도가 다름아닌 별신굿이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난장이다. 사회생리의 정상화를 위해 일시 인위적으로 자극해서 불러일으킨 잠복된 병리상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별신굿판의 난장이 세속적으로 사용되어서 무질서, 혼돈, 엉망인 상태 등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말이 되어버렸듯이, 신바람 역시 세속화되어서 흥이 나는 상태, 유쾌하고도 뜻이 채워진 상태 등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말이 되기도 하였다. 즉, 굿판에서만 쓰이던 말이 한국인의 생활감정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