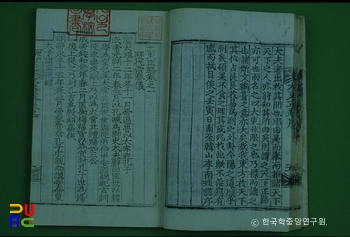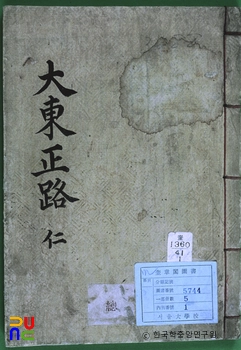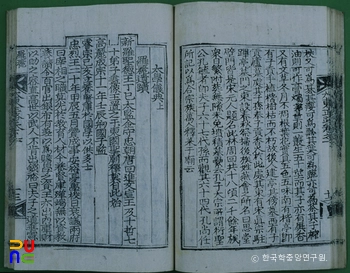대동정로 ()
『대동정로』는 개항기 유생 허칙·곽한일이 한국유교의 정통성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 1903년에 간행한 유학서이다. 1902년에 편찬되고, 1903년 진남(현 통영)에서 간행되었다. 6권 5책, 목판본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규장각 한국학도서관에 있다. ‘대동’은 우리나라, ‘정로’는 정당한 길로서 서양문물에 대립하는 전통으로서의 유교를 의미한다. 주요 내용은 공자 존숭 문제, 태학 제도, 유현(儒賢)의 언행, 서양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판이다. 한국유교의 주체적 각성과 구한말 유교 전통의 계승과 진작을 추구하는 집약된 의지를 보여주는 문헌으로서 의의가 있다.
‘대동정로’의 뜻은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로’는 치우치고 사특한 길이 아니라 공변되고 정당한 길로서 서양문물에 대립하는 전통으로서의 유교를 의미하며, ‘대동’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우리나라의 유교가 바른길을 밝힘으로써 천하에 바른길을 밝히고자 하는 뜻을 지닌다. 이 책은 한국유교의 주체적 각성을 내포하며, 유교의 전통성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
1902년에 편찬되고, 1903년 진남(鎭南: 지금의 통영)에서 간행되었다. 1985년여강출판사(驪江出版社)에서 영인·간행되었다.
6권 5책. 목판본.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규장각 한국학도서관에 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인물 291명을 수록하고 있는 만큼 그 범위가 넓다. 내용은 공자(孔子)를 존숭하는 문제, 유교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의 제도, 우리나라 유현(儒賢)의 귀감이 되는 언행, 서양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판 등 네 가지를 문헌적으로 정리해 한국 유교를 새롭게 진작시켜야겠다는, 당시의 현실 상황에 맞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공자의 존숭 문제는 「역대숭봉의(歷代崇奉儀)」와 「궐리사적(闕里事蹟)」에 실려 있다. 「역대숭봉의」는 역대 중국에서 공자를 존숭했던 사실로서, 공자묘와 연관된 것을 수록하고 있다. 곧, 공자 숭배의 역사적 사실로서, 중국 유교사의 줄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궐리사적」은 공자묘가 있는 궐리의 묘우(廟宇)·비각·문적(文跡)·공림(孔林)의 수목 등 공자묘를 유교의 성지로 존숭하는 의식을 장엄하고 신비롭게 서술하고 있다.
「태학의전(太學儀典)」은 42항목에 걸쳐 유교 교육기관의 제도와 의례를 정리하였다. ‘나려유적(羅麗遺蹟)’ 항목에서는 문묘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태학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묘우」는 현재 서울의 명륜동에 있는 문묘가 설치된 경위와 그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학사(學舍)」는 태학의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건물의 설치 과정과 이에 얽힌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종사(從祀)」는 문묘에 종사된 중국과 우리나라 유현들의 종사 시기를, 「직관(職官)」은 성균관의 직제가 설정된 이후 각 시대의 변천 과정과 임명된 중요 인물을 기록하였다. 「강제(講製)」는 태학의 유생들에 대한 시험 및 평가 제도를 수록하고, 그밖에 「학령(學令)」·「재규(齋規)」·「복색」·「식당(食堂)」·「유벌(儒罰)」의 항목은 태학 유생들의 생활규칙과 그 연혁을 기록하였다.
「공관(空館)」·「유소(儒疏)」에는 유생들이 소를 올리던 관례와 사례들을 수록하였다. 「벽이(闢異)」는 각 시대 태학의 유생이 불교나 무속 등을 배척하는 소를 올린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사학(四學)」·「향학(鄕學)」도 하급 또는 지방의 교육제도에 관한 연혁을 수록하였다. 「주군양로연의(州郡養老宴儀)」·「향음주의(鄕飮酒儀)」·「향사의(鄕射儀)」는 선비들의 향촌 의례를 기록하였다.
「동현언행(東賢言行)」은 ‘입교’·‘명륜’·‘경신’의 3편으로 우리나라 유현들의 언행을 정리하였다. 이것은 본래 황덕길(黃德吉)이 편찬한 『동현학칙(東賢學則)』의 편차와 범위를 기본으로 해 증보한 것으로서, 『소학』의 분류 체계를 계승하였다. 「동현언행」은 『동현학칙』·『해동소학』과 더불어 우리나라 유학자의 언행으로 초등 교육용 교재를 편찬해, 한국 유학의 주체적 체계화를 추구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척사론(斥邪論)」은 윤음(綸音)과 신후담(愼後聃)의 「서학변(西學辨)」, 홍정하(洪正河)의 「증의요지(證疑要旨)」, 허전(許傳)의 「서서학변후(書西學辨後)」, 김치진(金致振)의 「척사론」, 이익(李瀷)의 「천주실의발(天主實義跋)」 등 6종의 서학 비판 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윤음은 기해사옥 후의 「척사윤음」과, 1889년에 내린 윤음으로 우리나라의 종교가 유교임을 천명하고 고종과 왕세자가 우리나라 유교의 종주임을 밝히며, 공자를 높이고 학제를 개정하여 성균관의 학풍을 진작시키겠다고 선포하는 「존성윤음(尊聖綸音)」이 있다.
이 책에 실린 신후담의 「서학변」은 「직방외기(職方外紀)」를 비판한 부분 가운데 특히 서양의 학교제도에 관해 비판한 구절만 뽑아내어 수록한 것으로, 이 책의 편찬 의도가 교육제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정하의 「증의요지」는 개괄적 언급과 함께, 『천주실의』·『진도자증(眞道自證)』·『만물진원(萬物眞源)』·『성세추요(聖世蒭蕘)』에 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증의요지」는 아직 다른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는 만큼, 특히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여기서 홍정하의 비판태도를 신후담과 비교해 본다면, 신후담이 교리적 개념을 성리학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에 비해, 홍정하는 서학의 실천규범에 더욱 관심을 높인 구체적 비판 자세를 보여준다. 김치진의 「척사론」에서 원본의 32항 가운데 천주교 교리에 관한 비판을 제외하고, 신앙 의례나 실천 문제에 관한 비판을 8항목만 추려 수록한 것도 이 책의 편집 목적이 실천적 교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한말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유교 전통의 계승과 진작을 추구하는 집약된 의지를 보여주는 체계적 문헌이라는 점에서, 이 책의 사상사적 특징과 의의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00년에 간행된 송병직(宋秉稷)의 『존화록(尊華錄)』도 같은 시기이며, 유사한 체계와 편집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 두 책을 비교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존화록』은 기호학파 학자에 의해 편찬된 반면, 이 책은 영남학파 학자에 의하여 편찬된 것이므로, 자료의 공통부분도 있으나 동시에 학파에 따른 자료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책은 도학이념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편집의 결실이며, 이념과 실천의 체계적 구성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문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