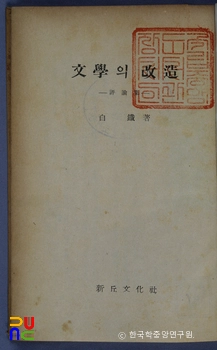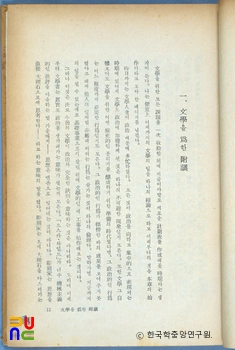문학의 개조 (의 )
A5판. 330면. 1959년 신구문화사(新丘文化社)에서 간행하였다. 이 책은 제1부 과도기의 문학, 제2부 환경에 대한 반성, 제3부 어떻게 개조될 것인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광복 당시의 시기를 과도기적 특성으로 보면서 정치에 과열된 당시의 문단을 비판하고 있다. 문학에 있어서 정치는 문학의 창작품 속에서 형성되고 구현되는 것으로, 정치가의 정치적 실현과는 그 성격이 다름을 논파하였다.
정치를 추종하는 것은 문학 창작과는 다른 행위라는 관점에서 문학의 발전을 기대한 백철은 광복 당시의 창작계에 그러한 작품들이 발표되지 못하였음도 언급하였다. 또한, 광복 후의 염상섭(廉想涉)·김동리(金東里)·계용묵(桂鎔默) 등의 작가들에게서 창조적 진전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어 민족문학과 세계성에 대한 논급에서 우리말의 예술적 성숙과 우리의 고전과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논하였다. 대체로 지도비평적 논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평론집의 흐름이라 하겠다. 제2부에서는 우리의 역사적 인식과 세계성 획득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김성한(金聲翰)의 「바비도」의 출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논평하였으나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문학의 후진성과 부흥」에서는 신문화 50년간의 창조적 집적을 ‘모방’이라고 논단하면서, 전통의 계승을 게을리 하였음을 비판하여 문화계의 창조적 반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화랑과 같은 인간형의 현대적 형상화라는 방법을 하나의 창조적 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어 「신인과 현대의식」에서 손창섭(孫昌涉)·장용학(張龍鶴)·김성한 등을 평가하였다.
제3부에서는 당대와 같은 시대적 전환기에는 “인간성의 변성(變成)에 주목하는 것이 현실의 심류(深流)로 파악하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즉,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함으로써 문학을 개조할 것을 말하였다.
이 책은 광복 당시부터 1950년대까지에 걸친 지은이의 견해가 집약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