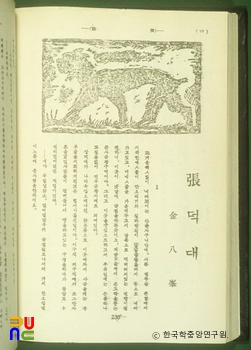장덕대 (덕대)
1934년 11월 『개벽』 신간 1호에 발표되었다. 뒤에 『김팔봉문학전집』(전 6권, 1989) 제4권에 수록되었다. ‘덕대’는 남의 광산에서 광주와 계약을 맺고 그 광산의 일부를 떼어 맡아 광부를 데리고 채광하는 사람을 일컫는 직책명이다.
작자는 1934년 4월 총독부 광산과로부터 평안남도 안주군 운곡면의 광산채굴허가통지를 받고, 김웅권(金雄權)과 함께 금광을 하였으나 넉달 만에 실패하고 물러난 일이 있었다. 장덕대는 바로 이 무렵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자가 광부들의 생활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자는 1930년 중반 이후 그의 본령이었던 비평 활동을 그만두고 방황과 갈등 속에서 생과 문학의 지표를 모색하다가 이 작품을 내놓았다. 이후 그는 친일로 치닫게 된다.
50년이나 금광을 찾아다니며 전 재산을 잃어버린 65세의 장 노인은 어느 날 광주에게서 우연히 청을 받아 덕대가 된다.
그는 사실 금광에 대해 잘 몰랐으나, 처음에는 광주에게 신임을 받았다. 하루는 광부나 광주들이 확실히는 알지 못하나 금을 싸안고 있다는 감을 발견했다고 물어오자, 그는 그것이 감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 흙을 캐서 팽개치라고 명한다.
그 후 그것이 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광주는 장덕대에게 50년이나 금광을 했다는 사람이 감인지 아닌지 구별하지도 못한다며 쫓겨나게 된다. 주먹만한 옷보퉁이를 달고서 다른 금점판을 찾아 나서는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솟는다는 간단한 줄거리의 소설이다.
별다른 구성의 전개나 사건의 기복도 없고, 소설로서 기교도 갖추지 못한 자서전적 서술이다. 단지 김팔봉이 지속적 관심을 지녀왔던 빈민계층, 즉 거지·농민·어민 등에 이어 광부들을 대상으로 그 평가절하가 된 삶을 형상화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