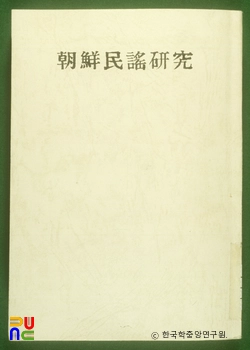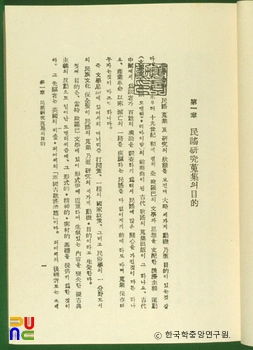조선민요연구 ()
A5판. 546면. 1949년 수선사(首善社)에서 간행하였다. 민요 이론서로서는 최초의 것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민요를 한국 문학의 복판에 앉혀야 하고, 민요의 수집 연구는 민족 문학 건설의 선행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신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곧, 종합예술로서의 민요에 대한 속성 구명, 한국 문학에 있어서 문학으로서의 민요가 차지하는 기능적 지위의 중대성, 민요의 분류 및 내용과 형식의 검토 등 세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 논의한 책이다.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서(序)와 예언(例言) 다음에, 제1장 민요 연구 수집의 동기, 제2장 민요의 개념, 제3장 민요의 성립, 제4장 민요의 발전, 제5장 조선 문학과 민요, 제6장 조선 민요의 형식, 제7장 조선 민요 수집 연구, 제8장 조선 민요의 분류, 제9장 조선 민요의 특질, 제10장 조선 민요 수집 연구의 장래를 위하여 등으로 짜여졌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류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필자 자신이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직접 채집한 1,000여 편의 자료와 이미 수집된 2,000여 편의 자료를 토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서 우러나온 성과이다. 특히, 직접 수집한 자료를 1,000여 편이나 확보하였다는 사실이 이 획기적인 이론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다.
3,000여 편에 이르는 자료 중에서도 예요(例謠)로 든 364편은 가급적 직접 · 간접으로 채집, 입수한 사설로써 충당하려 하였던 저자의 의도를 앞세워 자료에 대한 신빙성과 논의에 대한 신념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미 수집된 자료로서는 김소운(金素雲)의 『조선구전민요집(朝鮮口傳民謠集)』(1933)에서 주로 인용되었다.
민요 사설의 표기는 방언을 그대로 적고, 한글맞춤법에 따르는 데 충실하였으며 특수한 어휘에 대해서는 주해를 덧붙였다. 제8장 말미에는 ‘조선 민요 분류 일람표’를 제시하였으며, 일반 색인과 게재 민요 색인을 덧붙였다.
이 책은 한국 민요를 분석한 첫 이론서이며, 그 이론 전개의 방법과 논지 전개의 깊이 면에서 한국 민요 연구 내지 한국 문학 연구의 획기적인 저서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민요에 대한 기초이론을 최초로 정립하였으며, 한국문학에서의 민요의 위상을 논리적으로 밝혔다. 특히 한국 민요 수집 연구의 경위와 한국 민요의 특질을 논의하였다.
둘째, 타당성 있는 민요 분류와 각 편의 예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한국 민요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민요 사설을 서민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해 낸 이 작업은 한국 민요의 제 모습을 밝혀 주었으며, 소재별로 간추려 낸 364편의 자료는 자료 자체로서도 평가할 만하다.
셋째, 민요 연구의 방법을 본격화시켰다는 점에서 뜻이 깊다. 한국 민요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단편적이거나 비체계적이었는데, 이 책에서 비로소 민요 연구도 학문의 궤도에 올라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