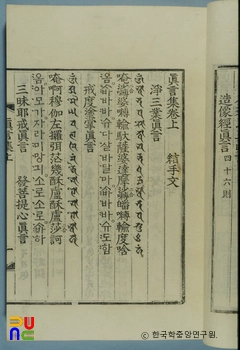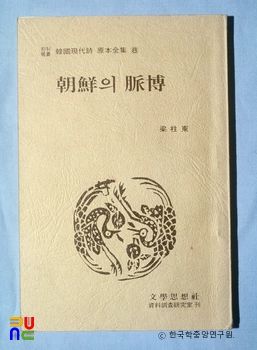음운론 ()
음운론이라는 술어가 의미하는 내용은 시대에 따라 또는 학파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서구의 언어이론이 도입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음운연구는 음운학 또는 운학이라고 불려졌던 것인데, 주로 한자의 음운분류와 발달을 다루는 학문이었다.
전통적인 운학이론에서는 하나의 음절이 성(聲)과 운(韻)의 결합으로 인식되었던 것이기에 음운학이란 음성 전반을 다루는 학문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성운학(聲韻學)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다.
개화기 이후의 이른바 신학문에 있어서도, 어음(語音)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일원론적인 것이었고 명칭도 단일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음학(音學)이라 불리기도 하고 ‘소리갈’이라는 호칭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지만, 어음의 학문은 성음학 또는 음성학이라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음운론이 음성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된 것은 어음에 대한 이원적 인식이 도입된 뒤부터의 일이다. 특히, 프라그학파(Prague學派)의 영향이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의미를 식별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한 이 새 학문의 이름을 음운론이라 하고, 음운론의 기본단위를 음운이라 하여 음성학에서의 음성과 구별시켰다.
음운론이 음성학과 대립되어 쓰일 때에도 그 용법에는 두 가지가 식별된다. 하나는 프라그학파적인 전통에 따른 것으로 음운론과 음성학이 대립될 뿐 이들을 포괄할 언어음의 연구 전체에 대한 학문의 명칭이 결여된 경우이고, 둘째는 음운론을 포괄적인 명칭으로 하고 그 아래에 음성에 관한 부문과 음소(音素)에 관한 부문을 두는 경우인데, 이것은 미국적인 기술언어학의 전형적인 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음소 쪽을 다루는 분야가 음소론(音素論, phonemics)이라고 불리게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적인 기술언어학 또는 구조언어학의 이론 도입과 함께 음운이라 불리던 phoneme의 번역어가 음소 쪽으로 기울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소론이라는 술어는 일반화되지 않았다.
또한, 생성음운론(生成音韻論)의 단계에 와서는 음운론이 음성 실현까지를 다루는 포괄적인 학문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으면서도 그 안에 특별히 음소를 다루는 분야를 설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음소론과 같은 술어가 더이상 정착할 수가 없었다. 이는 음운론이라는 술어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양쪽으로 쓰였던 것과도 관계가 있는 일이다.
음운론과 형태론을 연결시키는 분야로는 형태음소론(形態音素論, morphophonemics) 또는 형태음운론(形態音韻論, morphophonologie)이 있다. 이 분야에서의 기본단위라 할 형태음소(morphophoneme)는 형태소의 이형태들의 교체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되는 추상적 단위로 이해되는 존재였다. 초기의 생성음운론에서는 음소의 개념이 전통적인 이 형태음소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음소
음성에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음소가 출발에 있어서는 음운론의 기본단위로 여겨왔지만, 실상 음소란 시차적 자질들(distinctive features, 또는 변별적 자질)의 묶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론에서의 최소의 단위는 이 자질들이 된다. 그런데 언어 사실의 기술에 있어서 음소를 기준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으며, 실용적으로도 편리하다.
음성자질(sound feature)에는 시차적인 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공헌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잉여자질(剩餘資質, redundant feature)이 있다. 그런데 잉여자질이 때로는 의사전달에 상당한 공헌을 한다.
예컨대, 영어의 ‘pen’의 복수인 ‘pens’와 ‘pence’의 짝은 /penz/와 /pens/처럼 그 음운론적인 차이가 끝소리 z와 s에 있지만, 런던 근교의 발음에서는 두 어형의 끝소리가 s로 실현된다.
그런데도 이때에 pens와 pence의 차이는 구별되어 인식되는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n의 길이이다. 즉, pens의 n은 길고 pence의 n은 짧게 발음된다. 결국 ‘n’의 장단이 두 어형의 식별에 공헌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293}}]과 [n]이 영어에서 시차적 대립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잉여자질은 어떤 언어의 발화(發話, utterance)를 그 언어답게 만드는 데에도 공헌한다. 국어의 경우 ‘ㄱ · ㄷ · ㅂ · ㅈ’ 등으로 적히는 폐쇄음들은 어두에서는 ‘k · t · p · č} ’, 등 무성음으로 실현되지만, 모음간의 경우 유성음 환경에서는 유성음 ‘g · d · b · ○’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유성음 환경에서 무성음 ‘k · t · p · č}’로 발음한다고 하여 의사소통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유성음으로 발음하였을 때 비로소 한국어다운 발화가 된다. 이처럼 국어에서의 성(voice)은 의미의 분별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의 발음을 국어답게 만드는 구실을 하는 잉여자질이다.
음성은 또 고유자질(固有資質, coher-ent feature)과 운율자질(韻律資質, prosod-ic feature)로 구분된다. 주로 시차적 자질에 대하여 이와 같은 구분이 운위되는 것이지만, 전자는 그 자질 자체로 그 인식이 가능한 반면에 후자는 계기적인 발화 맥락 속에서 앞뒤 요소들과의 대비에 의해서만 그 본체가 인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모음이 원순모음인가 장순모음인가, 또는 개모음(開母音)인가 폐모음(閉母音)인가 하는 것 같은 것, 자음이 유성음인가 무성음인가, 또는 유기음인가 무기음인가 하는 것 등이 그 소리에 대한 판단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자질인 반면에 어떤 소리가 긴 소리인가 짧은 소리인가, 강한 소리인가 약한 소리인가, 또는 높은 소리인가 낮은 소리인가 등은 그 소리만을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는 음파의 주파수 · 파장 · 파고 등의 절대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음절들의 길이나 높이, 그리고 강약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요소들을 운율자질이라 하는 반면에 그 자체의 관찰만으로 식별될 수 있는 자질들을 고유자질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음소의 차이에서 구분할 때 분절음소(分節音素, segm-ental phoneme)와 상가음소(上加音素, sup- rasegmental phoneme)의 구분이 생긴다.
이 경우 분절음소를 그대로 음소라 부르는 일이 많으며, 상가음소를 그 특질에 따라 강세소 · 성조소 · 장음소 등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상가(上加)’라는 표현은 ‘초분절(超分節)’이니 ‘덮씌움’이니 하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있다.
음소론을 분절음소만의 학문으로 한정하였을 때 그에 대립되는 분야를 운율론(韻律論, prosody)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르는 단위로서의 운소(韻素, prosodeme)는 상가음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다. 억양(抑揚, intonation)은 문에 걸리는 상가요소인데 어사음운론(語詞音韻論, word phonology)의 차원을 넘어선 문음운론(文音韻論, sentence phonology)의 중요대상이 된다.
음소들이 모여서 이루는 다음 단계의 단위가 음절인데, 음절에는 음절의 중심으로서의 핵과 그것을 둘러싼 주변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훈민정음에서의 초성 · 중성 · 종성으로의 분석은 현대의 음절이론과 일맥상통하는데, 중성이 음절의 중심이 되고 초성과 종성이 그 앞뒤의 주변적 요소로서 거기에 첨가된다. 중성은 다시 그 핵이 되는 모음과 그것을 둘러싸는 반모음으로 분석된다. 음절의 구조는 언어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국어의 경우 음절구조를 ‘자음 · (반모음) · 모음 · 자음’, 즉 C(y)VC로 나타내었을 때, 형태음소론적 표기 또는 기저구조의 표시가 아닌 표면에서의 구조에 있어서 C는 단일자음일 수 있을 뿐, 영어의 strike, ground에서와 같은 자음들의 복합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위의 구조에서 모음 다음에는 반모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중모음 ‘의’를 i-y로 인정한다면 국어의 음절구조} C(y)V(y)C라고 적어야 할 것이다.
음절
종래의 음운론에 있어서는 음운론적 기술에서 음절이 차지하는 몫이 크지 못하고, 자음과 모음 또는 반모음 등의 구분을 짓는 데에 음절 구성에서의 기능을 참작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최근의 음운론 기술에 있어서는 음절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없고→업고’의 음성 실현에 있어서 음절의 개념을 도외시하였을 때에는 모음 사이에 자음이 세 개 이상 개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ㅅ’의 탈락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국어의 음절구조가 초성의 자리에서나 종성의 자리에서 다같이 자음의 복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음절 질서를 상기시킨다면, 앞에서 말하였던 것과 같은 두 모음 사이에서 세 자음의 연속이 허락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조건을 내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어두에서나 어말에서는 일체의 자음 결합이 허락되지 않고, 모음들 사이에서는 두 자음의 결합까지만 허락될 수 있다는 이중의 기술을 하는 대신에 적어도 자음의 결합에 관한 한 음절의 변두리(margin : 초성이나 종성의 자리)에서는 일체의 자음 결합이 불가능하고, 자음 결합이 생기는 것은 음절과 음절이 결합할 경우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음절보다 상위개념으로서의 음보(音步, foot)가 음운론적 단위로 인정되어 음운론적 기술에 이용되기까지 한다.
음성기호를 이용한 선조적(線條的) 표기는 형태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정확히 말한다면 형태소가 이형태(異形態)들로 분화하는 첫째 단계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형태소와 이형태들의 관계가 철저히 과정적인 성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형태소 자체로부터의 음운론적 기술을 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이형태들이 보충법에 의하여 설명될 때에는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못하다.
예컨대, ‘없-(無)’에 대한 ‘əps-, əp-, əm-’과 같은 이형태들은 하나의 형태 əps-로부터 순차적으로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얻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즉,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예 : 없어)가 연결되었을 때에는 əps- 그대로 실현되는 반면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예 : 없다)가 연결되었을 때에는 s가 탈락되어 əp-만으로 나오고, 그 자음이 비음(예 : 없는)일 때에는 끝의 p가 그에 동화되어 əm-으로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격조사 ‘-이’의 경우에나 어간 ‘있-(有)’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주격조사가 자음 아래에서는 ‘-이’로 나타나는 반면에 모음 아래에서는 ‘-가’로 나타난다고 할 때, 비록 이것들이 일정한 음운론적 조건 아래에서 교체를 보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부터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아 유도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있-’과 ‘계-’의 교체는 그것이 음운론적 조건 아래에서의 교체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특징적이다. “방안에 철수가 있다.”와 “방안에 선생님이 계시다.”에서와 같은 대비에서 볼 수 있는 ‘있-’과 ‘계-’의 교체는 음운론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에 든 두개의 형태소들과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 그 자체가 아니라 ‘이-’나 ‘-가’, ‘있-’이나 ‘계-’와 같은 이형태들로부터 음운론적 기술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어
단어 역시 음운론적인 단위의 하나이다. 다만 같은 단어라는 술어가 쓰인다 하더라도 문법론에서 말하는 단어와 반드시 일치되는 존재는 아니다.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하나의 토막으로 발음되는 것을 음운론적 단어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사람이 밥을 먹는다.”에서 ‘사람이’, ‘밥을’, ‘먹는다’는 각각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다.
대체로 기술언어학의 술어로서의 최소자립형(minimum free form)에 해당하는 것으로 syntagma라 불리기도 한다. 악센트나 성조의 배정이 이 단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중세국어의 성조의 경우에 ‘손[手]’은 거성(去聲)으로 되어 있고 조사 ‘ᄋᆞ로’는 두 음절 모두 거성으로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것이 결합되어 ‘소ᄂᆞ로’가 될 때에는 거 · 거 · 거(去 · 去 · 去)가 아니라 거 · 평 · 거(去 · 平 · 去)로 실현된다.
거성이 셋 이상 연속될 때에 중간의 거성이 평성으로 전환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러한 조정도 단어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기타
음운론적 단위들 가운데에는 자리만 있을 뿐, 특정한 음성으로의 실현을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이른바 제로(zero)음소와 같이 존재가 아닌, 즉 음소로서는 작용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형태소의 경계 또는 단어의 경계 같은 경계요소들은 비록 음성으로의 대응체를 가지지는 않는 것들이지만, 음운현상의 설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예컨대, 중세국어에서 반모음 y나 ‘ㄹ’ 아래에서 ‘ㄱ’이 떨어진다고 일컬어지는 현상(실은 k→Υ)에 있어서도, 어느 경우에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ㄱ’ 앞에 형태소의 경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ᄇᆞᆯᄀᆞᆫ’의 경우와 같이 그 사이에 형태소의 경계가 끼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ᄇᆞᆰ+ᄋᆞᆫ). 이와 같은 경계요소들을 나타내는 데에는 ‘+’표시 또는 ‘#’, ‘##’ 등이 쓰인다.
음소 결합의 규칙
음운론적 기술(記述)이나 설명을 위해서는 음소의 목록, 시차적 자질을 위시한 음성자질의 도표를 작성하고 그 음소들의 결합에 관계되는 규칙들의 수립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최소대립의 짝(minimal pair)의 발견을 수단으로 하여, 음운론적 대립의 확인으로 음소나 시차적 자질을 확인하여 그 목록들을 작성하던 단계를 거쳐 생성음운론에 들어와서는 그 목록들에 종종 수정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로 규칙들에 대한 성찰의 심화에 말미암을 때가 많다.
예컨대, 영어의 ŋ, 프랑스어의 비모음(鼻母音) 같은 것은 종래 독립된 음소로 간주되어오던 것이지만, 요즈음에는 그것들이 기저구조에서의 음소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유도되는 표면에서의 음성 실현으로 설명되게 되었다.
ŋ의 경우에는 n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k나 g 앞에 오는 n이 그 자음들의 동화로써 ŋ가 된다는 것이다(ink→iŋk, finge{{%294}}→fiŋg{{%289}}).
다만 king, sing에 있어서와 같이 단어의 끝에 g가 올 경우 또는 행위자 표시의 형태소 -er 앞에 이 g가 있을 때에는 g에 의하여 n이 ŋ로 동화된 이후 g가 의무적으로 탈락되는 규칙이 다시 한번 적용된다.
프랑스어의 비모음의 성립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모음이 비자음 앞에 놓일 때 그 자음들의 영향으로 비모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비모음화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비자음들의 탈락이 후속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음소들의 결합을 지배하는 규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형태소구조규칙(形態素構造規則, morpheme structure rule=MS rule)이요, 다른 하나는 음운규칙(音韻規則, phonological rule=P rule)이다.
앞의 것은 형태소구조에 관계되는 규칙인 데 대하여 뒤의 것은 그러한 구애 없이 같은 종류의 음소 연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ㄱ의 탈락’은 일종의 형태소구조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무데서나 함부로 ‘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소 결합에서의 둘째 형태소의 두음인 경우에만 ‘ㅇ’과의 교체를 보이는 것이다.
‘ㄱ’이 ‘ㄹ’이나 ‘y’를 만나도 그 앞에 형태소의 경계가 개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비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음운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폐쇄음들이 비자음 앞에서 그 동화를 입는다든지 하는 현상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구별이 없이 어디에서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음운규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보기 : 먹는→멍는, 잡는→잠는).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두 형태소의 결합에서만이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예를 보일 수 없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두루 적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의 역행동화 또는 움라우트의 경우에는 ‘아기→애기, 어미→에미, 먹이→메기, 먹이다→메기다’와 같이 두 범주에 드는 예들을 다 찾아볼 수 있다.
음운 규칙의 제약 조건
음운규칙이 보편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음운규칙이 다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음운규칙에는 일정한 제약조건(constraint)이 따르는 것이 오히려 통례라 할 수 있는데, 제약조건에는 음운론적인 것과 비음운론적인 것이 있다.
음운론적인 것의 보기로 움라우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음 사이에 낀 자음이 ‘ㄴ, ㄹ, ㅅ, ㅈ, ㅊ’ 등일 때, 다른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더라도 움라우트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아니→애니, × 다시→대시
× 허리→헤리, × 가지→개지
× 까치→깨치, × 앉히다→앤치다
또한,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 동화될 위치에 있는 모음이 고모음(高母音)일 때에도 움라우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후비다→휘비다, × 우기다→위기다
× 느끼다→니끼다, × 묶이다→뮈끼다
음절의 수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관형사형을 만드는 ‘적(的)’자의 ‘ㅈ’은 된소리로 발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그 앞에 오는 말이 한 음절로 되어 있으면 경음화가 일어나고 두 음절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경음화되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두 음절 이상의 명사라 하더라도 말음이 폐쇄음이거나 ‘ㄹ’일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난다(보기 : 물질적→물찔쩍, 건설적→건설쩍).
심적(心的)→심쩍
사적(私的, 史的)→사쩍
지적(知的)→지쩍
‘표적(標的)’의 경우와 같이 같은 ‘적’자라 하더라도 관형사를 만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러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 이기적(利己的)→이기쩍
× 개인적(個人的)→개인쩍
×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민주주의쩍
× 추상파적(抽象派的)→추상파쩍
형태론 내지는 통사론적인 측면에서의 제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움라우트의 경우 뒤에 오는 모음이 같은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형태소인가에 따라 움라우트의 성취여부가 결정된다. 명사를 만드는 전성의 접사인 경우에나 이른바 피동이나 사동의 접사인 경우에는 움라우트를 보인다.
먹이→메기
고기잡이→고기재비
먹이다→메기다
잡히다→재피다
안기다→앵기다
그러나 주격조사 ‘이’나 동명사형 어미로서의 ‘기’의 ‘이’에는 그러한 힘이 주어져 있지 않다.
× 밥이→배비
× 사람이→사래미
× 가기→개기
× 먹기→메끼
또, 어떤 것은 체언에는 적용되는 데 반하여 용언에는 적용되지 않는 종류의 것들도 있다.
언어연구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운론에 있어서도 공시태(共時態)와 통시태(通時態)의 구별이 존재한다. 지금은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지만, 실은 언어연구의 이 두 축을 분간해내는 데에 크게 공헌한 것은 음운에 대한 연구에서였다.
소쉬르(Saussure, F.de.)에 있어서는 언어요소들은 서로 일정한 유기적 관계에 있어, 이른바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변화를 입는 것은 각 항목들에 일어나는 독자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리된 변화들의 결과로 다음 시대에는 새로운 체계가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프라그학파의 사고는 소쉬르의 체계개념에 입각하여 발전된 것이면서도 변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매우 달랐다.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개개의 요소에 대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 자체가 변화를 입는 것이고, 변질되는 것은 음소 그 자체가 아니라 음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음운론적 대립이라고 믿었으며, 변화의 원인 역시 선행하는 시기의 음운체계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같은 구조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프라그학파에서와 같은 심성주의적(心性主義的, mentalistic) 경향을 배격하던 미국 중심의 기술언어학의 사고에서는 되도록 시기를 세분하고, 그 각 시기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정밀한 구조적 기술을 하는 것이 언어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전통에서는 사유적인 설명 기제보다도 음소를 확인하는 기준과 절차의 정밀성과 정확성이 강조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이론의 등장 이후에는 사적 음운론이 다루는 과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전통적인 음소개념 위에서 음운사를 기술해오던 사적 연구로서는 새로운 음소개념을 수용하여 음소목록부터 수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겠거니와, 변화에 대해서도 단순히 음소나 음운체계만이 아니라 음운규칙 등 새로이 인식된 고찰대상들을 추가하여 부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결과로 해서 통시음운론(通時音韻論)의 내용이 훨씬 풍부하고 다양하여지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언어연구의 관점이 다각화된 결과로 해서 지금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해져가고 있다. 언어습득에서 생기는 세대간 언어체계의 차이에 대한 주목이나, 신경생리학적인 기초 위에서의 언어연구의 성과 등도 사적 음운론에 공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들이다.
음운에 대한 연구는 운학의 시대부터 우리 나라 학자들이 뛰어난 업적을 쌓아온 분야였다. 훈민정음 창제를 뒷받침한 음운이론은 중국으로부터의 운학이론을 흡수, 소화하고 그 위에 독자적 경지를 전개한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그 뒤로도 운학연구는 언어연구의 대명사처럼 되어 내려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주시경(周時經)이나 박승빈(朴勝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 거의 자생적이라 할 주목할만한 인식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음운론연구는 이들의 자생적 인식내용의 계승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학사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게 기록될 사항들이다. 광복 전의 국어학자들로서 음운론과 음성학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의 학자들은 프라그학파의 음운론이론에 접하여 있었고, 현대언어학이 다루는 과제들에 착안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학자들의 관심은 주로 훈민정음 28자 중 없어진 글자들의 음가를 추정하는 데 쏠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 · ’, ‘ㅿ’, ‘○’ 등이 연구의 주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은 28자 밖의 것임.).
그러나 모음조화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에 대한 관찰내용도 이 시기에 이미 발표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광복 이후 적어도 5년간은 학문적으로 큰 전환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학계의 주역들은 여전히 광복 전에 활약하던 소수의 기성학자들이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발표될 수 없었던 업적들이 빛을 보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주제는 압도적으로 음운사적인 것이었으며, 소실문자(消失文字)의 음가에 관계된 연구들은 그 뒤에도 얼마간 지속되어 나온다.
6·25을 정리하면서 국어학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연구 인구도 증가하였지만 다루는 주제들도 확장되었고 설명의 기제들도 폭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적인 기술언어학 이론의 소화에 따라 음소의 확인작업 같은 것이 성행하기도 한 시기이지만, 언어에 대한 관찰이 정밀해지고 정확해진 것을 더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프라그학파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연구에 동원되게 된 것도 이 시기에 있어서라 할 수 있다. 음운체계에 입각하여 음운사를 기술하는 업적들이 이런 조류에서 나올 수 있었다.
연구의 주제도 이제는 소실문자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같은 표기에 의하여 적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대에 관계 없이 고정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할만큼 국어음운론은 성장하였다.
중세국어의 모음체계가 7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애, 에, ᄋᆡ, 외, 위’ 등은 문자 그대로의 이중모음들로서 현대국어에서의 음가와는 달랐다는 사실의 발견은 다음 단계에서의 체계적 연구들을 촉진시키는 기틀이 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어음운론 연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연구업적들도 전에 없이 풍성해져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개관하기가 어려울 정도이지만, 몇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구의 정밀성이 현저히 향상되어, 제약조건이나 예외에 대한 주의가 깊어졌다.
② 생성이론의 영향이 국어학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활발하여졌다. 특히, 구미 각국에서의 연구(주로 해외주재의 한국인 학자 및 유학생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들에서 이러한 경향은 압도적이었다.
③ 공시적 연구에서의 방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각 방언, 각 지역에 대한 정밀한 관찰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④ 한자음에 대한 인식수준이 제고되어 한자음 체계에 대한 사적인 연구가 진척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계림유사(雞林類事)』나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에 대한 음운론적 복원작업이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
⑤ 성조(聲調)에 관한 업적이 집중적으로 생산된 10년간이기도 하였다. 중세국어에 대한 것과 함께 동남방언 및 동북방언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나옴으로써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된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나 공시적으로나 그 연구가 가장 늦었던 분야이기에 이와 같은 집중현상이 생겼다고 평할 수 있겠는데, 외국인 학자(미국과 일본)에게서 훌륭한 참여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한때 기저구조를 위한 음소 설정에서나 음운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상당히 추상적인 성향을 띠었던 음운론연구가 그 추상성을 극복하고, 되도록 음성 실현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오늘에 와서의 음운론 일반의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어음운론에 있어서도 매우 뜻있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면서는 그간의 국어 음운론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반성하려는 업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기저형의 추상성과 관련된 문제와 음운규칙의 공시성(共時性)과 통시성(通時性)의 구별 문제를 논의한 업적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기저형의 추상성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소위 불규칙활용이 중심과제였다. 생성음운론적인 방법으로 불규칙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추상적으로 설정하여 불규칙활용을 음운규칙으로 설명하려 했던 종래의 여러 제안들이 언중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는 실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님을 비판하고서 불규칙용언 어간에 대해서는 기저형을 복수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돕고, 돕지, 도우면, 도와’에서의 어간의 기저형을 /toβ-/과 같이 단일하게 추상적으로 설정하거나 ‘돕-’과 ‘도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하지 말고, 교체형(交替形) 둘을 모두 기저형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to/).
이러한 제안은 현대국어의 불규칙활용 어간들이 보여 주는 비자동적 교체는 통시적 음운변화를 겪은 어간들이 재구조화를 통해서 통시적 음운변화 이전의 교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이들 어간 이형태들의 교체를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방언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성음운론적인 방법론이 국어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국어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 나름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동기도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음운규칙의 공시성과 통시성의 문제가 새로이 등장한 것은 어휘부의 구조 및 음운론과 형태부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공시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통시적 자료들은 모두 어휘부에 등재시켜서 음운부가 떠맡아야 할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시적 음운규칙의 한계를 분명히 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형태론에서의 어휘화라는 개념과도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파생어 형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예컨대 현대 국어에서의 사 · 피동사들은 그 접미사의 이형태들이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어간 전체가 하나의 어휘소로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 · 피동사 어간들은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되는 공시적인 음운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공시적인 형태소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음운규칙에 대한 비음운론적 제약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 일으켰다. 종래에는 ‘안-’(拘)의 명사형 ‘안기’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면서 피동형 ‘안가-’에서는 안 일어나는 것을 활용과 파생이라는 문법범주를 고려하여 비음운론적 제약으로 설명하려 했던 것인데, 위의 견해에 따른다면 ‘안기-’는 전체로서 어휘부에 등재되는 단위여서 경음화라는 공시적인 음운규칙을 적용받을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음운론적 제약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은 이 때까지 음운규칙에 대한 비음운론적인 제약이라고 알려져 왔던 것들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음운규칙의 공시성과 통시성에 관한 논의는 움라우트를 대상으로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어 음운론의 논의들은 공시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언어활동에 있어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과 규칙에 의존하는 부분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언어의 규칙들은 어떻게 습득되고 또 어떻게 운용되는가, 규칙이란 과연 무엇인가 등등 언어의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겨 주었다.
음운규칙의 공시성과 통시성의 문제는 단순히 음운론적 기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음운현상이 주로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음운현상을 지배하는 음운규칙의 공시성, 통시성의 문제는 그 형태소의 결합과정이 공시적인가 통시적인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태론과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음운론자들이 형태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 밖에 이 시기에는 음절(音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음운현상의 동기를 국어의 음절구조에서 찾아 설명하려는 업적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방언 음운론에서는 공시적인 기술에만 머물지 않고 방언 음운사를 기술해 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내적 재구의 방법과 타방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음운변화의 상대적 선후관계를 논의하기도 하였고, 방언이 반영되어 있는 문헌자료들을 모으거나 새로 발굴하여서 방언음운사를 기술하기도 하였다. 그동안의 국어 음운사가 중앙어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할 만하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음운론의 관심 영역을 단어 차원에서 발화(發話) 차원으로 확대해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발화 차원의 음운론은 주로 운율적인 요소와 관련된다. 음조, 음장, 강세, 억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간의 언어능력에는 문법적 능력(좁은 의미의)과 구별되는 화용적(話用的) 능력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 화용적 능력과 관련되는 표현적 자질로서의 음장(音長)이 발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정밀하게 분석하기도 하였고, 형태론적 관점에서 표현적 음장을 다루기도 하였으며, 방언을 대상으로 발화 차원의 음운론적인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음운론의 관심 영역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국어음운론은, 특히 광복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한 연구업적의 축적을 이루었고 이론적으로도 많은 성숙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어음운론 앞에는 자료의 불투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대국어의 음운론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와 함께, 이론적으로는 외래 이론의 수용단계를 벗어나 국어음운론 나름의 이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음운론 일반이론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등의 큰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