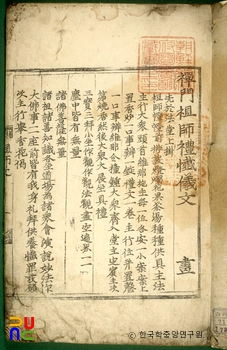구두선 ()
선종은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의 종파로 심구상응(心口相應), 신구일여(身口一如), 해행상응(解行相應),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중시한다. 이 말은 몸으로 좌선의 자세를 취하고 마음으로는 주1을 선택하여 집중함으로써 번뇌를 물리치고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무시한 채 선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하여 이론으로 해박하게 설명하고 논의하는 일에 치중하는 것이다. 마치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하여 미주알고주알 흉내내거나,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수행의 행위가 따르지 않고 언설이나 문자 내지 관념을 앞세워 남에게 선을 지도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비판한 말이다.
이와 같은 풍조는 선어록이 보편적으로 널리 출현하던 당대 말기 내지 송대에 나타난 현상이다. 곧 좌선을 통한 선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수많은 어록이나 선지식의 가르침을 모방하여 언어유희나 문자놀음 내지 관념론적인 이해를 앞세워 그것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구두선(口頭禪)이라고 말한다. 구두선이 출현한 배경에는 선종사적인 배경이 있었다. 선종에서는 당나라 시대부터 문중을 중시하는 문화가 다져지면서 수많은 선사들이 나름대로 각각 개인의 어록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후손들에게 문중의 홍보 내지 권위를 도모하였는데, 그것이 소위 선어록(禪語錄)의 출현이었다. 이후로 선어록이 크게 유행하면서 실제로 선수행에 대한 실천보다 도리어 선어록에 제시된 일화 내지 비유에 대하여 문자를 동원하여 비평을 가하는 문자놀음의 전통이 출현하였는데, 이것을 문자선이라고 하였다. 문자선은 이전의 공안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을 붙이거나 비평을 가하거나 자기의 견해를 주석으로 붙이는 것을 선수행이라 하면서 유행하였다.
이처럼 실제로 선수행이 뒤따르지 않고 수행 내지 깨달음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문자와 언설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선수행의 풍조를 비판하여 용어로 구두선이라는 말이 활용되었다. 구두선은 달리 구두삼매(口頭三昧)라고도 하고, 야호선(野狐禪)이라고도 하며, 엉터리선이라고도 한다.
야호선이라는 용어는 당(唐) 대 말기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의 일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까마득한 과거생에 어떤 제자가 스승 곧 전백장(前百丈)에게 물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인과법(因果法)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인과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답변은 불교의 가르침인 인과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때문에 제자의 질문에 엉터리로 답변한 과보로 500생 동안에 걸쳐 주2인 여우의 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에 당(唐) 대에 일찍이 여우의 몸을 받은 전백장은 후백장(後百丈) 곧 백장회해에게 과거전생에 자신이 잘못 답변한 과보로 여우의 몸을 받은 사연을 밝히고, 후백장에게 자신이 어떻게 답변했어야 여우의 몸을 받지 않았는지 그 가르침을 구하였다. 그러자 후백장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인과법을 잘 이해한다.”고 답변해 줌으로써 여우의 몸을 받은 전백장을 해탈시켜 주었다. 후백장의 답변은 인과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이로부터 야호선은 전백장의 경우처럼 실제의 수행 내지 깨달음의 실속이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선풍 내지 사실과 전혀 어긋난 엉터리 선풍을 가리키게 되었다.
구두선은 달리 상사선(相似禪)이라고도 말하고, 앵무새처럼 말로만 선을 흉내만 낸다는 의미에서 앵무선(鸚鵡禪)이라고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