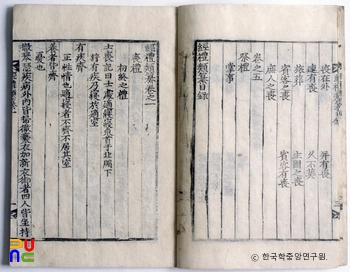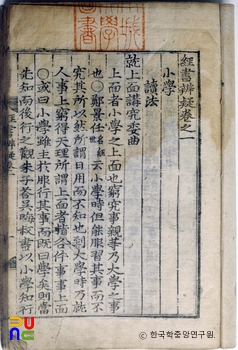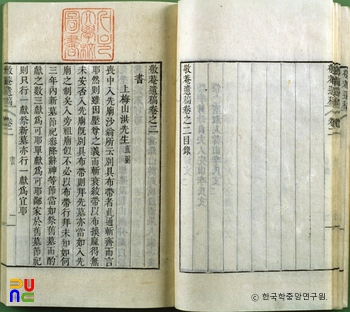예괘 ()
‘예(豫)’는 본래 ‘큰 코끼리’를 뜻한다. 큰 것은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려면 미리 대비해야 하므로 ‘예비하다’는 뜻으로 발전되었으며, 예비해 여유가 있으면 즐겁기 때문에 ‘즐겁다’는 뜻이 파생되었다. 예괘는 즐거움에 처하는 방도에 관해 말하는 괘이다.
예괘는 구사(九四) 하나의 양효와 5개의 음효로 구성되었다. 구사는 강한 운동성을 상징하는 진괘(震卦)의 주효(主爻)로서 상하 5개의 음효가 여기에 감응해 즐거워한다. 또한 아래는 땅이고 위는 우뢰로서 겨울 동안 땅속에 뭉쳐있던 양기가 초봄에 땅위로 분출되면서 ‘통창화예(通暢和豫)’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땅은 ‘순(順)’하고 우뢰는 ‘동(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전(彖傳)」에서 “천지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운동함으로 일월과 사계절의 변화가 어긋나지 않듯이 성인이 이 법에 순응해 움직임으로 형벌이 맑아서 백성들이 열복(悅服)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괘사에서 “예는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이 이롭다.”고 말한 것은 제후가 이 법에 순응해 다스릴 때에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된다는 유교의 정치사상을 말해 준 것이다.
인간이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쾌락에 탐닉하기 쉽다. 예괘의 6효사는 대부분 이 점을 경고한다. 초육(初六)은 구사(九四)의 총애를 받아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흉하다.
육삼(六三)은 구사(九四)와 음양 관계로서 부정한 위치에서 쾌락에 빠지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 육오(六五)도 구사(九四)와 음양 관계이면서 음효가 양효를 타고 있다. 쾌락에 탐닉해 고질병이 걸려 있는 상태다.
상육(上六)은 열낙(悅樂)의 극치로서 즐거움에 눈이 어두어졌으나 극한에 도달했기 때문에 크게 변화해 욕구를 절제하고 행동을 삼가기 때문에 허물이 없게 된다.
“육이(六二)는 절개가 돌처럼 굳으니 날을 마치지 않으니 올바르기 때문에 길하다.”고 했듯이 중정(中正)한 덕을 갖고 자신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쾌락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