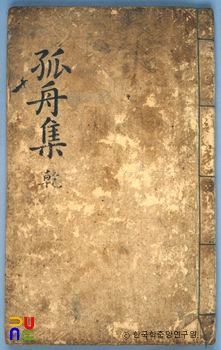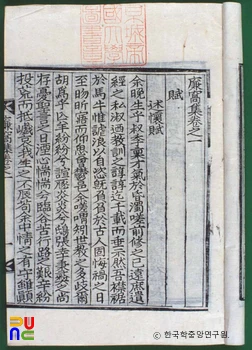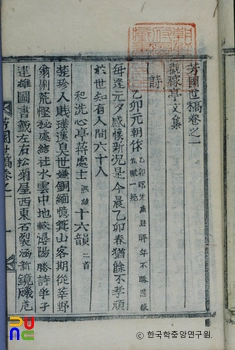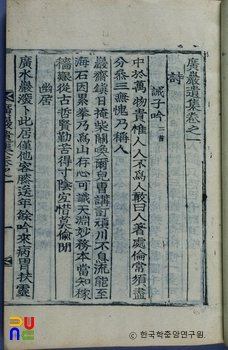두와문집 ()
17권 8책. 목활자본. 1908년 아들 정진(廷鎭)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재종손 시술(蓍述)의 지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민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252수, 권3·4에 소 3편, 서(書) 96편, 권5·6에 잡저 2편, 권7에 서(序) 23편, 권8에 기 19편, 권9에 발 18편, 상량문 4편, 권10에 축문 14편, 제문 11편, 애사 3편, 권11·12에 유사(遺事) 9편, 권13·14에 행장 10편, 권15에 전(傳) 3편, 비명 1편, 묘지명 1편, 묘갈명 3편, 권16에 겸재하선생입후변무록(謙齋河先生立后卞誣錄) 1편, 권17은 부록으로 행장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대체로 자연에 관한 시가 많으나, 인심(人心)·도심(道心)과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한 시로서, 사단칠정은 모두 정에서 나왔다고 묘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서(書)는 학문과 예설에 관한 문목(問目)이 대부분이다.
잡저 중 「세한만록상(歲寒漫錄上)」은 심성정(心性情)·이기(理氣)·사칠설(四七說)에 관한 논설이며, 「세한만록하(歲寒漫錄下)」는 이기·음양·동정 등에 관한 논술이다.
「산중문답(山中問答)」은 당시의 국가와 사회의 모든 폐단과 부조리 5개 항목을 열거한 것으로, ① 사림의 언로가 편파된 폐단, ② 선비의 과거 폐단, ③ 향리의 산송(山訟) 폐단, ④ 군정(軍政) 양역(良役)의 폐단, ⑤ 전부(田賦)의 환상(還上) 폐단 등을 열거하였다.
그밖에도 공부(貢賦)와 노비의 제도에 관하여 모순과 폐단을 열거하고 대책을 논술하였다. 또한, 환상법에 대한 폐단의 대책으로 상평창(常平倉)과 주희(朱熹)의 사창법(社倉法)의 실행을 역설하고, 아울러 사창법의 실행조례 13개항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