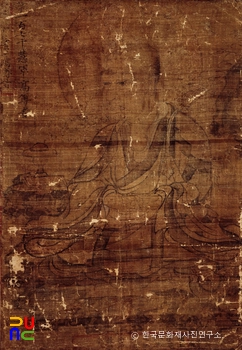양산 원효암 석조 약사여래 좌상과 복장유물 ( 과 )
2005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의 석조약사여래좌상 1구와 복장유물 3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불상조성기에 의하면, 원래 양산 통도사의 약사전에 봉안되었던 것을 인근의 원효암으로 옮겼다고 한다. 제작연대는 1648년(인조 26)으로 나흠(懶欽), 원변(元卞), 학청(學淸), 쌍남(雙蝻), 혜영(惠英), 설옥(雪玉), 언이(彦伊) 등 7명의 화원이 참여하여 조성하였으며,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한 이는 어산도인(魚山道人) 희민(熙敏)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석조약사여래좌상은 좌측에 관음보살과 우측에 지장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재질은 고르고 연한 경주 옥돌[慶州玉石]을 사용하여 조성하고 도금하였는데, 경주 옥석은 새기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 조선 후기 불상 재료로 많이 이용되었다. 이 불상은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인,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등이 약간 구부린 자세를 취하고 항마촉지인에 자비로운 원만상(圓滿像)을 구현하였다. 특히 왼손은 자연스러운 반면,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 짧고 측면이 다소 두껍다. 이것은 석재 불상의 특징으로서, 목불에서 양손을 따로 제작하여 손가락의 길이나 부피감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견의 법의에 결가부좌한 좌상으로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취하였다. 머리는 신체에 비해 작은 편이고,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나발과 이중계주가 표현되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우며 각진 이마, 가늘면서 수평으로 선각한 눈, 얼굴에 비해 큰 코, 가는 입술에 미소를 머금어 인자한 인상이다. 또 눈썹에서 코로 이어지는 선, 코 양측의 선각이 깊고, 귀나 귓불이 매우 두꺼운 것은 역시 목조불상과의 차이이다. 목과 귀는 비교적 짧게 표현되었으며, 다소 좁아 보이는 양어깨는 아래로 쳐져 있으나 측면에서 보면 어깨와 가슴이 둔중해 보일 정도로 두껍고, 팔 역시 매우 비대할 정도로 두껍게 조각되었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걸치고, 그 위로 대의를 입어 왼쪽 어깨 위로 자락을 넘긴 변형통견식으로 법의의 단면이 매우 두껍게 드러나 있다. 가슴 아래에는 승각기를 접어 꽃잎 모양으로 만들고, 두 줄의 띠로 묶어 정리하였다. 결가부좌한 양다리 사이에 군의자락을 수직으로 깎아서 목조불에서 자연스럽게 군의자락이 바닥에 이르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며, 군의자락의 단면이 매우 두꺼워 조각기술상의 한계가 드러난다. 대좌는 앙련과 복련이 표현된 목조대좌로서 후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장유물로는 불상조성기 외에 다라니경과 동제후령통 등 3점이 수습되었으며, 후령통에서는 오색실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의 재질인 경주 옥석은 새기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 조선 후기 불상 재료로 많이 이용되었다. 불상 모습은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등이 약간 구부린 자세를 취하고 있어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옥석을 사용한 불상 중에서는 등신대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크며, 1648년이라는 절대연대와 조성자가 정확히 밝혀져 있어 조선시대 석불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