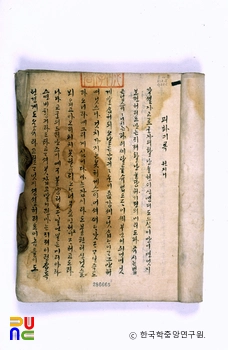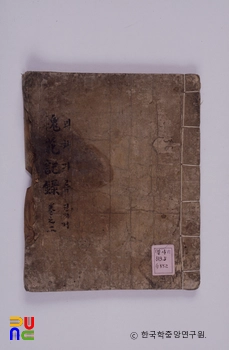괴화기록 ()
총 2권 2책의 한글 필사본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괴화긔록」은 일사문고(一簑文庫)에 속해 있는 자료로, 안에 ‘경성대학도서(京城大學圖書)’ 장서인이 찍혀 있다. 제1책은 총 82면으로 크기는 29.1×21.2cm이며, 제2책은 총 118면으로 크기는 29.1×23.7cm이다. 각 면의 글자 수는 일정치 않으나 대략 11행 25자 내외이다. 작품 전체의 분량은 68,600여 자이다.
“을츅 쵸츈의 만숑당 한만헌 필단”이란 필사 후기로 보아 대략 1925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필사자로 추정되는 만송당 한만헌의 신분은 미상이다. 한편 『김용전』 뒷부분에 필사되어 있는 「향산동중약조」의 필사자가 “향산 만송당”이어서 「괴화기록」의 필사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니 쇼셜쥬인 니씨부인 역 오젼히 된 고로 …… 쇼상히 드른 바로 그 결점을 씻기 위ᄒᆞ여 …… ”라고 한 필사 후기의 내용을 보면, 만송당 한만헌이 듣고 안 이야기를 나름대로 엮어 필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집안에 있는 꽃이 경사가 있으면 피어날 시절이 아님에도 만발하는 현상이 가문의 융성으로 상징되어, 제목을 ‘괴화기록’으로 붙인 것 같다.
작품의 전체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조선 영조 대에 누대로 삼청동에 살던 이 승상(丞相)은 늙어서 자식을 얻었으나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주9는 이 한림(翰林)으로, 이 한림은 부친의 초상을 치른 후, 암행어사의 직을 맡아 황해도 산골을 지나게 된다. 어사(이 한림)는 황해북도 토산의 한 산골에서 우연히 어느 총각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 총각은 이 좌수의 아들로 부친의 죽음 이후 누이 ·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였다. 손님인 어사에게 접대할 것이 조밥밖에 없었으나 총각의 어머니가 제사 지낼 쌀을 내어 어사를 정갈하게 대접한다. 어사는 가난으로 인해 혼약이 깨진 총각의 고민을 듣고, 어사의 권한으로 총각이 김 좌수의 딸과 혼례를 올릴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총각의 누이를 김 좌수의 딸과 혼인하려던 조 서방과 혼인할 수 있게 한다. 어사는 김 좌수가 사위에게 주3하도록 주4 준다.
어사의 임무를 마친 이 한림은 안동에 부사로 부임하게 된다. 부사(이 한림)는 늙은 어머니와 부인 최씨를 데리고 근처 암자의 약수터를 찾아가는데, 부사 일행을 본 김가가 최씨 부인의 미모에 반해 부사의 부인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는다. 본래 김가의 부친은 좌수였는데 주5하던 것이 부사의 부친에게 발각되어 자리에서 쫓겨났고 유리걸식하다 죽었다. 김가는 이를 원한으로 여겨 통인 하돌이와 작당하여 부사를 독살한다. 부사를 독살한 김가는 박군실을 비롯한 일당을 주6으로 위장시켜, 과천의 선산으로 성묘를 가는 부사의 부인 최씨를 납치한다.
안동부사의 부인 최씨는 잉태한 채로 김가에게 납치되어 겁탈 당할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마침 옛날에 황해도어사로 있던 부사에게 은혜를 입었던 김 좌수의 혼령이 나타나 최씨를 도와준다.
김 좌수의 혼령은 부인을 구하고, 17년 뒤에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부인의 안위를 옆에서 지켜 준다. 유복자인 이효석은 김가를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자라나고, 김가는 이효석에게 용문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다.
이효석은 17세가 되던 해, 과거를 보기 위하여 상경하던 중 조수재를 만난다. 이효석과 조수재는 의기투합하여 과거에 급제하면 처남과 매부 관계를 맺기로 약속한다.
이효석은 서울에 도착하자 어머니의 지시대로 삼청동 할머니 댁에 투숙한다. 그러나 이효석과 그의 할머니는 아직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한다. 이효석은 그날 밤 할머니의 부탁으로 아버지인 안동부사의 제사를 지낸다.
그때 마침 제사 광경이 평복으로 밀행 중인 임금의 눈에 띈다. 임금은 그 장면을 괴이하게 여겨 유심히 보았다가 다음날 과제(科題)로 출제한다. 이효석은 과거에 장원급제한다. 또 김 좌수의 혼령에 의하여 이미 과제를 알고 있었던 조수재도 2등으로 급제한다. 이효석은 조수재와의 약속에 따라, 그의 누이 조규수와 혼인하여 함께 귀가한다.
한편, 부사의 부인 최씨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통하여 안동부사를 죽인 김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적어 부윤에게 전한다. 그로 인해 김가 일당은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씨는 17년 동안 겪은 고초로 기력이 떨어져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최씨에게 정렬부인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그런데 최씨는 김 좌수의 혼령을 통하여 비법을 전수받았던 며느리 조씨의 도움으로, 장례식 도중에 다시 살아난다.
이효석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삼청동 본가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유복한 생활을 한다. 벼슬은 승지(承旨)까지 오르게 된다. 한편, 김 좌수의 아들과도 결의형제를 하여 화목하게 지낸다.
이 작품은 이효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다시 가문을 융성시킨다는 내용의 가문소설이다. 최근 논의에서 제1권의 행방이 발견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작품은 전대의 야담과 설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한 점에서 특징적인데, 특히 제1책은 널리 알려진 ‘박문수 암행어사 설화’를 그대로 옮겨 싣다시피 서사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수의 아내가 되었다가 아들이 장성한 뒤 주7하고 자결한 열녀 이야기, 임금이 순시 중에 갸륵한 사람을 보고 그를 위하여 과제를 내는 이야기, 신이한 능력을 지닌 며느리 이야기, 은혜 입은 사람의 혼령이 보은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설화가 한 편의 소설 내에서 무리 없이 짜여져 있다.
한편, 괴화가 피는 것으로써 복선(複線)을 마련한 기법, 그리고 일상어에 가까운 문장 표현을 구사한 점 등은 신소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할 때, 「괴화긔록」은 고소설과 신소설의 중간적 성격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주10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신-구소설의 문체가 절충된 주8적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의고적 면모는 선악의 갈등을 주제로 삼았으되,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초월적 존재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퇴행적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고소설의 창작 방식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1920년대에도 여전히 새로운 작품의 창작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