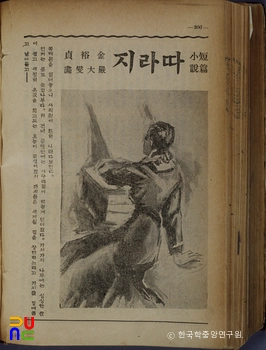따라지
소설은 어느 화창한 봄날 사직동 꼭대기에 올라붙은 초가집, 주3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주4의 푸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그날만은 방세를 반드시 받아 내리라 결심하고 버스 주5 딸에게 붙어 사는, 영양실조로 얼굴이 뜬 주6 영감에게 주7를 재촉하지만, 앓는 소리와 호통으로 물러나온다. 그 뒤, 카페에 나가는 ‘아끼꼬’에게로 화살을 돌리나, 늘 그렇듯이 역습 당하기만 한다. 결국 가장 만만한 ‘톨스토이’라는 세입자에게 방세를 받아내려고 조카를 불러다 짐을 들어내게 한다. 그러나 누이의 방에 얹혀살면서 누이에게 늘 구박당하고도 방구석에서 글만 쓰는 톨스토이에게 연민을 느껴왔던 아끼꼬가 끼어들어 오히려 주인마누라와 조카를 몰아세운다. 거기다가 화가 난 노랑퉁이 영감까지 지팡이를 휘둘러 사태가 역전된다. 주인마누라는 파출소 순경을 불러대지만, 이미 평상시로 되돌아가 있는 집안을 본 순경에게 애매한 비난만 듣고 만다. 화가 난 주인마누라의 요청대로 아끼꼬는 순경에게 호출되지만, 항상 그랬듯이 그녀는 별일 없이 돌아오며 주인마누라에게 보복할 생각을 한다.
이 작품은 셋방살이하는 여러 유형의 인물들을 희화적으로 그려낸 웃음의 문학이다. 웃음 속에는 도회 변두리에서 허덕이는 최하층의 삶의 슬픔과 고달픔이 반어적으로 나타난다. 이죽거리는 야유가 기지에 가득 찬 필치를 통해 생생히 드러나며, 인물의 말씨, 동작, 심리의 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그려내 생동감이 넘친다.
김유정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은 「봄봄」, 「동백꽃」, 「산골 나그네」 등으로, 이들은 시골을 배경으로 궁핍하고 고단한 농민들의 모습을 그린다. 그럼에도 이들 소설에서 농민들이 어둡게만 그려지지 않은 것은 작가 특유의 웃음, 곧 골계와 해학 덕분이다. 「따라지」에서도 소설의 배경은 주8로 옮겨왔지만, 방세를 받으려는 주인의 음모와 방세를 어떻게든 미루려는 셋방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김유정 문학의 특징인 골계와 해학이 잘 드러나고 있다. 사실적인 묘사가 뛰어나게 구현된 한편 작가의 개성 역시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평가되는 것 역시 이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