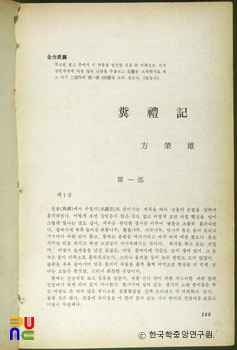분례기 ()
『분례기(糞禮記)』는 1967년 방영웅(方榮雄)이 지은 장편소설이다. 해방된 지 수년 후 충청남도 예산읍의 ‘호롱골’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똥례’라는 열여덟 살 소녀의 삶을 그린다. 작품 속의 토속적 세계는 근대의 역사적 시간으로부터 단절된 원시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은 동물적인 삶에 가까운 것으로 그려진다. 현재형 시제의 서술을 통한 빠른 전개, 인물들의 대화 속 실감나는 충청도 사투리의 구사, 원색적인 성 묘사 등으로 당대 평단 및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해방된 지 수년 후 충청남도 주1의 ‘호롱골’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똥례’라는 열여덟 살 소녀의 삶을 그린 『분례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석(石) 서방의 첫째 딸인 똥례가 먼 친척 ‘용팔’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친구 봉순의 자살을 계기로 자기도 죽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마음을 고쳐먹고 신랑 점(占)을 보러 향천사로 향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제2부는 똥례가 ‘노랑녀’의 아들 ‘영철’과 혼사가 결정된 후, 호롱골에서 벌이는 상여 잔치 다음날 혼인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다. 제3부는 노름꾼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변소의 분변 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처녀쥐’를 몰래 기르며 시집살이를 견디던 똥례가 영철에게 맞아 실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오해까지 받으며 결국 시집에서 쫓겨나 호롱골로 돌아온 뒤 실성하여 사라지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분례기』는 현재형 시제의 서술을 통한 빠른 전개, 인물들의 대화 속 실감나는 충청도 사투리의 구사, 원색적인 성 묘사 등으로 당대 평단 및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똥례는 노름판 주2으로 소일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석 서방과 주3에 걸려 하루 종일 누워있는 석 서방댁을 대신하여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팔고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주4에서 낳은 아이라 하여 주5에까지 ‘분례(糞禮)’라고 이름을 올린 똥례는 열여덟 살 되던 해 어느 겨울날, 성불구자라고 소문난 용팔과 함께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그로부터 겁탈을 당한다.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내던 똥례는 친구 봉순이 누군가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목매어 자살하자 충격을 받고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하지만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을 지닌 똥례는 마음을 돌리고 신랑 점을 치러 향천사로 향한다. 얼마 후 읍내 장터에서 국밥집을 하는 노랑녀의 아들 영철이 혼인 상대로 정해지고, 똥례는 마을에서 성대한 상여 잔치가 벌어진 다음날 주6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노랑녀의 집으로 시집을 간다.
하지만 노름꾼에 애꾸눈인 영철은 이내 노름을 하느라 며칠씩 집을 비우고 똥례에게 폭행을 일삼는다. 어느 날 노름판에서 큰돈을 따온 영철은 이제 손을 떼겠다며 똥례에게 돈을 맡기지만 바로 다음날 돈을 잃는다. 돈을 내놓으라며 정신을 잃을 때까지 똥례를 구타한 영철은 똥례가 바람을 피운다는 오해까지 하고, 이에 노랑녀 모녀가 합세하여 똥례를 쫓아낸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똥례는 과수원의 머슴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실성한 채 호롱골로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똥례를 위한 굿판이 벌어지고, 다음날 새벽 똥례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여겨 몰래 키워온 암컷 쥐의 시체를 싼 보퉁이 하나만 들고 처음 용팔에게 강간당했던 삽티고개로 달려간다. 새벽에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똥례를 발견한 용팔은 똥례가 빨갛게 떠오르는 햇덩이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잘 가라고 외친다.
『분례기』는 해방 후 2~3년이 지난 어느 때의 충청도 예산읍 일대라는 시공간적 배경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속의 주7 세계는 근대의 역사적 시간과 거의 단절된 몰역사적이고 원시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은 특히 성에 관한 묘사와 육체에 관한 묘사에서 두드러지듯이, 동물적인 삶에 가까운 것으로 그려진다. “소경”, “백치”, “벙어리”, “애꾸”, “간질병”처럼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며 그들이 주로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묘사된다는 것 또한 이 작품의 특징이다.
한편으로, 『분례기』는 원시적인 농촌 마을에서 살아가는 무구한 사람들의 생명력이 대화 속에 사용되는 토속어의 능란한 구사나 민요의 삽입 등을 통해 풍부하게 제시된다는 점 역시 특징으로 꼽힌다.
『분례기』는 『창작과비평』에 3회에 걸쳐 연재되고 이듬해 바로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가난하고 무절제하며 폭력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며 살아가는 농촌 사람들의 실상을 토속적이고 실감나는 문체로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된다.
백낙청을 비롯한 『창작과비평』의 편집진은 『분례기』를 『창작과비평』이 문학적 지향점으로 삼았던 리얼리즘의 구체적인 예술적 성취로 평가했다. 반면 선우휘는 『분례기』를 김동인의 「감자」나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 또는 김유정의 단편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자연주의 소설로 보았다.
최근의 논의에서는 『분례기』에 대한 『창작과비평』의 발견 자체가 1960년대 근대화와 개발주의에 대한 저항의 한 전략이었다고 보거나, 작품 속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성찰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