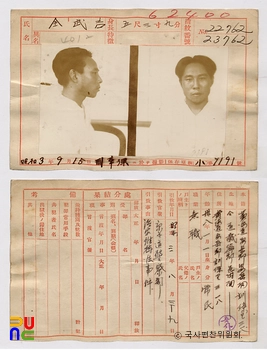여정 ()
「여정(旅程)」은 조용만(趙容萬)이 지은 단편소설로 『문장(文章)』 1941년 2월호에 발표되었다. 일제 말기 일본의 점령지였던 북중국[北支]으로 팔려나가는 식민지 조선 여성들의 모습을 신문기자인 ‘나’의 우울한 시선을 통해 그려낸 작품이다.
소설은 인천에서 다롄[大連]으로 가는 배 안의 풍경을 그린다. 1년 차 신문 기자인 ‘나’는 조선은행 다롄 지점에 근무 중인 최군과 함께 배에 타게 된다. 갑판에서 ‘나’는 열서너 명의 조선인 소녀들들이 몰려서 있는 것을 본다. 최군은 그들을 브로커를 따라 북중국으로 팔려가는 ‘반도낭자군(半島娘子軍)’이라 말한다. 선실에는 흰옷을 입은 조선 사람들이 섞여 있어 붐빈다. 선실에 들어온 조선인 소녀들이 명랑하게 웃고 있는 와중에 쓸쓸한 얼굴로 앉아 있는 복순이가 ‘나’의 눈길을 끈다. ‘나’는 선실에 있는 승객들의 대화를 통해 빚에 치여 팔려 오게 되었다는 복순이의 사연을 듣게 된다.
마침 기선회사의 창립 기념일이라 축하연과 연극이 열린다. 객선의 ‘뽀이’는 연극 소도구를 빌린다는 명목으로 복순이의 뒷머리에 꽂혀 있던 일본 빗을 허락도 없이 뽑아 간다. ‘나’는 복순이를 대하는 그의 능글맞은 태도가 ‘얼마 안 있어서 자기네 같은 사람한테 웃음을 팔 그런 계집애라고 경멸하는 것’ 같아 보여 불쾌해 한다.
‘나’가 연극을 보기 위해 휴게실에 들어섰을 때는 주1의 한 장면이 공연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우스꽝스러워진 ‘나’가 갑판으로 나오니, 복순이는 어두운 의자 등에 혼자 기대어 서 있었다.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애련과 불안’을 느끼며 복순이를 지나 의자에 앉지만, 놀란 복순이는 곧 그곳을 떠났고 ‘나’는 까닭 모를 우울을 느끼며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선실에 돌아오니, 다른 소녀들이 연극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복순이만은 헌 담요를 뒤집어쓰고 누워 있었다. 그녀가 울고 있을지 모른다고 ‘나’가 생각하던 중 최군은 연극 구경을 다녀온 ‘나’를 ‘경멸하는 어조’로 나무란다.
「여정」은 일제 말기 일본의 침략 전쟁에 휘말려 가던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지식인의 우울하고 착잡한 내면을 포착하고 있다. 특히 ‘반도낭자군’이라는 명목 아래 전선으로 팔려가는 조선인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 사회의 비참한 삶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자, 일제 말기 조선인 여성에 대한 전시동원(戰時動員)을 소극적으로나마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당대 보기 드문 성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상황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는 매우 무력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전시동원을 위한 주3가 강요되었던 194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황에서 식민지 지식인들이 느꼈던 우울함과 무력감을 드러내는 작품으로서, 작가인 조용만 스스로가 그랬듯이 직후 대일 협력으로 치달았던 일부 조선인 지식인들의 전향 직전의 정신적 풍경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