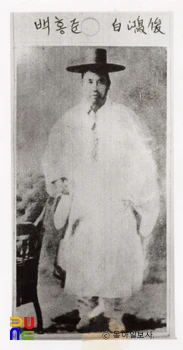대한기독교서회 ()
대한기독교서회는 1890년 기독교 서적의 출판과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초교파적 연합 사업 단체이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헐버트, 스크랜턴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참여하였다. 한국 출판 문화의 개척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였고, 기독교 선교는 물론 한국적인 기독교 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대한기독교서회는 한국어로 된 기독교 서적, 전도지, 정기 간행의 잡지류를 발행하여 전국에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889년 10월 헤론(John W. Heron)의 제안으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서울의 언더우드(Horace G. 주1 집에서 기독교 문서 선교 사업을 의논하였고, 1890년 6월 25일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라는 연합 기구를 만들었다. 주2 임원으로 회장 올링거(Franklin Ohlinger), 부회장 헐버트(Homer B. 주3, 섭외 총무 언더우드, 기획 총무 스크랜턴(William B. 주4, 회계 펜윅(Malcolm C. Fenwick)을 주5, 언더우드, 게일(James S. Gale), 마펫(Samuel A. Moffett),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스크랜턴, 올링거, 존스(George H. Jones), 헐버트, 벙커(Dalziel A. Bunker), 맥길(William B. McGill), 펜윅이 이사에 선임되었다. 이들은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남성 선교사 대부분이었다.
언더우드가 영국서회(Religious Tract Society of London)에 서회 설립을 알리고 재정을 요청하자 영국서회는 1893년부터 후원을 시작했다. 미국서회(American Tract Society)도 1892년 후원을 시작했다. 회장 올링거는 중국성교서회의 위원으로 중국에서 전도와 교육 · 출판 사업에 깊이 관여했고, 1899년부터 조선성교서회의 서기로 활동한 리드(Clarence F. Reid) 역시 중국에서의 경험을 한국의 출판사업에 반영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초기에 영 · 미 서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중국서회로부터는 서적 번역과 출판 · 유통에서 영향을 받았다.
한국 명칭은 1891년 1월 ‘조선성교회’로 정했다가 얼마 후 ‘조선성교서회(朝鮮聖敎書會)’가 되었고, 1897년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뀌자 ‘대한성교서회’로 고쳐 부르다가, 1907년 ‘조선예수교서회(朝鮮耶蘇敎書會)’로 명칭을 바꾸었다. 영문 명칭도 1915년 ‘The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로 변경했고, 다시 1919년에는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로 명칭을 바꾸었다. 1939년에는 ‘조선기독교서회’로,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06년 종로에 낡은 한옥을 구입하였고, 1911년에는 새로 2층 건물을 지었다. 출판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 필요해지자, 스와인하트(Martin L. Swinehart)가 모금과 건축을 맡고 미국 주6들의 후원을 받아 1931년 종로에 현대식 5층 건물을 마련하였다. 1973년 종로 2가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재정으로 자립을 하였다. 1987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사옥을 새로 짓고 이전하였다.
1893년 서울 · 부산 · 평양에 관리인을 두어 서적 판매 실무를 맡기며 본격적 사업이 추진되었다. 서울 관리인인 빈턴(Cadwallader C. Vinton)이 판매뿐 아니라 편집 출판 실무까지 맡으며 초기 기틀을 잡았다. 1907년 빈턴이 건강 악화로 귀국한 후 사업이 부진하다가, 1909년 한국인 이용균이 판매 업무를 전담하였다. 미국서회와 영국서회에서 전임 총무의 봉급을 3년 동안 지원받기로 하고 1910년 구세군 사관 본윅(Gerald Bonwick)을 전임 총무로 고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확장하였다.
1912년부터는 한국 교회가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서회주일’로 지키면서 한국인의 헌금도 증가하였다. 1915년 이후에는 미국 남 · 북장로회,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와 미국 남 · 북감리회, 미감리회여선교회 등 7개 선교부가 총무의 봉급을 전담하면서 교회 연합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1918년 클락(William M. Clark), 베어드(William M. Baird), 양주삼(梁柱三)으로 편집부를 구성하면서 편집 · 출판 · 판매 기능이 체계화되었다. 1924년 하디(Robert A. Hardie)가 편집부장 겸 『기독신보』 사장이 되었고, 김필수, 오천영, 최성현, 김태원이 편집부 보조원이 되었다. 회장 · 부회장 · 총무 · 회계 등 임원 외에 실행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두어, 도서의 내용 검토와 추천권은 검열위원회가, 출판 결정권은 실행위원회가 갖고 있어 상호 견제와 보완을 하게 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전임제 편집위원을 두어 연속성 있는 출판 기획이 가능해졌다. 1928년에는 32명의 이사 중 김필수, 최재학, 전필순, 장락도, 김인영, 차재명 등 6명의 한국인이 참여하였다.
1890년 첫 주7은 중국 선교사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의 글을 언더우드가 번역한 『셩교촬리(聖敎撮理)』였다. 1892년에는 한국 최초의 찬송가인 「찬미가」를 발행했다. 1894년 12종을 발행했고, 1900년에는 서적과 전도지 판매 부수가 9만 743부에 달했으며, 1905년 25만 부의 서적을 판매했다. 1910년에는 전도용 소책자 21만 부, 책 3만 4천 부, 전도지 318만 부를 출판했으며, 1911년부터 1931년까지 일반 도서 321만 부, 잡지 및 신문 323만 부, 전도지 2,358만 부가 출판되었다. 선교사들이 1905년에 창간한 『The Korea Mission Field』를 1910년부터 맡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915년에는 교단연합신문 『기독신보(基督申報)』를 맡아 발행하여 서회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1890년에서 1940년까지 약 700여 종의 서적을 출판하고 4,470만 권을 판매했으며, 전도지는 2,800만 매를 발행했다.
초기에는 전도 소책자와 초보적인 계몽 · 교양서적을 발행하였는데, 새 신자들을 위한 교리서, 가톨릭 비판서, 교회 생활 안내서와 교회사 서적, 복음의 핵심과 주8을 담은 예수전 서적들을 발간하였다. 한국 교회의 조직이 체계화되면서 주일 주9 공과와 교재들이 배포되었고, 1907년 부흥 운동 이후에는 개인 구원과 영적 묵상집 등이 발간되기도 했다. 점차 출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질적 수준도 높아졌으며, 성서주석 · 찬송가 · 교회사 및 신조와 교리, 주일 학교 교리와 전도용 소책자가 대거 출판되었다. 한글 공부, 건강과 위생, 결혼 생활, 세계 역사, 절제 생활, 유아 양육, 농민 생활 등 일반 교양 서적도 다수 발행하였다.
1941년 태평양 주10이 발발하면서 영미계 선교사들은 대부분 귀국하였고 남아 있던 선교사들도 강제 추방을 당했다. 1940년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은 효과적인 운동이 되지 못했다. 1941년 3월 이사회에서 외국인과의 관계를 끊고 체제와 경영을 변경하기로 하고, 4월 양주삼(梁柱三)에게 행정 총무직을 맡겨 서회의 관리권을 넘겨주었다. 1942년 일제는 서회의 재산을 주11으로 선언하여 모든 운영권을 박탈해 갔고 서회의 임무는 중단되었다.
광복 후 1948년 3월 이사회에서 이사장 남궁혁(南宮爀), 총무에 김춘배(金春培)를 임명하여 출판 사업의 재건을 도모하였다. 1949년 8월 출판된 『합동찬송가』는 발행 1년 만에 10만여 부가 팔렸다. 그러나 6·25전쟁 중인 1950년 9월 서회 건물은 크게 파괴되었고, 납북 및 희생 등 인명 피해도 상당했다. 전란 중인 1952년 3월 부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납북된 남궁혁 대신 오긍선을 이사장으로, 버크홀더(Marion O. Burkholder)를 부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1952년 어린이 잡지 『새벗』을 발간하였다.
1955년 개신교선교 70주년 기념 출판 사업, 1957년 월간지 『기독교사상』 창간, 1958년 신학 교재의 출판, 1960년 점자(點字) 찬송가 발행 등의 업적을 남겼다. 1960년대부터는 사업에 잘 되어 1962년 평신도신학총서가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가정 예배서인 『다락방』의 발행, 1967년 맹인들을 위한 점자 월간지 『새빛』의 창간, 개편찬송가 발행, 그리고 현대사상사(現代思想社)의 설립, 1972년 『그리스도교대사전』의 출판, 1976년 기독교 출판 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만든 대한기독교출판사의 설립 등 여러 활동이 전개되었다. 1975년 처음으로 서적 판매가 100만 부를 넘어섰고, 1978년에는 153만 부를 기록했다. 1983년 『통일찬송가』, 2006년 『21세기 찬송가』를 발행하였다.
개화 초기부터 시작하여 한국 출판 문화의 개척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였고, 기독교 선교는 물론 한국적인 기독교 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