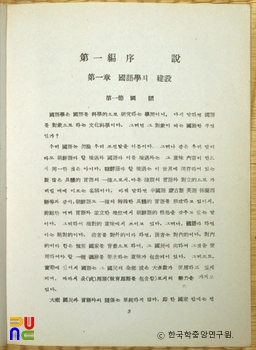문법 변화 ( )
이에는 문법단위의 생성·발달·소멸 뿐만 아니라 어순이나 문법적 의미기능의 변화도 포함된다.
이 변화는 일정한 원리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어떤 목적을 두고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며, 그 원리는 구조 속에 내재하는 체계에 잠재한다. 그것은 문법의 효율이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체계의 안정을 지향하는 평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변화에 있어서도 넘을 수 없는 한계는 그 내용의 의미를 손상시키거나 없앨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는 도리어 평이화에 역행하는 어형 확충을 위한 변화가 일어난다.
문법변화의 원리는 일정시기의 정태적인 단면의 모습을 시대의 순차에 따라 계기시킴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일정시기의 문법적 상황을 있는 모습대로 기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몇 개의 단면들을 차례로 겹쳐 그들 사이에다가 연계성을 주는 데서 인지되는 것이다.
국어 문법변화에 있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형태소의 생성과 소멸이다. 옛말로부터 오늘의 국어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태소가 생성되었다면, 그것은 ① 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옛말의 문법형태를 모태로 하였을 것이고, ② 상당한 시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하였을 것이라는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형태소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옛말의 문법형태와 관련되는 정도나, 물려받은 영향의 정도는 같지 않으므로 그 판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문법형태소의 생성 및 발달은 여러가지 일정한 변화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곧, ① 체언의 보조사화, ② 용언의 후치사화, ③ 통사적인 우언적(迂言的, periphrastic) 구성의 선어말어미화, ④ 용언어간의 선어말어미화 등의 변화과정이 그것들이다. 체언 또는 용언의 조사화 혹은 후치사화는 많은 예가 있다.
우선 체언이 조사화한 예로는 ‘그ᅌᅦ(명사 ‘○’+처격 ‘에’의 구성)’가 그 앞에 오는 속격 ‘ᄋᆡ/의’와 함께 여격의 ‘에게’로 변화한 것이다.
한편, 이 구성에서 ‘ᄋᆡ/의’ 대신 ‘ㅅ’이 연결된 ‘·ㅅ#그ᅌᅦ/긔·게’는 존대의 여격 ‘께’로 발달하였다. 또, 체언 ‘ᄀᆞ장’은 그 앞의 속격 ‘ㅅ’과 함께 보조사로 변화하였는데, 현대어의 ‘까지’가 곧 이에서 발달한 것이다.
용언이 후치사화된 예도 적지 않은데, 동사어간 ‘ᄃᆞ리·(率)’에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가 결합된 ‘ᄃᆞ려’가 이미 중세 후기어에서 여격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것은 ‘니ᄅᆞ다[謂]’ 등의 동사에 지배되던 특성을 가지기도 하였다.
동사 ‘보다[見]’에 ‘·고’가 붙은 ‘보고’도 현대어에서는 여격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밖에 용언의 부동사형에서 보조사로 굳어진 예는 ‘○·[附]’의 부동사형 ‘브터’, ‘좇·[隨]’의 ‘조차’, ‘닥·[將]’의 ‘다가’, ‘ᄒᆞ·[爲]’의 ‘ᄒᆞ고’, ‘남·[餘]’의 ‘나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어류를 후치사(後置詞)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자립형식의 단어가 문법적으로 추상화되어 일정한 관계의 의미만을 가지고 주로 체언 뒤에 쓰이는 의존형식으로 변화된 것으로서, 중세 후기만 해도 아직 일반적인 조사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 후치사는 점차로 변화를 거치면서 대부분이 보조사로 되어 체언에 직접 붙거나, 일정한 격형태에 접미하게 되었다.
통사적인 우언적 구성이 선어말어미화한 대표적 예는 과거시제어미 ‘·았·었·’이 역사적으로 생성된 과정을 들 수 있다. ‘·았·었·’의 전단계형은 ‘·앳/엣·’이며, 이것은 ‘용언어간+아/어#잇·’의 우언적 구성에서의 ‘아/어+잇·’의 축약형이었다.
그 뒤 이 축약형은 음운론적으로 ‘·앗/엇·’으로 변모하는 한편, 그 분포를 확대시키면서 과거시제의 의미기능을 확보하게 되고, 나아가 형태론적으로는 선어말어미로 정착되어갔다.
한편, 용언어간이 선어말어미화하는 현상도 있다. 예컨대, 향찰이나 이두자료에 보이는 ‘백(白)’자는 용언어간의 용법도 가지나, 겸양법의 선어말어미의 용법도 보여주는데, 이러한 두 용법에서 용언어간이 선어말어미로 변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향가 <원왕생가 願往生歌>의 “白遣賜立(ᄉᆞᆲ고샤셔)”의 ‘白’은 ‘사뢰다’를 뜻하는 용언어간에 해당하여 전자의 용법으로 보이나, “集刀花乎白良(모도ᄒᆞᄉᆞᆯ滾)”의 ‘白’을 후자의 용법으로 판독 가능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선어말어미 ‘·白·’은 중세 후기에 ‘·ᄉᆞᄇᆞ/ᄉᆞᄫᆞ/ᅀᆞᄇᆞ/ᅀᆞᄫᆞ/ᄌᆞᄇᆞ/ᄌᆞᄫᆞ·’ 등의 이형태를 가진 것으로 발달하지만, 다음 시기의 과정에서는 심한 음운론적인 간섭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현대어에서는 ‘·ㅂ·’의 한 자음으로 또는 ‘·오·’의 한 음절로 축소되거나, ‘·삽·, ·습·, ·사오·, ·잡·, ·자오·’ 등으로 변화하였다.
문법형태소가 소멸되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감탄법의 선어말어미 같은 것이 그 한 예이다. 중세 후기의 감탄법은 ‘·도·, ·돗·, ·노·, ·놋·, ·다·, ·닷·, ·샤·, ·샷·, ·ᄉᆞ·, ·사·’ 등의 선어말어미에 의하여 심한 분화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면서 단순화현상이 일어나 마침내는 ‘·도·’ 하나만을 남기고 모두 소멸되어갔다. 그 대신 ‘·구나’가 생성되는데 이러한 생성과 앞서의 소멸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밖에 중세 후기의 의문법어미 ‘· (으)ㄴ/ㄹ다’, 이른바 의도법의 ‘·오/우·’ 등이 근대 이후에 소멸한 것이나, 가상 내지 강조의 선어말어미 ‘·거·’ 등이 접속어미 등에서 그 형태를 현대어에도 일부 남기고 있기는 하지만, 중세어와 같은 선어말어미로서의 생산적인 활용기능을 잃은 것도 문법 범주의 소멸과 유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어의 문법변화에는 어순의 변화와 같은 통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다만, 형태소의 기능변화에 따른 분포의 변화가 주목된다.
가령, 고대어에서 동명사어미 ‘·(으)ㄴ/ㄹ’ 등은 부가어적 용법뿐만 아니라 명사적 용법도 보인다. 이 후자의 용법은 중세 후기에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이어진다. ‘얼운( >어른)’은 동사 ‘얼·(嫁)’에 동명사어미 ‘·(으)ㄴ’이 붙어 파생명사가 된 것이며, ‘없·(無)’, ‘아니·(不)’ 앞에서 동명사어미 ‘· (으)ㄹ’이 쓰인 ‘다○ 업스니’, ‘아○ 아니며’와 같은 용례도 보이는 한편, “威化振旅(위화진려)ᄒᆞ시ᄂᆞ로”에서처럼 ‘· (으)ㄴ’이 붙은 ‘ᄒᆞ신’에 부사격조사 ‘·(ᄋᆞ/으)로’가 결합한 것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명사적 용법은 중세 후기에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여 근대에 들어서부터는 일관되게 부가어적인 용법으로만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용언이 지배하는 격의 변화도 통사상의 변화로 주목할 일인데, 가령 현대어의 ‘같다(如)’의 전신인 ‘ᄀᆞᆮᄒᆞ다’는 그 동사구 구성 내에 주격형을 지배하던 것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공동격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밖에 종속절의 주어가 대격형으로 실현된 구성이 중세 후기에서 확인되는 것도 현대어와는 다른 문법변화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예 : ○ᄋᆞᆯ ᄃᆞᆯ며 ○믈 맛본 거시라).
이밖의 문법변화로는 선어말어미간의 배열순서, 즉 서열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중세의 서열인 ‘·더시·’가 근대 이후 그 서열을 바꾸어 ‘·시더·’로 변하였다든지, ‘·ᄉᆞᆸ시·’가 ‘·시삽·’으로 변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리하여 현대어에서는 ‘·십디다 (―시+ㅂ+더+이+다)’에서 보듯이, 중세어의 ‘·ᄉᆞᆸ더시·’가 ‘·시삽더·’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서열변화는 이들 형태소의 문법기능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들 형태소만의 변화가 아니라 이들이 속한 문법범주, 가령 경어법이나 시제법 범주상의 체계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