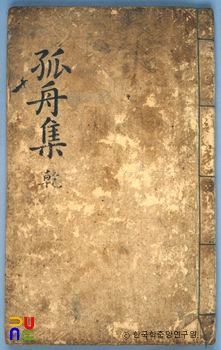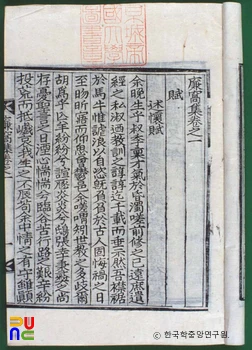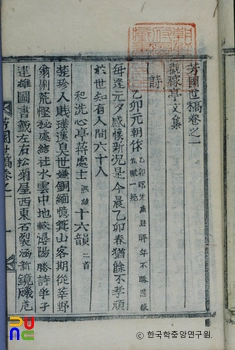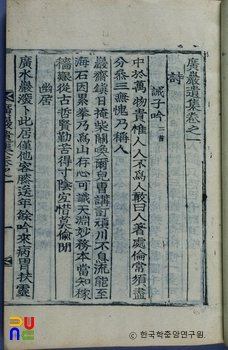유재집 ()
1959년 송기면의 아들 송성용(宋成鏞)과 문인들이 편집·간행하였다. 부록 권두에 전일건(田鎰健)의 서문이 있다.
본집 6권 4책, 부록 2권 1책, 합 8권 5책. 석인본. 국립중앙도서관과 단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부(賦) 2편, 시 276수, 권2에 서(書) 112편, 권3에 잡저 8편, 권4에 서(序) 18편, 기(記) 12편, 제발 16편, 명(銘) 12편, 찬(贊) 5편, 자사(字辭) 1편, 혼서 4편, 고축 6편, 제문 23편, 애사 1편, 상량문 2편, 권5에 비(碑) 7편, 묘갈명 31편, 묘표 21편, 권6에 묘지명 8편, 행장 12편, 전(傳) 1편, 부록 권1·2에 가장·행장·묘갈명·묘지명 각 1편, 제문 14편, 만시 68수, 사우왕복서(師友往復書), 창수시(唱酬詩), 제가기술(諸家記述), 읍혈서(泣血書), 강학록(講學錄), 간재수서(艮齋手書), 유묵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의 「필부(筆賦)」는 필법의 진결(眞訣)을 밝힌 것이다. 먼저 서예도 육예(六藝) 중의 하나인 예술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어서 왕희지(王羲之)·안진경(顔眞卿)·유공권(柳公權) 등 옛날 중국 명필들의 필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예서·전서·행서·초서·해서 등 각체의 운필법과 서법 이론에 대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서법을 상호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서법을 밝히고 있다. 한편, 스승 이정직(李定稷)에게 전해 받은 자신의 서체 이론을 간결명료하게 설명하였다.
잡저 중 「유신론(維新論)」은 새로운 것은 옛것을 계승하여 본체로 삼고, 옛것은 새로운 것을 응용으로 삼는다는 구체신용설(舊體新用說)을 제기하였다. 참된 유신이란 전통의 계승적 창조에 있음을 강조한 논술이다. 「병중산필(病中散筆)」은 태극·음양·이기·인심도심(人心道心)·사단칠정(四端七情) 등을 연역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이기설은 이이(李珥)의 학설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망언(妄言)」 2편 중 1편에서는 군민·의리·경권(經權)·강약·문무·빈부·용겁(勇怯)·금일동서(今日東西) 등 18조를 열거하여 현실의 절실한 문제들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망언」 2편에서는 양계초(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飮氷室文集)』에 실린 「동서고금정치학술(東西古今政治學術)」을 읽고 동서양의 정치이념과 제도를 종합·검토하여 양계초의 서구적 정치사상에 따른 변법론을 비판하고 있다. 유교적인 도덕정치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