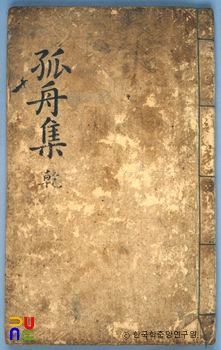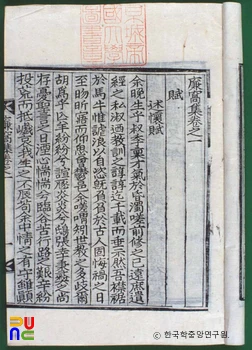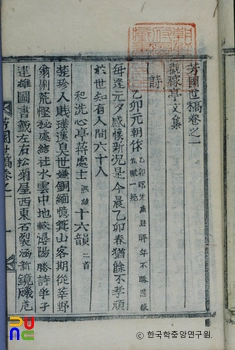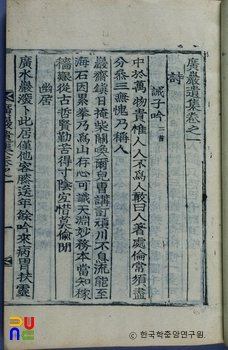인재유집 ()
신채의 종손 신상하(申相夏)가 편집하여 1931년에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연즙(柳淵楫)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장명상(張命相), 8대손 신돈식(申敦植), 9대손 신세환(申世煥) 등의 발문이 있다.
4권 2책. 석인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35수, 서(書) 31편, 서(序) 6편, 기(記) 3편, 권3에 명(銘) 4편, 찬(贊) 2편, 설(說) 4편, 책문 1편, 제문 3편, 잡저 3편, 유사 1편, 권4에 부록으로 가장 1편, 행장 1편, 만사 3수, 제문·상량문·봉안문·상향축문(常享祝文)·청증작상언(請贈爵上言) 각 1편, 통문(通文) 2편, 단구서원영건전말(丹邱書院營建顚末) 1편, 편말기략(編末記略)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대체로 자연시가 많으나 거경(居敬)과 학문에 관한 시도 간혹 실려 있다. 서(書)는 대부분 학문에 관한 서한으로 『중용』에 관한 연구와 문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답대학문목(答大學問目)」에서는 명덕(明德)에서 혈구(絜矩) 등에 이르기까지 문답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였다. 그 중 지(智)에 대해서는 인의예지의 지와 총명예지의 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동이점을 설명하였다. 또, 극명덕(克明德)과 극명준덕(克明峻德)의 ‘극’자와 일일신(日日新)과 구일신(苟日新)의 ‘신’자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해설하였다.
「용학표리설(庸學表裏說)」은 『중용』과 『대학』은 서로 안팎으로 연관관계를 가지며, 『중용』의 성(性)과 『대학』의 심(心)은 동정에 관한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심이란 체용(體用)이 되어 서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 중 하나가 없다면 완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문(策問)」에서는 심(心)은 경(敬)의 대명사로 심이 경 없이 작용하는 것은정(正)이 아니고 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인심이 되고 심이 경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 곧 도심임을 『서경』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학십도(聖學十圖)』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한 「성학십도명(聖學十圖銘)」이 있다. 『성학십도』 중 두 번째인 서명도(西銘圖)가 『소학』과 『대학』의 근원으로 『성학십도』의 중추가 된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