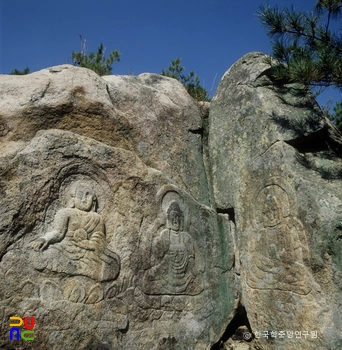미륵하생경변상도 ()
《미륵하생경변상도》는 『미륵하생경』의 내용을 도상화한 고려 시대의 불화이다. 미륵이 세상에 내려와 모든 대중을 성불시키는 『미륵하생경』의 내용을 그렸다. 윗부분은 미륵불이 중생에게 설법하는 장면이고 아래는 미륵하생지의 여러 모습들이다. 경전의 내용을 설명하는, 교화를 위한 변상도적 성격을 가지는 구도법을 쓰고 있다. 상하 2단구도법을 사용하여 윗부분의 미륵삼존을 전체 화면에서 크게 부각시켰다.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 기록이 있는데 화가는 회전이라고 되어 있다. 이 그림은 1350년(충정왕 2년)의 불화 양식을 잘 보여 준다.
1350년(충정왕 2년) 작. 비단 바탕에 채색. 세로 178.2㎝, 가로 90.3㎝. 일본 신노인(親王院) 소장. 도솔천(兜率天)의 미륵이 하생하여 주1 아래서 성불(成佛)하고 그때까지 구제되지 못한 모든 대중을 성불시킨다는 『미륵하생경』의 내용을 그린 일종의 교화용 경변상도(經變相圖)이다.
본존을 크게 부각시켜 화면을 압도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예배용의 존상화(尊像畵)에 가까운 그림이다. 화면을 크게 2등분하였다. 윗부분에는 미륵불이 용화수 아래서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렸다. 그리고 아래는 미륵하생지(彌勒下生地)로 알려진 성의 여러 모습을 그렸다.
그림 상부의 중앙에는 미륵불과 두 협시보살이 묘사되었는데, 이 삼존은 삼각형적인 구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주위에는 10대제자와 제석(帝釋) · 범천(梵天) · 사천왕(四天王) · 팔부중(八部衆) 등이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하늘 세계와 미륵불이 있는 지상 세계는 흰 광선 모양의 둥근 광배가 분리시키고 있다. 하늘 세계의 구름 속에 싸여 있는 2층의 화려한 건물은 미륵이 성불하기 전에 거주하던 도솔천궁이 분명한 듯하다.
삼존의 발 아래의 청문 대중은 좌우 대칭의 구도로 묘사되어 왼쪽에는 여성, 오른쪽에는 남성이 배치되었다. 이 중 꿇어앉은 인물들은 용왕(龍王)과 용녀(龍女)일 것이다. 그리고 삭발하고 있는 인물은 전륜성왕(轉輪聖王)과 왕비로 생각된다. 즉, 이 장면은 미륵불이 용화수 아래서 성도하고 난 뒤 전륜성왕 내외와 모든 신하 내지 시녀 그리고 미륵의 부모를 위시한 일체중생에게 세 번에 걸쳐 설법하여 출가성불(出家成佛)하게 하는 내용을 도해한 것이다.
그림의 하부는 미륵불이 하생한 성의 여러 가지 모습을 묘사하였다. 화려하게 단청한 궁전, 성벽, 궁전 앞의 보수(寶樹)와 보당(寶幢), 궁전 주위의 칠보(七寶) 등은 이 왕궁의 장엄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장면 아래는 또 두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왼쪽의 보련(寶輦)과 상대해서 두 마리의 소를 끌고 두 명의 농부가 밭갈이하는 장면이그려져 있다. 이 장면에서는 돈황61굴의 미륵변상도와 달리 멍에를 두 마리에 연결하지 않고,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농부가 밭갈이하는 점 등이 주목된다. 이 장면이 세속의 괴로움을 나타낸다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이 역시 오른쪽 장면과 함께 농경 생활 가운데 춘경(春耕) 장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대칭하여 오른쪽은 추수하는 장면(秋景)이 그려져 있다. 아래쪽에서는 벼를 베고 위에서는 도리깨로 타작하고 떨어진 낟알을 쓰는 등의 갖가지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곧, 이 두 장면은 춘경과 추경의 풍성함을 묘사하여 “비가 때 맞추어 내려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고 한 번 심어 7번이나 수확한다.”는 『미륵하생경』의 표현을 도상화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이 「미륵하생경변상도」는 상하 2단구도법을 사용하면서도 미륵삼존을 전화면에서 크게 부각시켰다. 이로써 경전의 내용을 설명하는, 교화를 위한 변상도적 성격은 물론 예배를 위한 존상도적인 성격을 가지는 특이한 구도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물의 형태는 좀 경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불보살들의 전체적인 자세나 신체의 양감 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부 형태 가령 얼굴이 지나치게 굳어졌다든가, 좀더 단순화된 무늬 등은 시대적 변화로 보인다.
색채는 전반적으로 녹색을 칠한 부분이 많아서 화면이 밝고 화려하지는 않다. 하지만 찬란한 금색의 피부, 호화로운 꽃무늬와 장신구 등은 치밀한 구도와 함께 불계(佛界)의 장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1350년(충정왕 2년)의 불화 양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는 붉은색 바탕에 금니(金泥)로 쓴 화기가 있다. 그래서 이 불화는 발원자인 현철(玄哲)이, 미륵불이 하생해서 설법하는, 법회에 참석해서 불법을 듣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에 의하여 조성한 것이며, 승려와 속인(俗人) 20여 인의 시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화가는 회전(悔前)이라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