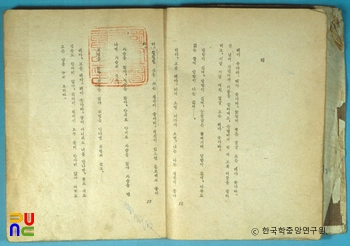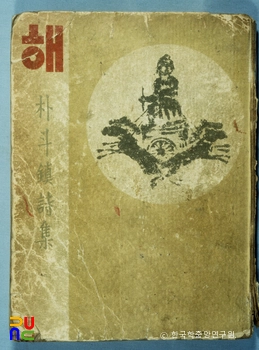해
「해」는 어둠을 몰아내고 만물에 빛을 비추는 자연의 상징인 ‘해’라는 소재를 통해, 현실의 부정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생명의 의지를 북돋우는 갈망이 강렬하게 표출된 작품이다.
1연과 2연에는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시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해”와 “달밤”, “맑앟게 씻은 얼굴”과 “눈물같은 골짜기”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이때 “해”와 “어둠”은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맑앟게 씻은 얼굴”로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은 “어둠을 살라먹”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해”는 단순히 희망의 대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정성을 원동력으로 삼아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 상징이다.
3연에는 어둠을 극복하고 솟은 “해”가 비추는 세계를 “청산”이라는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긍정적 에너지의 표상인 “해”는 “달밤”의 어둠을 만물이 생동하는 “청산”으로 전화(轉化)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보유한 상징이다. 중요한 것은 “달밤”과 “청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에너지에 의해 전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두진의 의지적 시편들은 막연한 열망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는 초기의 많은 시에서 부정성으로 가득한 시공간이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한 시공간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적시하고 있다.
4연과 5연에는 박두진 초기의 시 특유의 수사법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 대상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짤막한 문장들을 병렬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시의 리듬감을 확보하고 의미를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슴”과 “칡범”은 청산의 구체적 면모를 형상화하는 데 일조하면서도 자연 속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수단들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이를 통해 “청산”은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효과적으로 상징화된다.
시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와 활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향이 제시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볼 것은 “꿈이 아니여도”라는 구절과 “누려 보리라”라는 미래 시제로 제시된 부분이다. 미래 시제를 통해 기대를 표현한다. 동시에 이것이 당장 현실의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만, 이 변화가 단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해」는 해방 직후의 구성원들이 열망하는 공동체의 이상향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이상향은 현재의 어둠을 극복해야 가능하며, 그 공동체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병렬적인 문장들 안에서 힘 있게 표현되고 있다.
「해」는 어둠으로 표상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부정적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렬하게 표출한 시이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조화와 평화 속에서 공존하는 세계를 이상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말기와 해방 정국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공동체가 지향하는 삶의 비전을 시적으로 주1 형상화한 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