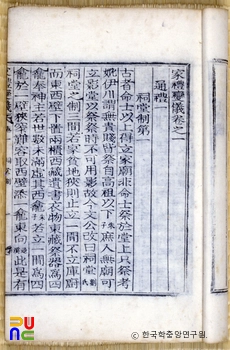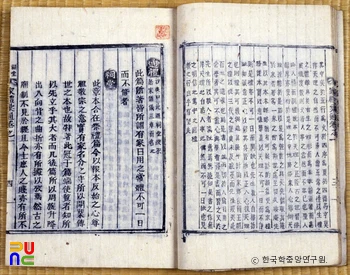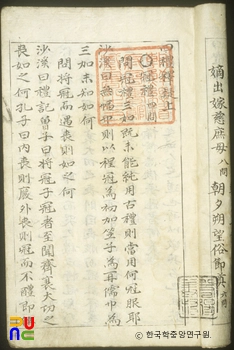휘 ()
유교문화권에서는 옛날부터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글로 쓰지 않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를 ‘휘(諱)’라고 했다. 물론 아무에게나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다. 『춘추(春秋)』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대상으로 세 경우를 제시했다. 첫째, 임금과 같이 신분이 존귀한 사람[尊者], 둘째 조상이나 부모와 같은 친한 사람[親者], 셋째 인격이나 학문이 뛰어난 어진 사람[賢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세 대상의 이름을 휘하는 것을 ‘삼휘(三諱)’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글로 쓰지 않는 것도 ‘휘’라고 하는데, 『예기(禮記)』에서는 졸곡(卒哭)이 지난 다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고례(古禮)에서 졸곡은 보통 죽은 뒤 3개월쯤에 지내게 되며, 이때부터 휘를 하는 이유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섬기는 일이 끝나고 귀신으로 섬기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만일 죽은 사람이 생전에 국가가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다면 시호(諡號)를 내려달라는 청을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거나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부르거나 쓰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먼저 해당 인물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해당 이름자의 원래 음 대신 ‘모(某)’라고 발음했다. 예를 들면 공자(孔子)는 공구(孔丘)를 ‘공모’라고 발음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글자를 써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다른 글자로 바꿔쓰는 대자(代字), 글자를 고쳐 쓰는 개자(改字), 그 글자를 빼고 쓰는 결자(缺字), 그 글자에서 획을 빼고 쓰는 결획(缺劃) 등이다. 예를 들면, 신라 문무왕(文武王)을 문호왕(文虎王)으로 쓴 것은 ‘대자’의 방법이고, 진시황(秦始皇)의 이름인 정(政)을 정(正)으로 쓴 것은 ‘결획’의 방법이다.
한편, 누군가가 죽은 뒤에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이름을 ‘휘’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공자의 이름자인 ‘구(丘)’는 공자의 ‘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