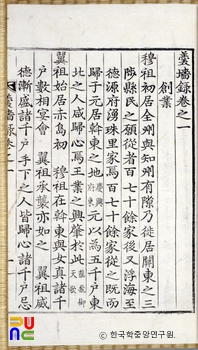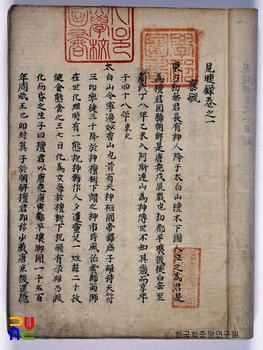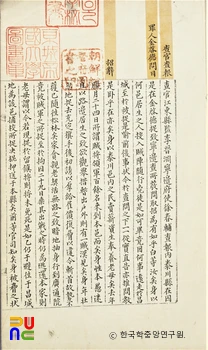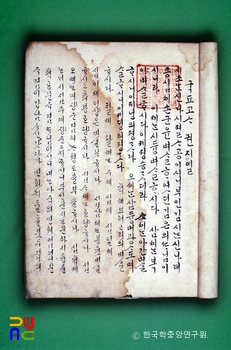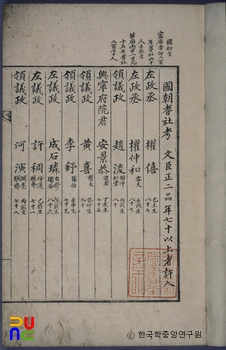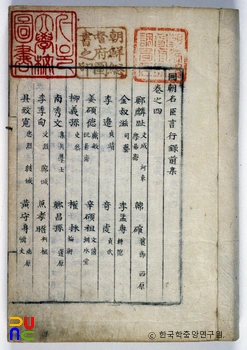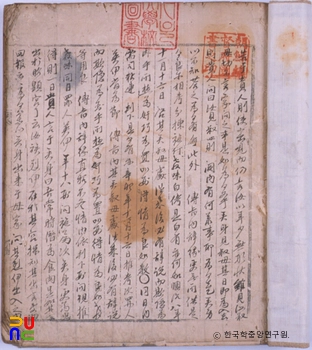노계정 ()
본관은 안강(安康). 자는 국휴(國休). 아버지는 노성빈(盧聖賓)이고, 어머니는 이선지(李橏之)의 딸이다. 삭주부사 노상추(盧尙樞)의 조부이다.
어려서 친척인 처사 노성여(盧聖與)에게 글을 배웠으나,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무술을 연마하여, 1725년 증광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 뒤 손오병법(孫吳兵法)을 익히고 독서로 자신을 연마하다가, 1732년(영조 8) 주1 김취로(金取魯)의 천거로 수문장이 되어 출입자의 규율을 엄하게 세웠다.
1734년 훈련주부 · 도총부도사를 거쳐 이듬해 박천군수에 제수되었을 때, 시장을 열고 군기(軍器)를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보자고(補資庫)를 설치하여 관노비의 비용에 쓰고, 족징(族徵) 등의 민폐를 막았다.
1737년 위원군수(渭原郡守)가 되어서는 성을 쌓고 포루(砲樓)를 세웠다. 또 장별청(壯別廳)을 설치하여, 향품무사(鄕品武士) 360인을 모아 ‘장별군(壯別軍)’이라 이름하고 완급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군병들의 수요를 위하여 보자고를 설치하고, 서당을 세워 교육에 힘써 지방 수령으로서 모범이 되었다. 1739년 상주영장 · 선천방어사를 거쳐 어영청천총이 되었다.
1742년 전라우수사가 되어 낡은 전함과 군장비를 수리, 개조하고, 명송(明松)과 미역을 저축하였다. 제방을 쌓아 둔전(屯田)을 만들어 1만 2천 냥이나 되는 돈을 마련하여 국용에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 영상 김재로(金在魯)가 업적을 인정하고 전라감사 조영국(趙榮國)이 비호하여 면하였다.
그러나 전함을 새로 만들면서 나무로 된 닻 대신에 철로 된 닻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그 뒤 어영청별장을 거쳐 1743년 창성부사가 되었으나, 사조(四祖: 부 · 조 · 증조 · 외조)의 성명을 모록(冒錄: 거짓으로 기록)했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1745년 곡산부사 · 강화중군 · 금위영천총 · 초산부사 등을 지내면서 구황 정책에 많은 업적을 쌓았으나 개인의 영리를 꾀했다 하여 또 한번 파직되었다.
1747년 이산부사가 되어 따로 장별군 900여 인을 모집하여 외침을 방어하려고 도모했으나, 이듬해 순창에 유배되었다. 1749년에 풀려나 이듬해 경상좌병사 · 어영도감좌별장 등을 지냈으나, 탐학하고 조정을 기만했다는 탄핵을 받고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