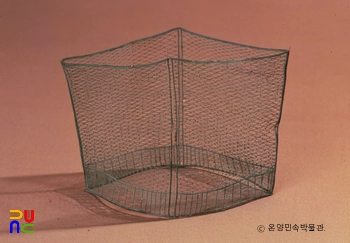면사 ()
머리부터 온몸을 덮어 쓰는 사각 보자기 모양의 사(紗)를 뜻한다. 면사에 관한 기록은 조선 초부터 나타난다. 즉 성종 2년(1471)에 양반부인이 노상에서 면사 걷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태종과 세종 때의 입모(笠帽)에 대한 논의로 보아 입모, 즉 너울과 면사는 조선초에 명칭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 면사와 너울은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나는데, 너울은 기마행차에 사용되는 데 비해 면사는 법복(法服)에 속하여 예장용(禮裝用)이었음이 확실하다. 면사는 궁중용과 민가용이 있으며, 궁중용 면사에는 겹면사와 홑면사가 있다. 홑면사는 비·빈의 가례 때 법복에 사용하였으며 자색의 나(羅)가 9자 소용되고 여기에 각종 무늬를 금박하였다.
숙의·공주·옹주의 길례에는 남색의 전면사(前面紗)를 사용했는데 비빈의 면사와는 명칭과 그 색이 다를 뿐이고 형태에는 별차이가 없었으며 옷감의 재료와 색으로 등차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겹면사는 안팎이 모두 자적라(紫赤羅)로 당기[月亇只]라는 부속이 있어 그 형태가 홑면사와는 약간 다른 것이라 짐작된다.
민가에서도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집에 갈 때 검은 색 사(紗)로 만든 면사를 썼다고 하나 문헌기록은 없다. 한편 무속복(巫俗服) 중에도 너울가지라고 불리는 면사 형태의 쓰개가 사용되었다. 현재 면사의 유물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2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