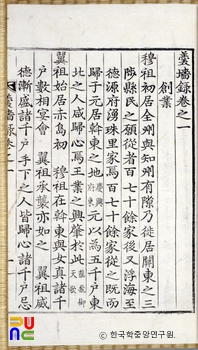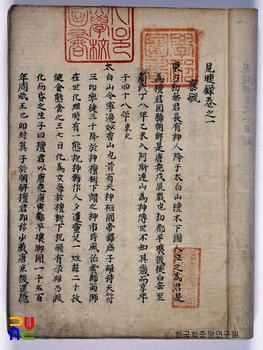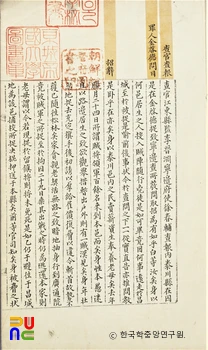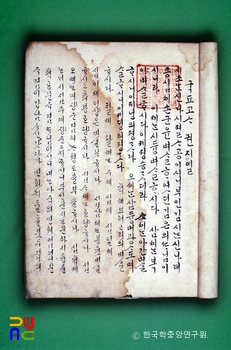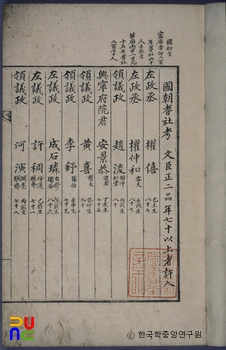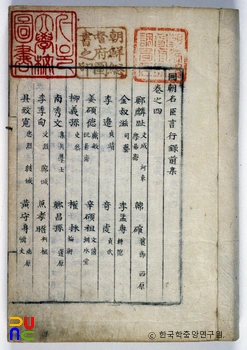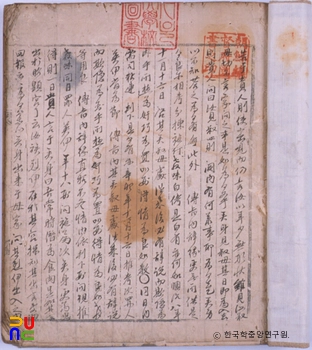민통수 ()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사연(士淵). 강원도관찰사 민광훈(閔光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판서 민유중(閔維重)이고, 아버지는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이며, 어머니는 윤지선(尹趾善)의 딸이다.
1721년(경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참봉으로 1734년(영조 10)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한림(翰林)의 천거로 6품직에 올랐다.
1739년 교리(校理) 때는 형인 민형수(閔亨洙)와 함께 아버지의 억울한 심정을 대신하여 정미환국 이후 아버지가 당론자로 오해받고 있음은 부당하며, 특히 당시 영의정이던 이광좌(李光佐)에 대한 대립적 입장을 토로하는 소를 올렸다.
곧이어 광주부윤·겸문학(兼文學) 때도 계속 이광좌를 논척하고, 아버지를 신원하는 소를 올렸다. 1740년 헌납(獻納)을 거쳐, 1741년 이조좌랑이 되었다가 사사로운 일로 정사를 돌보지 않아 성환찰방(成歡察訪)으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다시 이조좌랑·응교(應敎)·승지 등을 거쳐, 광주부윤이 되어서는 공명첩(空名帖) 수천 장(張)으로 군기를 제작, 수리하고, 황해도 여러 지방의 전세(田稅)를 발매하여 그 잉여금으로 염철(鹽鐵)을 사도록 할 것, 삼군문(三軍門)과 병조의 1년 포목 여분을 남한산성에 유치하여 불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비할 것과 군량으로 저축한 곡식 중 오래된 것은 수성(守城)에 사용할 것, 군향곡(軍餉穀)의 명목으로 복호(復戶)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혁파하자는 등의 정책을 건의하여 비변사에서 논의하게 하였다.
원래 노론계의 집안 출신으로 영조의 탕평책에 거슬리는 논란을 자주 제기하였으나, 관료생활은 비교적 깨끗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