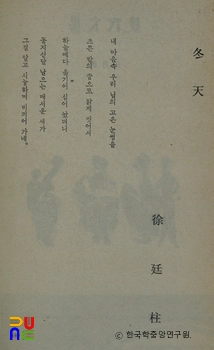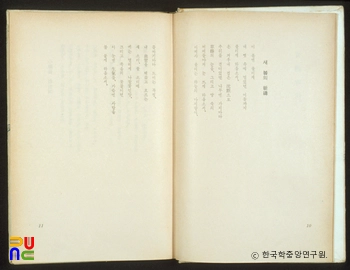밭일기 (밭)
총 101편. 1965년부터 초고를 작성하여 196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4월 2일까지 『주간한국』에 13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그 뒤 이 연작시 가운데 60편을 추려 『구상연작시집(具常連作詩集)』에 재수록하였다.
저자의 술회에 의하면 이 작품은 저자가 광복 후 “너무나 현실참여에 행동적으로 기울어져 자신의 삶이 문학 작업에서 이탈된 것을 깨닫고, 시창작에의 전념과 복귀를 위한 자기훈련 삼아 인간의 원초적 삶의 터전인 밭에다가 상념을 집중시켜 본 것”이라고 한다. ‘밭’은 생명이 자라는 터전이자 인간 생존의 현장이기도 하다. ‘밭’에서는 생성과 소멸이 교차되며 현실과 역사의 변환이 펼쳐진다.
저자는 밭을 구심점으로 하여 생명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 및 그 승화의 경이로움을 형상화하는가 하면, 인간의 현실적 조건과 역사적 변환이 다채롭게 전개되는 양상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그러한 시상의 근저에는 이 시인 특유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연작시를 이루는 개개의 시편들은 관점이나 정서도 다양하고 작품의 형식도 다채롭다. 어떤 것은 몇 십 행에 이르는 장시인가 하면 어떤 것은 4행의 짤막한 단상이나 소묘로 되어 있다.
작자의 시를 포괄적으로 해설한 이운룡(李雲龍)은 이 작품의 주제를 다섯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생성과 소멸이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는 생명 본체의 움직임, 민족분단의 체험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 무명(無明)과 허무의 초월세계로의 승화, 과학문명에 대한 종말의식과 전통적 토속미에 대한 가치인식, 기독교적 인간관과 우주관 등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측면은 서로 단절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긴밀한 관련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생명의 본체를 밭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시련과 고통을 거치고 면면히 이어오는 민족의 역사적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무명과 허무가 창조로 승화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밭은 과학문명과 대립된 원시적 생명의 공간이기에 당연히 토속적이고 인간적인 전통의 가치가 긍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성과 소멸이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고 모순과 갈등이 화해로 수용되는 전 과정은 저자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울타리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