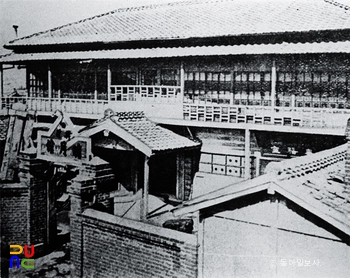야간통행금지 ()
야간통행금지는 전근대사회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 실시되었던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도 실시된 적이 있다. 전근대사회의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치안상의 필요가 주된 이유였다.
전등이 발명·보급되기 전 등불 밑에서의 생산활동은 물론 구매·위락 등 일체의 활동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실상 도시주민들의 밤 시간은 휴식 내지 잠자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
『경국대전』 병전 문개폐조(門開閉條)에 “궁성문(宮城門)은 초저녁에 닫고 해가 뜰 때에 열며, 도성문(都城門)은 인정(人定:인경, 밤 10시에 쇠북을 스물여덟 번 치던 일)에 닫고 파루(罷漏:오경, 새벽에 쇠북을 서른세 번 치던 일)에 연다.”라고 하였으며, 행순조(行巡條)에는 “2경 후부터 5경 이전까지는 대소인원은 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 시간에는 높은 관료 이하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이같은 야간통행금지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01년(태종 1) 5월에 처음 나오고, 이때에 “초경3점(初更三點) 이후 5경3점(五更三點) 이전에 행순을 범하는 자는 모두 체포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 때의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야간통행금지제도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었고, 이것을 더욱 엄하게 다스리기로 정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초경3점 이후 5경3점 이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대개 오후 8시에서 오전 4시 반경까지이다.
이것이 실제 주민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준 까닭인지 1458년(세조 4) 2월에는 두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2경부터 4경까지(오후 10시∼오전 3시)로 바꾸었으며, 『경국대전』에서 다시 바뀌어 ‘2경 후 5경 전’으로 정해졌다.
이것이 조선 말기까지 변함없이 지켜져왔다. 그런데 만약 급한 공무나 질병·사상(死喪)·출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순관(巡官) 또는 경무소(警務所)에 신고하면 순관 이나 경무소에서 사람을 시켜 통행증인 경첨(更籤)을 가지고 본인의 행선지까지 보호·연행해주고 다음날 그 사실을 병조에 보고하여 다시 그 진실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통행금지를 위반한 자는 이웃 경무소에 잡아두었다가 다음날 각 영(營)에서 곤장형(棍杖刑)을 집행하였는데, 벌칙도 시간별로 차이가 있어 초경 위반자 곤장 10도, 2경 위반자 20도, 3경 위반자 30도, 4경 위반자 20도, 5경 위반자는 10도를 부과하였다.
여기서 통행금지는 2경부터인데 초경 통행위반자란 관례로 남녀 성별의 통금 시차제가 실시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철저히 남녀유별사상에 입각한 이른바 내외법(內外法)이 지켜졌다.
그 결과 양반·상인 계급의 여자는 낮 동안에 외출을 삼가하였고, 따라서 불가피한 용무가 있을 때는 부득이 야간 외출을 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어둠이 찾아들면 성내의 남자들은 집안으로 들어갔고, 대신 여자들이 외출하였으며, 초경이 시작되면 인정 또는 인경이 한두 번 울렸다.
이 때부터는 여자 전용 통행시간이고 남자들의 통행금지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반한 남자에게는 곤장 10도의 벌이 가해졌고, 2경 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이 조선시대 야간통행 금지는 1895년(고종 32) 9월 29일자 포달(布達) 제4호로 인정·파루 제도가 폐지되면서 동시에 폐지되었다.
광복 후의 야간통행금지제도는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미 제24군 사령관의 ‘일반명령’에 의하여 경성·인천 두 지역에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의 통행금지령을 발포한 것이 처음이다.
이어 9월 29일에는 일반명령을 개정한 야간통행금지령을 발포하여 ‘미국 육군이 점령한 조선지역 내 인민’에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통행금지가 포고되었다. 이 군정법령이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계승되어 치안 상황에 따라 시작 시간이 밤 11시로 단축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밤 8시부터나 10시부터로 연장되면서 지켜져 왔다.
통행금지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계속되다가, 1954년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에 “전시·천재지변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야간통행금지 위반자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면서부터 법령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1983년 12월 30일자로 이 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에도 ‘야간통행 제한 위반’이라 하여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 제도가 뚜렷한 근거 법령 없이 존속되어온 것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항상 준전시상태에 있다는 국민 간의 암묵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① 어떤 사회 불안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때에는 통행제한시간이 연장되고, ②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와 같이 야간통행이 빈번해질 때는 일시 해제도 되었으며, ③ 경주·제주도·충청북도 등지에는 순차적으로 전면 해제되면서 1981년까지 존속되었다.
이 제도의 전면 해제 건의안이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1981년 12월 10일이었고, 다음해인 1982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경기·강원 두 도 안의 휴전선 접적지역(接敵地域)과 해안선을 낀 면부(面部)들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1988년 1월 1일에는 제외되었던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일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 유지 및 질서 확립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로 작용했으나 근본적으로 사상 통제, 국가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세력 억압을 위해 국민들의 시·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야간통행금지제도 시행 아래 일반 시민들은 일상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일제의 감시와 처벌 방식은 야간통행금지제도의 처벌과 감시양식으로 이어져 식민지 국가폭력은 해방 후에도 사회 전반에 지속되었고, 이후 계엄법과 국가보안법으로 분화·적용되는 주요한 동력을 제공해 왔다.
통행금지제도라는 강제된 국가적 시간규율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빨리 빨리 문화, 택시 합승, 새치기, 속도전, 조급증, 속전속결주의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다른 국가의 경우 국가비상사태에 한하거나 미성년자 안전을 위해 일시적이고 보호적인 성격의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는데 반해, 36년 4개월간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집행 기간이나 시행상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탄생하여 답습되어 36년 이상 시행한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식민지, 미군정, 전쟁 이후 분단 상황, 군부독재 등의 상황으로 계속되었다. 냉전체제 안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라는 명분 아래 불가피하게 도입된 이후 점차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와 시간을 통제·관리함으로써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이나 이데올로기 통제기제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