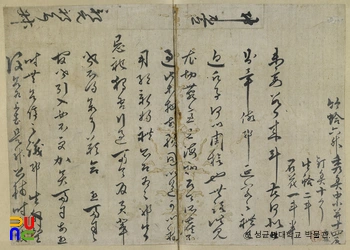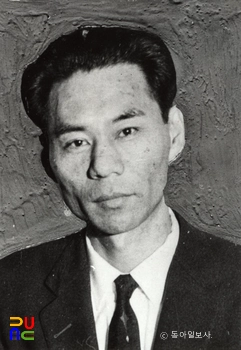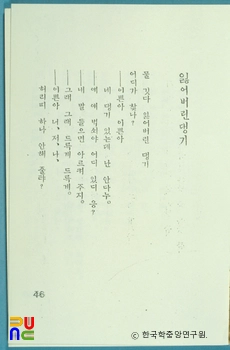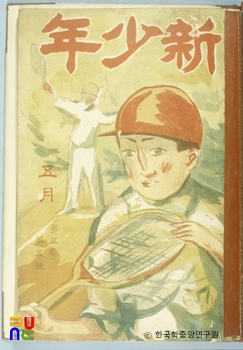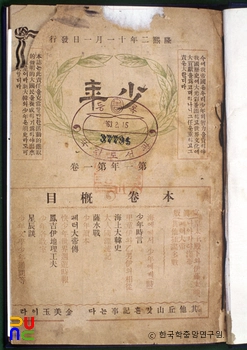정익 ()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자제(子濟). 정원희(鄭元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흠(鄭欽)이고, 아버지는 정효준(鄭孝俊)이다. 어머니는 이진경(李眞卿)의 딸이다.
1642년(인조 20)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지평·정언·장령·헌납 등 언관으로 활동하였다. 1652년(효종 3) 정언으로 효종의 사부인 윤선도(尹善道)의 승지 통제를 둘러싼 대립에서 그를 적극 찬성하였다.
그리고 우율종사(牛栗從祀: 성혼과 이이를 사우에 모시고 신위를 받듬)를 반대한 이상진(李象震)의 문묘알성 분란에서 대사간 목행선(睦行善)을 두둔하는 등 남인 당론을 견지하였다.
1659년(현종 즉위) 고부사(告赴使) 서장관으로 청에 다녀왔고, 이 공로로 가자(加資)되고 노비와 전답이 하사되었다. 이듬해 승지로 승진했으나 윤선도의 예론을 지지한 뒤 향리로 돌아간 권사(權思)의 소환교지를 늦게 작성시킨 죄목으로 체직되었다.
이 후 병조참지·형조참의·호조참의 등을 거쳐 원양(原襄: 강원도의 이전 일부 명칭)감사로 나가 도내 재해처의 제반 신역의 탕감과 면세를 요구하고,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경평군(慶平君) 늑(玏)의 소환을 요청하였다. 1670년 내직으로 옮겨 승지, 예조참의, 병조참판을 지냈다.
이 해 12월에 동지부사로 청에 갔다가 황제로부터 조선의 잦은 재해와 백성의 곤궁은 권력이 신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소위 신강설(臣强說)’을 조정에 보고하여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환국하여 병조참판을 거쳐 도승지로 승진했으나 반대당으로부터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탄핵을 받았다.
1674년(숙종 즉위) 강화유수로 나가 강화도의 목장을 폐지하고 민간에 경작케 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왕은 이를 처음 설치한 효종의 뜻을 존중하여 반대하였다. 이 후 숙종 초반 남인 집권기에 남인의 핵심인 오정창(吳挺昌)의 장인으로 도승지, 형조판서·한성판윤, 좌참찬·우참찬 등의 요직을 지내면서 송시열(宋時烈)의 안율(桉律) 정청(庭請)에 참가하였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신강설’의 혐의를 받고 있던 서인 당국자들에 의해 하옥되어 국문을 받고 영덕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재이로 죄가 감등되었고, 곧 석방되었다. 졸기(卒記: 실록에 죽은 뒤에 기록한 인물평)에 인물이 용렬하고 권력에 아부하여 참찬에까지 올랐다는 악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