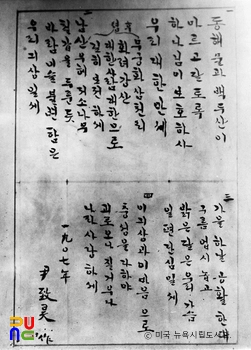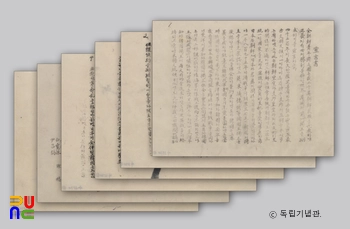한국 ()
한국은 아시아대륙의 동북연해안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고조선 이래 세워 온 나라의 국호이다. 발해 멸망 이후 강역이 한반도로 제한되었고 통일신라 이후 한 국가로 존재하다가 현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다. 기후는 한대성과 열대성이 혼합된 냉온대지역에 속한다. 나라꽃은 무궁화, 국기는 태극기이다. 국토면적은 22만㎢(남한 약 10만㎢)이고, 인구는 남한만 2019년 현재 5,170만명이다. 한글이라는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고 신석기시대부터 단일 종족으로 한반도에 정주하며 특유의 문화를 형성해왔다.
반도의 남북간 최장거리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약 840㎞에 이르나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 일컬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10세기 초 발해가 멸망함으로써 중국 동북지방의 강역을 상실한 뒤 줄곧 한반도를 강역으로 삼아왔다. 10세기 이후에는 한번도 분열된 일이 없이 통일을 유지해오다가, 1945년 8 · 15광복에 이르러 38선으로 분할되었다.
1950년 6 · 25전쟁이 일어난 뒤 현재의 휴전선이 남북한을 가르는 분단선이 되었다. 현재 한반도는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치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명칭은 남북한을 통틀어 말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좁은 의미로는 남한의 대한민국을 가리킨다. 과거 우리나라는 조선 · 고려 · 삼한 등 여러 가지 국호를 가진 바 있다.
한국을 가리키는 외국어 코리아(Corea, Korea)는 고구려를 계승한 통일왕조, 고려 또는 고구려에 대한 중국측 호칭인 고려에서 유래한 말이다. 고려의 본래 뜻은 가운데 또는 가을이라는 우리 고유어를 사음(寫音)하여 만든 한자어로 해석되고 있어,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 밖에도 동국(東國) · 진국(震國) · 진역(震域) · 부여(夫餘) · 발해 등 다른 이름이 있었다. 특히 국화인 무궁화(無窮花)와 관련해 근화지역(槿花之域) 또는 근역(槿域)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국을 상징하는 나라꽃은 무궁화로 일명 근화라고 한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숭상하게 된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이다. 조선 세종 때 학자인 강희안(姜希顔)에 따르면 무궁화는 단군이 개국할 때부터 나라꽃으로 숭앙되었다고 한다.
중국측 기록에도 “군자의 나라 천리에 무궁화나무가 많다(君子國地方千里多木槿花)”고 하였다. 「애국가」의 한 구절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한다. 무궁화는 일시에 피고 일시에 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 사계절을 끊임없이 피고 지는 꽃이다. 이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무궁화는 “일만육천세를 산다”는 옛말이 있다.
무궁화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도 특징이 있다. 무궁화는 과장없는 고고(孤高)한 미, 촌스러운 듯도 한 꾸밈없는 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꽃 중의 꽃(花中花)으로 일컬어져 왔다.
이와 같이, 지칠 줄 모르는 힘, 굽힐 줄 모르는 지조, 그리고 가식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화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는 일본인들이 특별히 아꼈던 벚꽃 때문에 수난을 당하기도 하면서 우리 겨레와 더불어 고락을 같이해왔다.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로 국가(國歌)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는 현재 윤치호(尹致昊) 작사, 안익태(安益泰) 작곡의 「애국가」로 대신하고 있다. 일제침략기에 남몰래 불렀던 유서 깊은 「애국가」를 두고 따로이 국가를 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불리고 있는 「애국가」 이외에도 많은 애국가가 있었으나, 이들은 주로 대한제국을 찬양하는 노래들이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현재의 「애국가」 가사 가운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후렴은 이미 1896년 독립문 정초식 때부터 불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국가로서 손색이 없는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애국가」는 윤치호에 의하여 작사되었다고 전하나 확실한 작사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작사자 미상이라는 사실은 「애국가」의 권위를 손상시킨다기보다 도리어 그 국민적 바탕을 암시해 권위를 한층 더 높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애국가」의 작곡자는 안익태로 밝혀져 있고 작곡 연대는 1936년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애국가」의 내력 때문에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가로 불리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을 상징하는 깃발, 즉 국기(國旗)는 태극기이다.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화된 것은 1883년 1월이며, 전해 박영효(朴泳孝)가 일본에 수신사로 갔을 때 처음 게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태극기를 국기로 정하자는 논의는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있었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1883년 국왕 고종이 이를 공포한 것이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은 한층 고양되어 1919년 3 · 1운동 때에는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당시에 쓰인 태극도안은 4괘(卦)의 위치가 현재의 국기와 다르고, 태극의 음양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어 상하로 배치된 현대의 태극과 달랐다. 이러한 도안의 차이는 뒷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1945년 광복을 맞게 되었다.
태극의 유래는 삼국시대를 거쳐 단군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뿌리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음양사상에 두고 있다. 태극도안은 특히 그러하다.
태극기의 구성은 첫째 흰 바탕, 둘째 청색과 붉은 색으로 칠한 태극원형, 셋째 네 귀퉁이의 4괘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흰색 바탕은 우리 민족의 순수한 동질성과 결백성,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백의(白衣)를 숭상하는 민족문화를 상징한다.
둘째, 태극은 인간생명의 원천과 불멸의 상을 상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人道)가 극에 달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 태극 속의 청색과 홍색은 음과 양, 땅과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화합으로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생명이 움트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다. 청과 홍이 서로 곡선을 이루어 안고 있는 듯이 그려져 있는 것은 음양이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다는 불리성(不離性)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셋째, 4괘는 음양이 자라나서 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홍색에 가장 가깝게 자리한 건(乾, ○)은 태양(太陽)이라 하여 양의 원천이며, 청색에 가장 가깝게 자리한 곤(坤, 곤○)은 음의 원천인 태음(太陰)이다. 나머지 감(坎, ○)과 이(離, ○)는 태양과 태음에서 태어나 자라난 소양(少陽)과 소음(少陰)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 4괘는 서로가 서로를 낳아 모습을 바꾸어 무한한 순환과 발전의 상을 나타내고 있다.
민족의 기원과 계통을 알려면 문헌자료뿐 아니라, 인류학 · 고고학 · 언어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료를 종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가 행해지지 못해서, 한국민족의 기원과 계통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우리 민족의 기원 · 계통을 연구하려면 우리 민족이 속한 종족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세계 인류는 세 종족, 즉 코카시아종(Caucasoid: 백인종) · 몽골종(Mongoloid: 황인종) · 니그로종(Negroid: 흑인종)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세 종족으로 분리된 것은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호모 사피엔스(Homosapiens)단계이고, 지질 연대로는 후기갱신세(後期更新世)에 해당한다.
우리 민족은 이 가운데 몽골종에 속한다. 몽골종의 형질적 특성이 형성된 것은 시베리아의 바이칼호 부근이라고 한다. 몽골종의 형질적 특징으로서 광대뼈[顴骨]가 나오고 눈꺼풀이 겹쳐진 것(epicanthic fold)은 시베리아와 같은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베리아의 몽골종은 다시 형질적 · 언어적으로 서로 다른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옛시베리아족(Palaeo-Siberians)’ 또는 ‘옛아시아족(Palaeo-Asiatics)’ · ‘옛몽골족(Palaeo-Mongolians)’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새시베리아족(Neo-Siberians)’ 또는 ‘새몽골족(Neo-Mongolians)’이라고 한다. 시베리아의 몽골종이 언제 이와 같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는지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뒤로도 다시 분화되어 오늘날에는 매우 많은 수의 민족으로 나누어져있다. 즉, 옛시베리아족에는 축치족(Chuk-chee) · 코리약족(Koryak) · 캄차달족(Kam-chadal) · 길리약족(Gilyaks) · 아이누족(Ai-nu) · 아메리카 인디언 등이 있고, 새시베리아족에는 사모예드족(Samoyeds) · 위구르족(Uigrians) · 핀족(Finns) · 터키족 · 몽골족 · 퉁구스족 등이 있다.
그리고 새시베리아족은 언어학적으로 우랄어족(Ural language family)과 알타이어족(Altai language family)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할 개연성이 크다.
그것은 한국어와 알타이어족의 언어들이 음운에 있어서 모음조화현상과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의 제약, 특히 유음(流音)을 피하는 점,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군(子音群)이 없는 점, 그리고 문법에 있어서 교착성(膠着性)과 부동사(副動詞)의 존재 등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諸語) 사이에는 경어법(敬語法)이나 주격 접미사의 존재 등 몇 가지 구조적인 차이가 없지 않다. 그러나 경어법은 언어 발달에 있어 훨씬 후대에 생긴 것이므로, 한국어의 경어법은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서 분리된 뒤에 독특하게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몽골종 가운데 새시베리아족의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몽골종의 형질적 특성이 형성된 시베리아의 바이칼호 남쪽은 삼림 · 초원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더 남쪽으로는 중앙아시아 · 외몽골 · 내몽골 지역과 중국 북쪽의 장성지대(長城地帶)까지 초원 지대가 이어져 있다. 그리고 장성지대의 동북부에서 만주 · 요령 지방에 걸쳐서는 삼림 · 초원 지대가 이어지고, 만주 동북부의 삼림지대는 한반도에 이어져 있다.
이와 같이, 남쪽 시베리아지방으로부터 이남의 장성지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비슷한 생태학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몽골종의 여러 민족들은 일찍부터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대체로 제4빙하기 후기부터 후빙기에 이르는 시기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이동에 따라 시베리아의 신석기문화 및 청동기문화가 전파되었다.
신석기시대의 문화가 한반도에 전파된 경로는 두 갈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갈래는 남쪽 시베리아로부터 몽골과 만주 서부를 거쳐 한반도의 서부와 남부에 전파된 것으로, 뾰족밑[尖底] 또는 둥근밑[圓底]의 반란형(半卵形) 유문토기문화(有文土器文化)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갈래는 동쪽 시베리아로부터 흑룡강 유역을 따라 만주 동부와 한반도 동북부에 이른 평저(平底)의 유문토기문화이다.
이 때 한반도에 신석기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은 옛시베리아족일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인골(人骨)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몽골 · 만주 · 한반도에 청동기문화의 전파는 카라수크문화기(Karasuk文化期)로부터 시작되었다. 카라수크문화의 청동기는 단검 · 공부(銎斧) · 창 · 끌 · 내만도(內彎刀)와 단추형장식(bronze button) · 연주형장식(聯珠形裝飾) 등이 찾아진다.
이러한 청동기는 내몽골지역의 수원(綏遠)청동기와 만주 요령청동기에서 모두 볼 수 있다. 다만, 요령청동기에 있어서는 단검과 단추형장식에서 발달한 비파형단검(琵琶形短劍)과 다뉴경형동기(多鈕鏡形銅器)가 독특하게 발달해 수원청동기와 차이가 있다. 수원청동기가 주로 유목문화와 연관된다면, 요령청동기는 농경문화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요령청동기문화는 그대로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로 이어져, 만주와 한반도는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체를 이루었다. 한국민족의 형질적 특징은 두개골의 형태가 단두형(短頭型)이면서 고두형(高頭型)이라는 점이다.
몽골족도 같은 단두형이지만, 한국인의 단두는 머리길이가 짧은 데서 오는 것인 데 비하여, 몽고족의 단두는 머리의 너비가 넓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인의 고두는 몽골족의 정두형(整頭型)과 다르며 오히려 화북지방의 중국인에 가깝다.
같은 알타이족에 속하는 퉁구스족의 경우에는 중두(中頭) 또는 장두(長頭)로서 한국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퉁구스족이 시베리아로부터 이동해 오는 과정에서 선주민인 옛시베리아족과의 혼혈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민족은 같은 알타이족에 속하면서도 몽골족이나 퉁구스족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한국민족은 알타이족의 한 갈래로서 남쪽으로 이동해 중국 장성지대의 동북부와 요령지방 및 한반도에 정착하여 하나의 민족단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난하(灤河) · 대릉하(大凌河) · 요하(遼河) · 노합하(老合河) 등 여러 하천의 유역에 펼쳐진 충적평야에서 농경문화가 시작되고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농업생산력을 배경으로 청동기문화가 발달하면서 읍락국가(邑落國家)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읍락국가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고조선(古朝鮮)이 여러 읍락국가의 맹주국(盟主國)이 되었다. 한국민족의 신화와 습속은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한국민족의 기층문화가 주로 시베리아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의 원시문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은 한국민족의 기원과 계통이 그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위치
국가의 위치, 정확히 말해서 지리적 위치는 당해국 정부가 국가적 · 국제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다. 특히, 자국의 산업 · 주민생활 · 국제정치 등을 추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국가의 지리적 위치는 최근의 연구 · 논의에 기초해서 분류하면, 경도 · 위도의 수리(數理)에 근거한 수리적 위치, 지표상의 바다와 육지의 배치를 고려해서 말하는 수륙배치상의 위치, 주위국가들과의 인접상태 여하를 고려한 관계적 위치로 삼분된다.
수리적 위치
한국의 수리적 위치는 남북은 대략 33°∼43°N(제주도 남단∼함경북도 북단), 동서는 124°∼132°E(평안북도 서단∼경상북도 동단)에 해당한다. 국토 중앙을 남북으로 종관하는 경선은 127°30′E선이고, 동서로 횡단하는 위선은 38°N선이다.
특히, 위도상 한반도가 북반구 중위도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의 온난과 계절적 변화, 그에 따른 인간활동의 활성화 등을 가능하게 한 자연적 이점이다.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한 나라로는 일본 · 터키 · 그리스 · 에스파냐 · 포르투갈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4극지점은 동쪽은 131°52′42"E선, 서쪽은 124°11′00"E선, 남쪽은 33°06'40"N선, 북쪽은 43°00'39"N선이다. 〈표 1〉
| 4극 | 지점 | 경 · 위도 | |||||
|---|---|---|---|---|---|---|---|
| 동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단 | 131。52′42″E | |||||
| 서 |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 서단 | 124。11′00″E | |||||
| 남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단 | 33。06′40″N | |||||
| 북 | 함경북도 온정군 유포진 북단 | 43。00′39″N | |||||
| 〈표 1〉 한국의 4극지점 | |||||||
수륙배치상의 위치
한국은 세계최대인 유라시아대륙의 동부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반도국이다. 반도는 기능상 결합기능과 분리기능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도 대륙 및 해양 양방으로의 진출 가능성과 함께 그 양방으로부터의 고립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 하느냐는 주로 거기에 사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반도 기능을 잘 살려 불교 · 유교 등 대륙문화를 수용해 적절히 토착시켰고, 일부는 해양 쪽의 일본으로 전수해 주었다. 한때 대륙 · 해양 양방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을 크게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히 북방대륙외교, 임해성(臨海性)을 잘 살린 조선 · 중화학 등의 공업입지, 수산 · 해운 진흥, 국제무역항 개발 · 이용 등에 우리의 ‘반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도적 임해성은 우리에게 산업 · 경제, 국제무역, 국제정치 일부, 국력 향상 등에 커다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적 위치
우리 국토와 인접하여 있는 나라는 북쪽의 중국과 동북쪽의 러시아이다. 관계적 위치상 2면적 인접관계의 위치를 한국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가까이 자리잡고 있으나 인접해 있지는 않다. 바다로 한일 양국이 격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2면적 인접관계와 일본과의 근거리라는 위치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국제정치와 그를 둘러싼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조선시대의 사대교린정책(事大交隣政策) 추진, 일제에 의한 식민지 전락,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토 분단과 분단해소 노력, 최근의 중국 ·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외교 전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이 지닌 이와 같은 관계적 위치는 기능상으로 볼 때 완충지 구실을 할 수도 있다. 반면 주위 강대세력들의 힘이 미쳐오기 때문에 공간적 성격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중간의 장(場, field)’ 구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한국은 완충지 구실을 하기도 했고(중일간, 러일간), 또한 장의 구실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수리적 위치와 수륙배치상의 위치가 거의 절대적 성격을 띠는 데 대해서,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들의 인식 · 노력에 따라서 관계적 위치가 지닌 가치와 기능은 달라질 수 있다.
영역
국가의 영역은 영토 · 영해 · 영공으로 구성된,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3차원[입체]적인 공간이다. ‘영역’이라고 하면 흔히 영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토의 비중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와 국민도 일차적으로는 자국의 영역[특히 영토] 내에서 정치 · 방어 · 경제 · 문화적 활동들을 전개해야 하므로 그 영역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관계적 위치상 영토는 대개 타국과의 인접관계도 지니는 것이 상례여서, 이차적으로는 국제적인 정치적 · 경제적 활동의 전개와도 관련이 커서 중요시된다.
영토
우리 국토는 면적이 약 22만㎢이다. 반도부의 남북길이는 함경북도 온성군 북단으로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남단까지의 약 1,070㎞이다. 동서간 최단길이는 평안북도 박천군 서단으로부터 함경남도 정평군 동단까지의 약 175㎞이다. 최장길이 : 최단길이는 약 6.1 : 1이 된다.
형상지수(形狀指數), 즉 국토형상이 원형(圓形)에 얼마나 가까운 모양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수를 캔스키(Kansky, K. J.) 공식인 S=L/M(단, S=형상지수, L=최장축길이, M=최장축길이의 2등분 수직선길이)을 써서 계산해 보면 약 2.8이 된다. 이 값은 최장축길이인 1,070㎞를 그의 수직 2등분선 길이인 380㎞(황해도 송화군 서단∼강원도 동해시 북평 동단 거리)로 나눈 값이다.
이로써, 한국의 국토형상은 원형으로부터 아주 먼 형상, 즉 오히려 신장형(伸長形)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형은 그 지수가 1이고, 1보다 값이 클수록 원형으로부터 먼 형상이 된다.
그리고 한국은 반도부 외에 크고 작은 3, 962개의 섬이 있고, 그 중 3,201개(1989년 현재)가 남한에 있다. 남한의 것 중 전라남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1,997개가 있다. 남한의 것 중 약 500개만 유인도이다.
한국영토와 규모가 비슷한 나라로는 캄보디아 · 라오스 · 시리아 · 루마니아 · 영국 · 에콰도르 · 뉴질랜드 등이 있다. 남한(약 10만㎢)만을 보면, 규모가 비슷한 나라로는 요르단 · 오스트리아 · 포르투갈 · 쿠바 등을 들 수 있다. 영토 규모로 보아 우리 나라[남북한]는 세계 나라 중 중간 규모의 나라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국토는 〈표 2〉와 같이 영토의 공간적 조직(spatial organization of territory)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한 것은 영토 ·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국민들에게는 유효한 봉사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구분 | 명칭 | 기타 |
|---|---|---|
| 특별시(1) | 서울 | 수도, 특별시내에 특별시청을 둠. |
| 자치시(1) | 세종 | 특별자치시, 자치시 내에 시청을 둠. |
| 광역시(6)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각 광역시내에 광역시청을 둠. |
| 도(14)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함경북도 · 함경남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황해도 | 각 도에 도청 소재지를 둠. |
| 〈표 2〉 한국영토의 공간적 조직 | ||
현재 남한은 1특별시, 1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6광역시, 9도로 조직되어 있고, 각 시 · 도에 시청 · 도청에 소재지가 있다. 현재 북한은 1특별시(평양), 3직할시(남포 · 개성 · 나진-선봉), 9도(함경북도 · 함경남도 · 양강도 · 자강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황해남도 · 황해북도 · 강원도)로 조직되어 있다. 역시 각 시 · 도마다 시청 · 도청 소재지가 있다.
영해
남한은 1978년부터 영해 12해리원칙을 수용해 우리의 영해 범위를 설정하였다.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수용해 쓰고 있는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 국제적으로 서명, 채택(1982)되기 4년 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다.
1985년에 대한민국정부는 위의 협약에 서명하였다. 동해에서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의 선을, 그리고 황해 및 남해에서는 기선(基線: 영해 외한선을 긋는 데 근거가 되는 것들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12해리의 선을 원칙으로 삼아 영해를 설정하였다.
제주도 · 울릉도 · 독도에서는 그들 각 해안으로부터 12해리의 선까지를, 대한해협에서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의 선까지를 영해로 삼았다. 반도부와 제주도 사이의 해역은 영해이기는 하나 국제적 항행의 편의를 위해서 무해통행(無害通行)을 인정하고 있다.
남한의 기선(직선 기선)획정을 위한 거점들은 〈표 3〉과 같다. 한편, 북한도 남한과 같은 원칙으로 영해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에서는 12해리까지를, 그리고 황해에서는 역시 먼저 기선을 설정하고 그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잡은 것이다. 국제적 추세에 따른 조치였다.
| 해역 | 번호 · 거점명 |
|---|---|
| 영일만 | 1. 달만곶 |
| 2. 호미곶 | |
| 울산만 | 3. 화암추 |
| 4. 범월곶 | |
| 남해 | 5. 1.5미터암 |
| 6. 생도(남단) | |
| 7. 홍도 | |
| 8. 간여암 | |
| 9. 상백도 | |
| 10. 거문도 | |
| 11. 여서도 | |
| 12. 장수도 | |
| 13. 절명서(도) | |
| 14. 소흑산도 | |
| 황해 | 15. 소국흘도 |
| 16. 홍도 | |
| 17. 고서(도) | |
| 18. 횡도 | |
| 19. 상왕등도 | |
| 20. 직도 | |
| 21. 어청도 | |
| 22. 서격렬비도 | |
| 23. 소령도 | |
| 〈표 3〉 남한의 기선획정을 위한 거점들 | |
| 자료 : 대한민국 영해법 시행령. | |
영공
영토와 영해를 수평적으로 합한 면(面) 위의 상공에 존재하는 공역(空域, air space)을 영공이라고 한다. 영공도 해당 국가, 즉 하토국(下土國)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다. 이론상으로는 무한천공(無限天空)까지가 하토국의 영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고도까지만 사실상의 영공이 된다.
어느 하토국이 타국 국적의 비행기(특히 적국군기)를 ‘어느 고도’ 이상의 상공에서는 도저히 격추시킬 수 없다면, 그 어느 고도 이상의 높은 상공[공역]은 비록 이론상으로는 영공이 되지만 현실상으로는 그 하토국의 영공이 되지 못한다.
배타적인 주권 · 능력이 실제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영공의 고도한계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경제력과 군사전술능력, 특히 고공 격추능력이 발달된 나라의 영공 고도한계는 대단히 높은 곳에 있게 되고, 반면 그 능력이 낮은 나라는 고도 한계가 낮은 곳에 있게 된다.
18세기 네덜란드 법률가 빈케르슈크(Bynkershoek, C. van)의 “토지의 주권은 병기의 힘이 끝나는 데서 끝난다”라는 이론은 과거 영해 설정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적 영공한계 설정에도 잘 적용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영공의 고도 한계는 군사력, 특히 대공포(對空砲)나 공군의 고공 전투능력의 고도한계가 어느 높이에 있는가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리고 그들 한계는 군사적인 것이라 공표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력 및 군사력(특히 대공격추에 있어서)이 성장되면 한국의 현실적 영공의 고도한계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향상될 것이다.
지질과 지형
지질
아시아대륙의 동쪽에서 태평양을 향해 남북으로 뻗은 한반도에는, 고생대 및 그 이전의 지질시대에 속한 지층이 많고 신생대의 지층은 아주 적다. 고생대 전반까지의 지층은 대체로 해성층(海成層)이며, 고생대 말기 및 중생대의 지층은 대부분 육성층(陸成層)이다.
한반도는 만주 · 화북 · 시베리아 등 동북아시아의 대륙부와 같이 육지의 형성 연대가 매우 오래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시생대(始生代)에 퇴적된 지층이 변성작용을 받은 경기변성암복합체의 암석들이다. 그 다음은 시생대 말에 이들 변성퇴적암을 관입한 화강암이 변성된 화강편마암이다.
이들 변성암과 더불어 널리 분포하는 것은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이다. 변성암과 화강암은 국토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퇴적암은 국토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며, 고생대 초에 쌓인 조선누층군(朝鮮累層群)과 고생대 말∼중생대 초에 걸쳐 쌓인 평안누층군(平安累層群)이 대표적이다.
조선누층군은 평안남도 동부와 강원도 남부에 비교적 널리 분포하며, 석회암층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평안누층군은 평안남도 북부와 남부, 강원도 남부, 전라남도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 나라 무연탄의 대부분을 부존하고 있다.
중생대지층으로는 대동누층군(大同累層群)과 경상누층군(慶尙累層群)이 있다. 경상누층군은 경상도지방에 널리 분포한다. 신생대의 제3기층은 국지적으로 산재한다. 제3기말에서 제4기 전반에 걸친 화산활동으로 조면암 · 현무암 등이 분출해 백두산 · 칠보산 등의 화산과 제주도 · 울릉도 등의 화산도 및 개마고원 · 철원 · 신계 등지의 용암대지를 형성하였다.
지형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있고 우리나라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개마고원이 함경산맥 북쪽에 위치해, 동쪽과 북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은 형상이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산악국이지만,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는 약 10%에 불과하고, 200∼500m의 낮은 산지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한반도와 만주를 통틀어 가장 높은 백두산(2,744m)을 비롯, 관모봉(2,541m) · 북수백산(2,522m) · 금강산(1,638m) · 설악산(1,708m) · 오대산(1,563m) · 태백산(1,567m) 등의 높은 산들은 북쪽과 동쪽에 편재한다. 특히 해발 2,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은 개마고원과 그 주변에 솟아 있고 남한에는 없다.
한반도는 오랜 침식으로 전반적인 지형이 저평화(低平化)되었다가 제3기중신세(中新世) 이후 지반이 융기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지반의 융기는 동쪽과 북쪽에 치우쳐서 일어났으며, 저평했을 때의 지형적 흔적이 산지의 곳곳에 남아 있다.
개마고원에는 저기복의 평탄한 지면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대관령 일대에도 사면의 경사가 극히 완만한 구릉성지형이 해발 800m 내외의 고도에 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은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또한, 서부에는 고위평탄면이 해체되면서 이루어진 파랑상의 구릉지가 넓게 분포한다. 구릉지 위로 솟아 있는 구월산 · 북한산 · 관악산 · 계룡산 · 무등산 등은 해발고도는 높지 않으나 예로부터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에는 명승지 내지 관광지 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맥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태백산맥 · 낭림산맥 · 함경산맥 등이다. 이들 산맥은 중신세 이후의 융기운동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태백산맥과 낭림산맥에서 빗살처럼 뻗어나온 강남 · 적유령 · 묘향 · 언진 · 멸악 · 마식령 · 광주 등의 산맥들은, 지각이 약한 지질구조선을 따라 하곡(河谷)이 팸으로써 산지가 하곡들 사이에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연속적인 맥을 이루지 못한다. 다만, 소백산맥은 속리산 · 덕유산 · 지리산 등의 고산들로 이어져 예로부터 영남 · 호남 · 호서 지방 간에 교통상의 장벽이 되어 왔다.
압록강 · 대동강 · 한강 · 금강 · 낙동강 등의 주요 하천들은 황해와 남해로 흘러든다. 이들 하천은 20세기에 근대적인 육상교통이 발달하기 전까지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으며, 평양 · 한양 · 공주 · 부여 등의 역대 도읍들도 하안에 건설되었다. 또한, 대하천의 주변에는 강경 · 부강 · 영산포 · 낙동 · 안동 등의 하항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의 하천들은 유역 면적이 좁고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잦아 유량의 변동이 심하다. 하천을 통한 물자 수송은 유량이 많은 시기와 하류에서는 만조(滿潮)로 수위가 상승할 때 주로 이루어졌다. 한강의 경우에는 인도교 부근까지 조석(潮汐)의 영향이 미친다.
하천은 막대한 수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하류에는 비옥한 충적평야를 이루어 놓았다. 김포 · 안성 · 논산 · 호남 · 나주 · 김해 등의 평야는 황해와 남해로 유입하는 주요 하천의 하류에 발달된 평야로서, 벼농사를 집중적으로 행하는 핵심 지대는 모두 충적지이다.
이들 평야의 충적지는 하천의 토사가 쌓여 형성된 지형으로, 해발 고도가 10m 내외이고 과거에는 홍수의 재해를 상습적으로 입었던 지역이다.
형산강 · 용흥강 · 성천강 등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들의 하류에도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으나 그 규모가 작다. 또한, 황해와 남해로 유입하는 하천들의 중류 · 상류에는 춘천 · 원주 · 충주 · 제천 · 안동 · 김천 · 거창 · 남원 등의 침식분지가 형성되어 지방의 산업 ·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반도국이어서 해안선이 매우 길다. 동해안은 비교적 단조로우나 황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들이 많아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이룬다. 동해안은 지반이 융기하고 태백산맥이 해안을 따라 뻗어 있기 때문에 단조롭다. 이에 반해 황해안과 남해안은 태백산맥과 낭림산맥에서 갈라진 산맥들이 해안을 향해 뻗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조차가 큰 황해안에는 간석지(干潟地)가 넓게 발달되어 있다. 간석지는 주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토사가 만을 중심으로 쌓여 형성된 해안퇴적지형으로, 예로부터 간척사업에 의해 논이나 염전으로 개발되어 왔다.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사빈(砂濱)은 동해안에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황해안과 남해안의 사빈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기후와 식생
기후
우리나라는 북위 33°∼43°의 아시아대륙 동안(東岸)에 위치해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온대 내지 냉온대 기후지역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중위도의 대륙 동안은 서안에 비해 한서(寒暑)의 차가 심하며, 특히 겨울철의 기온이 매우 낮다. 거의 같은 위도상에 있는 서울과 아테네의 1월 평균기온은 각각 -4.6℃, 8.8℃로서 약 13℃ 정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한대성과 열대성의 2중적 성격을 띤다.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대륙성고기압으로부터 북서계절풍이 불어와서 일최저기온이 -10℃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으며, 한파(寒波)가 내습할 때는 -15°∼-20℃의 혹한도 나타난다.
이에 반해 북태평양의 해양성아열대고기압이 지배하는 한여름[盛夏]에는 일최고기온이 30℃를 넘어 열대습윤기후를 방불하게 하는 무더위가 계속된다.
최한월과 최난월의 평균기온차는 북부에서 약 40℃, 중부에서 약 30℃, 남부에서 약 23℃에 달해 북쪽으로 갈수록 대륙성기후의 성격이 짙어진다. 우리나라의 한극(寒極)인 중강진에서 최저 -43.6℃, 서극(暑極)인 대구에서 최고 40℃의 기온이 기록된 바 있다.
한반도는 위도 10°에 걸쳐 있고, 북쪽은 고도가 높으며 대륙에 접해 있는 데 비해 남쪽은 낮으며 바다에 돌출해 있어 남북간의 기온차가 심하다. 연평균 기온의 분포는 서귀포(14.7℃)에서 가장 높고 중강진(3.8℃)에서 가장 낮아 10℃ 이상의 남북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계절상으로는 여름에는 그 차가 작고 겨울에는 매우 크다. 8월에는 서귀포(25.8℃)와 중강진(22.7℃)의 기온차가 3℃에 불과하지만, 1월에는 각각 5. 1℃와 -20. 8℃를 나타내어 그 차가 무려 26℃나 된다. 때문에 여름의 더위는 전국적이지만 겨울의 추위는 남쪽과 북쪽이 현저하게 다르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겨울이 길고 여름이 비교적 짧으며, 봄과 가을은 몹시 짧다. 북부지방에서는 겨울기간이 4∼5개월, 중부지방은 3.5∼4개월, 남부지방은 2∼2.5개월이다. 또한, 여름기간도 개마고원에서는 몇 주일에 불과하고, 관북 해안지방은 약 1개월, 관서지방은 약 2.5개월, 중부지방은 약 3개월, 남부지방은 약 3.5개월이다.
같은 위도상일지라도 동서간에는 비교적 현저한 기온차가 나타난다. 즉, 동해안은 황해안에 비해 겨울에 3℃ 정도 높은 기온을 보여준다. 이는 태백산맥이 한랭한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고, 북서풍이 영서지방에 눈을 내릴 때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변해 동해사면을 불어 내리기 때문이다.
강수(降水)는 거의 전국적으로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 7월에, 중부 이북에서는 8월에 많은 비가 내린다. 냉량한 오호츠크해기단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기단의 접촉부에 형성되는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상륙한 다음 천천히 북상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6∼8월의 우기에 연강수량의 약 60%, 장마철인 7월에 내리는 강우만도 연강수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장마철은 대개 6월 하순에 시작해 중부 이남에서는 7월 하순에 끝나며, 북부지방에서는 8월까지 계속된다. 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가 계속되는 한여름에는 때때로 태풍이 비를 몰고 온다. 연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강우량의 지역적 분포는 지형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여름에 양쯔강 유역에서 발생해 우리 나라로 이동해오는 이동성저기압이 산지에 부딪히는 큰 하천의 중 · 상류 지방은 다우지이다. 산지로 둘러싸인 섬진강의 하류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400∼1,500㎜의 최다우지를 이룬다.
한강과 임진강의 중류 · 상류 및 청천강의 중 · 상류 지방도 1,200∼1,300㎜의 다우지이다. 개마고원은 함경산맥이 여름계절풍을 차단하고 이동성저기압의 영향을 적게 받아 연강수량이 700㎜ 이하로서 가장 적다.
이 밖에 구릉성저지대인 대동강 하류지방과 태백산맥 및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낙동강 중 · 상류 지방은 800∼900㎜ 이하의 과우지(寡雨地)이다. 우리나라는 습윤기후지역에 속하나 연강수량의 변동이 심하다. 이는 주로 여름철의 강수량에 원인이 있다.
연강수량의 변동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서울의 경우 1940년에는 2,135㎜, 1949년에는 633㎜를 기록해 그 차이가 약 1,500㎜에 달한다. 또한, 농업의 중심지인 중부와 남부지방에서는 연평균치가 20% 내외의 큰 폭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의 대륙 동안에 위치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과 기압의 배치가 계절에 따라 매우 다르다. 겨울에는 한랭건조한 대륙성의 시베리아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시베리아기단은 발달과 쇠퇴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기단의 세력이 강해져 한파가 우리나라로 내습할 때는 기온이 내려가며, 약화되어 이동성고기압이나 온대성저기압이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다가올 때에는 날씨가 온화해져서 이른바 삼한사온(三寒四溫)의 현상이 나타난다.
봄철이 되면 시베리아고기압은 약화되고 여기에서 분리된 이동성고기압과 온대성저기압이 2,3일 간격으로 통과하며, 날씨는 화창하나 변화가 심하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남부지방에서부터 여러 가지 꽃이 피기 시작해 점차 북쪽으로 옮아간다. 진달래가 피는 시기는 남부와 북부 사이에 1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다.
봄에는 공기가 건조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며 황사현상(黃砂現象)도 나타난다. 늦봄과 초여름에는 냉량다습한 오호츠크해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세력을 확장해 날씨가 비교적 맑으며, 태백산맥 서쪽의 중부지방에는 푄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오호츠크해고기압이 약화되고 저위도에 머무르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한다. 이들 고기압 사이에 형성되는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북상해 장마철이 시작된다.
장마전선이 만주지방으로 올라가면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해 삼복(三伏)더위가 계속되는 한여름으로 접어들며, 이 때는 남서풍 · 남풍 · 남동풍 등 남풍 계통의 바람이 불어온다.
가을이 되면 시베리아고기압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분리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날씨가 맑다. 온대성저기압이 통과할 때는 날씨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봄철보다는 약해 농작물의 결실에 유익하다.
식생
우리나라는 남북간의 기후차가 크고 지표의 기복이 상당해 식물의 종류가 풍부한 편이다. 삼림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난대 · 온대 · 냉대가 분포한다. 난대림은 남해안에 분포한다.
잎이 넓은 상록활엽수가 많고 대표적인 수종은 동백나무와 북가시나무이다. 이러한 유형의 삼림을 조엽수림(照葉樹林)이라고 하며, 일본 남부와 중국의 화중 · 화남 지방으로 이어진다.
낙엽활엽수로 대표되는 온대림은 북한의 구릉지대와 남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수종은 신갈나무 · 떡갈나무 · 상수리나무 등이다. 대체로 남쪽으로 갈수록 수종이 점차 변해 느티나무 · 팽나무 · 서나무 · 흑송 · 참대 등 난대성의 수종이 섞인다.
북한의 동북부에는 상록침엽수림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냉대림의 상록침엽수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기후에 알맞은 식물로 북반구의 북부에 널리 분포한다. 대표적인 수종은 분비나무 · 가문비나무 · 구상나무 · 눈잣나무 등이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도에 따른 식생의 변화가 현저하다. 특히, 북한의 산악지대와 제주도의 한라산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신갈나무 · 떡갈나무 등을 주로 하는 낙엽활엽수림대 위에는 가문비나무 · 분비나무 · 구상나무 등의 아고산대(亞高山帶) 침엽수림대가 나타난다.
아고산대가 시작되는 높이는 한라산 1,500m, 금강산 1,200m, 백두산 900m 등이다. 삼림의 한계 고도는 백두산 2,000m, 관모봉 2,200m이며, 지리산과 한라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환경과 생활
지형과 생활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 취락 · 교통 등 각종 인문현상은 지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우리나라는 농업국으로 발전해 왔지만 산지가 많기 때문에 농토가 비교적 협소하다.
농업은 벼농사가 중심이지만 논과 밭의 분포는 대체로 지형과 일치한다. 하천 양안의 충적지와 계곡의 저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며,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와 산록은 밭으로 이용된다.
오늘날 쌀의 곡창을 이루고 있는 평야지대의 충적지는 원래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서, 금세기 이전에는 대부분 황무지였다.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도 강(江)가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기술되어 있다.
당시 논농사에 유리했던 곳은 평야지대의 넓은 충적지보다는 비교적 작은 하천이 흐르는 계곡이었다. 이러한 곳은 보(洑)로 막아 하천을 관개용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수해도 적은 이점이 있다. 그리하여 넓은 평야를 이용하지 않고 계곡에서 계단식 논을 만들어 농토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큰 강 하류의 평야지대에서도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은 구릉지와 충적지가 만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곳은 논과 밭이 고르게 분포해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야산에서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높은 산지는 예로부터 교통상의 큰 장애였다. 태백산맥 · 소백산맥 · 낭림산맥 등은 여러 고개[嶺]를 통해 산맥의 양쪽 지역이 연결되기는 했으나, 교통이 불편했던 과거에는 주민들을 갈라놓는 구실을 하였다. 태백산맥의 대관령 · 추가령, 소백산맥의 조령 · 추풍령 · 육십령 등은 넘기가 어려웠으며, 고개의 양쪽 기슭에는 통행인을 위한 영취락(嶺聚落)이 현저하게 발달하였다.
조선 8도의 행정경계는 산맥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호남과 영남, 관서와 관북 등 각기 개성이 뚜렷한 지역들이 형성되었다. 높은 산맥의 양쪽 지방은 방언 · 가옥구조 · 농업 · 풍속 등서 차이가 크다.
산지는 농업에 불리하지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란을 피하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주로 화전(火田)을 일구어 생계를 이어갔으며 화전민으로 정착하기도 하였다. 화전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땅은 산지 중에서도 지면이 비교적 평탄한 고위평탄면이었다.
고위평탄면은 토양층이 비교적 두꺼워 영구적인 농토로 바뀌었다. 교통이 편리해진 오늘날 대관령 일대에는 채소를 중심으로 한 고랭지농업(高冷地農業)이 활발하다. 서부지방의 산정부에 고위평탄면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평정봉(平頂峰)은 산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시에 방어거점으로 삼았다. 남한산 · 금오산 · 구월산 등의 산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황해안의 간석지는 중요한 토지자원의 하나로서 계속 농경지로 개발되어 왔다.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정부가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식량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척사업을 추진하였다.
백제시대에 쌓았다고 하는 벽골제(碧骨堤)도 저수지의 제방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조수가 드나드는 갯골을 가로막은 것으로 보아 방조제(防潮堤)의 기능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까지의 간척사업은 규모가 작았고 민간에서 추진한 간척사업은 더욱 그러하였다. 근대적인 토목공사에 의한 대규모의 간척사업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척지가 주로 논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방조제와 더불어 수리시설도 축조되었다.
호남평야와 같은 해안평야는 간척사업을 통해 확장되어 왔다.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옥구군(현, 군산시)의 미면(米面, 1920년대)과 김제군(현, 김제시)의 광활면(廣闊面, 1930년대) 및 부안군의 계화면(界火面, 1970년대) 등은 간척사업으로 생겨났다.
간석지는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구간척지 외부로 신간척지가 조성된다. 지면이 높아 조수의 침입이 적고 염분에 강한 식물들이 자라는 염생습지(鹽生濕地)는 황해안과 남해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했으나, 지금은 거의 논과 염전으로 바뀌어져 있다.
기후와 생활
기후는 의식주 생활과 취락의 입지, 산업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소한(小寒)에서 동지(冬至)까지의 24절기(節氣)에 따라 세시풍속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있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은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기에 알맞도록 고안되었다.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에서 겨울옷은 천 사이에 솜이 들어 있고 바지에는 대님을 매어 체온의 발산을 최소로 줄이고 있다. 여름옷은 통풍이 잘되는 삼베 · 모시 등의 마직물을 많이 사용하며, 풀먹이기에 주의를 기울여 체온의 발산을 최대로 늘리도록 하였다.
겨울이 긴 지방에서는 겨울 동안 신선한 채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식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의 하나이다. 김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 특유의 채소저장법이다. 추운 북쪽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갈수록 김치의 맛이 짠 것도 기온차와 관련이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각종 음식물을 현저하게 달리해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는다.
전통적인 가옥에는 겨울철의 난방시설인 온돌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붕이 낮고 방이 좁으며 벽이 두껍다. 창과 문의 수는 적고 규모도 매우 작으며, 2중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가옥구조는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방한(防寒)에 치우친 때문이다. 한편, 마루나 대청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에는 이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가옥구조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북쪽으로 갈수록 폐쇄성을 띠는데, 추운 관북지방의 가옥은 부엌을 넓혀 작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이 없는 온돌인 정주간(鼎廚間)을 설치하였으며, 가축의 축사도 온기가 있는 부엌에 붙어 있다.
전통적인 가옥의 건축재료로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임산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목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흙과 돌도 중요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옥은 지붕의 재료에서 외형적 특색이 뚜렷해 지붕의 재료에 따라 초가 · 기와집 · 너와집 등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초가지붕은 단열재 구실을 하여 기와집이나 양철집보다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초가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붕의 재료는 상이해 벼농사 지대에서는 볏짚, 밭농사지대에서는 조짚이나 밀짚, 제주도에서는 새[茅], 김해평야에서는 갈대 등이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향산록이 제일 좋은 집터로 꼽힌다. 남향산록은 강한 북서계절풍을 직접 받지 않고 일사량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천의 이름에는 남대천(南大川)이 많다. 하천이 동서방향으로 흐를 때 하천 북쪽의 남향산록에 위치한 마을의 남쪽을 흐르므로 이러한 명칭이 붙여진 것이다.
택지풍수(宅地風水) · 촌락풍수 · 묘지풍수 등 과거에 성행했던 각종 풍수사상에서 길지(吉地)의 으뜸으로 여겼던 배산임수(背山臨水)는 우리나라의 기후 및 기타 자연환경과 부합된다. 가옥의 구조뿐만 아니라 취락의 입지에서도 여름철의 더위보다 겨울철의 추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기후와 가장 관련이 밀접한 산업은 농업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벼농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벼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열대성농작물인데, 몬순아시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여름이 고온다습해 벼농사에 알맞은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부지방의 평야지대에서는 만생종(晩生種)을, 북부와 산간지방에서는 조생종(早生種)을 재배하고 있다.
벼와 더불어 널리 재배되는 작물은 보리이다. 보리는 서남아시아가 원산지로서 생육기가 우리나라의 일반 식물과는 달리 가을에서 봄까지이다. 그리하여 보리는 겨울이 비교적 온난해 논의 그루갈이가 가능한 중부 이남에서 주로 생산된다.
지금은 주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나, 과거 남부지방에서는 늦봄부터 가을까지의 식량은 거의 전적으로 보리에 의존했기 때문에 ‘꽁보리밥’이라는 말도 생겼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 밭농사가 활발한 관서지방에서는 조와 기타 잡곡이 많이 생산된다. 또한, 여름이 짧고 냉량한 영서지방과 관북지방에서는 감자와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어 주식으로 이용된다.
근래에는 비닐하우스의 등장으로 기후의 제약을 극복하고 연중 채소와 화훼를 재배한다. 특히, 겨울이 온난한 남부지방에서는 원교농업의 형식으로 채소를 많이 재배한다. 제주도에서는 1970년대 이후 감귤재배가 활발해 지금은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실이 되었다. 이러한 농업은 기후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좋은 예이다.
자연재해와 그 극복
자연재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가뭄 · 홍수 · 냉해 · 산사태 등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절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업에 해를 끼치는 가뭄은 초여름과 한여름에 자주 발생한다. 장마전선의 북상이 늦어져 6월에 가뭄이 심하면 모내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7월까지 연장되는 해도 있다. 어떤 해에는 장마가 일찍 끝나고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력해 벼의 성숙기에 가뭄이 계속되기도 한다.
가뭄이 계속될 때 태백산맥 서쪽의 영서 · 경기 지방에 푄현상이 일어나면, 심한 경우에는 우물이 마르고 농작물은 물론 산과 들의 초목까지 마르게 된다.
1939년에는 보기 드문 가뭄이 들어 쌀생산량이 평년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가뭄은 넓은 범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482년 동안에 극심한 가뭄이 89회에 달하였으며 2, 3년간 연속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1919 · 1924 · 1928 · 1939 · 1966년에 가뭄이 전국적으로 극심했고 국지적인 가뭄은 이보다 잦았다.
수해를 일으키는 홍수는 6∼9월의 우기에 주로 발생하며 하천 양안의 저지대에 피해를 준다. 거의 매년 장마철이면 일강수량 100㎜를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며, 태풍이 통과할 때는 강수 집중도가 이보다 훨씬 커서 예외없이 심한 홍수가 발생한다.
태풍은 강한 바람까지 수반해 농작물에 풍해(風害)를 입히기도 한다. 태풍은 7∼9월 사이에 3,4년에 1회 정도로 남부지방을 내습하는데, 해안지방에서는 해일(海溢)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중부지방의 경우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심하였던 수해는 1925년 7월에 있었다. ‘을축년홍수(乙丑年洪水)’라고 불리는 이 때의 수해는 경기만 쪽으로 내습한 태풍에 의한 것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400∼600㎜의 집중호우가 내려 한강 주변의 저지대가 전부 물로 덮였다. 1959년 김해지방을 강타한 사라호 태풍도 풍수해와 해일을 일으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집중호우시에는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과 농경지를 순식간에 휩쓰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의 산사태는 사면의 토양층이 빗물을 흡수하고 수목이 바람에 흔들려 기반암 위의 토양층이 요동될 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규모가 크지는 않다.
냉해는 농작물의 생육기에 궂은 날이 계속되어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기온이 낮을 때 발생한다. 발생률은 가뭄과 수해에 비해 작지만, 냉해가 심한 경우에는 농작물의 결실이 부실해 흉년이 들기도 한다. 냉해는 저지대보다 산간 고지대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관북 해안지방은 여름철에도 한류인 북한해류의 영향을 받아 냉해가 비교적 심하다.
한반도는 주로 고생대 이전의 안정된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의 피해가 극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옥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일으킨 지진도 다수 있었다. 『삼국사기』 ·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11회, 고려시대에 4회, 조선시대에 26회의 큰 지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1727년(영조 3) 함경도의 함흥을 비롯한 7읍에 발생한 지진은 가옥과 성벽을 무너뜨린 대지진이었다. 근래에는 1978년 충청남도 홍성에 진도(震度) 4, 5도의 지진이 발생해 가옥 · 공공건물 · 성벽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강도가 약하고 빈도도 적어, 일상생활에서 의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연재해의 극복
농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가뭄과 홍수를 극복하기 위한 수리사업이 역대 왕조를 통해 기본정책의 하나로 이어져왔다.
가뭄은 농업 전반에 피해를 준다. 일찍부터 벼농사를 시작한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저수지를 축조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삼국시대의 저수지로는 상주의 공검지(恭儉池), 의성의 대제지(大堤池), 제천의 의림지(義林池), 밀양의 수산제(守山堤), 김제의 벽골제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작은 계류(溪流)를 배경으로 축조한 저수지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관개면적이 넓지 못하였다. 평야지대에서는 구릉지를 배경으로 낮은 둑을 쌓아 빗물을 저장하는 작은 저수지, 즉 동(垌) 또는 방죽이 주요 관개시설로 이용되었다. 이 밖에 작은 골짜기의 하천에 보를 축조해 논의 관개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관개시설은 가뭄을 극복하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은 천수답(天水畓)이거나 이와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궁중 · 관청 · 민간에서는 연례행사로서 모내기철에 기우제를 올렸다.
조선 세종 때에는 측우기를 만들고 서운관(書雲觀)을 두어 우량을 관측했으며, 서울의 청계천에는 수표교(水標橋)를 만들어 수위를 관측하였다. 이러한 관측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수해에 대한 대비책은 가뭄보다 소홀한 편이었다. 심한 수해는 큰 강 양안의 충적지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조선시대와 그 이전에는 홍수를 다스릴만한 높은 제방을 쌓을 수 없었다.
오늘날 벼농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평야지대의 충적지는 20세기에 들어와 근대적인 토목공사에 의해 대규모의 제방을 쌓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양수장을 설치하는 한편, 저습했던 땅을 배수함으로써 가뭄과 수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산지에서 평지로 흘러나오는 소규모 하천은 둑을 쌓아 유로를 고정시키고 홍수시의 범람을 막아 양안의 농토를 보호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사가 하상에 집중적으로 쌓여 하상이 주변의 농토보다 높은 천정천(天井川)이 발달한다. 이러한 천정천은 수백년에 걸쳐 둑을 계속 쌓아올려서 형성된 것이다.
평야지대의 충적지에서는 지면의 주변보다 다소 높은 자연제방이 농토로 이용되는 한편, 취락의 입지에도 이용되었다. 수해가 비교적 적은 자연제방에서도 집터를 돋우거나 돈대(墩臺)를 설치해 홍수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가옥에서는 초가지붕을 밧줄로 그물처럼 엮고 돌담을 높이 쌓아 바람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 근래에는 감귤밭도 높은 방풍림을 조성해 보호하고 있다.
개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표경관은 인구의 증가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부분이 인공적으로 개조된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룩된 촌락과 도시를 비롯해 도로 · 경지 등은 조상의 얼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다.
하천은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로를 바로잡았다. 경지의 관개를 위해 작은 하천을 가로막아 저수지를 축조했고 계곡에는 계단식 논을 조성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공업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경제규모의 증대로 대규모 댐, 아산만방조제, 영산강하구언, 경부고속도로, 대도시의 고층빌딩 등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졌다. 계화도 · 영산강 · 서산 · 시화 · 새만금 등의 간척사업으로 해안선이 크게 변모하였다.
현재의 우리나라 인문환경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던 한반도를 한민족의 가치관과 기술 발달로 변형, 성장시킨 산물이다. 이러한 인문환경의 차이는 그 지역의 자연적 차이에서 유래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을 점유한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 차이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산록에 발달한 집촌과 산간지대의 산촌, 마을 주변 구릉지의 묘지군(墓地群) 등은 우리나라 특유의 촌락 경관이다.
우리나라의 기본 산업이었던 농업은 점차 제조업분야의 팽창에 따라 국민총생산에서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경인 · 남동 임해공업지역 · 영남공업지역 · 호남공업지역 · 태백산공업지역 · 중부내륙공업지역 등을 비롯한 근대적 공업지역의 발달은 원료의 수입과 공산품의 수출을 주로 하는 선진국 산업형으로 급속히 전환시켜 국토의 경관이 크게 변모되었다.
도보 · 수로(水路) 교통의 시대에서 철도 · 고속도로 · 항공으로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권을 전국 내지 세계로 확대시켰다. 1970년대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호남 · 남해 · 구마 · 88올림픽 · 중부 · 영동 · 동해 고속도로 등이 완공되고, 중앙 · 서해안 · 대전통영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1일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일 뿐만 아니라 산맥도 남북과 동서로 교차해 교통의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삼국시대까지는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각각 독립된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결과, 현재까지도 기호(畿湖) · 관동(關東) · 관서(關西) · 영남(嶺南) · 호남(湖南) · 관북(關北) 등 각 지역은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띤다.
일반적 특성
인구
조선 중기의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추계되고, 그 뒤 약 200년 동안 정체상태에 머물러 조선 말기에는 약 1,300만 명으로 추계된다. 근대적 인구센서스가 처음으로 실시된 1925년의 총인구는 약 1,900만 명이었다. 1944년의 인구조사에서는 2,51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시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인구가 북으로는 만주와 노령(露領)으로, 남으로는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1945년 광복 당시 일본에는 약 210만 명, 만주에 약 160만 명, 구소련에 약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광복과 더불어 일본에서 거주하던 약 150만 명은 귀국했으나 만주와 구소련에 거주하던 동포들은 대부분 그대로 머물렀다. 광복 이후에 귀국한 해외동포들은 주로 남한에 정착하였다. 또한, 국토가 양단되어 많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이동했으며 6 · 25전쟁 동안 절정에 달하였다.
6 · 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55년의 인구조사 결과 북한을 제외한 총인구는 2150만 명이었고, 1960년에는 2,495만 명으로 1945년 당시 남북한 전체인구 규모에 다다랐다. 196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증가율도 연 2% 이상으로 인구의 급증을 기록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1.0%내외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85년 총인구가 4,000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세계상위권의 인구 대국이 되었으며, 1999년 현재 총인구는 약 4,685만명이다. 평균 수명은 광복 직전에 남자 45세, 여자 49세였으나, 1985년에는 남자 65세, 여자 72세로 40년 동안에 20세 이상 길어졌다. 이후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 1997년 현재에는 남자 71세, 여자 78세이다.
인구의 성별구조에서는 전쟁을 치렀거나(1955) 주민의 해외이주가 많았던 때(1944)에는 여초현상(女超現狀)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985년의 경우 섬유공업 · 전자공업 등의 발달로 여성근로자가 많은 공업도시와 관광도시에서 여초현상이 두드러졌다(마산 92.0, 구미 92.1, 경주 92.1 등). 반면, 남초현상(男超現狀)이 나타나는 지역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도시와 광산도시, 여자인구의 유출이 많은 농촌지역 등이었다(창원 111.3, 울산 108.2, 태백 109.6, 정선 109.7 등).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일제시대에는 청장년층의 해외유출로 청장년층이 감소하고 유년층이 증가했으나 광복 직후에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6 · 25전쟁 이후의 출생률 상승으로 유년층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유년층은 감소한 반면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졌다. 소득과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년층의 비율도 증가해 199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5.9%를 차지한다. 200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약 4612만명이며, 지역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 시 · 도\구분 | 면적 (㎢) |
인구 (명) |
|---|---|---|
| 서울특별시 | 606.37 | 10,270,484 |
| 부산광역시 | 753.19 | 3,829,094 |
| 대구광역시 | 885.53 | 2,493,387 |
| 인천광역시 | 957.64 | 3,485,199 |
| 광주광역시 | 501.15 | 1,339,441 |
| 대전광역시 | 539.79 | 1,341,413 |
| 울산광역시 | 1,055.72 | 1,015,249 |
| 경기도 | 10,190.73 | 8,672,632 |
|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 16,873.72 | 1,552,667 |
| 충청북도 | 7,432.72 | 1,484,429 |
| 충청남도 | 8,584.76 | 1,913,428 |
|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 8,047.54 | 2,009,245 |
| 전라남도 | 11,963.79 | 2,171,024 |
| 경상북도 | 19,031.77 | 2,809,584 |
| 경상남도 | 10,504.41 | 3,069,757 |
| 제주도(현, 제주특별자치도) | 1,845.89 | 534,008 |
| 총계 | 99,774.72 | 46,991,041 |
| 〈표 4〉 시 · 도별 면적과 인구 (1999.2.1 현재) | ||
| *주) 인구 : 1998.12.31 주민등록기준 잠정통계. | ||
취락
1960년에 약 70%를 차지하던 촌락인구는 1980년에 42.7%로, 1990년에는 25.6%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도시의 팽창에 따른 촌락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진공업국에 비하면 촌락인구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촌락인구의 대부분이 대도시근교를 제외하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경지의 분포와 대략 일치한다.
촌락의 대부분은 집촌(集村)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간지대와 개척촌에서는 산촌(散村)을 이룬 곳이 많다. 집촌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이루어져,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풍수사상에 바탕을 둔 자연관(自然觀), 그리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촌락의 입지는 낮은 구릉지를 등지고 남사면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사면 산록입지는 겨울의 북서계절풍을 막을 수 있고, 일사량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지를 최대로 경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치이다. 우리나라의 공업화와 때를 같이하는 새마을운동은 촌락경관을 많이 변모시켰다.
불규칙한 집촌은 규칙적인 가옥 배치로 정리되었고, 건축재료와 구조면에서도 중부지방의 ㄱ자집, 남부지방의 一자집 등에서 새마을 표준가옥형으로 전환되어 종래의 초가지붕은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아직 전통적 가옥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촌락의 입지 및 형태에서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인구는 1960년의 700만 명에서, 1980년에는 2,140만 명으로, 다시 1985년에는 2,641만 명으로, 1996년에는 4,04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비해 농촌인구는 격감하였다.
196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일어난 도시인구의 증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960∼1966년에는 도시중심의 경공업발달에 따르는 인구증가가 있었으며 촌락인구의 감소는 없었다.
1966∼1970년의 제2차경제개발 기간에는 수도권과 태백산 지역에서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였으며, 1968년 이후에는 촌락인구의 절대 감소가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인구증가는 서울의 팽창에 따른 위성도시의 발달 때문이었다.
1970∼1975년에는 대부분의 도시지역과 태백산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주변 도시와 남동임해공업지역의 포항 · 울산 · 부산 · 마산 등지에서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였다. 이 시기의 도시발달은 공업지역이나 공업단지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75∼1980년에는 전국에 걸쳐 도시인구는 증가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도시인구는 460만 명이 증가한 반면, 촌락인구는 180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팽창과 관련 산업의 신장기에 해당한다. 1980∼1985년에는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약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 수도권전철의 부설과 고속도로의 개통, 위성도시의 성장 등으로 팽창된 수도권 인구는 1985년에는 총인구의 39.1%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는 196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해, 1985년 전국의 시부인구(市部人口)는 65.4%에 달하였다.
인구분포면에서 보면 농업이 주축을 이루었던 광복 이전까지는 온난한 남부 · 서부의 평야지대의 인구밀도가 높고 한랭한 동부 · 북부의 산악지대로 갈수록 낮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공업화로 많은 농촌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었다.
지역별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1960년에 서울 9,111인 · ㎢, 부산 4,826인 · ㎢, 제주도 157인 · ㎢이던 것이 1989년에는 1만7469인 · ㎢, 7,334인 · ㎢, 283인 · ㎢으로 각각 높아졌다. 제주도의 경우는 감귤과수원과 관광지개발에 따른 전입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광복 당시 남한에는 도시가 11개(개성 제외)에 불과했으나 1955년 25개, 1975년 35개, 1990년 67개, 2000년 현재에는 7개 광역시를 포함해 79개로 늘어났다.
산업활동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업활동의 중심은 농업이었다. 1960년에 총취업인구 가운데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50%를 넘었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였다.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급속한 공업화로 농업인구와 국민총생산에서의 비중이 급속히 저하되었다. 1989년에는 1차산업인구가 총취업인구의 19.5%, 국민총생산의 10.3%를 차지하였다.
농업 내부에서도 기계화를 위한 경지 정리, 관개시설의 확충, 수확품종의 개량, 영농의 다각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삼국시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벼농사는 중부 · 남부 지방의 평야지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농업의 주축을 이룬다.
기후의 차이에 따라 중부에서는 조생종, 북부에서는 중생종, 남부에서는 만생종이 재배된다. 1972년 이후에는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 · 유신벼 등의 도입과 영농방식의 개선으로 쌀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의 우리나라 곡물생산량은 614만t이며, 그 중 쌀은 545만t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맥류는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밀은 추위나 가뭄, 토질 등에 대한 적응력이 보리보다 강한 작물이어서 북한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며, 광복 이전에는 전국 생산량의 3분의 1을 황해도에서 생산하였다. 영남 · 호남 지방에서는 그루갈이로 재배된다. 서류는 전라남도 · 경상남도의 고구마와 강원도의 감자가 유명하며, 전체 곡물생산량의 약 6.3%를 차지한다.
도시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채소 · 화훼 · 과수 · 육우 · 양계 등을 포함하는 근교농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채소류의 생산량은 1970년 250만t에서 1998년에는 925만t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비닐의 보급으로 시설농업(施設農業)이 발달해 계절에 관계없이 고급채소와 화초를 도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농촌의 경관도 많이 변모하였다. 대관령을 중심으로 하는 고랭지농업에 의한 여름 채소 공급도 최근의 변화이다.
주곡 생산 위주의 자급농업에서 점차 다각적인 영농과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호당 경지면적이 1 내외인 좁은 경지에서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래수공업은 임진왜란 이후 관영공업(官營工業)이 폐기되면서 가내수공업으로 성장했으나, 20세기에 접어들어 서구문물이 유입되고 외세가 침입해 쇠퇴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한산의 모시, 안동의 안동포(安東布), 담양의 죽세공품, 강화의 화문석(花文席), 전주의 합죽선(合竹扇)과 한지(韓紙), 안성의 유기(鍮器), 충무의 나전칠기(螺鈿漆器), 운봉의 목기(木器) 등 일부만이 남아 있다.
근대적인 공업은 일제 때 시작되었으나 일본경제에 예속되어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광복 이후에는 국토가 양단되어 전력 · 중화학공업 시설의 대부분이 북한에 편중되었고, 소수인 남한의 공장들도 사회의 혼란과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였다.
1950년부터 공업진흥계획이 수립되었으나 6 · 25전쟁으로 기존의 공장시설마저 파괴되었다. 휴전 후 섬유 · 식품 · 시멘트 · 전력 등의 소비재산업에 치중했으나 발전은 미약하였다. 본격적인 공업발전은 1962년부터 시행된 일련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이루어졌다. 1970년대는 1차산업국가에서 2 · 3차산업국가로 급속히 전환하는 시기였다.
1971년에 2차산업인구는 총인구의 17.6%였으나 1980년에는 30.5%, 1989년에는 28.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1970년대에 수출산업이 급신장했기 때문이다. 1971년에 수출액 1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1977년 100억달러, 1989년 623억달러로 19년 동안 62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인구도 변화하였다.
무역구조도 1960년에는 총수출액의 80% 이상을 식료품과 원료가 차지했으나 1966년부터 공산품의 비중이 높아져 1989년에는 약 95%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업은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지향적인 것이 특징이다. 원유 · 철광석 · 원목 · 원면 · 양모 · 고무 등의 원료를 수입, 가공해서 그 일부를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화학공업은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편리한 임해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 편중에서 제철 · 기계 · 화학 · 조선 · 자동차 등의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한 뒤 최근에는 다시 반도체 · 컴퓨터 · 통신기 등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공업발달은 우수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및 자본의 도입에 따라 이룩되었다.
교통과 생활권
삼국시대에 성립된 역원제(驛院制)에 따른 도로망은 조선시대에 한성∼의주로, 한성∼서수라로, 한성∼평행로, 한성∼동래로, 한성∼제주로, 한성∼강화로 등의 주요 간선이 확립되었다.
이 간선은 현재의 주요철도 및 간선도로와 대략 일치하고 있으나 보행과 우마차의 통행을 위한 것이었다. 차량을 위한 교통로는 일제시대에 전국적으로 건설된 신작로(新作路)이다.
6 · 25전쟁 이후 자동차교통이 급속도로 보급되었고, 1962년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산업도로 · 고속도로 · 관광도로 등이 건설되었으며, 도로포장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8년 현재 남한의 도로연장은 약 8만 6,989㎞이다.
또한, 고속도로는 총연장 1,996㎞이며, 일반국도 1만 2,447㎞, 특별 · 광역시도 1만 7,670㎞, 지방도 1만 7,155㎞, 시도 1만 5,145㎞, 군도 2만 5,576㎞ 등이다. 1997년 현재 도로포장률은 74%이다.
도로교통은 여객수송에서 1965년 이후 철도를 앞질러 1996년에는 여객수송량의 83.2%를 담당하였다. 또한,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대수가 급증해 1960년 약 3만대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는 1,041만대를 초과하였다. 자동차는 대도시(서울 약 40%, 부산 약 10%)에 편중되어 도로교통망도 대도시 지역에 특히 잘 발달되어 있다. 서울∼대전간은 자동차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다.
철도교통은 1899년에 개통된 노량진∼인천간의 경인선이 효시이다. 광복 당시 남한의 철도 총연장은 2,642㎞였으나 산업철도 부설, 간선철도의 복선화 · 복복선화 · 전철화, 지하철의 개통 등으로 1999년에는 총연장 6,683㎞로 늘어났다.
부분적으로는 자동차교통에 밀려 수려선(水驪線)과 같이 철거되기도 했으나 화물수송의 18.7%, 여객수송의 4.4%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 중에서 경부선 · 경인선 · 호남선은 여객수송 중심이며, 중앙선 · 영동선 · 태백선 등은 화물수송 중심이다.
1975년에 서울의 지하철 1호선 개통 이래 지하철망을 점차 확대시켰다. 부산, 대구, 인천에도 건설되어 1999년 말 현재 전철의 총연장은 661㎞에 이르렀다. 이로써, 여객수송의 대부분을 자동차교통에 의존하고 있던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되었다.
철도와 자동차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19세기 말까지는 하천과 연안수로를 이용한 수운이 화물과 여객수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정에 수납하는 조곡을 운반하는 조운(漕運)은 물론, 한강 · 금강 · 낙동강 등의 주요 하천 곳곳에는 하항이 발달해 중요한 교통로 구실을 하였다. 특히, 한강은 휴전선에 의해 하구의 교통이 막히기 전까지는 바다의 해산물과 내륙의 농산물이 서울로 집산되는 주요 교통로였다.
연안항로도 자동차교통에 밀려 쇠퇴했으나 남해안과 다도해지역, 반도부와 제주도 · 울릉도 · 흑산도 등을 연결하는 항로는 중요하다. 해외수출상품과 수입원자재가 급증해 부산 · 인천 · 포항 등의 항만시설을 확장했고, 1998년 현재 약 4,900척 524만t에 달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
항공교통은 1962년 대한항공이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77개국과 항공협정을 맺었으며, 국적항공사가 30개 국가의 80개 도시에 운항하고 있다. 서울에서 아시아 · 중동 · 미주 · 유럽 등을 연결하는 국제노선이 있고, 서울은 국내항공노선의 중심이기도 하다.
고속도로의 발달, 기차와 전철의 고속화, 항공교통의 발달로 국내는 1일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활동이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지구 전체를 생활권으로 하는 ‘지구촌’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지역특성
지역구분
우리나라는 동일한 문화를 가지는 단일민족이면서도,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달라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지역 구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지방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전통적인 구분을 택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를 크게 북부 · 중부 · 남부 지방으로 나눈 뒤, 북부지방은 관서와 관북, 중부지방은 기호와 관동, 남부지방은 호남과 영남 등으로 세분한다.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은 도경계선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 · 풍속 · 경제활동 등을 기준으로 멸악산맥을 경계로 황해도의 북쪽은 북부, 남쪽 해안지방은 중부지방에 포함시켰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경계도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하였다. 문화지역의 경계는 언어 · 민속 · 경제활동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이지대(漸移地帶)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기호지방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와 경기만을 둘러싸고 있는 황해도의 해안지방과 충청남도 북서 해안지방을 포함한다. 주민들의 생활은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 안성천 · 삽교천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이들 하천이 모여드는 경기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통된 지역적 특색을 보인다.
이 지방의 중심부이자 우리나라 전체의 심장부인 서울 · 인천 · 수원 · 부천 · 안양 · 성남 · 의정부 등의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2.8%에 해당하나, 인구는 2,221만 명(2000년)으로 총인구의 약 46%를 차지하는 최대의 인구집중지역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1차산업의 비율은 낮고 2 · 3차산업의 비율이 높다는 데에 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해 경인공업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경인공업지대는 서울의 영등포와 인천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수도권이 급속하게 도시화하면서 서울∼인천 간은 거의 연속된 도시지역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안양과 수원 등지도 연속해 도시화가 이루어져, 경인공업지대는 서울 · 인천 · 부천 · 안양 · 수원 · 성남 · 안산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대로 성장하였다. 경인공업지대는 인구 2,000만에 가까운 수도권의 대소비시장은 물론 세계의 시장들을 상대로 한 각종 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경인지방은 동력자원과 공업용수가 풍부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또한대소비시장이자 정치 ·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과 인접해 자본과 기술의 도입에도 유리하다.
대도시 근교에서는 채소 · 과실 · 육우 등의 근교농업이 성하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고급채소와 화초의 재배도 유명하다. 또한 이 지방 전지역에 걸쳐 젖소의 사육이 급증하고 있다.
관동지방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의 일부를 포함하며 국토개발계획상의 태백산지역과 일치한다. 관동지방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서쪽의 영서와 동쪽의 영동으로 나누어진다.
영서지방은 대부분이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에 속해 우리나라 최대의 수자원 보유지역이며, 발전 · 공업용수 · 관광산업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북한강과 남한강은 예로부터 이 지역의 교통로였으며, 지역적 공통성을 이루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영서지방은 밭농사가 중심이며 감자와 옥수수의 산출이 유명하다. 최근에는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의 기온이 낮아서 고랭성(高冷性)의 야채재배가 성하며, 고위평탄면을 이용한 기업적 규모의 목축업이 발달하고 있다.
춘천 · 원주 · 충주 등이 영서지방의 행정 · 경제 · 문화의 중심지이다. 영동 · 동해 · 중앙고속도로를 비롯한 서울∼충주, 춘천∼원주∼충주 간의 고속화도로가 발달해 이 지역의 새로운 발전이 기대된다.
영동지방은 동해어장을 바탕으로 수산업이 발달했으며, 최근에는 아름다운 해안과 설악산국립공원 등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영동선과 1970년대 이후 건설된 여러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더욱 밀접해졌다.
태백산지역은 무연탄 · 철광석 · 중석 · 흑연 · 석회석 등의 지하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시멘트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공업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의 공업발전을 위한 동력과 지하자원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
호남지방 · 제주도
호남지방은 광주광역시 · 전라남북도와 그리고 충청남북도의 일부를 포함하며, 중부지방과는 차령산맥, 영남지방과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한다. 금강유역의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발달한 백제문화권에 속한다. 호남평야 · 나주평야 등 남서해안지방의 넓은 평야와 섬진강 유역의 산간분지 및 진안고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뜻한 기후와 넓은 평야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우리 나라의 곡창지대를 이루었다. 황해안과 남해안의 어장을 끼고 있어 각종 어업과 양식업이 발달하였다. 지하자원이 빈약하고 동력 개발도 늦어 공업 발달은 아직 미약하지만, 교통망의 발달과 정부의 공업정책에 힘입어 새로운 산업발전이 기대된다.
이 지역은 경지의 65%가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호남평야가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논이 총경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겨울이 따뜻하고 생육기간이 길어 보리를 2모작으로 재배하며, 쌀보리의 생산량은 전국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 밖에도 면화 · 대마 · 모시 등 섬유작물의 재배가 성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자연환경도 상이해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이루어 왔으며, 언어 · 풍속 등에서 옛 것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인구의 성별구조에서는 여초현상이 뚜렷하며, 특히 40세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현저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래 고구마 · 보리 · 유채 등의 밭농사가 중심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과수 · 채소 · 특용작물 등 상품작물 재배로 전환되었고, 특히 귤생산이 활발하다. 오랜 역사를 가진 목축은 현대적인 기업적 육우사육으로 발전했고, 온난한 겨울과 남국적인 풍경으로 인해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영남지방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를 포함하는 영남지방은 낙동강과 형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일찍이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건설했던 곳이다.
이 지역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북쪽의 중부지방, 서쪽의 호남지방과 인접해 있다. 이 지방은 언어 · 풍속 · 생활양식에서 뚜렷한 지역성을 보이며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불교문화와 안동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유교문화는 현재도 잘 보존되어 있다.
이 지역은 경상북도 북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논농사지역으로 호남지방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곡창을 이룬다. 전체 경지의 약 60%가 논이지만 2모작으로 보리를 재배하므로 벼와 보리의 생산지가 일치한다.
부산과 대구의 근교에는 1960년 이래 근교농업이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대구의 사과와 김해 · 구포의 배 · 채소 등은 전국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잠과 약초 재배도 성해 뽕밭의 면적은 전국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동해남부어장과 남해어장을 끼고 있어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약 2분의 1을 차지하며, 부산은 원양어업기지이다.
남동임해공업지역과 영남내륙공업지역은 1970년대의 급속한 공업발전을 주도한 곳이다. 남동해안지역은 항만건설에 유리한 자연조건과 온난한 기후, 수도권 및 남서지방과 연결되는 경부철도 · 경부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정부의 공업정책 등에 힘입어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급신장하였다.
제철 · 정유 · 석유화학 공업에서는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해 일부를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조선 ·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이며, 금속 및 기계공업의 종업원수는 전국의 약 40%를 차지한다.
관서지방
철령관(鐵嶺關)의 서쪽으로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의 일부를 포함하며, 북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마주하고 남으로는 멸악산맥을 경계로 중부지방에 인접한다.
이 지역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옛터로서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한민족이 북방으로 진출하는 근거지였다. 또한 북방 이민족의 침입도 잦아 압록강 상류의 자강고원(慈江高原) 지방은 시대에 따라 국경선의 변화가 심했던 곳이다. 광복 이후 북한이 이 지방을 점령하게 된 것도 이러한 지리적 위치에 기인한 바 크다.
멸악산맥 이남의 황해도 일부는 언어 · 풍속 등으로 보아 중부지방에 속하지만, 휴전선 때문에 실제로는 관서지방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1945년 당시 토지이용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황해도 75%, 평안남북도 약 80%로 밭농사가 농업의 주축을 이룬다. 이는 강수량이 1,000㎜ 이하여서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고 생육기간도 중부 · 남부 지방에 비해 짧기 때문이다.
밭작물로는 밀 · 보리 · 조 · 수수 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다. 황해도의 연백평야 · 재령평야, 대동강 하류의 평양평야, 청천강 하류의 박천평야 등에 일제강점기에 확충된 관개시설도 논농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지역에는 철 · 석탄 · 금 · 중석 · 흑연 · 은 · 규사 등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철은 황해도 북서부의 은율 · 재령 · 하성과 평안남도의 개천 · 강서 등지에서 주로 산출되며, 송림에는 제철소가 있다.
무연탄은 평안북부탄전과 남부탄전이 주산지이며, 유연탄은 사리원의 봉산탄광에서 산출된다. 평양과 남포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공업지대는 이 지역의 지하자원과 압록강 수풍에서 발전되는 풍부한 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관서지대는 중공업에 치중해 소비재 생산이 빈약하다.
관북지방
함경남북도를 포함하는 관북지방은 한민족(韓民族)의 북방진출과 여진족의 남하세력이 부딪치는 곳으로, 조선시대까지도 충돌이 끊이지 않아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언어와 풍속의 지역적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밭농사와 어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오랜 기간의 공동생활로 지역적 유사성이 강화되었다.
이 지역은 개마고원과 좁은 해안지대로 나누어진다. 해발고도가 높고 겨울이 길며, 연강수량이 600㎜ 내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다. 개마고원은 벼농사가 불가능해 밭농사가 주를 이룬다. 함경북도는 밭이 92%, 함경남도는 87%이다. 밭작물인 감자 · 귀리 · 피의 생산량은 전국의 50%를 초과한다.
해안지방은 북쪽의 한류와 남쪽의 난류의 영향으로 각종 어류가 풍부하며, 주요 수산물은 대구 · 명태 · 고등어 · 청어 · 방어 등이다. 이 지역은 지하자원이 풍부해 철 · 석탄 · 마그네사이트 · 흑연 · 금 · 은 · 구리 등이 많이 산출된다. 특히, 이원 · 단천의 철, 아오지의 갈탄, 이원의 마그네사이트 등은 이 지역 공업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다.
개마고원에서 압록강으로 북류하는 하천은 장진강 · 부전강 · 허천강 등이다. 이들 하천의 유로를 경사가 급한 남쪽해안사면으로 변경해 대규모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더불어 함흥 · 청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북공업지대의 기초가 되고 있다. 장진강발전소와 부전강발전소는 현대적인 발전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1945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시설이었다.
전통적인 환경관
환경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에게 직접 ·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한 지역 내에서 상호결합해 지역 고유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 즉 환경을 대하는 입장은 환경결정론과 환경가능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경결정론은 자연환경과 인류의 사회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할 때 자연의 제약에 중점을 두는 사고방법이다. 인간의 행동, 민족성 심지어는 왕조의 성쇠까지도 자연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환경가능론은 그 반대되는 주장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부여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술과 역사적인 전통에 바탕을 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위치면에서 보면, 대륙과 해양과의 접촉이나 연결에는 유리하나 국력이 약하면 두 방향으로부터 압력을 받기 쉬운 반도적 · 육교적 위치라는 것이다.
기후적으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지방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름철의 집중호우, 열대지방을 방불하게 하는 무더위, 겨울의 혹심한 추위, 그리고 종종 내습하는 태풍의 다양한 변화는 한국인의 문화형성에 큰 구실을 하였다.
지형적으로는 전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우리에게는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였다. 토양 또한 대부분이 산성토로서 농업에 불리하다. 이러한 불리한 자연환경이야말로 전통적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 민족을 자연환경에 순응하게 만들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지는 신라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의 실학사상이 대두하기 전까지 한국 전역에 유행했던 풍수지리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풍수지리의 토지관에서는 토지[또는 환경]는 만물을 화생(化生)하게 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토지 생명력의 후박(厚薄)에 따라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곳에 조상의 선산을 모시고 있는 후손들의 길흉화복(吉兇禍福)이 결정된다는 유기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지리서 저자인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에 의한다는 지인상관론(地人相關論)을 주장하여, 8도인심은 자연환경에 의해 각각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주지역을 선정할 때 지리적인 입지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는 토지의 상태나 산천과 해륙의 지세를 의미하는 지리(地理)를, 둘째로는 그 지역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생리(生理)를, 그리고 셋째로는 그 지역의 인심을 강조하였다. 그는 마을의 인심이 착한 곳은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환경을 중시해 환경에 순응하는 의식주생활을 영위하면서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을 죄악시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조수처럼 밀려드는 서양문물과 더불어 불가피했던 경제개발은 환경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마침내는 환경문제를 야기시켰다.
경제발전과 환경훼손
경제발전에는 환경 훼손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경제개발정책 수행에 있어서 항상 지적되는 문제이다. 선진공업국의 다수가 경제개발과 더불어 자연환경을 훼손시킴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하여 훼손된 환경을 소생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잘살아보겠다는 환경개발정책이 오히려 생활의 불이익을 초래했기 때문에 성장개발 위주의 정책에는 제동이 걸렸으며, 자연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합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환경의 훼손은 지진 · 화산 · 태풍 · 해일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인간 활동에 의한 자연환경의 훼손은 자연자원의 고갈과 자연환경의 오염 및 자연경관의 파괴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자원의 고갈은 공업생산의 증진을 위해 무절제하게 원료를 채취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생산활동 및 주거체계로부터 오염물질과 폐기물이 여과되지 않은 채 방출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불합리한 건설, 무절제한 위락행동도 자연의 파괴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결국, 환경훼손의 원인은 크게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산업화는 자연환경을 비롯한 모든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즉, 공업생산의 투입요소인 자원을 채취함으로써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에 수반해 공업잔재물 또는 폐기물이 증가된다.
폐기물은 생산과정에서 직접 자연환경으로 유출되는데, 이들은 공장의 분진 · 폐수 또는 생활폐기물로 구성된다. 자연환경으로 유입되는 잔재물은 공업의 종류와 제조과정의 형태에 따라 양과 질이 모두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에 비례해 그 양이 증감한다. 결국, 산업화가 가속될수록 그에 따른 폐기물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산업화와 더불어 가속되는 도시화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함께 물자와 기술 및 정보의 집중을 동반하며 인공시설의 과밀을 가져온다. 밀집된 도시일수록 공공기관 · 고층빌딩 · 공장 · 일반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검댕 · 연탄가스 등과 자동차배기가스 · 쓰레기 · 공장폐수 · 가정용하수 등이 더 많아진다.
이들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동상 · 건축물들을 부식 또는 파손시키고 질병을 유발하는 등 인문사회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해 또다른 재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산업화 및 도시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문제의 대두
환경의 훼손은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및 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인류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수 십년 전만 하여도 환경문제는 일부 선진공업국의 고민으로만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해, 1970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던 인간환경회의는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표제를 걸고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후반부터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문제가 대두하였다. 산업화와 비례해 환경오염은 급속하게 증가한데 비해,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방지에 대한 정책의지는 상대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소음 등의 문제가 날로 급증하였다.
대기오염
산업화 · 도시화의 진전은 도시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암모니아(NH₃) · 일산화탄소(CO) · 이황화탄소(CS₂) · 염화수소(HCl) · 염소(Cl) 및 그 화합물 황화수소(H₂S) · 질소산화물 등이다.
이들은 주로 공장에서 뿜어대는 검댕과 분진, 그리고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매연으로부터 산출된다. 이들은 광화학적 반응을 하여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식생의 성장에도 큰 장애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조물[기념비 · 빌딩 · 조각 등], 심지어는 의복과 도서관의 장서까지도 부식시키거나 파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원별 추이를 보면 산업화에 따라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NO₂(83%)와 HC(60%)는 자동차 수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아황산가스는 1981년부터 저유황이 공급되면서 그 배출량이 점감해 1998년 현재 서울의 경우 기준치(0.05ppm)를 밑도는 0.008ppm)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0.008∼0.019ppm)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예로는 1952년 12월에 있었던 ‘런던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이 때에 런던에는 기온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또 바람이 잔잔해 오염된 대기가 확산, 희석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이 안개에 섞여 떠 있었다. 이 현상으로 시민 가운데 400여명이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뉴욕 · 로스앤젤레스 · 동경 등지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대기오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1999년 말 산성비로 분류되는 산도(PH) 5.6 이하의 비가 내린 날은 전체 강수일수의 57%이며, 전체 강수량 가운데 산성비의 비율은 70%였다. 특히 부산에서는 생태계에 매우 해로운 산도 3.2의 비가 온 적도 있다.
대기의 오염정도는 대기의 혼탁도로 가늠할 수 있다. 서울은 연평균 에어로졸 광학깊이가 0.190으로 대기혼탁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특히 여름철에 높다. 오염에 의해 혼탁해진 대기는 온실효과의 원인이 된다.
수질오염
도시의 오물들은 수질을 오염시켜 인간이나 주위환경에 위해작용을 유발한다. 오염원은 도시하수나 생활하수로 인한 것, 공장폐수로 인한 것, 농업폐수로 인한 것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1953년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사건(水俣事件)은 가장 대표적인 수질오염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안에서 나타나는 적조현상이나 대부분의 하천에서 기형어가 잡히는 것으로 보아 수질이 매우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역면적이 넓고 인구집중도가 높은 한강하류지방의 오염도는 심각하다.
그 밖에도 인천 앞바다에서 1983년 7월 25∼29일 사이에 망둥이 · 송어 등 28종의 어류가 집단폐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며칠 뒤에는 조개 15t이 떼죽음을 한 일이 있다. 1985년 환경청조사에 의하면 공장의 집중도가 큰 남해안이 동해안보다 3배 1 오염되어 있었다. 특히 진해 · 마산 · 부산 · 목포 · 울산 · 인천 · 광양만은 수산물서식부적지로 판명된 바 있다.
토양오염
토양의 오염은 공장폐수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주로 농약의 과대사용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농약은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DDT · 엔드린 · 디엔드린 · 알드린 · RHC 등과 제초제인 2.4-D 등이 많다.
이들은 토양 중에 장기간 잔류하고 일부는 농작물에 흡수되거나 하천 또는 해양에 유입되어 부유생물 번식에 큰 피해를 주고 어류도 대량 폐사시키고 있다.
소음공해
도시과밀화 및 산업화 현상은 소음공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공장 · 사업장의 소음, 건설작업장의 소음, 교통기관의 소음 및 거리의 확성기 소음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1996년 말 현재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낮시간대 소음도는 모두 52㏈ 이상으로 기준치 50㏈를 초과하였다. 특히 공항이나 간선도로 부근의 소음이 심각한 상황이다.
소음은 청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 정신적인 면에서도 피해를 주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소음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파악해 소음원을 제거, 차단 또는 흡수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정책
개발이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뜻한다면, 보전의 의미는 오염의 방지 내지는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생태학적 · 심미적 특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개발과 보전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의 개발이 불가피하므로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간에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가에 있다.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환경담당 정부기구의 설치
인간은 생존을 위해 계속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자연의 파괴와 오염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자연적 순환과정 속으로 환원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폐기물이 누적되었다. 환경보전문제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국제회의에서는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권리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환경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공해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성격을 띤 「공해방지법」(1963년)을 제정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정책과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의 결여,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 행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부의 환경보전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1977년에 국민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전제로 한 「환경보전법」을 제정했고 1978년에는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였다.
1980년에는 정부기구에 환경청을 신설하고, 1983년 일부 조직개편을 거쳐 1990년 1월 환경처로 승격시켰다. 환경처는 환경보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산하기구로 환경의 보전과 연구를 위한 기관을 두었다. 환경처는 다시 1995년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 관련 법령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령은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기준 · 환경영향평가 · 환경관리 · 자연보전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위원회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연구기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염배출 및 방지 시설, 대기 · 수질 · 토양의 질보전과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것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오염분야별 환경대책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환경보전법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나뉘었다.
환경교육의 실시
환경보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므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떠한 작용을 받는가에 관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환경상황을 파악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환경교육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필수적이나, TV ·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사회교육의 기능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지구는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스스로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들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사 시대구분
역사는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갈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시대구분이다. 시대구분이란 역사가가 어떤 일관된 기준에 의해 역사발전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각 단계는 일반적으로 고대 · 중세 · 근대 등의 개념으로 정의되곤 한다.
그러나 시대를 구분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시대구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같은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각 시대의 기점과 종점은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시대구분의 유형들이 제시되었다.
한국사의 시대구분문제가 제기된 것은 근대역사학이 성립된 이후이며, 특히 1930년대에 사회경제사학이 대두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회경제사학자들은 마르크스(Marx, K.)의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입각해 한국사를 체계화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원시공동체사회 · 고대노예제사회 · 중세봉건제사회 · 근대자본주의사회 및 사회주의사회 등 5단계 사회구성론(社會構成論)을 적용한 한국사의 시대구분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백남운(白南雲)이 신석기시대까지를 원시씨족사회, 삼한 · 부여를 원시부족국가, 삼국 및 통일신라를 노예국가, 고려 · 조선을 집권적 봉건국가로 각각 구분해 한국사를 체계화함으로써 이 방면의 선구적 업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로도 사회경제사학에서의 시대구분론은 계속해서 논의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시대구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회구성체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대 구분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 즉 중세사회 기점에 대해서 삼국의 성립, 통일신라의 출발, 고려의 건국, 무신란 또는 고려 후기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근대사회의 기점에 있어서는 근대의 개념에 대한 입장의 차이 및 민족운동과의 관련성 때문에 더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1876년 개항, 1884년의 갑신정변,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 또는 같은 해의 갑오개혁, 1896년 독립협회의 활동, 1910년 경술국치 등이 각각 근대의 기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형편이다.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지배세력의 성격을 비롯한 정치 · 사회구조, 사상 ·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한국사의 시대구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 경우에는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변동과 고려 말 조선 초의 사회변동이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는 왕조의 교체를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왕조사관으로의 복귀가 아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인 변동이야말로 사회경제적 변동을 포함한 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대 · 중세 · 근대의 3구분법이 서양사회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 등 동양사에서 근대에 선행하는 근세의 개념이 채용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한국사에도 근세를 설정할 것이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성립 이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까지를 고대, 고려시대를 중세, 조선시대를 근세, 개항 이후를 근대로 각각 설정하는 시대구분이 제시되어,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도 구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까지를 원시사회, 철기의 사용과 함께 초기국가가 성립한 이후부터 통일신라 · 발해까지를 고대사회, 고려시대를 중세사회, 조선시대를 근세사회, 개항 이후 식민지시대를 근대사회,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현재까지를 현대사회로 구분해 서술한다.
한국사 개관
원시사회
흔히 우리 나라의 역사를 말할 때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한다. 이 말은 단군신화(檀君神話)에 실려 있는 대로 고조선의 건국연대인 서기전 2333년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삼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역사도 처음부터 국가가 형성되었던 것은 아니다. 선사시대, 즉 원시사회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사시대는 구석기시대 · 신석기시대 · 청동기시대 · 철기시대로 발전하는데, 우리 한국사도 같은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반만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발전해온 셈이 된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0만년 전의 전기구석기시대부터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주 석장리의 구석기유적과 상원 검은모루동굴, 단양 금굴의 구석기유적으로부터 확인된다. 이 밖에도 연천 전곡기, 제천 점말동굴, 덕천 승리산동굴, 상원 청청암동굴, 평산 해상동굴, 청원 두루봉동굴 등 20여 곳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견되었다.
이들 구석기인들은 조잡한 뗀석기[打製石器]를 사용해 나무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고기잡이와 사냥으로 동물을 잡아먹는 등 단순한 채집경제에 머물러 있었다. 이 때에는 생산력이 낮아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이루고, 무리를 지어 떠돌아다니는 군사회(群社會, bands)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한반도의 구석기인이 오늘날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나긴 구석기시대를 지나 1만년전부터 중석기시대가 도래해 잔석기(細石器)와 이음연장(複今道具)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대략 서기전 6000년경부터는 신석기시대가 시작되었다. 신석기시대유물의 특징으로는 종래의 뗀석기가 간석기[磨製石器]로 발전하고 새로이 토기가 출현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토기는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한반도의 신석기시대는 일반적으로 토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빗살무늬토기기(先櫛文土器期) · 빗살무늬토기기Ⅰ기 · 빗살무늬토기기 Ⅱ기 등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선빗살무늬토기기는 빗살무늬토기기에 앞서 만들어진 이른민무늬토기[原始無文土器]와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를 말한다. 부산 동삼동과 웅기 굴포리의 조개무디 및 양양 오산리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빗살무늬토기 Ⅰ기는 서기전 3500년경에 시작되었다. 이 때의 즐문토기는 밑이 뾰족한 반란형(半卵形)에 생선무늬[魚骨文]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주로 강가나 해안지방에서 출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빗살무늬토기기 Ⅱ기는 서기전 2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만들어진 토기는 바닥이 평평해지고 무늬도 종래의 생선무늬에서 점렬(點列)에 의한 파상문(波狀文)이나 뇌문(雷文)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중국의 채도문화(彩陶文化)가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세 차례에 걸친 토기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담당자, 즉 종족의 이주를 뜻한다. 먼저 한국 최초의 신석기인인 선빗살무늬토기인은 시베리아로부터 퍼져 내려온 고아시아족의 일파이다.
다음으로 내려온 빗살무늬토기인 역시 고아시아족의 일파이나 선빗살무늬토기인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 Ⅱ기에는 중국 신석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퉁구스계 종족이 만주로부터 이주해 왔다.
이와 같이, 신석기시대에는 세 차례에 걸친 종족의 이동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선주민과 새로 이주해온 종족 사이에 혼혈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인의 모체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신석기시대에는 경제생활면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석기시대의 초기 · 중기에 해당하는 선빗살무늬기와 빗살무늬토기 Ⅰ기에는 고기잡이와 사냥을 위주로 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점차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는 이전의 식량채집단계에서 식량생산단계로 발전했음을 뜻하며, 역사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조직도 변질되어, 종래의 군사회에서 혈연관계가 보다 확산된 부족사회(部族社會, tribes)로 발전하였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없는 씨족공동체(氏族共同體) 위에 형성된 이러한 부족사회의 사회원리는 역시 평등사회였다.
서기전 10세기 북방으로부터 청동기가 새로이 수용되면서 청동기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동기유적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유물은 무문토기와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 그리고 많은꼭지거친무늬거울[多鈕粗文鏡] 등이다.
특히 비파형동검은 중국에서는 출토되지 않고 요령지방과 한반도에서만 독특하게 출토되어, 이 지역이 중국과는 구별되는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남부시베리아지방과 연결된 북방식청동기문화로, 알타이계통의 예맥족(濊貊族)에 의해 전래되었다.
앞서 신석기시대 후기에 시작되었던 농경이 청동기시대에 더욱 발달해 주산업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나타내주는 유물로서 반달돌칼[半月形石刀]과 홈자귀[有溝石斧]가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농경에 따른 생산력의 발달로 빈부의 차가 나타나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생겨 정치적 지배자로서 군장이 출현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정치사회인 군장사회(君長社會)이다. 종래의 평등했던 부족사회는 붕괴되고 지도자로서의 부족장이 지배자로서의 군장으로 변질했던 것이다.
이를 표시하는 유물이 바로 고인돌이다.
고인돌은 군장의 가족묘로 보이는데, 이처럼 거대한 고인돌을 축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권력의 소유자가 출현했음을 나타내 준다. 이 군장사회는 뒤에 철기의 사용과 더불어 국왕이 출현하면서 초기국가로 발전해갔다. 뒷날 초기국가로 발전한 고조선 · 부여 · 고구려 · 옥저 · 동예 · 삼한 등이 처음에는 모두 이 군장사회 단계를 경유했던 것이다.
이들 국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은 3세기경의 것으로서 이미 초기국가단계로 발전한 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 군장사회의 모습은 유제로서 나타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부여에서 사출도(四出道)를 다스렸다는 마가(馬加) · 우가(牛加) · 저가(猪加) · 구가(狗加) 등의 대가(大加)나, 고구려에서 국왕이 출현한 뒤에도 스스로 사자(使者) · 조의(皁衣) · 선인(先人) 등의 관리를 두고 있었다는 대가들이 종래의 군장이었을 것이다.
또한, 삼한의 경우 마한의 50여개 소국(小國)과 변한(弁韓) · 진한(辰韓)의 24개 소국이 바로 군장사회이다. 그러므로 이들 소국을 다스리고 있는 신지(臣智) · 읍차(邑借) · 험측(險側) · 번예(樊濊) · 살해(殺奚) 등 장수(長帥) 또는 거수(渠帥)가 군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시조인 단군왕검(檀君王儉)도 본래는 대동강유역의 평양에 자리잡고 있던 군장사회의 군장을 지칭하는 칭호였다.
군장사회에는 지배자인 군장 밑에 피지배자인 하호(下戶)가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하호는 이전의 부족원의 후신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군장에 대해서는 조세와 역역(力役)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군장사회의 주산업은 농업이었기 때문에 가을에는 제천행사가 행해졌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 삼한의 시월제(十月祭) 등이 그것인데, 이는 씨족공동체의 유풍(遺風)으로 족제적(族制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고대사회
청동기시대에 출현한 군장사회 중에는 청동기시대 말기에 이미 국가형태를 이루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철기를 사용하게 된 뒤에 초기국가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서기전 4세기경으로,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출현했던 철기문화가 이 때 전래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력이 더욱 증가되어 지배자의 부(富)의 축적이 확대되고 철제무기를 사용한 정복전쟁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우세한 군장사회가 주위의 군장사회들을 병합해 초기국가로 발전하였다.
이 초기국가는 국왕의 출현과 더불어 정복사업으로 확대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조직을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군장들은 국왕 아래의 중앙관료로 변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의 독립적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국왕권을 제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세력관계는 왕권이 더욱 강화되고 완전한 국가 형태가 갖추어지는 고대국가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의 각지에는 여러 초기국가가 성립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국가 형태를 갖춘 것은 고조선이었다. 고조선은 청동기시대 말기인 서기전 5, 4세기경에 초기국가로 발전하였다.
영역은 요하유역으로부터 한반도의 서북부, 대동강유역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 뒤 고조선은 철기의 수용으로 더욱 강성해졌으나 한 무제(漢武帝)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말았다(서기전 108).
이어서 서기전 2~1세기경에는 만주 송화강유역에서 부여가, 서기전 1세기 무렵에는 압록강 중류지방에서 고구려가 각각 초기국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후진적인 옥저와 동예는 끝내 군장사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삼한 역시 서기 전후까지도 군장사회에 머무르다가 점차 내부에서 중심세력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즉, 삼한지역에서는 한강유역의 백제국(伯濟國)과 낙동강유역의 사로국(斯盧國) 및 구야국(狗邪國)이 중심이 되어 백제와 신라 · 가야가 각각 출현했던 것이다.
부여는 고구려에 병합되고 가야는 신라에 병합됨으로써, 결국 고구려 · 백제 · 신라만이 발전을 거듭해 고대국가의 체제를 갖추는 데 성공하였다. 고대국가는 초기국가의 발전된 형태이다.
국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마련되었으며, 이전의 반(半)독립적이던 군장들은 그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앙관료의 지위로 편제되었다. 강력한 왕권과 집권적인 정치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사업을 전개해 더욱 넓은 영토를 확보해 나갔다.
먼저 고구려는 1세기 후엽 태조왕 때에, 백제는 3세기 중엽의 고이왕 때에, 신라는 4세기 후반의 내물왕 때에 각각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해 고대국가의 틀을 갖추었다. 이들 삼국은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때로는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경쟁적으로 발전하였다.
처음 삼국상쟁의 주도권은 가장 일찍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한군현 및 위(魏) · 전연(前燕) 등 중국세력과의 싸움을 통해 국력을 축적한 고구려가 장악하였다. 고구려는 4세기 말부터 5세기에 걸쳐 광개토왕과 장수왕대의 전성기를 구가해 북으로는 요동과 만주를 차지하고 남으로는 죽령 · 조령 일대로부터 남양만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백제는 4세기 후반의 근초고왕 때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고구려와 대결하는 등 강성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밀려 웅진(熊津: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으로 천도하면서 국력이 위축되었다.
그리고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국가체제를 갖추고 그나마 고구려의 군사적 · 외교적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5세기 초부터는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로써, 5세기에는 고구려가 대단히 강성한 가운데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 대항하는 형세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삼국간의 세력관계는 6세기에 들어 변화하였다. 우선, 신라가 지증왕 · 법흥왕 · 진흥왕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백제도 무령왕 · 성왕 때에 중흥을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유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곧 신라가 백제를 몰아내고 한강유역을 독차지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한강유역의 풍부한 자원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황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외교관계를 맺게 되어 삼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6세기 후반에는 중국에서 남북조(南北朝)의 분열이 수습되고 수(隋) · 당(唐) 등 통일왕조가 들어서면서 고구려와 충돌을 일으켰다. 이 때 고구려가 수 · 당의 거듭된 침략을 막아낸 것은 당사자인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와 신라의 존립까지도 구원한 것으로 민족보위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신라와 당의 연합이 더욱 강화되어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차례로 멸망하였다.
신라는 계속해서 당의 세력을 축출하여 삼국통일을 완수하였다(676). 이 삼국통일은 우리 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혈통 · 언어 · 문화를 같이하면서도 서로 다른 국가체제 속에 들어가 있던 우리 민족이 하나의 국가 안에 통합됨으로써 민족국가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삼국의 문화를 수렴해 보다 차원 높은 민족문화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그 영토가 대동강과 원산 이남에 그쳐 고구려의 영토였던 만주지역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만주지방에는 곧 고구려의 유민들이 진국(震國), 즉 발해를 건국함으로써(698) 남쪽의 신라와 함께 남북국가가 형성되었다. 뒤에 발해가 멸망함으로써 우리 역사에서 이탈하고 신라만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지만,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가 발해의 유민을 포섭, 흡수함으로써 민족의 재통일은 완수되었다.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은 강력한 왕권을 지닌 국왕이 종래의 군장들을 정치기구 속에 편입시켜 전제정치를 실시하였다. 먼저 삼국에는 모두 왕권이 강화되면서 고구려의 고씨(高氏)와 백제의 부여씨(扶餘氏), 신라의 김씨(金氏) 등 왕위를 세습하는 왕족이 출현하였다. 종래의 군장들은 그 독립성을 상실하고 고대국가의 관리로 편입되었다.
이 때 이들을 왕권 아래에 흡수하면서 관등조직(官等組織)이 성립하였다. 고구려의 대대로(大對盧) · 태대형(太大兄) 등 14관등, 백제의 좌평(佐平) · 달솔(達率) 등 16관품(官品), 신라의 이벌찬(伊伐飡) · 이찬(伊飡) 등 17관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국무를 분담하는 여러 관부들이 설치되었으며, 전국을 통치하기 위한 지방제도는 군사적인 성격으로 조직되었다.
군장들은 관등조직에 편제되는 과정에서 귀족신분을 보장받았다. 이들 귀족은 왕경에 거주하는 지배신분으로서 왕족과 함께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토지 · 노비 등 재산을 소유하며, 그 밖에도 사회적인 특권을 향유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신라의 화백(和白)과 같은 합좌기구(合坐機構)를 통해 재상(宰相)을 선출하거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는 왕권의 전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귀족연합적인 정치가 유지되었음을 뜻한다. 이 때문에 통일을 전후해 신라에서 전제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삼국의 왕족과 귀족들은 그들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율령(律令)을 제정하고 신분의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였다. 당시의 신분제도는 신라의 골품제도(骨品制度)로 대표된다.
이는 신분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등과 관직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제약하는 매우 엄격한 것이었다. 이러한 골품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래로부터 붕괴되어 갔으나, 상위골품인 진골(眞骨)과 6두품(六頭品)은 강고하게 존속하다가 신라의 멸망과 함께 비로소 소멸하였다.
엄격한 신분제도 아래 모든 특권이 귀족층에 의해 독점되었지만, 이 시기에 가장 광범하게 존재했던 것은 역시 일반농민이었다. 이들 농민은 신분으로는 평민(平民)으로 편제되었다.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면서 조세(租稅)와 공부(貢賦) · 역역(力役) 등을 부담하였다.
통일신라에서는 백성들에게 정전(丁田)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농민들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경작해 오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그 대가로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의 농민들은 아직도 촌(村)에 할당된 공유지를 공동체적인 노동으로 경작하는 전통적 유제에 의한 역역을 부담하고 있었다.
통일 이후 100여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던 신라는 8세기 후반에 들어 진골귀족 내부의 분열과 그에 따른 왕위계승전의 격화로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진골귀족들은 혈연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운명공동체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사회발전은 이들의 유대를 이완시켜 여러 족당(族黨)으로 분열되었다.
점차 이들 족당 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지방에서는 호족(豪族)들이 새로이 성장해 독립적인 세력을 이루었다.
이들 호족은 촌주(村主) 등 지방의 토착세력이나 지방에 내려간 중앙귀족들이 성장한 세력이었다. 호족은 성주(城主) · 장군 등을 자칭하면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을 장악했으며 조세와 역역을 징수하였다.
진골과 함께 신라사회의 지배세력을 이루고 있었으나 역시 폐쇄적인 진골중심의 사회에서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았던 6두품들이 기존 체제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고, 지방의 호족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9세기말부터는 초적(草賊)이라 불리는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호족들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들 호족 가운데 견훤(甄萱)이 완산주(完山州: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후백제를 세우고(892), 궁예(弓裔)가 송악(松岳: 지금의 개성)에서 후고구려를 세움으로써(901) 신라와 더불어 후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
이후 후고구려는 마진(摩震) · 태봉(泰封)으로 이름을 바꾸다가 역시 송악지방의 호족인 왕건(王建)에 의해서 고려로 교체되었다. 결국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고(935) 곧이어 후백제가 정복되어 고려에 의한 후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936).
이와 같은 신라 말 고려 초의 변동은 단순한 왕조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성장한 호족세력에 의해서 진골귀족 중심의 고대적 체제가 극복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사상계에서도 새로이 선종불교(禪宗佛敎)가 풍미해 종래의 교종(敎宗)을 대신했고, 주로 6두품 지식인에 의해 유교적 정치이념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호족이나 6두품의 진출과 더불어 고대적인 신라사회를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중세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사회의 출발은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농민의 지위향상은 새로운 사회의 대표적인 표징이었다. 신라 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농민의 성장, 그 가운데서도 민전(民田)을 소유한 자영농민의 성장은 종래의 공동체적인 국가파악을 극복하고 고려초에 ‘취민유도(取民有度)’의 합리적인 수취제도를 실시하게 하였다. 또한, 후삼국 혼란기의 농민반란에 따른 농민의식의 상승도 농민의 지위향상에 커다란 구실을 하였다.
중세사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도 지방에는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적 기반을 가진 호족들이 존재해 중앙의 통치력이 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고려왕조는 중앙집권화정책을 추진해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중앙관리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태조 때에는 호족들과의 혼인정책을 비롯해 호족들에게 관계(官階)를 수여하고 토성(土姓)을 분정(分定)하고 기인제도(其人制度) · 사심관제도(事審官制度)가 실시되었다. 광종 때에는 과거제도(科擧制度)를 처음으로 도입해 신진관료를 채용하는 한편 과감한 개혁정치로 호족세력을 억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려왕조가 건국된 지 약 50년이 지난 성종 때에 이르러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마련되고 국가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때 최승로(崔承老)에 의해 유교정치이념이 채택되고 당의 제도를 모방한 중앙정치기구가 마련되었으며,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어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호족들은 중앙집권체제에 편입되어 중앙의 관리로 전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남아서 향리(鄕吏)로 격하되어갔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가 확립됨과 동시에 사회적인 지배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지방호족 가운데 중앙의 관리로 진출한 계열과 신라 6두품계통의 유학자들이었다. 이들은 그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고위관직에 올라 문벌귀족(門閥貴族)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들 문벌귀족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막대한 토지를 점유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제1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면서 고려사회의 지배세력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왕족을 비롯한 귀족 상호간에 폐쇄적인 통혼권(通婚圈)을 형성해 귀족신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향리의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끊임없이 신진관료로 진출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귀족가문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사회는 소수의 문벌귀족이 지배세력이 되어 폐쇄적인 귀족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나, 신라의 진골체제에 비해서는 훨씬 개방적이었다. 신라에서는 극소수의 진골귀족만이 정권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비해 고려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귀족가문이 존재해 보다 개방적인 사회로 발전했던 것이다.
또한 혼인이나 과거를 통해 새로운 귀족가문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는 고려사회가 고대적인 신라사회에 비해 확실히 일보 전진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성종 때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가 확립된 이후 문종 때에 이르러 정치제도를 포함한 각종 제도와 문물이 완성되었다.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당의 제도를 채용한 3성(省) · 6부(部)가 중심이었다.
여기에 송(宋)의 제도를 본떠 중추원(中樞院)과 삼사(三司)가 설치되고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로 도병마사(都兵馬使)와 식목도감(式目都監)이 두어져 세 계통의 정치기구들이 운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중추원의 종2품 이상 관원을 재추(宰樞)라 하여 이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 결정하는 등 정치운영의 중심이었다. 이들 재추직은 문벌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6부가 국왕에게 직주(直奏)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왕에게 정부기구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지게 하였다. 이렇게 보면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국왕과 문벌귀족 사이의 권력의 조화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현제도(郡縣制度)를 근간으로 하여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중기 이후로는 중앙정부와 군현 사이의 중간기구로서 양광(楊廣) · 경상(慶尙) · 전라(全羅) · 서해(西海) · 교주(交州) 등 5도(道)와 북계(北界) · 동계(東界)의 양계(兩界)가 설치됨으로써 지방제도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않아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 즉 속현(屬縣)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인근의 주현(主縣)을 통해 중앙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이는 당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가 불완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군현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 향(鄕) · 소(所) · 부곡(部曲) 등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는데, 이들 속현과 향 · 소 · 부곡 등은 점차 소멸해가는 추세에 있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과란 모든 관리로부터 향리 · 군인 ·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직역(職役)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토지를 차등있게 나누어 준 제도이다.
그러나 토지 그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토지는 백정(白丁)이라 불리는 일반농민들이 조상대대로 이어받아 소유하고 있는 민전이었다. 전시과는 이 민전 위에 설정되어 농민들이 국가에 내게 되어 있는 조세를 수조권자에게 위임한 것이었다.
일반농민들은 국가에 대해 조세 · 공부 · 역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조세는 토지를 소유한 국민이 국가 또는 수조권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고려시대의 수조율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 원칙이었다. 이 밖에 공부는 지방에서 포(布)나 토산품 등 현물을 납부하는 것이고, 역역은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를 정(丁)이라 하여 이들로부터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 · 경제 제도가 완비된 위에 고려귀족사회는 산업이 발달하고 학술이 진흥되며 귀족문화가 융성하는 등 11세기의 전기간에 걸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귀족정치의 전개는 점차 귀족사회 내부의 모순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문벌귀족들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탈점으로 토지를 집적해나갔다. 이러한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특권적 확대는 이를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이자겸(李資謙)의 난 (1126)과 묘청(妙淸)의 난(1135)이었다. 이 두 반란은 일단 수습되기는 했지만 이로부터 고려 귀족사회는 그 근저로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일어난 무신란(武臣亂, 1170)으로 고려 귀족사회는 결정적으로 붕괴되었다.
문신 중심의 귀족정치에서 무신들은 차별대우를 받는 가운데서도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이나 이자겸 ·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지위를 상승시켜가고 있었다. 여기에다 문벌귀족들의 토지탈점에 대한 일반군인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되어 무신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귀족사회는 붕괴되고 새로이 무신정권이 성립되어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무신란은 고려사의 흐름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무신정권은 그 형성기에는 집권 무신간의 치열한 정권다툼이 전개되었으나 최충헌(崔忠獻)의 집권과 함께 수습되고 정권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최씨정권은 최고집정부로서 교정도감(敎定都監)을 두고 국가의 서무(庶務)를 관장했으며, 정방(政房)을 두어 관리들에 대한 인사를 처리하였다. 사병집단으로서 도방(都房)을 더욱 확대해 독자적인 무력기반을 마련했고, 국가의 공병(公兵)인 야별초(夜別抄) 역시 사병처럼 이용하였다.
이러한 정치기구와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토지를 겸병해 막대한 경제력을 축적하였다. 정국이 안정되자 최씨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학문적 소양과 행정실무의 능력을 고루 갖춘 문신들을 다시 기용하였다.
이 때 등장한 문신들을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새로운 관인층’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주로 지방의 향리출신으로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었다.
무신집권기에는 12세기 이래 지배층의 토지탈점에 의한 사회경제적 모순에 저항하는 농민 · 천민들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무신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문신귀족들의 토지탈점과 과중한 수탈로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유망(流亡)하는 현상이 적지 않았고 때로는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무신란 이후에 집권무신들에 의한 토지탈점이 더욱 심해진 데다가 무신들간의 권력싸움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곡민이나 노비 등 천민들의 신분해방을 위한 봉기도 일어났다. 이러한 농민 · 천민의 봉기는 최충헌의 집권과 함께 무신정권의 강력한 진압으로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란(民亂)은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탈피해 새로운 사회체제로 넘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최씨정권이 확립되어 있던 시기에 고려는 몽고의 압박을 받아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다.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약 30년 동안 6차에 걸쳐 몽고의 침략을 받았다.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육지의 백성들을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게 하여 몽고에 대항하였다. 특히 각지에서 고려의 일반민들이 몽고군과 용감히 항전하였다.
그러나 항전을 고수하던 최씨정권이 붕괴되자 강화가 성립되었다. 그 뒤로도 김준(金俊) · 임연(林衍) 등에 의해 무신정권이 계속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몽고의 군사적 압력에 의해 붕괴되었다.
삼별초(三別抄)는 몽고와의 강화에 반대해 진도와 제주도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로써, 고려는 약 100년간에 걸친 무신정권이 종식되고 왕정이 복고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몽고족이 건국한 원(元)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었다.
원간섭기에는 고려의 관제가 격하, 개편되었고, 지방에는 원의 관부가 설치되어 일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였다. 그 밖에도 경제적 수탈이 매우 심해 큰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주권은 엄연히 존속하였다. 비록 정동행성(征東行省)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했고, 고려의 국내 정치는 자주적으로 수행되었다.
당시 고려의 지배세력은 권문세족(權門世族)이라 불리는 계층이었다. 이들은 무신집권기와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새로이 형성된 사회세력이다. 무신집권기에 부상한 무신세력, 원과의 관계를 통해 대두한 세력, 그리고 고려 전기 문벌귀족 가운데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권문세족은 대체로 친원적인 성향을 띠었고, 도당(都堂: 都評議使司)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대토지소유자로서 농장(農莊)을 경영했다.
이들은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과 비교할 때 그 성분부터가 전혀 달랐다. 문벌귀족이 가문 자체의 권위로써 귀족적 특권을 누렸음에 비해, 이들은 현실적인 관직을 통해 정치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관료적 성격이 농후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이러한 권문세족에 대한 새로운 세력이 또다시 대두하고 있었다. 이들은 신흥사대부계층(新興士大夫階層)으로 무신집권기에 등장한 ‘능문능리’의 새로운 관인층의 후신으로 이들은 지방의 향리출신으로 원간섭기에 과거를 통해 중앙의 관리로 진출했으며, 보수적인 권문세족과 정치적으로 대립하였다.
특히, 이들은 원으로부터 성리학(性理學)을 수용하여 새로운 정치이념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선진적인 강남농법(江南農法)을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발달시켜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였다.
신흥사대부의 정치활동은 1298년(충선왕 즉위년)의 개혁정치와 충목왕 때 정치도감(整治都監)의 활동에서 보이듯이, 주로 권문세족의 토지탈점 등 불법행위를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개혁정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은 원과 결탁된 권문세족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공민왕이 중국에서 원이 쇠퇴하는 틈을 이용해 대대적인 반원개혁을 추진했고, 결국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다. 부원배들을 제거하고 원이 점령하고 있던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를 무력으로 탈환했으며, 원의 간섭으로 변형되었던 관제를 고려 전기의 3성 · 6부 체제로 복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돈(辛旽)을 기용해 권문세족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흥사대부의 세력도 점차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권문세족이 공민왕을 죽이고 우왕을 옹립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신흥사대부는 이성계(李成桂) 등 신흥무장세력과 결탁하여 마침내 위화도회군을 감행하여 정권을 잡았다. 이후 사전개혁(私田改革)을 단행, 권문세족을 도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사전개혁은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켰고, 이 때 새로이 성립한 토지제도가 과전법(科田法)이었다. 정권을 잡은 신흥사대부 내부에서 새 왕조를 개창하려는 역성혁명파(易姓革命派)와 고려왕조를 유지한 채 폐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온건파가 대립하다가, 결국 역성혁명파가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개창하였다.
근세사회
조선이 건국된 뒤에는 왕권이 강화되고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가 확립되어갔다. 이성계를 추대해 조선 건국의 주체가 되었던 여말의 신흥사대부들은 새 왕조의 양반관료(兩班官僚)가 되어 유교정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진력하였다.
특히, 조선 초기에는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부국강병이 매우 강조되었다. 그 결과 세종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되는 등 민족문화가 발흥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4군(郡) · 6진(鎭)이 설치되어 영토가 확장되었다. 건국 후 80여 년이 지난 15세기 후반에는 『경국대전』이 반포되어 통치조직과 사회구조 등 국가체제가 완성되었다.
조선의 지배층은 양반이었다. 양반은 관리가 되어 정치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높고 경제력이 강하며 또한 문화의 주인공으로서 조선사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사회계층이었다. 이들이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향유하고 세습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신분적인 배타성이 강화되어 조선사회는 양반 · 중인 · 양인 · 천민으로 구별되는 엄격한 신분구조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양반사회는 고려의 문벌귀족사회에서 일보 전진한 것이었다. 조선의 양반은 고려 후기에 대두한 신흥사대부의 후신으로 가문의 후광보다는 자기자신의 실력을 중요시하였다.
이들로 구성된 문반 · 무반의 관리는 전제왕권의 정치적 · 행정적 실행자로서 관료적 성격이 강하였다. 또한, 고려의 문벌귀족이나 권문세족에 비해 훨씬 많은 가문이 조선의 양반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지배층의 확대를 의미하여 사회발전의 일면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는 농업생산력이 크게 발달하고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보다 진전되어 양인자작농(良人自作農)이 많아져 전체적으로 농민의 지위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천민들이 양인화하고 있었다. 그 단적인 예로 향 · 소 · 부곡 등 천민집단의 특수행정구역이 소멸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배층의 확대와 양인 · 천민 지위의 상승은 사회신분면에서의 발전이었다.
이 밖에도 사상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고려 후기에 수용되었던 주자학이 조선에 들어와 정치이념으로 채용되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범이 되었다. 이는 고려시대에 훈고학적(訓詁學的)인 유교와 불교 신앙이 병립해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의 성립은 정치 · 경제 · 사회 · 사상 등 모든 면에 걸쳐 커다란 발전을 수반했기 때문에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교체를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으로 보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는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를 골간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왕권의 강화에 따라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가 확립되어 실제 정무를 담당한 육조의 권한이 강했고 의정부는 국왕의 자문기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사헌부(司憲府) · 사간원(司諫院) · 홍문관(弘文館) 등 삼사(三司)가 국왕에 대한 간쟁(諫爭)과 관리들에 대한 감찰(監察)을 담당하였다. 심사 관원들은 언관(言官)이라 하여 특별히 중시되었다.
지방은 경기 · 충청 · 경상 · 전라 · 황해 · 강원 · 함경 · 평안 등 8도(道)로 나누고 아래에는 부(府) · 목(牧) · 군(郡) · 현(縣)을 두었다.
조선왕조의 토지제도는 고려 말에 제정된 과전법(科田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과전법은 경기의 토지만을 전직 · 현직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15세기말에 이르면 이를 둘러싼 양반관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주(田主)와 전객(佃客)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해 토지의 지급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하거나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해 전주가 농민으로부터 직접 수조하는 것을 지양했지만 이러한 제도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는 점차 소멸했고, 그에 대신해 양반관리들에 의한 사적 소유지의 확대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국초부터 시작해서 『경국대전』 체제로서 일단 정비된 조선의 제도 · 문물은 16세기에 한 차례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제도의 붕괴 또는 질서의 해이가 아니라 당시의 발전적인 경제 변동을 반영하고 있었다.
16세기에는 농업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유통경제가 자못 활성화하였다 그것은 지방의 장시(場市)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경제변동에 편승해 소수의 훈신(勳臣) · 척신(戚臣) 등 권세가들이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였다.
이들 훈척계열은 고려 말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신흥사대부의 후손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세조의 즉위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집적해 농장을 확대하는 등, 온갖 비리적 수단을 동원해 사리를 취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유망하거나 권세가의 농장에 들어가 소작농인 전호(佃戶)로 전락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농민들의 부담에 의해 유지되던 공납제(貢納制)와 부역제(賦役制) 등 국가의 재정제도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농장의 확대와 공납제 · 부역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져 각지에서 도둑이 창궐하였다. 황해도에서 일어난 임꺽정[林巨正]의 난이 대표적인 예이다.
16세기 사회변동에 편승한 훈척계열의 특권적인 비리행위를 비판하면서 새로이 등장한 정치세력이 바로 사림파(士林派)였다. 이들은 고려 말에 역성혁명을 반대했던 신흥사대부의 후손들이다.
조선왕조 개국 초기에는 관직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방의 중소지주(中小地主)로서 유향소(留鄕所) 등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 사림파가 성종 때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해 주로 언관직에 포진해 훈척계열을 공격하였다.
수세에 몰린 훈척계열 쪽에서 사림파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서 일으킨 것이 사화였다. 사화는 연산군 때부터 4차에 걸쳐 일어나 그 때마다 중앙에 진출해 있던 사림파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잇따른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파는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보급운동을 통해 세력을 결집하고 더욱 신장시켰다. 결국 16세기 후반의 선조 때에 이르면 훈척계열이 도태되는 가운데 정계의 주류를 이루어 사림정치를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사림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구체제, 즉 훈척정치의 척결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강 · 온의 대립이 나타나 동인과 서인의 분열이 일어났다. 종전의 훈척계열과 사림세력의 대립이 사림 내부에서 붕당을 이루어 대치하는 양상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이후로도 정치적 사안에 따라 사림의 분화가 거듭되어 선조 때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17세기 말에 이르러 숙종 때에는 서인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였다.
이러한 정치형태를 ‘붕당정치(朋黨政治)’라 한다. 붕당정치는 사림 내부의 엄정한 자체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림에 의한 성리학적인 정치운영의 형태였다. 또한 붕당정치는 정치적 주장을 달리하는 붕당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상호비판체제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붕당정치가 싹트고 있을 무렵, 16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임진왜란과 정묘 · 병자 호란이 발발하였다. 임진왜란의 경우, 초기에는 전쟁준비의 부족으로 패배를 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수군의 승전과 각지에서 일으킨 의병의 활약 및 명(明)의 원병으로 전세를 만회해 왜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다. 왜란 후에는 전쟁 중에 줄곧 주전론을 펴던 북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서인에 의한 인조반정으로 북인정권이 붕괴된 후로는 이후로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붕당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때 성립된 서인정권은 중국의 명 · 청 교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두 차례의 호란을 자초하였다.
항전 끝에 결국 청(淸)에 항복해 종속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청에 대한 적개심과 문화적 자부심에서 소중화의식(小中華意識)이 대두했고, 더욱이 청을 공격하자는 북벌론이 제기되어 실제로 준비되기까지 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장기간에 걸친 왜란과 호란은 16세기 이래 해이해지던 조선의 통치체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중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 문란해진 통치기구 및 수취제도를 개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통치기구에 있어서는 비변사(備邊司)의 기능이 확대되어 종래 의정부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군사제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오위제(五衛制)가 무너지면서 훈련도감(訓鍊都監) · 총융청(摠戎廳) · 수어청(守禦廳) · 어영청(御營廳) · 금위영(禁衛營) 등 오군영체제(五軍營體制)로 개편되었다.
수취제도의 개편도 있었다. 우선 전세(田稅)를 개편해 풍흉에 관계없이 1결(結)당 미(米) 4두(斗)로 세액을 고정하였다. 공납제에 있어서는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해 특산물을 현물 대신 미(米)로 통일해 토지 1결당 12두씩을 내도록 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세제의 합리화를 꾀하였다. 군역제에 있어서는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해 종래 농민들이 1년에 2필(匹)씩 내던 군포(軍布)를 1필로 감했다.
17세기 이후의 이러한 체제개편은 이 시기의 경제발달과 사회변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경제 발달은 우선 농업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이앙법(移秧法)의 보급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생산량은 배가하는 효과를 거두어, 근면한 일부 농민들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부를 축적해 지주로 성장하였다. 이들을 경영형부농(經營型富農)이라 한다.
이들은 이른바 광작(廣作)을 행해 수확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당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상업적 농업경영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경영형부농의 등장은 지주제의 변동을 초래해 지주와 전호와의 관계가 지배 · 예속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적인 관계로 변질되어갔다.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인구가 급증하고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어 비농업인구의 도시유입이 현저해지면서 상업은 더욱 발달할 수 있었다.
당시 상업활동의 중심은 대동법의 실시와 더불어 나타난 공인(貢人)과 전국적인 장시의 발달에 힘입어 성장한 강상(江商) · 송상(松商) · 만상(灣商) · 내상(萊商) 등 사상(私商)들이었다. 이들은 특정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해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都賈)로 성장해 점차 상업자본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수공업과 광업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먼저 수공업에 있어서는 종래의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사영수공업이 성장하는 추세였다. 광업에서는 광산의 운영에 있어서 상업자본가인 물주가 시설과 자금을 투자하고 광산개발에 경험이 있는 덕대(德大)가 광산을 경영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이는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서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경영형부농의 농업 경영이나 새로운 광산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은 주로 임노동(賃勞動)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의 이러한 경제변동은 또한 사회계층의 분화를 초래해 종래의 신분제를 붕괴시켰으니, 농민층과 양반층의 분해 및 노비제의 해체 등이 그 실상이었다.
이 시기의 농민층의 분해는 특히 소작지의 보유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한편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경영형부농이 성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빈농(貧農) 및 무전농민(無田農民)이 발생해 유망하거나 임노동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분해현상은 양반층의 경우에도 심각해 실세한 양반들이 잔반(殘班)으로 몰락하였다. 이들 잔반은 자영농 또는 소작전호가 되거나 상업 · 수공업으로 전업해 생계를 꾸려나갔다.
한편, 노비와 양인들이 각각 양인 ·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서얼(庶孽)과 중인이 점차 신분적 차별에서 벗어남으로써 지배신분층은 격증하고 피지배신분층은 격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처럼 종래의 신분적 지배 · 예속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가운데, 노비제 역시 붕괴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동은 종래의 사(士) · 농(農) · 공(工) · 상(商)의 직분적 사회구성 위에서 기능하고 있던 주자학 일변도의 사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였다. 주자학에 대한 비판은 결국 18세기에 이르러 실학(實學)의 발생으로 귀결되었다.
실학의 중심과제는 조선 후기 사회의 제반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우선 농업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형원(柳馨遠) · 이익(李瀷) · 정약용(丁若鏞) 등은 주로 농민층의 입장에서 현실의 토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유수원(柳壽垣) · 홍대용(洪大容) · 박지원(朴趾源) · 박제가(朴齊家) · 이덕무(李德懋) 등에 의해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들은 중상론(重商論)과 함께 청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으므로 북학파(北學派)라고 한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실학은 현실적인 개혁론보다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학풍은 김정희(金正喜)에 이르러 일가를 이루었다. 이들은 청의 고증학(考證學)을 받아들여 객관적인 학문연구의 태도를 정립하여, 역사학과 지리학 · 금석학(金石學)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실학사상은 정약용과 김정희의 제자들에 의해 초기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었으니, 이는 곧 실학사상 안에 근대지향적인 성격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이와 같이 사회경제부문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면에 있어서는 인조반정 이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붕당정치의 원리가 점차 퇴색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퇴보하고 있었다.
현종 때에는 두 차례의 예송(禮訟)으로 서인과 남인의 세력관계가 역전되었고, 뒤이은 숙종 때에는 세 차례의 환국(換局)을 거치면서 상대 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가해지면서 공존을 전제로 하는 붕당정치의 원리가 무너졌다.
이에 영조와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붕당 간의 세력균형을 꾀하기 위해 치열한 정쟁을 억제하려는 탕평책(蕩平策)을 실시해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붕당정치의 말폐를 근본적으로 제거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억누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붕당간의 세력균형도 실제 이루어지지 못해 탕평 하에서도 노론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노론 일당전제의 가능성은 영조 · 정조의 강력한 왕권 아래서는 드러나지 못하다가, 정조 이후 왕권이 약화되자 세도정치라는 더욱 파행적인 정치형태로 나타났다.
세도정치란 특정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형태로서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붕당정치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세도정치는 경제 ·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극심한 부패를 야기시켰다. 그 집약적 표현이 전정(田政) · 군정(軍政) · 환곡(還穀) 등 이른바 삼정(三政)의 문란이었다. 삼정의 문란은 표면적으로는 수령 · 아전의 횡포와 그 운영상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조세 수취가 신분제와 지주-전호제에 바탕하여 이루어졌다는 데에 있다. 조선 후기의 경제변동 속에서 몰락해가고 있던 농민들은 삼정의 문란으로 더욱 궁핍해졌다.
몰락농민 가운데 일부는 유망하거나 도둑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민란으로 발전하였다.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洪景來)의 난을 비롯해 1862년(철종 13)에는 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무력을 동원해 농민들을 토벌하기도 하고 삼정의 운영을 개선해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민란은 개항 이후까지도 줄기차게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농민들의 주체적 항쟁은 조선의 양반사회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민간에서는 비기(秘記) · 도참(圖讖) 등 예언사상이 유행했고, 천주교가 들어와 유포되었으며, 동학(東學)이 창도되었다. 주로 농민 등 핍박받는 피지배층 사이에서 열렬히 신봉된 새로운 종교들은 당시 빈발하던 민란에 혁명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근대사회
동요하던 조선 후기 사회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집권으로 한 차례 정비될 기회를 맞게 되었다. 대원군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자 세도정치를 종식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며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는 등 나타난 폐단들을 제거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를 재정비하려는 일대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무렵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의 통상압력이 가해지자, 조선에서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대원군은 강경한 쇄국정책을 고수해 척양(斥洋) · 척왜(斥倭)를 표방하면서 서양의 통상요구에 불응하였다.
이 때문에 병인양요(1866)나 신미양요(1871) 등 서양열강과의 무력충돌이 일어났지만 이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여 쇄국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계 일각에서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통상개화론이 대두하고 있었다. 대원군의 실각과 동시에 통상개화론이 채택되어 개국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876년에는 일본과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개항이 이루어졌고, 뒤이어 미국 등 서양열강과의 통상조약이 맺어졌다. 이로써, 조선은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어 자주권을 유지하면서 근대사회로 발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적극적인 개화정책이 추진되어 일본과 청으로부터 서양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화사상이 대두하였다. 이 개화사상은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 특히 북학파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이 전개되었다. 위정척사운동은 보수적인 유생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당시 정부의 개화정책이 외세의 침투에 주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외세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애국적 성격을 강하게 띤 운동이었다.
이로부터 개화와 보수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비롯된 것이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이었다. 임오군란은 개화정책으로 피해를 보게 된 구식군인들에 의해 일어났다.
그 결과 대원군이 재집권했으나 곧 청의 군사개입으로 대원군은 청으로 압송되고 청의 내정간섭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청의 경제적 진출이 두드러져 국민들의 반청감정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화사상을 가진 젊은 관료들에 의해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이며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으로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그러나 갑신정변 역시 청의 군사개입으로 실패하고 조선에서의 청의 지위는 더한층 강화되었다.
개항 이후 지배층 사이에서 개화와 보수의 대립이 격화되고 청 · 일본 등 외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19세기 이래의 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개항 이후에는 개화정책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수세부담이 증대하였다. 지방관들의 탐학은 여전했고 일본과 청의 경제적 침투로 농촌경제는 결정적으로 파탄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주권을 상실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경제적 침투로 농촌경제를 좀먹는 일본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이 폭발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것이 곧 동학농민운동이었다.
1894년(고종 31) 전라도 민란을 발단으로 동학농민운동은 전개되었다. 동학군들은 전주를 점령한 뒤 정부와 강화를 맺고 지방관의 농민에 대한 수탈의 중지, 신분차별의 폐지, 토지균분제 실시 등 전근대적인 정치 · 사회체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원병요청으로 파견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학군과의 강화가 이루어진 뒤에도 철수하지 않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동학군은 다시 봉기했으나,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계속해서 일어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조선침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 의의는 매우 크다. 대내적으로는 전근대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운동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또한, 뒤이은 갑오개혁을 통해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뒤 조선정부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바로 갑오개혁(1894)이었다. 일본의 간섭이 없지 않았지만, 당시 일본은 청과 전쟁 중이었으므로 이 개혁은 비교적 자주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때 정치 · 경제 · 사회 각 방면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이 있었다. 특히 사회면에서는 양반과 평민의 신분을 타파하고 백정 · 광대 등 천민신분의 폐지와 함께 노비제도를 혁파하는 등 신분제도를 완전히 개혁하였다.
그러나 개혁이 진전되면서 점차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졌고, 개혁의 방향 또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사회체제를 변형시켜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변질되어갔다.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가 부상하자 조선에서는 러시아에 의지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세력이 나타나 친러정권이 수립되고 개혁은 중단되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을미사변을 일으켜 다시 친일정권을 수립하고 개혁을 계속 추진하였다. 이 을미개혁은 갑오개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을미사변에 뒤이은 일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개혁의 의미는 크게 퇴색하였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특히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을미사변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을미개혁을 추진했던 친일정부는 붕괴되고 친러정권이 다시 수립되었다.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금광채굴권이나 철도부설권 등 각종 이권들이 제국주의열강에게 침탈되고 있었다. 그러나 집권층은 외세에 의존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자주권 확립의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이 운동의 중심조직이 독립협회(獨立協會)였다. 독립협회는 서구의 근대사상을 받아들인 지식인과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유학자들이 주도하였다. 여기에서는 자주독립 · 자강혁신(自强革新) · 자유민권(自由民權) 등 세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집권층은 독립협회의 급진적인 개혁요구를 탄압했고, 결국 강제로 해산시키고 말았다.
독립협회의 활동 역시 실패했으나 그 개혁운동은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국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일제침략에 대항해 민족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상적 기반과 함께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독립협회의 요구에 따라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부터 환궁하여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내외에 선양하기 위해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였다. 또 한 차례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으니, 이것을 그 연호를 따라 광무개혁(1897)이라 한다.
이 개혁에서는 특히 절대왕정체제를 도입해 황제의 전제권을 법적으로 확립하였다. 이는 독립협회에서 주장한 입헌군주제나 의회정치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이었다.
산업과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개혁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성립 자체가 조선을 둘러싼 열강 세력의 균형으로 가능했던 만큼 그 균형이 깨짐에 따라 광무개혁 역시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1900년대에 들어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점점 표면화되면서 결국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한국에서 일본의 우위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이 때 일본은 미국 · 영국 · 러시아 등 열강으로부터 한국을 보호국으로 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1905년에는 흔히 을사조약이라 불리는 제2차한일협약을 체결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統監府)를 두어 본격적으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국권은 사실상 침탈되었다.
1910년에는 친일정부로 하여금 합방조약을 의결하도록 하여 대한제국은 완전히 종말을 고하였다. 이로써 한국인은 주권을 상실하고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일제의 침략에 의한 국권의 침탈은 한국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한국인은 나라를 잃고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서 갖은 고난을 겪어야 했을 뿐 아니라, 민족사의 일시적인 단절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권상실의 원인은 다각도로 찾을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추진세력이 형성되지 못해 외부세력의 침투를 불러들였고, 당시 집권세력이 외세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점을 특히 개화 · 보수의 알력과 여러 계층의 갈등을 하나의 민족적 역량으로 통합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때마침 일본이 제국주의적 팽창을 강행하는 시기였고,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 일본의 한국침략을 묵인했던 국제정세를 들 수 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은 여러 방향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국권을 상실한 뒤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운동으로 확대, 계승되어갔다. 이러한 민족운동 가운데 특히 뚜렷한 움직임은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다. 이것은 각각 개항 직후의 위정척사운동 및 개화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의병운동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자극받아 일어난 을미의병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에는 종전의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대거 가담했고, 의병장은 대개 지방의 명망있는 유학자들이었다.
그 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전국에서 다시 의병이 일어났다. 군대가 해산되면서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여 의병의 규모가 커지고 무장과 조직이 강화되어 의병운동은 전면적인 항일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의병운동은 무력의 열세와 일본군의 대규모 작전으로 위축되어 갔다. 특히 국권이 침탈된 뒤에는 대부분의 의병들이 국외로 이동해 독립군에 합세했고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병운동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일어난 항일운동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며 또한 가장 효과 있는 운동이었다.
의병활동은 개항 후의 위정척사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배출되었다. 구성에 있어서도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전국민이 참여한 범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은 국민의 의식을 계발해 애국심을 기르고 국가의 힘을 축적해 주권을 회복하려는 구국운동이었다. 사상적으로는 개화사상과 연결되며, 특히 도시의 지식층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적 의식을 가진 국민대중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었다.
이들의 활동으로는 민족산업을 육성해 자립적인 경제부강을 이룩하려는 경제자립운동, 국민들의 정치사상과 사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 신민회(新民會) 등 정치 · 사회 단체들의 활동, 『황성신문(皇城新聞)』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등 언론기관의 국민계몽운동, 사립학교와 각종 학회를 통한 민족교육운동, 국사와 국어를 연구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국학운동, 기독교 · 유교 · 불교 · 동학 · 대종교 등 종교계의 계몽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한일합방에 따라 일제는 종전의 통감부를 총독부(總督府)로 바꾸고 조선총독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하였다. 총독부의 한국지배방식은 무단통치라고 불리듯이 매우 강압적이었다.
총독부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수탈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토지를 탈점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실시했고, 회사령(1910) · 조선어업령(1911) · 조선광업령(1915) · 임야조사사업(1918) 등을 통해 한국의 산업을 침탈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의 민족산업은 위축되었고 한국은 일본의 식량공급지 · 상품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무단통치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의병운동이 계속되었고 비밀결사를 통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해 간도 · 연해주 등지에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하였다. 상해(上海)나 미국에서도 열강을 상대로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18년 말부터는 학생 및 천도교 · 기독교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계획되었다. 더욱이 제1차세계대전 이후 발표된 민족자결주의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크게 고무시켰다. 그 결과 1919년에 3 · 1운동이 일어났다.
이 만세운동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고 지방에 따라서는 4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 일제는 헌병경찰뿐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잔인하게 탄압함으로써 3 · 1운동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3 · 1운동의 의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우선 3 · 1운동은 모든 국민이 하나의 목표 아래 하나의 방법으로 전개한 민족운동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전통사회의 신분적 제약이나 계층간의 이해를 초월해 온 국민이 민족운동에 참가한 것은 전통사회의 전근대적 잔재를 일소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갈래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이 3 · 1운동을 계기로 일원화됨으로써 앞으로의 독립운동에 있어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3 · 1운동은 비록 실패했으나, 한국독립운동사의 흐름에 있어 방향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3 · 1운동은 일제에게 한국인에 대한 무단통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 통치방식을 변환시키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문화통치가 나타났는데, 무단적 억압을 완화시켜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부여한다는 통치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통치는 한국인들을 회유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탈을 하려는 고등적인 기만정책에 불과하였다. 문화통치기에 오히려 경제적 수탈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해 한국의 쌀을 약탈함으로써 한국의 농민들은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였다. 토지를 일본인에게 빼앗긴 한국농민들은 영세소작인으로 전락해갔다. 또한, 한국에 직접 자본을 투자해 상품시장 이상의 자본투자시장으로 재편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는 한국을 전쟁물자를 공급하는 병참기지로 만들면서 동시에 철저한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하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물적 자원뿐 아니라 병력과 노동력을 징발했을 뿐만 아니라, 내선일체(內鮮一體) ·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내세워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려 하였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은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3 · 1운동 이후 해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국내에서는 실력양성운동을 비롯해 학생 및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실력양성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가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이름 아래 유화국면으로 접어드는 틈을 이용해 사회 · 문화 ·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려는 민족운동이었다.
먼저 민족언론으로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어 실력양성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국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세우려는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비롯해, 노동야학을 통한 민중교육운동과 문맹퇴치운동 등 민족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경제계에서도 민족산업의 육성과 민족자본의 형성을 통한 경제자립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위한 대중운동으로서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동맹휴학 등을 통해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6 · 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 등으로 폭발하였다.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어 사회주의운동이 전개되었다. 한국의 사회주의는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활동 역시 노동쟁의 등 조직적인 항일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사회주의계열은 민족주의계열에서 주도한 실력양성운동을 비판, 거부하였다. 서로 대립한 가운데 민족주의계열의 일부가 일제의 자치론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족주의 계열은 사회주의계열과의 연결을 모색했고, 사회주의계열에서도 응함으로써 두 계열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신간회(新幹會)가 조직되었다(1927). 신간회는 자치론을 기회주의로 규정해 철저히 규탄하면서 조직적이고 일원화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노선변경에 따라 사회주의계열이 신간회에서 탈퇴한 후 신간회는 해체되었다. 이 밖에도 1920년대부터는 농민들의 소작쟁의와 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빈발, 단순한 경제투쟁을 넘어 일제에 대한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3 · 1운동 이후에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의 정부를 조직해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민족의 여망에 따른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였다.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해 국내와의 연락을 취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광복군을 편성해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에 참가하였다.
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공화주의정부이며, 또한 3 · 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수립되었고, 이후 항일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된 단일정부라는 점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민족의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지 못했고 내부 분열로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했던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만주 · 간도 · 연해주 등지에서는 독립군들의 무장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은 1920년에 봉오동(鳳梧洞)과 청산리(靑山里)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전과를 올렸다. 참의부(參議府) · 정의부(正義府) · 신민부(新民府) 등이 설치되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군정부의 기능을 하였다.
1931년에 만주지역에서의 독립군활동이 어려워지자 중국이나 연해주로 흩어졌고, 그 일부는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이 밖에도 김구(金九)가 조직한 애국단과 김원봉(金元鳳)의 의열단(義烈團) 등이 중심이 되어 애국열사들의 폭력수단에 의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현대사회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되는 동시에 우리 민족도 35년간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다. 이러한 조국광복의 이면에는 온 민족의 꾸준한 항일독립운동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우리 민족은 항일운동을 계속했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무장독립군이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항쟁이 광복과 독립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광복이 우리의 자력만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일제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라는 타력이 게재되어 있었다. 광복의 이러한 성격이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규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광복 직후 미 · 소 양군의 분할점령과 군정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고, 좌우익의 대립 속에 결국 남북한에 두 개의 독립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광복 직후에 가장 먼저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은 여운형(呂運亨) 등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해 치안을 유지하는 등 준정부(準政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민족주의계열에서는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명분으로 건국준비위원회와 대립하면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건국준비위원회의 후신인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미군정만이 38선 이남에서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과거 총독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한국인 가운데 친일분자들이 미군정에 참여해 그 세력을 온존시키게 되었다.
기회를 보고 있던 민족주의계열에서는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약칭 한민당)을 결성하고 미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점차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에서 활약하던 이승만(李承晩)과 중국으로부터 김구 등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잇따라 귀국하고, 박헌영(朴憲永)이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자 좌우익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한 가운데 조만식(曺晩植)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계열과 네 갈래의 공산주의세력, 즉 박헌영의 노선에 따르는 국내파와 소련군을 따라 입국한 김일성(金日成) 등 갑산파(甲山派) 및 소련파, 그리고 중국 연안에서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을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귀국한 연안파(延安派)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익은 반탁을, 좌익은 찬탁을 각각 주장하면서 양측은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북한에서는 반탁을 주장하던 조만식 등 민족주의계열이 소련에 의해 거세되었고, 남한에서는 찬탁을 주장한 좌익진영이 대중의 지지를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신탁통치문제는 한국에서 좌우익의 대립을 더욱 첨예화시켰을 뿐 아니라 남한에서는 우익이, 북한에서는 좌익이 각각 우세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46년에는 남한에서 우익측의 김규식(金奎植) · 안재홍(安在鴻)과 좌익측의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좌우합작운동이 추진되었으나 곧 결렬되고 말았다.
좌우합작운동의 실패는 1947년 무렵부터 시작된 동서냉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이 때부터 미국은 한국에서의 신탁통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유엔에서는 한국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고, 이를 소련이 거부함으로써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되었다.
남한단독선거가 남북의 영구적인 분단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김구 · 김규식 등은 남북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1948년 5월 10일 남북협상파가 대거 불참한 가운데 총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과 한민당계열이 압승을 거두었다.
제헌국회가 소집되고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선출되었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소련군의 후견 아래 민족주의계열과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고 소련파 및 연안파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1948년 9월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였다.
남북의 분단과 대립은 한국전쟁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광복 직후부터 소련의 원조를 받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중국이 공산화되고 미국의 애치슨라인이 발표되는 등 남침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였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는 등 초기에는 군사력이 우세한 북한이 제주도와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토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세는 역전되어 국군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다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38선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이 일어난 지 3년 만인 1953년에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 전쟁으로 남북한 모두 엄청난 인명피해와 건물 · 도로 · 산업시설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민족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남북한의 분단이 고정되었다. 전쟁 후에는 남북한이 각기 경제 재건을 통한 체제경쟁에 힘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독재체제가 성립되었다.
정부수립과 함께 출범한 이승만정권은 처음부터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못했다. 과거 미군정에 의해 온존된 친일세력을 그대로 이어받아 권력기반을 삼았을 뿐 아니라, 경제정책, 그 가운데서도 특히 토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전쟁 직전에 실시된 제2대국회의원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이 참패를 당하고 무소속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반공을 구실로 자신의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1952년에 피난 수도 부산에서 자유당(自由黨)을 조직하고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개헌안에 의한 선거에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54년에는 ‘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한다. ’는 내용의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956년의 제3대 대통령선거와 1960년의 제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승만과 자유당정부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정 · 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극심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등 독재화의 경향을 노골적으로 띠어갔다.
이러한 독재정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것이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정 · 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을 계기로 폭발해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4월혁명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에서도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의 1인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 1951년부터 남로당(南勞黨)계열에 대한 숙청을 시작해 1955년에 박헌영을 처형함으로써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1956년에는 소련에서 일어난 스탈린격하운동의 여파로 연안파와 소련파가 중심이 되어 김일성의 1인독재에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계기로 이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이 때부터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고조되고 주체사상이 대두하였다.
4월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은 붕괴되고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에서 내각책임제개헌이 이루어졌다. 선거를 통해 민주당정권(民主黨政權)이 수립되어 제2공화국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대통령에는 윤보선(尹潽善)이, 총리에는 장면(張勉)이 각각 선출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에서 구파(舊派)와 신파(新派)가 대립하여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고, 4월혁명 이념의 구현이나 자유당정권 하에서의 부정 · 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였다.
불만을 품은 학생과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연일 가두시위가 계속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었으나 당시 이러한 국민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수습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혼란을 구실로 1961년 5월 16일에 군사혁명(정변)이 일어남으로써 제2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새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朴正熙) · 김종필(金鍾泌) 등 혁명주체세력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대통령중심제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그리고 1963년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을 창당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공화당의 박정희후보가 야당인 민정당(民正黨)의 윤보선후보를 누르고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뒤이어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어 공화당정부가 수립되고 제3공화국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공화당정부는 출범 직후 한일협정(韓日協定)과 월남파병문제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야당을 비롯한 학생 · 지식인 · 언론 · 종교인 등의 범국민적인 반대에 봉착하였다. 계엄령을 선포해 반대세력을 탄압함으로써 이 때부터 이미 독재화의 경향을 띠기 시작하여 학생 · 지식인 등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정권의 정통성확립에 일조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67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박정희후보가 신민당(新民黨)의 윤보선후보에게 또 다시 승리해 제6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대통령은 1969년 3선개헌을 강행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3선개헌에 따라 재출마가 가능해진 박정희와 신민당의 김대중(金大中)후보가 1971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박정희가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3선개헌은 박정희정권의 독재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기 때문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대통령은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고 장기집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10월유신을 단행하였다.
1972년 10월 박정희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유신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를 구성한 다음 여기에서 제8대대통령에 선출되었으니, 이로써 제4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1978년에 또다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9대 대통령에 선출됨으로써 박정희대통령의 영구집권은 점차 실현되어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10월유신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1979년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 ·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때 10 · 26사태가 일어나 박정희대통령이 저격당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되고 18년 동안 계속된 박정희정권은 종말을 고하였다.
공화당정부는 반민주적 성격으로 인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사혁명 직후부터 추진된 네 차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한국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은 성장에만 힘을 기울인 나머지 분배의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공업위주의 개발정책은 필연적으로 농촌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민간부문의 자립성이 크게 상실되고 국가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경제구조가 취약해지는 부작용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공화당정부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1970년 8 · 15선언으로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해 남북간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고 7 · 4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그 뒤 남북대화가 결렬되었지만, 한국정부는 1974년 북한에 대해 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을 제안하였고, 1979년에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없이 남북한 당국자회의를 통해 통일문제를 직접 토의할 것을 주장하는 등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10월유신이 단행된 직후인 1972년 12월에 주체사상을 강조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해 김일성이 주석(主席)에 오르고 1인독재와 개인숭배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 김일성의 장남인 김정일(金正日)이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부자세습체제가 성립되었다.
10 · 26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된 뒤에는 최규하(崔圭夏)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 위기관리내각의 구실을 했으나, 사회 각계에서 유신잔재세력의 제거와 조속한 민주화조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 5월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군대를 투입, 진압한 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약칭 國保委)를 설치하였다. 국보위의 위원장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全斗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대통령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1981년 2월에는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고, 여기에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약칭 민정당)의 전두환후보가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새로이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과감한 체제개혁을 표방하였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수출증진에 주력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신장시켰으니, 그 단적인 표현이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개최국으로 결정된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자행되고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형금융부정사건이 일어났으며, 정치체제문제와 관련해 학원과 재야를 중심으로 민주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1987년 6월에는 군정종식과 민주화,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민정당의 노태우(盧泰愚)대통령후보는 대통령직선제개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6 · 29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야당인 통일민주당(統一民主黨, 약칭 민주당)의 김영삼(金泳三)후보와 평화민주당(平和民主黨, 약칭 평민당)의 김대중후보가 후보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민정당의 노태우후보가 당선되어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 이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국회는 평민 · 민주 · 신민주공화당(新民主共和黨, 약칭 공화당)과 함께 4당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여당의 일당독재를 막고 의회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각 정당의 지지기반이 지역적으로 편중됨으로써 지역감정의 심화라는 새로운 정치 ·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개혁정치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선 군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불식하기 위해 민간주도형의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지역감정의 해소를 통한 국민화합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쓰며,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추구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1988년의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국력 신장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중국 및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국가와의 외교에 주력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에는 집권당인 민정당과 통일민주당(김영삼) · 공화당(김종필)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 약칭 민자당)으로 합당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야당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약칭 평민당)이 신민당으로 개편되고, 1991년에 민주당 잔류파와 합당해 민주당을 결성함으로써 정계는 민자당과 민주당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나 1992년에는 정주영(鄭周永)이 통일국민당을 만들어 3당체제로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치루었고, 결국 민자당의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1993년의 김영삼정부는 과거 32년간의 군사정권에서 벗어난 문민정부로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 출범하였다. 김영삼정부는 ‘변화와 개혁’, ‘세계화 · 국제화’,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등의 기치를 내걸고 '청와대 점심 칼국수'라는 서민대통령의 풍모를 내비쳐 국민들의 갈채 속에 신한국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개혁정치에 착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의 5년간의 치적은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긴 채 실정으로 끝났다. 한국의 경제는 종래의 고도성장에서 후퇴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불황에 처했고 종래의 군사독재에 대신해 '신권위주의'가 지배하였다.
민자당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1996년 신한국당으로 개명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임하였다. 그래서 1995년 김종필이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약칭 자민련)과 김대중이 결성한 새정치국민회의(약칭 국민회의)의 3당체제로 개편되어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의 정치구도가 형성되었다.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대통령후보를 경선으로 선출, 이회창(李會昌)이 후보로 뽑혔다. 국민회의는 김대중이 추대되고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李仁濟)가 국민신당을 만들어 입후보하였다.
이 사이에 정당간에 이합집산이 진행되어 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으로 통합되어 조순(趙淳)은 이회창과 합류했고, 자민련의 김종필은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김대중과 연대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이회창 · 김대중 · 이인제의 3파전으로 이루어져 김대중의 승리로 끝났다.
1998년에 새로이 출범한 김대중정권은 헌정 50년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된 정권교체였다. 이것은 한국민주주의의 승리이며 그 만큼 한국사회가 성숙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의 전도는 결코 낙관만은 할 수 없다. 1997년 12월의 금융위기에 따른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경제정책의 추진, 또 여소야대의 국회, 김종필과의 약속에 따른 내각제개헌 등 불안한 정치구도 등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다.
2000년 6월 김대중대통령은 평양을 직접 방문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 · 15선언을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 그 동안의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사의 특성
한국사는 원시사회 이후 부단한 발전을 계속하여왔다. 한국사를 원시사회에 이어 고대 · 중세 · 근세 · 근대 · 현대로 나눈 것도 이러한 사회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내부적 발전은 한국사의 첫 번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의 내부적 발전은 우선 사회신분면에서 찾을 수 있으니, 일반민중의 지위가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여갔던 것이다. 즉, 한국사의 사회발전은 꾸준히 양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또한 천민의 신분해방이 이루어져 고려말 조선초의 사회변동을 거치면서는 향 · 부곡 · 소 등 천민집단이 소멸하였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노비제도가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분제의 변화는 곧 지배계층의 확대로 이어졌으니, 민중의 전반적인 지위가 상승하면서 그 일부가 점차 지배층으로 전환되어갔다.
삼국시대에 왕족과 고대귀족의 상층신분만이 지배층이 되었던 것에서 고려에 들어와서는 새로이 문벌귀족이 지배층으로 되었다. 그것은 종래의 편협한 진골체제보다 개방된 것이었으나, 역시 문벌이 중시되는 폐쇄성을 가진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을 형성하였으며, 뒤이어 신흥사대부가 새로이 대두하여 조선의 양반관료사회를 성립시켰으니, 이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관리가 될 수 있는 진전된 형태였다.
그리고 이 양반관료사회도 조선 후기에는 점차 붕괴되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개화세력의 성장에 따라 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한국사의 지배세력은 고대 이후 점차 확대되고 개방되어갔으니, 이는 한국사의 발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한국사회는 또한 경제력의 상승을 계속하였다. 농경지의 확대와 농법의 개량은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켰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상업과 수공업에도 커다란 발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적 성장은 사회변동의 토대를 이루었으며, 한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밖에 한국사는 문화적인 향상을 끊임없이 이룩하였다.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토착적인 원시신앙에다 외래의 불교사상과 유교사상, 그리고 근대에는 서구의 사상과 문물을 수용하여 문화의 폭을 넓혀갔으며, 또한 한문학을 중심으로 한 여러 학문의 발달과 다양한 예술의 전개는 한국문화의 수준을 높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향상은 한국사의 지적 역량의 축적을 뜻하는 것으로 정신면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국사의 두 번째 특성으로는 이러한 내부적 발전이 한국사의 주체적인 역량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에서 중세사회로의 발전은 폐쇄적인 진골체제에 반대하는 6두품계층 및 지방 호족세력들의 대두와 더불어 고대적 수취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저항의 결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근세사회로의 발전도 당시의 사회변동에 따른 신흥사대부의 성장과 함께 12, 13세기 이래 농민 · 천민의 난으로 표현되는 기층사회의 움직임이 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의 자율적인 발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이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것은 확실히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힘찬 움직임이었다.
우선, 경제면에서는 농업생산력이 급증하여 사회변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상공업에 있어서도 이미 상업자본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회면에서는 신분제도가 붕괴되어갔다. 또한, 사상계에 있어서는 실학이 발생하여 사회개혁으로 현실개혁의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이, 한국사는 그 스스로의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의 광복 역시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에 따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지하에서 줄기차게 계속된 우리 민족의 항쟁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한국사는 대외적으로 외세의 거듭된 침략에 대항하면서 국토를 방위하고 국권을 수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 국토보전의 역사라는 점이다.
고조선이 한의 침략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고구려가 수 · 당과 충돌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거란 · 여진 · 몽고족의 침략을 받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왜란과 호란을 겪었지만, 이들 침략세력과 항쟁하여 국가를 보위하였던 것이다.
특히, 고구려가 수 · 당의 침략을 물리친 것은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와 신라의 존립까지도 구원한 민족보위의 의의를 지니는 것이며, 고려가 당시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골족에 대항하여 30여년간의 치열한 항쟁 끝에 국가를 보전한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다만, 조선 후기에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여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35년 동안 주권을 상실한 단절기를 맞이하였으나, 식민지하에서도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의 항쟁은 계속되었고, 우리의 국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하여 계승됨으로써 한국사의 정통성은 단절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는 곧 민족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신석기시대에 이미 형성된 우리 민족은 국가성립 이후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된 채 서로 상쟁하였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표방한 일통삼한의식(一統三韓意識)이 바로 그것으로, 이러한 동족의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삼국통일을 계기로 하나의 민족국가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뒤 후삼국의 분열이 있었지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아가서는 발해 유민까지 포섭함으로써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내적으로 한글이 창제되고 단군국조관념이 대두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경선 확장에 따라 국토의식이 성장하는 등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국민국가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후기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서 민족주의가 제시되고 민족의식이 강조되었는데, 민족의식은 식민지하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한국사가 단일민족의 역사라는 사실은 오늘날 분단상황의 극복과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국문화는 한국인이 5,000여 년 동안 살아온 역사이자 삶의 지혜이다. 문화는 살아가는 사람의 역사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과거의 역사로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가늠해주는 지침이 된다.
이 점에서 문화는 삶의 지혜로서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의식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가 언제나 새롭게 쓰여지고 정리되어 가듯이, 우리의 문화도 언제나 새롭게 재정의되고 끊임없이 재창조되어가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한국인이 지나온 발자취이다. 그 발자취는 각종의 역사적 유물들과 기록에 의해서 밝혀진다. 그렇다고 역사적 유물과 기록이 그 자체로서 발자취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유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해석방법이 매개되어야 하고, 역사적 기록 자체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나 유물과 기록이 제작되고 기록되던 당시의 한국인은 그 유물과 기록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시대의 한국인과 동시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석은 해석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맥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삶의 지혜라는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주로 역사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춘 진화론적 설명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일반적인 내용을 여기서 정리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인지인류학(Cognitive Anthropology) 내지는 구조주의 입장에서 논하는 대대적 문화문법(對待的文化文法)으로 설명하겠다.
한국문화의 형성과 전개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창조물과 성과를 가리켜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한다면, 인류의 문화는 인류사회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도 물론 이러한 보편적인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는 이러한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도 갖추고 있다. ‘한국문화’라고 할 때는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더 염두에 둔 말이다.
한국문화의 형성과 전개에 있어서 그 주체는 한국인이다. 문화를 인간활동의 산물로 본다면 한국문화는 한국역사의 전개와 궤를 같이한다. 한국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역사적인 시기 구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문화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시대구분에 따라 서술해 나가기로 한다.
① 원시공동체사회: 한국문화의 형성기, ② 고대: 한국문화와 외래문화의 접촉기― 문화의 개방성과 전파성, ③ 삼국시대: 한국문화의 분열기―한국문화의 자기 점검기, ④ 통일신라와 발해: 한국문화의 성숙기.
⑤ 고려: 한국문화의 다양화 시기, ⑥ 조선: 한국문화의 폐쇄기―민중문화의 태동기, ⑦ 일제강점기: 한국문화의 투쟁―암흑기, ⑧ 광복 후: 한국문화의 시련기―문화적 통일지향기.
여기서는 문화 주체인 인간의 활동,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요컨대 역사적 상황과 그 상황을 조화시키려는 한국인의 노력을 문화형성 및 전개의 주된 동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화담당 주체의 변화라는 면도 고려할 것이다.
원시공동체사회의 문화
우리나라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던 지역이었다. 최초의 문화라 할 수 있는 구석기시대문화는 도구와 불의 사용, 채집 · 어로 · 수렵 활동 등을 통해 형성된 무리사회라는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다. 생산성은 낮았지만 공동생산체제에 기반을 둔, 모든 사람이 공유한 문화였다.
원시예술이나 신앙은 이러한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자연과의 더없는 교감 속에서 소박하게 자리잡아갔다.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인간은 또 하나의 활동, 즉 자연을 정복하려는 의지를 키워 나갔다. 이와 함께 더욱 견고하게 짜여진 공동체사회 형태인 혈연적 모계씨족사회를 형성하였다.
신석기시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련되었다. 신석기시대 문화를 형성한 주요 요인들로는 도구의 발전, 토기의 제작, 농경의 시작, 정착생활 등을 들 수 있다. 농경은 자연법칙을 더 한층 목적의식적으로 이용한 생산활동의 시작으로, 사회적 생산의 성장과 문화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큰 구실을 하였다.
농경으로 인해 불가피해진 정착생활은 문화 발전과 다양화에 큰 몫을 하였다. 안정된 생활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각종 형태의 토기는 당시 주민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정서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기술이 크게 발전했던 시기도 바로 이 신석기시대였다.
농경이 보습농사로 바뀌어가면서 남성이 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생산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생산도 증가했다. 분배에 있어서 남성이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점차 가부장적 씨족공동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문화 성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문화가 생산도구와 토기 제작을 중심으로 한 오랫동안의 여성 중심의 문화에서, 생산도구와 무기 제작을 주된 요소로 삼는 남성 중심의 문화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속기의 사용은 이를 더욱 촉진시켰고, 물질문화도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청동무기의 사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음식문화의 다양화는 그릇문화를 발전시켜 토기 제작을 더욱 다양화 시켰다.
토기에 각종 장식이 가해졌고, 사람의 모습을 주된 테마로 삼는 조형예술도 발전하였다. 오랫동안의 정착생활은 주거문화의 발전을 가져왔고, 돌무덤이라는 한국 원시문화 특유의 매장문화도 형성되었다.
한국문화의 형성기에 해당하는 원시공동체사회의 문화는 여성이 그 주체였다.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그 주체가 남성으로 옮겨지긴 했어도, 아직은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공동문화였고, 그 취향은 토기를 중심으로 한 여성문화였다.
아직 인간 사이의 갈등과 투쟁, 그에 따른 불평등을 반영한 문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인간활동의 기본전제가 되는 의식주문화는 안정을 이루었다. 이는 앞으로의 한국문화 전개에 있어서 정신적 · 물질적 기초가 되었다.
신석기시대 말기, 즉 원시공동체사회 말기에 이르러 사유재산이 출현했고 그로 인한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가 제기되었다. 고대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결정짓는 이른바 노예제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의 산물이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예 · 맥 · 한 종족집단들은 원시공동체사회 말기에 이르러 공동체적 경제형태를 청산하고 노예소유자적 경제형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사회경제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노예소유자 국가인 고조선 · 부여 · 진국이 형성되었다. 이 국가들은 물론 계급국가였다. 고조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첫 고대국가였다. 고조선 문화의 모습을 알려주는 유적과 유물은, 여러 가지 이설이 있긴 하지만,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무덤이라는 유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고조선의 문화는 우선 발전된 청동기문화였다. 다양한 형식과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독창적인 비파형 청동단검은 고조선의 청동기문화가 무기를 귀중하게 여겼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춘추전국시대라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다.
이 밖에도 장식품 · 생활용품 · 수레부속품 · 마구류 등은 실용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동시에 미술적 취향을 잘 드러내주는 공예품들이었다. 특히, 잔줄무늬거울과 같은 것은 당시의 높은 기하학적 도안법의 발전을 보여주는 걸작품이다.
고조선은 법률에 의해 유지된 국가였다. 그것은 노예소유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법률로, 고조선문화가 가지는 성격의 일면을 반영한다.
부여는 예의범절을 중시하며 깨끗한 것을 숭상하는 문화성격을 지녔던 국가로, 제천 등 종교의식문화도 발전하였다. 이러한 의식문화와 동반된 놀이문화 등 부여의 문화는 고구려에 직접 이어졌다.
또 주변의 예 · 옥저 등 여러 종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한족(韓族)으로 대표되는 진국의 문화는 금 · 은 · 철 등 금속문화 방면에서 잘 나타나며, 특히 이 문화는 일본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대규모 집단이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하여 문화의 직접 전파가 이루어졌다.
고대의 문화
한국의 고대는 보편적인 세계사의 발전법칙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고대사회는 아직 해결해야 할 학문적 문제들이 많긴 하지만, 노예제사회로 보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문화가 이 시기에 중국을 비롯한 오늘날 중국 동북부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수많은 종족들과 끊임없이 접촉한 결과로 나타난 사회경제형태이다.
고대 한국문화의 성격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문화의 폐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중국문화는 물론 북방의 문화요소들이 고조선이 남긴 각종 문물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는 문화의 종속성이 아니라 개방성이다. 민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적 관념이 나타나기 이전의 문화가 가지는 특성이라 하겠다.
그러면서도 그 개방성이 모방성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비파형 청동단검이나 돌무덤과 같은 군사문화와 매장문화는 다른 종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문화라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개방성과 전파성, 이것이 한국 고대문화가 가지는 특성이었다.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주된 위치를 차지했던 여성적 문화가 이 시기에 오면 보다 남성적인 취향의 문화 내지는 계급성을 반영한 문화로 전환되어간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어져오며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전통적인 여성취향의 문화는 장식예술과 각종 기물에 새겨진 문양들에 면면히 반영되고 있다.
삼국시대의 문화
문화의 개방성과 전파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고대의 문화는 고조선의 멸망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이는 중국민족이 진 · 한을 거쳐 통일되는 역사적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화이관념(華夷觀念)이 중국인에게 정착되고, 이 관념의 외연적 확대라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필연적으로 주변 민족들과의 투쟁을 초래했다. 그 결과 고조선이 내부 분열로 몰락했고, 고조선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한국 고대문화의 개방성과 전파성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고조선 말기 중국 한나라 상인과 관리들이 대거 고조선에 몰림으로써 풍속이 각박해지고, 그리하여 법조항이 8조에서 60여 조로 늘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뚜렷한 자기 판단 아래서 개방과 전파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던 문화의 특성이 변질되었음을 잘 말해준다.
삼국시대는 고조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개방과 전파라는 고대문화의 특성이 변화되어, 삼국 각자가 폐쇄적인 통로를 통해 문화를 수용하고 전파하는 문화의 분열시기였다. 이 시기의 폐쇄성은 조선시대의 문화가 가지는 폐쇄성과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삼국의 폐쇄성은 고조선 몰락 후 초래된 정치적 · 영토적 분리에서 오는 문화전파 통로의 폐쇄였지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적 문화 폐쇄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좀더 넓게 말하면 고조선이 몰락한 후 한국 고대문화를 삼국이 각자의 방향으로 재편성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결국 통일을 위한 과정이었다.
삼국의 문화적 특성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위에서 말한 안목으로 삼국의 문화를 본다면, 한국문화가 보다 다양해졌음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상호경쟁으로 문화발전은 한층 촉진되었다.
삼국시대의 문화는 문화의 주체가 여성 · 남성의 차원이 아닌 국가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빚어낸 결과였다. 신라 불교 수용과정이나, 고구려가 도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목적성도 당시의 문화전반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문화생산의 담당자와 민중이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또 문화생산의 담당자가 지배계층과도 신분적으로 분리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도 이 시기였다.
고대의 문화는 지배계층과 노예 내지 예속민이라는 극단적인 계급이 동시에 담당하였다. 다시 말해 문화활동에 대한 제한 내지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문화가 국가에 의해 주도되던 삼국시대에는 문화담당자가 신분적으로 일반 민중이나 지배계층과 구분되었다.
또 문화활동의 산물이 지배계층에 예속되어 민중의 생활과 유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문화담당자는 하나의 신분층으로 굳어졌다.
요컨대, 삼국시대는 삼국 각자의 폐쇄적인 문화수용 통로를 통해 주변문화를 현실적 요구에 맞게 경쟁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것을 점검해나가는 시기였다. 문화수용의 통로는 국가가 독점하여 폐쇄성을 띠었으나, 문화수용의 내용은 전과 별차이없이 개방적이었다. 이는 한국문화의 성숙기를 구가한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
삼국이 신라에 의해 통합된 시대를 흔히 통일신라시기라 부른다. 여기에 발해는 일찍부터 남북국시기의 북국으로 인정되어왔고, 최근 더욱 그 역사적 위치가 평가되고 있다.
이 양자의 문화를 함께 뭉뚱그려 개괄하기란 현재로서는 힘들다 그러나 한국문화가 이 시기에 와서 보다 성숙되었다는 점만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이민족에 의한 민족분단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시기의 문화는 신라나 발해가 모두 국제적인 성격의 중국 당문화(唐文化)를 한껏 받아들여 충분히 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당문화가 수용되었던 것은 두 나라가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달리 찾을 수 있다. 신라는 삼국을 통합할 때 당이라는 거대한 외세의 힘을 빌렸다는 측면에서 당문화의 세례를 면하기 어려웠다. 특히 지배계층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발해는 문화적인 수준이 크게 뒤떨어지는 다수의 말갈민을 통합해 세운 나라였고, 또 초기에는 신라와 대립되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의 문화가 절실했던 것도 당연했다. 물론 신라나 발해 모두가 현실적인 대외관계라는 측면에서도 당과의 관계 유지는 필연적이었다.
통일신라의 문화는 크게 보아 특정 신분에 의해 독점되었다. 골품제라는 특유의 신분체계는 몇 차례의 개혁시도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 전시기를 통해 굳건히 유지되었다. 거의 모든 분야의 문화는 이 골품제의 최고자리를 차지한 성골과 진골 귀족에 의해 독점되었다. 찬란한 황금문화를 비롯한 거대한 고분문화, 그리고 찬란한 장식미술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삼국통합기에 보여준 건강한 불교정신은 통일 후 왕권과 골품귀족들의 특권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반동화했다. 이는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이라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상의 유입으로 귀착되었다.
흔히 혼란한 통일신라 말기에 새로운 지도이념으로서 사상과 문화 및 정치체제를 수용했다고 하는 6두품 계급의 현실인식도 개인주의적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신라 말기의 보잘 것 없는 문화적인 면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진성여왕대를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는 다음 시대의 문화질서 개편방향에 적지 않은 자극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가 지배계급에 의해 독점되었다는 점에서는 발해도 마찬가지였다. 고분문화 및 불교문화로 대표되는 발해의 문화에는 성숙한 당문화의 요소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 다만 과거 고구려의 강인한 문화의 단면이 끊기지 않고 계승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문화의 독점은 발해국의 주민구성상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발해가 별다른 이유없이 문화적으로 열등했던 거란에 의해 멸망되었다는 사실은, 문화의 수용과 분배가 자기철학 없이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의 문화수용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신라는 국제적인 성격의 성당문화(盛唐文化)를 보다 넓어진 영토와 증가된 인구를 다스리는 데 활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족적 성격이 강한 골품제를 개편하지 못해 그 문화를 주로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적용하고 말았다.
통일신라의 문화는 귀족적 취향의 성숙된 면이 구석구석에서 묻어나오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자에 맞게 형성했던 삼국시기의 문화적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성과 전체성을 모색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말갈인을 다스려야 했던 발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통일신라 말기가 철저하게 힘에 의해 재편될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해 그 어떤 사상과 종교도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나, 발해가 거란의 군사력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던 사실에서 이 시기 문화의 한계점이 드러난다.
아울러 이 시기는 한국문화가 전개되는 무대가 한반도로 좁혀지는 시기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향후 한국문화가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도 문화영역의 축소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려의 문화
고려의 문화가 비교적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게 된 데에는 전 시대의 문화가 보여준 사회적 역할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고려시대의 문화가 여러 방향에서 한국문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라의 골품제적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탓으로 무신집권기라는 정치적 암흑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한국문화의 긴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이 정치적 암흑기가 문화적 암흑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신집권기와 그 뒤의 문화적 성격은 대몽항쟁기와 몽고의 간섭기를 함께 고려한다면, 한국사의 전개와 함께 입체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다른 민족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이 아닌 강제적 이식이 행해진 시기의 문화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자유분방하다 할 수 있는 고려문화의 발전과정 속에서 이러한 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려시대를 흔히 귀족의 시대라 부르지만, 고려시대의 문화도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신집권기의 문화와 몽고간섭기의 문화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조선시대의 문화를 평민적이라 부를 수 있는 그 근원은 여기에서 찾아진다.
고려시대 문화의 특성을 한국문화의 발전과정 속에서 이해하려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고려 말에 수용된 성리학이다. 성리학은 조선 건국의 이념적 · 철학적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지만, 한국문화 전개과정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려왕조는 이 새로운 이념체계를 자기화하지 못하고 몰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념은 조선시대 양반층의 형성이라는 한국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고려시대 문화의 특성 이면에는 문화의 자기체질화라는 면이 결여되어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는 불교가 그 자체의 폭 넓고도 깊이 있는 문화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사실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조선의 문화
성리학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성향이 강하며 또한 배타적이다. 주자학, 즉 성리학이 형성된 남송대의 역사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성리학의 이 같은 성격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의 이념으로 자리잡은 그와 같은 성격이 한국성리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느냐는 좀더 논해야 할 문제이지만, 조선의 역사전개와 조선시대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조선의 지배계층인 양반들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는 성리학이 시대와 민중을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른바 실학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 문화적 운동이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던 것도 배타적인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성리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임진왜란 후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 다시 말해 역사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엄연한 결과였다. 병자호란과 물리적 힘에 의한 개항 및 일제의 침략도 모두 여기에 기인하는 바 크다.
조선시대의 문화는 고대나 삼국시대의 개방성, 통일신라시대의 성숙함, 고려시대의 자유분방함 등 앞선 시대의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질식당한 시대였다.
그러나 그 숨막힐듯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폭넓은 정치적 자각을 자극했다. 넓어진 지배계층과 한정된 관직이라는 현실이 빚어낸 정치문화, 그 정치문화가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민중의 자각, 그리고 싹트는 민중의 문화 등 실로 조선시대는 한국문화의 전개과정에서 민중문화를 배태시킨 시기였다.
한국의 문화 개관
한국의 사상과 종교
한국인은 고유의 언어로 사고하고 살아가는 몇 안 되는 민족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주체적이고도 독창적인 철학체계가 가능하였다.
먼저 한국사상의 두드러진 특색으로는 종합지향성을 들 수 있다. 한국사는 외래사상의 수용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도국가의 특징을 살려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종합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성장한 위대한 종교가들은 하나같이 삼교합일을 강조하였다. 최치원(崔致遠)의 난랑비(鸞郎碑) 서문, 유교 · 불교 · 도교에서 각기 자파인물로 기록했던 김시습(金時習)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휴정(休靜)은 『삼가귀감(三家龜鑑)』을 저술해 상이하게 이해되었던 삼교의 공통분모를 모색하였다. 기화(己和)의 『현정론(顯正論)』에서도 거의 동일한 인식방법이 보인다.
한국 신종교의 창교주들은 한결같이 삼교의 회통 속에서 각기 그들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최제우(崔濟愚) · 강일순(姜一淳) · 소태산 등이 좋은 예이다.
수행의 방법론에서도 특정 측면만을 고집하지 않고 종합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의천(義天)이 교관병수(敎觀並修)를 주장하고 지눌(知訥)이 정혜쌍수(定慧雙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한 것이 그 예이다.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방식도 한국인에게는 일상적이었다. 모든 사물을 상호관련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 통(通)의 논리, 원효의 진속일여(眞俗一如)의 대중불교운동과 정토종(淨土宗: 극락왕생의 희망을 서민들에게 불어 넣어줌.)을 제창한 무애행(無碍行)이 대표적이다. 이를 특별히 한사상이라고 명명한다면, 한사상의 특색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물건이 바로 핫바지와 엽전이다.
종전에는 비과학적 · 비합리적 · 무분별적이라고 하여 비하의 표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구별과 분리가 아닌 통철학적(通哲學的)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한국인의 자랑스런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다.
3차원적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적합한 입체적인 구조를 지닌 한복, 그리고 앞뒤의 구별과 대립이 지양된 엽전이 표상하는 한사상은 한국인의 마음구조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종합성을 강조하는 한사상은 홀로그래피(holography)의 발견, 홀론(holon)혁명의 도래, 현대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들에 의해 그 사유체계의 우수성을 증명받고 있다. 여기서 ‘한’이라는 한마디 말은 하나(一) · 여럿(多) · 가운데(中) · 같음(同) · 얼마쯤(或) 등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사물을 항상 복합적이고 유기체적인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고 전체가 곧 부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전체적 연관성에서 사물을 볼 수 있었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몸과 마음도 분리하지 않고 연관적으로 이해해 한의학(韓醫學)을 발전시켰다. 또한 우리네 조상들은 자연과의 분리가 아니라 총체적 합일을 강조한 풍수도참설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한의 논리를 대표하는 철학으로는 승랑(僧朗)의 「이체합명론(二諦合明論)」의 비비무비비유(非非無非非有)의 개념과 의상(義相)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의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 이이(李珥)의 묘합논리(妙合論理), 즉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과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 그리고 『천부경(天符經)』에서의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一始無始一 一終無終一)의 세계관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관련지어 한국사상의 한국적인 양식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보적이면서도 대립적인 짝의 개념으로 사물을 인식하려는 입장이다.
원효의 개(開)와 합(合), 그리고 종(宗)과 요(要)의 논리구조, 지눌에 있어서 정(定)과 혜(慧)의 관계, 유교에서의 성(誠)과 명(明), 이와 함께 체(體)와 용(用)의 이해방식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경(敬)의 세계, 동학에서 자신의 한 마음을 정해 만사를 아는 신(信)의 상태 등이 두드러진 예증들이다.
이른바 단순하고 일면적인 대립과 상보를 넘어서서 다차원적인 상호관련성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짝의 논리구조가 한국사상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즉 종합한 후 새로운 창조를 모색한 것이 한사상이다. 갖은 나물들이 각기 고유한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순한 혼합이 아닌 발전적 합침을 이루는 비빔밥의 독특한 맛에 비견될 수 있으리라.
나아가 한국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한다는 것이 특색이다. 한국인 고유의 신명사상(神明思想), 신인합발(神人合發), 신과 인간이 함께 새 역사창조의 역사(役事)에 참여한다는 강증산의 조화정부(造化政府) 개념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한국사상의 종합지향성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론화 · 논리화가 부족하고,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이해해 혼란을 빚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의 해결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한국사상의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중심적 성향이다. 단군신화에서 나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사유구조는 초월적 존재라도 인간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세상 안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 밖의 신화에서도 하늘에 관한 이야기보다 지상의 이야기가 많다. 시조설화와 건국신화들의 주된 내용은 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살고 인간과 결합해 신인(神人)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한국유학의 사단칠정(四端七情) ·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쟁 등은 결국 인간심성의 규명에 있었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 인내천(人乃天) · 향아설위(向我設位)와 증산교의 인존사상(人存思想) 등에서는 진정한 인본주의를 제창해 인간의 존엄성을 극명하게 강조하였다.
한국사상의 특성으로 현세중심적 경향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불교신앙 가운데 미륵신앙이 많이 신봉되었다. 미륵은 바로 행동하는 부처요, 서서 인간을 구원하는 부처이며, 지상의 중생을 빠짐없이 구원할 것을 서원한 현세적 부처인 것이다. 그리고 후천개벽설은 한국 신종교의 이상세계관으로 지상천국 건설이 목표이다.
한국인은 현세적 복락에 관심이 무척 많아서 살아서 잘 되자는 입장을 취한다. 현세적 생의 풍요를 바라며, 지상에서 못 다한 욕망이 있으면 죽어서도 귀신이 현세를 떠나지 못하고 연연해 한다고 믿는다.
현세적인 맹목적 욕망충족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조화를 모색하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상의 현세적 집약으로서의 현세중심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사상의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조화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원효의 화쟁론(和諍論)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한국사상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다. 이단배척의 형태로 나타나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강하고, 타협과 대화의 모색이 부족하고, 가변적 신축성이 약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국사상의 부정적 기능과 그 비판에 대한 대처는 한국인들이 향후 계발시켜 나가야 할 과업으로 남겨진다.
한국의 종교현황을 1985년 경제기획원의 인구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당시 전국인구(4,041만 9,652명)의 42.6%(1,720만 3,296명)가 종교인구였다고 한다. 총 종교인구 중 불교는 46.8%, 개신교 37.7%, 천주교 10.8%, 유교 2.8%, 원불교 0.5%, 천도교 0.2%, 대종교 0.1%, 기타 1%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은 일반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 여러종교들이 별반 갈등없이 잘 유지해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종교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종교들이 상호 반목하고 대결해 처참한 전쟁으로 돌입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대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신기할 정도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한국의 공휴일에는 유달리 종교적인 공휴일이 많다. 예수탄신일 · 석가탄신일 · 개천절 · 추석(조상제사) · 민속의 날(제사 · 신년의례) 등이 그것이다. 상이한 종교적 공휴일을 한국인들은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자연스레 소화시키면서 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독특한 사상적 ·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온갖 사상과 가치체계가 함께 녹아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인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념을 달리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어서 이념통일의 최후 보루이자 문제 해결의 해답이 얻어질 마지막 희망이 기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다양한 해결방법들이 끊임없이 모색되는 시험장이어서, 세계의 갖가지 문제들이 농축되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답이 있다. 한국에서의 문제는 세계사에서 나타난 고민들이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바로 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나는 이 땅에서 그 답이 찾아져야 한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고, 역동적인 가치체계들이 살아 움직이는 총체적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이하다. 앞으로 해결의 열쇠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들이 해 나가야 할 시대적 숙제로 남아 있다. 다각적으로 폭넓은 가치체계들을 섭취하면서 문제 해결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학
한국문학을 한국문화와 관련지어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 그 흐름을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기는 상고에서 삼국통일 이전으로, 제2기는 삼국통일 이후부터 12세기 말 고려 무신란까지로, 제3기는 13세기부터 조선 후기 영 · 정조시대까지로, 제4기는 영 · 정조시대 이후부터 현대까지로 나눌 수 있다.
2.2.1. 제1기
한국문학은 부여와 삼한에서 행해진 제천의식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현전하는 고대문학작품은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황조가(黃鳥歌)」 · 「구지가(龜旨歌)」 등이다. 「공무도하가」와 「황조가」는 사언사구(四言四句)의 한문체 고시이다.
이 시대에는 중국의 난만한 한문문화와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해, 수입된 한문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한문이 사용되면서 비로소 기록문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삼국유사』 등에 산견되는 자료를 모으면, 한국인들도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문화를 이룩하려고 애쓴 흔적이 단군신화를 비롯해 주몽신화 · 박혁거세신화 · 수로왕신화 등의 고대건국신화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가운데 단군신화는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을 신화적 사유의 형태로 잘 드러내고 있다.
「공무도하가」나 「황조가」 · 「구지가」 등은 고대 한국인이 자신들의 감정을 중국 『시경(詩經)』의 형식을 빌려 표현한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힘이 증대하면서 향찰(鄕札)처럼 한자를 빌려서 한문과 다른 형태로 한국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선진문화인 중국문화를 한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 창작된 노래는 대개 익명이거나 집단의 창작형태로 나타났다. 집단의 노래는 고대인의 무의식적인 갈망을 승화시켜놓기도 하였다. 「공무도하가」는 죽음을, 「황조가」는 님을 그리는 마음을, 「구지가」는 풍요한 생산을 기원하는 고대인의 열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건국신화에서 보여준 신화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가치관의 전반적인 혼란이 은연 중 드러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불교가 전파되면서 불교적인 색채를 띤 노래가 생겨났는데, 「풍요(風謠)」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노래는 여러 형태의 의식노래의 면모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 「도솔가」는 그러한 노래가 잘 정제된 양식이다. 노래의 가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한 것은 고대인의 발상이지만, 「해가(海歌)」에서처럼 국가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래는 재앙을 막거나 쫓는 주술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2.2.2. 제2기
신라의 삼국통일은 이후 한국문화의 전개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어가 경주어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중세국어의 저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고구려나 백제계통의 문화는 신라문화 속에 흡수되거나 인멸되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향찰로 표기된 사뇌가(詞腦歌)의 등장이다. 사뇌가는 향가의 하위 갈래로서, 경주 근처 사뇌야(詞腦野)에서 발생해 통일신라 이후 민요와 구별되는 대표적인 노래형태로 정착하였다.
이 노래는 10행으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대개 범창(梵唱) · 불곡(佛曲) · 한찬(漢讚) 등의 영향으로 불교적 색채가 짙다. 신분적 차별 때문에 문제되는 피지배층의 사회적 통합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불교적 이념화가 적극 필요하였던 까닭이다.
사뇌가가 창작되고 불리고 있을 때에도 6세기 말 「혜성가(彗星歌)」 등의 노래에서 주술적인 힘을 기대하고 있는 흔적이 엿보였다. 동시에 「안민가(安民歌)」에서처럼 유교적 사유와 이념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충담사의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에서는 이상을 추구하는 신라인의 전형을 그려내기도 하였다.
사뇌가의 마지막 마무리는 고려에 와서 균여(均如)가 담당하였다.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는 11수의 사뇌가를 모은 것으로서 형식에 있어서 훨씬 정제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리된 관념의 세계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 달 · 나무 · 구름 등의 비유대상은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였다. 그것은 곧 인간의 한 부분이면서, 믿음이나 의지에 의해 초월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설화에서는 불교설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한편, 「연오랑과 세오녀」 등 상층 지배계급과 하층 피지배계급의 관계가 폭넓게 다루어졌다. 호국불교로 숭앙된 불교와 함께 들어온 유교는 육두품출신의 지식인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엄격한 골품제도에 얽매인 이들은 신분의 불평등을 선험적 사실로 인식시키는 불교보다는 유교의 현세중심의 사유에 훨씬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신라의 지배층에서는 이들의 불만을 제도적으로 해소시키지 못하였다. 결국 유교적 지식인의 전형인 최치원 등의 방외인이 출현하게 되었다.
최치원은 당대의 고뇌를 적극적으로 타개하지 못하고 사뇌가에 상응하는 한문문학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육두품 출신들은 실용적인 문학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한편, 한시를 통해 내면세계를 구현해 나갔다.
이 시기의 문학은 향찰로 표기된 사뇌가가 공식 문학의 자리를 차지했고, 한문문학은 체제지향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사뇌가류에 비해 비공식 문화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한문 표기의 문학은 서서히 공식적인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고, 한문 위주의 사고양식은 유교이념을 정착시키는 토양이 되었다.
2.2.3. 제3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지식인들이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기 시작하자, 이 시기에 발달한 인쇄술의 발명 등으로 구비문학과 다른 본격적인 기록문학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다. 사대부들은 공식적인 문화의 기준으로 유교이념을 내세웠다.
그러나 12세기 무렵의 사상적 동향은 아직까지 불교적 사유의 두터운 저층을 대치하지 못하고 불교와 유교의 이념 사이를 방황하였다. 13세기에 들어서서 신흥사대부들이 개척한 「한림별곡」류의 경기체가와 「청산별곡」 계열의 속요는 그러한 정신의 소산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교적 이념을 문화의 척도로 내세우려는 시도는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등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사대부들에게 문학은 우주 자연의 원리와 같은 글(三才之文)로서 이해되었다.
객관적 사물의 세계를 중시하면서, 한편으로 도의의 근거를 문학을 통해 이루려고 하였다. 경기체가는 악장과 가사로 발전되었고 시조라는 새로운 문학의 갈래가 만들어졌다.
불교나 도교의 무의식적 교양이 저층으로 침전되어가면서 따라 유교적 관념체계인 성리학이 지배이념으로 부상해 문학이론에 있어서도 재도론(載道論)이 등장하였다. 재도론은 문학의 심미성보다 도덕성을 중시해 비유교적 이념을 배제하는 구실을 수행해서 일찍이 유례가 없는 문학의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남녀간의 애정이나 초월적 세계로의 지향과 같은 문학의 주제는 군주에 대한 충성 등 유교적 이념 속으로 수렴되었다. 모국어로 불린 고려속요 등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유교적 규범에 구속되었다. 노골적인 애정표현은 절제되었고 모국어 노래말 속에 한문가사가 삽입되기도 하였다. 「처용가」 · 「정석가」 · 「만전춘」 등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유교문화의 절정기인 15세기에는 한문학이 전성기를 맞이해 그 수준이 중국과 대등한 정도임을 서거정(徐居正)의 『동문선』이 대외에 입증하였다. 유교문화의 정착이라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모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자, 유교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배태하게 되었다.
구전되어오던 수많은 구비문학을 문자로 정착하게 되어 저층의 문화를 기록문학의 본격적인 궤도로 끌어올렸다. 사대부는 하층민에게서 골계담을, 하층민은 사대부에게서 도덕적 교훈의 주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유교문화에서 소외되었던 부녀자나 하층인들에게도 의사표현의 창구를 열어 놓아서, 결국 한문으로 대표되는 유교문화의 숨은 모순을 드러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진정한 이상향의 제시나, 유교적 이념의 허구에 대한 대담한 비판으로 발전해 소설이라는 새로운 갈래를 낳았다. 허균의 「홍길동전」이 바로 좋은 예이다. 국문소설은 17세기 이후에 새로운 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해 문학의 전반적인 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소설의 등장은 산문으로 된 서사문학의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쉽게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유로 상품화되어 널리 유통하게 되었다.
유교적 문화가 지배적 이념으로 변해가는 13, 14세기경에 이규보(李奎報) · 이제현(李齊賢) · 서거정 등의 한문학 대가가 나타난 것처럼, 16, 17세기경에는 한글문학의 대가들이 줄지어 등장하였다. 황진이(黃眞伊) · 정철(鄭澈) · 박인로(朴仁老) · 윤선도(尹善道) · 김만중(金萬重)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 중 정철과 김만중은 각기 가사와 소설에서, 유교적 세계의 모순을 도교적 세계에 가탁해 해결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보여준다. 김만중은 「사씨남정기」에서 처첩의 갈등에 대한 이해를 관념적으로 보여주었고 「구운몽」에서는 유교적 이념의 모순을 불교적 이념과 절충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대부로서 부귀영화에 대한 기득권을 긍정하려고 하는 당대의식을 노출하였다.
이에 비해 윤선도는 유교이념을 신봉하는 사대부로서의 절조를 간결한 모국어로 표현함으로써 시조문학의 정상에 자리하였다. 그의 문학은 입신양명한 사대부의 방종이나 하층인들의 절실한 삶의 고통을 배제하고, 고도의 간결성을 형상화하였다.
2.2.4. 제4기
유교적 이념은 임진왜란 이후 한국사회의 저층에 지배문화로서 완전히 정착하였다. 그러나 현실과 이념 간의 모순은 기생 · 서자 · 잔반 · 상인 · 농민 등 하층민의 삶과 괴리되어 결국 이들에 의해 사대부계층의 지배문화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한시의 격조가 파괴되고, 단시조와 다른 사설시조가 별도로 나타나서 시가문학이 전면적으로 변화할 뿐 아니라, 고문(古文)이 파괴되어 문체반정론(文體反正論)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구비문학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탈춤과 판소리 등 연행문학이 활발하였다. 탈춤의 기원은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도시에 기반을 두고 대규모로 성장하고 주제도 더욱 뚜렷해졌다.
18, 19세기에 이르러 전주나 안성 등지에서 방각본출판이 성행해 문학작품이 상품화되고, 직업적인 이야기꾼이 등장해 독자와 작자로 연결되는 문학의 유통체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지배층의 유교문화가 변화된 시대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하층인들을 상대로 하는 국문문학이 생산성과 자율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현실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상층문화와 하층문화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여성적인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 애정소설, 가문소설, 여성계 영웅소설 등의 범람이 이를 대변하였다.
서양문물의 유입과 천주교의 전파로부터 시작된 서양문화의 침투는 유교사회의 모순을 체득하되 논리적 근거를 찾지 못한 중인계층과 하층민에게 적극 환영받았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따라 한문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하고, 서양문체의 영향을 받아 섬세한 표현법을 익히게 되어 문학언어로서의 공고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인쇄기술의 도입으로 문학작품의 대중적 보급이 용이하게 되어 개화기문학의 토양이 되었고, 일부 자각한 민중은 동학 등 민중종교에 경도되었다. 특히, 최제우의 『용담유사』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하층민의 각성이나 시민의 성장이 가시화되어, 「칼노래」와 같이 유교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운동이 문학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인쇄술의 발달은 신문 등을 통해 식자층을 확대시켜 문학작품은 상품화되어 전문적인 문인이 생겨났다. 감정을 표현하는 운문으로 쓰여진 문체가 산문으로 바뀌어 현실세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을 얻었다.
이 시기에는 한문학이 문학의 판도에서 밀려났다. 이광수(李光洙) · 김동인(金東仁) · 염상섭(廉相涉) 등 국문소설가의 노력이 언문일치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노력은 시가문학에서도 활발해 김소월(金素月) · 한용운(韓龍雲) 등은 전통적 서정을 모국어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판소리계소설과 신소설에서 나타나 전통사상과 외래사상의 대립이라는 이중적 문화구조에 대한 무자각적 비판과 해석은 곧 한계를 가져왔다. 이광수의 경우는 ‘민족개조론’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서 문학의 자율성을 배반하고 유교적 이념으로 복귀하였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문학론 또는 일본제국주의의 국책문학론으로 흡수되었다.
최남선(崔南善)과 이광수 등 개화기 문학가들이 문화의 이중구조가 주는 모순성을 인지하지 못해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이용되자, 결국 신채호(申采浩)의 문학무용론 내지 유효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李箱)은 신채호와 다른 각도에서 문화적 주체의 상실을 「오감도(烏瞰圖)」와 「날개」를 통해 고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채만식(蔡萬植)은 판소리계소설의 이중구조에 착안해 풍자적 수법으로 식민지상황을 희화하였다.
광복 후의 문학은 일제의 검열을 받지 않음에 따라 비로소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좌 · 우익의 대립으로 문단이 분열되고, 마침내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적 정리와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 있기 전에 6 · 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발해 문학의 주제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로 전이되었다.
김동리(金東里) · 황순원(黃順元) 등에 의해 실존주의문학이 일어났고, 최인훈(崔仁勳)의 <광장>에 의해 이념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존재가 문제시되었다.
개인적인 경험의 틀 속에서 사회적 혼란과 모순을 인지하고 비판하려는 이러한 지적인 노력은 민주주의의 이면에 있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직시하게 되었다. 김정한(金廷漢)은 <인간단지>에서 경제정책의 폐단으로 사회문제화된 소외계층을 부각시켰다.
한편, 민족문학의 건설과 민족어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과제는 신경림(申庚林)의 민요시운동으로 접맥되고, 김지하(金芝河)의 경우는 담시(譚詩)라는 전통적 문학양식의 재발견으로 사회현실의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한국문학은 현대문명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분단문학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결국 전통문화의 정리와 외래문화의 비판 위에 기층문화를 확대하는 자리에 문학의 위상이 놓여 있고,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학이 가지는 소임이 성실히 수행될 것이다.
한국의 민속신앙
한국은 고대의 삼국시대부터 이미 왕과 귀족, 평민과 노비로 상하의 위계질서가 규정된 신분제사회였다. 이와 같은 신분제사회에서는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신분에 따른 가옥 · 의복 · 생활용품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제도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제는 시대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기도 했으나, 고려시대는 비교적 그 규제가 심하지 않아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도 귀족과 같은 의 · 식 · 주 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모든 기능인들을 관청에 소속시키고 능력에 따라 관직도 주었으며, 이에 따른 급료도 지불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장인들은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수요자의 기호에 맞추어 공예품의 제작에 전념할 수 있었다.
왕실의 보호를 받았던 불교사원에서도 노비를 거느리고 많은 전답을 소유해 양민(良民)을 공호(貢戶)로 삼아 각종 수공업을 일으켜 사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잉여품을 판매해 수익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에는 청자를 비롯한 나전칠기 · 청동은입사 제품 등 우수한 공예품이 양산되었고 귀족공예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공예품의 수요자는 왕실, 왕실의 보호를 받았던 사원의 승려, 지배계층이었던 귀족,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일부 상인들이었다.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유교를 통치이념과 도덕적 규범으로 삼았다. 사회의 지배계급인 양반들도 유교의 근검절약한 생활태도로 새국가 건설의욕에 불탔으며, 학문과 예술의 각 분야에 걸쳐 건전한 새탐구활동의 기틀을 잡았다.
조선시대의 공업은 가내부업으로서의 수공업이 존재했을 뿐이다. 전문적인 공장(工匠)은 모두 각 관청에 소속시켜 지배계급의 위의를 갖추기 위한 장식품을 만드는 데 종사하도록 해 관청의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였다. 장인들의 신분은 천민, 거란 · 여진 등에서 귀화한 집단부족, 관노(官奴) · 사노(寺奴) 등으로 구성되었다.
장인들은 관청에 속했을지라도 여전히 하층민이었고,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관직을 가지지 못했고 보수도 없었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공장세(工匠稅)를 납부하였다. 즉 이들은 노예노동 형태로 고용되었다.
그러므로 장인들은 자의적인 창작활동을 못 했으며, 양반계층의 주문제작에 응할 뿐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민중산업이 발전될 수 없었다. 관에 소속된 장인들 중 결원이 생기면 중앙관서 소속의 노비나 지방에서 선발된 노비들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했으나, 과중한 노역과 잡부금을 피하기 위해 변방으로 도망하는 장인이 생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세종 때에는 일부 양인(良人)으로 결원을 보충하기에 이르렀다. 점차 양인의 수효가 늘게 되면서도 장인들은 노예노동 형태에서 어느 정도 향상된 지위를 얻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인 양반들은 유교의 검소한 생활철학에 따라 근검절약했으며, 생활용품들도 사치하고 화려한 것은 피하고, 값싼 재료를 사용한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기물을 애용하였다.
조선시대의 생활용품들은 고려시대의 완벽하며 정교한 아름다움을 지닌 공예품들에 비해 기교면에서 뒤떨어지나, 대신 검소하고 세련된 멋을 지니게 되었다. 양반계층의 이러한 취향은 서민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실제로 청렴결백한 양반과 일반대중들의 생활기물들은 재료나 형태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신분에 따른 각종 규제가 있었고 그 시행은 과거의 어떤 왕조보다 엄격하였다. 규제내용은 가옥(대지 및 주택의 규모와 높이) · 금은주옥(金銀珠玉) · 금수능라(錦繡綾羅) · 주칠(朱漆)의 사용금지 등 사치품에 한하고 있었다.
17세기에는 임진왜란 · 병자호란의 두 차례 전란을 극복하면서 현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 경제 · 군사 등 여러 면에서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새로운 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한 실학이 일어나고 서민들의 자각이 커져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 금속화폐의 유통보급, 대외무역의 활발한 전개 등 자유상업이 발달하면서 관청수공업의 해체가 촉진되고 민간수공업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결과 18세기경에 장인은 물론 가내 수공업자들은 개량된 도구와 향상된 기술로 각종 기물을 양산해 사회각층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오랜 세월의 통치이념이었던 유교적 기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으나, 서서히 근대사회로 지향하는 데 기여하였다.
19세기의 순조 · 철종대에는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로 왕권은 약화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매관매직이 공공연히 행해졌다. 양반사회의 기반은 흔들리고 곳곳에서 민란이 발생해 조선의 전통사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신분에 따른 각종 규제는 폐지되었다. 그렇다고 이 때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온 것은 아니었다.
서민 대중들이 즐기던 세시풍속 · 민속공예 · 전통생활양식 등은 1910년의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급격히 밀려온 서구문화의 영향과 산업의 발달로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점차 전환되어갔다.
주택양식도 전통한옥에서 양옥집 · 고층아파트로 변모되어 갔고 농촌의 초가지붕도 주택개량사업이라는 정책 아래 모두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면서 의 · 식 · 주 생활의 양식은 서구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루면서 모든 전통의 맥은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가에서는 전통예술 94종목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그 중 전통기능보유 분야는 30종목으로 정하고, 이들 기능보유자를 보조금의 지급, 전수생의 육성, 제작품에 대한 판로 알선 등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1980년대 이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전통문화 보호정책에 힘입어 조상들의 숨결이 밴 전통문화가 점차 한국인의 의식생활 저변에 확산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신석기시대 이래로 농경국가였으며 그 전통은 1950년대까지 이어져왔다. 한국은 샤머니즘 분포권에 위치하였다. 청동기시대의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 · 팔주령(八珠鈴) · 세형동검(細形銅劍)들은, 요즘도 무당들이 사용하는 명두(明斗:巫靈의 상징물로서 직경 20㎝ 내외의 원형 놋제품)방울, 신칼들과 같은 종류로서 유구한 한국무속의 원형을 보여준다.
삼국시대에 도입된 불교는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호국불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융성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민간신앙으로 고구려의 동맹(東盟: 10월에 지낸 제천의식)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국가적인 행사로서 팔관회(八關會: 11월에 행하며 天靈 · 五岳 · 山川 · 龍神을 섬김.)가 거행되었다. 이러한 자연숭배의 민간신앙 위에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도교(道敎)의 방술(方術)은 민간신앙과 습합되어 민중들 사이에 깊게 자리잡았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국가 제의를 폐지하고 불교와 민간신앙들을 억압하고 유교의례만을 내세웠다. 엄격한 유교의례는 지배계층의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일반서민과 부녀자층에는 손쉽게 접근해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구할 수 있는 민간신앙이 깊게 침투되었다.
이러한 민간신앙은 조선시대 동제(洞祭)의 원류가 되었으며, 세시풍속 · 생활용품 · 복식 등에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정초의 줄다리기, 달맞이, 영등제, 볏가리, 집안에 모시는 조상단지, 삼신신앙 등은 짚을 이용해 재앙을 막고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신앙행위가 곁들여진 세시풍속이다.
정초에 닭그림이나 호랑이그림을 벽에 붙이는 것, 호랑이를 수놓은 어린아이의 굴레[방한모의 일종]나 복건, 호랑이 발톱으로 만든 노리개, 시집가는 새색시의 가마 위에 덮는 호피[호랑이 껍질] 또는 호랑이 담요, 또 종기 · 연주창 · 말라리아와 같은 당시의 의술로 치료가 힘든 병의 환부에 호랑이 그림을 붙이는 것 등은 모두가 벽사를 위한 민간신앙 행위이다.
새색시의 베개에 수놓은 원앙은 부부의 화합을, 혼례의식 때 둘러치는 모란병풍은 부귀를, 가구의 금속장식에 나타난 박쥐와 조바위[부녀자의 모자 일종]에 찍은 박쥐무늬는 복을 염원하는 기복부(祈福符)와 같은 것으로서, 이 역시 그 근원은 민간신앙에서 왔다.
요즘도 일부 사람들은 삼재(三災: 물 · 불 · 바람의 세가지 재앙, 또는 난리 · 병 · 기근의 불길한 운세를 뜻하며 평생동안 12년을 주기로 생성되어 3년 동안 머물다가 나간다고 함.)가 들면 머리가 셋 달린 매 그림을 벽에 붙인다. 입학시험의 합격을 빌기 위해 소원성취부를 지니고, 호신(護身)을 위해서는 동자 · 십이지 · 불상부적 등을 몸에 지니는 것은 한국민족의 내면 깊이 뿌리내린 민간신앙에서 기인하고 있다.
장[간장]의 맛이 변하면 집안에 흉사가 난다고 믿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장독에도 금줄을 치고 집안의 번영을 상징하는 버선을 종이로 오려 붙였다.
남자아이의 나이가 10세, 여자는 11세에 제웅직성[직성이란 사람의 행년을 따라 그의 운명을 맞는 별인데 제웅직성을 비롯해 土 · 水 · 金 · 日 · 火 · 計都 · 月 · 木의 아홉개 직성이 있다. 이 중 제웅직성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이 들면 짚으로 제웅을 만들고, 제웅에 그 아이의 옷을 입히고 제웅의 머리에는 동전을 넣은 뒤 아이의 성명과 출생년의 간지를 적어 음력 1월 14일 저녁에 길가에 버려 그 해의 액을 막는다. 이러한 풍습은 1960년대까지 서울에서도 일부 행해지고 있었으며 지방에 따라서 최근까지 행해지는 곳도 있다.
남자아이 12세에는 수직성(水直星)이 들고, 13세에는 일직성(日直星), 15세에는 월직성(月直星)이 명궁(命宮)에 들며, 이러한 사람은 모두 재액을 만난다고 믿어 종이로 해와 달의 모양을 오려 나무에 끼워 지붕의 용마루에 꽂았다.
제웅은 신라 헌강왕 때의 처용에서 유래하였다. 짚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든 것이며, 제웅직성이 든 사람 또는 앓는 사람을 위해 길가에 대신 버려져 액을 막는 주술 인형이다.
어린아이의 놀이나 노리개에서도 민간신앙의 벽사기능이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겨울이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호로(胡蘆) 세개[청 · 홍 · 황의 3색으로 칠한다.]를 채색끈으로 엮어 옷에 달아준다. 이것을 정월보름전날밤에 몰래 버림으로써 액을 막았다.
정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연날리기를 한다. 대보름날이면 연에 액(厄)자를 쓰거나 송액(送厄), 송액영복(送厄迎福), 식구의 이름 · 나이 등을 적어 날리다가 저녁 무렵에 줄을 끊어버림으로써 그 해의 모든 재액을 연과 함께 멀리 보냈다.
민간신앙 행위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을 위해 행하기도 하였다. 정월보름날 아침 해뜨기 전에 동쪽으로 뻗은 나뭇가지를 꺾어 둥글게 엮어 개의 목에 걸어주며, 왼새끼[짚을 왼쪽으로 꼰 새끼줄]를 소의 목에 걸어주면 그 해에 개와 소는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월 보름 또는 정월 2 · 3일경에 시골에서는 장승을 세우기 위한 장승제를 지낸다[지역에 따라 10월 초순에 행하는 곳도 있다.] 아침 일찍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와서 장승을 깎기 시작한다. 보통 오후 2∼3시경이면 장승이 완성되며, 완성된 장승을 동네 어귀로 옮겨 세울 준비를 한다. 이 때 농기를 맨 앞에 세우고, 농기의 뒤로는 장승을 진 짐꾼[동네사람]이 따르며 그 뒤로 농악이 따른다. 4∼5시경에 장승세우는 일이 완료되면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장승제를 지낸다.
장승은 기록상으로 통일신라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 마을 어귀에 세워 이정표로 삼고, 또 마을 수호신으로 여겼다. 장승 옆에는 나뭇가지 위에 새를 장식한 솟대를 세웠다. 솟대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존재한다. 솟대는 청동기시대부터 세워져서 매우 오랜 역사를 지녔다.
목장승은 3년마다 또는 매년 새로 깎아 세운다.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돌장승을 만들어 영구적으로 세워 두는 곳도 있다. 이 돌장승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장승제와 장승세우는 의식은 일제 때 거의 단절되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줄다리기는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세시풍속 놀이이다. 각 집에서 거두어 모은 줄을 장정들이 모여서 굵게 꼬아 긴 줄을 만든다. 마을 규모가 작으면 세 가닥을 합쳐 만든다. 규모가 큰 곳에서는 아홉 가닥을 꼰 것을 세 가닥씩 합해 그것을 다시 한 가닥의 굵은 줄로 만든다.
줄을 꼴 때에는 꼬는 사람, 꼰 줄을 잡아 당겨주는 사람 등 10여 명 이상이 함께 작업한다. 줄이 완성되면 남녀노소 모든 마을 사람들[많으면 수백명]이 동서의 두패로 나뉘어 줄을 당긴다. 끌려가지 않는 편이 이기며 이긴 쪽은 그 해에 풍년이 든다.
경상남도 동래지방에서는 줄다리기가 끝난 뒤 축하행사로서 들놀음(野遊)을 하였다. 이 들놀음은 가면을 쓰고 노는 농민들의 놀이이다. 가면극에는 관북형인 북청사자놀이, 서북형인 봉산탈춤 · 강령탈춤, 중부형인 양주별산대놀이 · 송파산대놀이, 남부형인 하회별신굿탈놀이, 통영 · 고성 · 가산 오광대놀이, 동래 · 수영 야류 등이 있다.
이 중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고려 중엽 이후부터, 그 밖의 가면극들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면놀이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이며, 쓰고 노는 가면도 마을사람 중 솜씨 좋은 사람이 만들었다.
북청과 봉산 · 강령은 38선 이북에 위치해 있으나, 예전에 놀던 사람들이 일부 남하해 서울에 정착한 뒤 함께 남하한 고향사람들에게 전수해 계승되고 있다.
가면의 재료는 현재는 바가지[匏]와 종이가 주로 쓰이고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종이와 목재가 많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하회별신굿 가면은 목재이다. 헝겊 · 짐승털 · 가죽 · 흙 · 대나무 등으로 만든 것도 있다. 가면의 색은 백색 · 적색(또는 朱色) · 흑색 · 황색(또는 갈색) · 청색 등 오방색이 주가 된다.
가면극에는 농악이 따른다. 내용은 벽사의식무(僻邪儀式舞)에 이어 파계승놀이, 양반에 대한 모욕, 남녀의 대립과 갈등, 서민 생활의 곤궁함 등을 보인다. 가면극은 비직업적인 연희자에 의해 계승된 반면, 직업적 유랑 연예인들인 남사당패는 농어촌으로 다니며 주로 장터에서 대중들에게 민중오락을 공연하였다. 이들은 양반집에 불려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남사당의 연희내용은 농악 · 버나[대접돌리기] · 살판[땅재주: 익살과 재담을 섞어서 물구나무서기 · 병신짓 등 따위로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행하는 동작] · 어름[줄타기] · 덧뵈기[假面舞劇] · 덜미[꼭둑각시놀음] 등이다.
과거 한국민의 대부분은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가정에서의 부업으로 수공업을 하였다. 주된 생산품은 직물이었으며, 이 밖에 농경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구, 생활도구, 초고제품[짚이나 풀을 이용해 만든 제품]들을 자가생산하였다. 직물의 종류로는 삼베 · 명주 · 모시 · 무명이 있다. 삼베와 명주는 상고시대부터 있어온 긴 역사를 지녔다.
신라시대 경주에서 부녀자들의 베짜기 경연이 있었음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직조는 일찍부터 여인의 전업임을 짐작하게 한다. 모시는 신라 때 한 노인이 건지산(乾芝山)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깨끗하고 늠름한 산풀[山草]이 있어 껍질을 벗겨보니 늘씬하고 보들보들해서 옷감짜는 데 이용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무명은 고려시대 문익점(文益漸)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그의 장인인 정천익(鄭天益)과 함께 고향[경상남도 산청군 단성]에서 재배에 성공했고, 정천익의 아들이며 문익점의 처남인 정문래가 물레를 고안해 제사법(製絲法)을, 정문래의 아들 정문영이 무명짜기를 시작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기록이 통설로 전해온다.
부녀자들이 짠 직물류는 의복 · 침구 등 가정의 수요에 충당하고 국가에서 조세로 부과하는 세포(稅布)로 납부하였다. 또 도시의 상점에 상품으로 보내지는 등 화폐의 대용으로서 상품교류의 기본을 이루었다.
여인들의 부업으로 생산된 직물류는 조선시대의 직물수요를 거의 충당할 정도로 그 생산량이 막대하였다. 왕실과 귀족계층에서 수요로 하는 무늬가 있는 고급직물들은 궁중과 공조 등에 소속된 방직장과 능라장(綾羅匠)이 생산했으며, 중국에서의 수입품도 사용하였다.
이 4종의 직물들은 전국적인 생산분포를 보이나, 특히 정교한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다. 무명은 경기도 고양, 경상북도 문경, 전라남도 나주가 유명하였다. 삼베는 전라남도 곡성 · 해남 지역과 함경도의 함흥 · 육진 · 길주 · 명천, 경상북도의 안동이 뛰어났다. 모시는 충청남도 서천 한산지방의 세모시가 특히 유명하며, 그 밖에 전라도의 진안 · 광주, 경상도의 영천이 알려져 있다.
모시와 명주실을 교직해 짠 춘포 · 춘주 · 춘사 · 항라 등은 한산지방에서 발달하였다. 명주는 평안도 전지역이 산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뛰어난 제품은 성천 · 회양이며, 충청도의 영동, 함경도의 명천 · 덕천산이 유명하다.
이와 같은 수직기에 의한 직조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섬유공장의 건설로 명맥이 단절되어 가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들 네 분야에 대한 기능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 육성하고 있다.
한국 고대복식의 기본형은 관모(冠帽: 머리에 쓰는 것) · 유(襦: 저고리) · 고(袴: 바지) 또는 상(裳: 치마) · 대(帶: 허리띠) · 이(履: 목 없는 신) 또는 화(靴: 목 있는 신, 장화)이다. 예를 갖출 때는 이 위에 포(袍 : 두루마기)를 더 입었는데, 이는 한대성 의복, 즉 북방 호복계통의 의복을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당시의 의복이 잘 나타나 있다. 저고리는 직령[곧은깃]에 통수[좁은 소매]이며 허리 아래까지 내려간 긴 형태이다. 고름 대신 허리띠로 옷을 고정시켰으며, 깃 · 섶 · 도련 · 끝동에는 옷색과 다른 색으로 선(襈)을 둘렀다.
바지는 남녀 모두 겉옷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통이 넓은 바지와 좁은 바지로 대별된다. 즉, 상류층은 넓은 바지, 하층인은 좁은 바지를 입고 있어 신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치마는 귀인 여자들이 입고 있었으며 치마 밑으로 바지가 보이는 모습도 있다. 길이는 발끝까지 닿는 긴 형태로서 잔주름이 잡힌 것, 길게 색동의 선을 댄 것 등이 있다. 두루마기는 저고리의 형태에 길이가 더 길며 품이 큰 것으로 허리에 띠를 둘러 여몄으며, 겉옷으로 입었다. 백제나 신라도 고구려와 동일한 복식문화였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남녀를 5계급으로 나누어 계급에 따라 옷감의 우열, 부수되는 장식품의 재질에 차이를 두었다. 통 넓은 소매, 허리띠 대신 앞가슴에 고름을 댄 형태가 나타나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고대복식의 기본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음이 이 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토용(土俑)에서 확인된다.
관리들의 복장은 태종무열왕이 된 김춘추(金春秋)가 648년에 당나라의 장복을 받아오고 중국의 공복제도를 따르게 함으로써 중국화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개국 초에는 신라의 복식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나 중국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가 건국된 뒤에는 관리의 계층별 공복 및 예복은 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남자의 평상복은 서민과 같은 바지 · 저고리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며, 여성의 치마 · 저고리도 공경대부로부터 사민(士民) · 유녀(遊女: 술집여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의 복식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초기인 성종 때 백관들의 복제를 정비해 중국 명대(明代)의 제도를 따랐다.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 이래로 조선시대까지 왕실 · 백관 등 지배계급의 공복 · 예복 등은 중국왕조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었으나 일상복인 남자의 바지 · 저고리, 여자의 치마 · 저고리는 큰 변화없이 계승되었던 것이다. 일상복은 왕실에서부터 서민층까지의 기본적인 옷에 관복 · 제복 · 예복을 덧입음으로써 신분에 따른 우위를 갖추었다.
어린아이들의 옷도 어른의 일상복과 동일하나 바지는 대소변을 보기에 편하도록 뒤를 튼 풍차바지이며, 저고리의 고름은 한끝을 길게 해 가슴에서 등뒤로 한번 돌려 앞에서 매었다. 이러한 기본복식은 계절에 따라 봄 · 가을에는 겹옷을, 여름에는 홑옷, 겨울에는 속에 솜을 넣거나 솜을 두어 누빈옷, 또는 갖옷[털옷]을 입었다.
한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염색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옷감으로 옷을 해입었기 때문에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 하였다. 이러한 것은 사치를 규제하는 요인 외에도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급급한 서민들이 옷감을 물들이고 이에 따른 별도의 세탁을 해야 하는 등 시간적 ·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더 큰 요인이었다.
그러나 점차 양반계층과 유사한 채색복식, 금수능라가 아닌 무명 · 명주 · 모시 · 삼베 등에 염색한 의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돌을 맞은 아기들이 입는 색동옷[돌옷], 혼기를 맞은 처녀들의 빨간치마 · 노랑저고리, 혼례복인 신부의 원삼과 신랑의 관복, 혼례가 끝난 새색시의 홍치마 · 초록저고리 등이 있다.
생후 1년을 맞는 아기의 생일에 색동저고리에 보라나 분홍 등의 바지를 입히고 가슴에는 수 놓은 돌띠를 두르며 금박 입힌 복건(여자아이는 조바위)을 씌운다. 수와 금박 무늬는 수 · 복 · 강 · 녕 · 부 · 귀 · 다남 등의 수를 놓아 입혔다.
한국의 과학기술
문화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크게 나누어볼 때, 과학기술은 물질문화에 속한다. 그러나 과학은 물질문화를 창출하는 근원으로서의 정신적 활동이란 면이 강하다. 이에 비해 기술은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창출된다.
그렇다면 과학과 기술은 다른 개념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히들 과학기술이라 붙여 부르는 데에는, 과학적 사고방식 내지 인식이 기술 발전에 절대적인 구실을 하여 양자간에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필요성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자극하고, 그 자극의 결과는 필요로 하는 대상물을 획득 내지는 만드는 행위로 이어진다. 이 행위가 의도에 의해, 즉 과학적이고도 현실에 기반을 둔 의식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넓은 의미로 기술이라 부른다. 따라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 낸 모든 물질문화에는 과학의식과 그에 따른 기술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한국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은 그대로 한국 과학기술의 형성과 전개과정이 된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 낸 최초의 물질문화를 우리는 도구라 부를 수 있다. 인류 최초로 기술이 구사된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사도 인간이 최초로 도구를 만들어낸 시기, 구석기시대로부터 출발한다. 한국문화의 발전 속에서 과학기술의 변화상을 이해하려면, 한국사의 전개과정에 맞추어 설명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2.4.1. 석기시대
인류 최초의 과학기술은 그들이 만든 도구에 반영되었다.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에서 출발해 신석기시대의 마제석기에 이르기까지 석기시대의 과학기술은 주로 도구 제작에 적용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인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킨 요인은 농업이었다.
즉, 농업에 따른 정착생활은 각종 도구를 필요로 했고, 특히 토기의 발명은 이 시기 과학기술을 대변하였다. 재료의 선택과 혼합, 그릇 모양의 다양화, 굽는 온도의 조절 등은 단순히 때리거나 갈아서 만든 도구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개념을 이미 크게 벗어나 있었다. 이른바 빗살무늬토기로 대표되는 신석기시대의 문화권이 발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반도 · 일본에 이르기까지 넓게 형성되었다.
석기시대 과학기술이 반영된 것들로는 이 밖에도 옷감이나 그물을 짜는 데 기술이 필요했던 물레나, 원시적이긴 해도 일정한 공간과 화덕을 갖춘 주거지를 들 수 있다. 석기시대의 과학기술의 주체는 도구와 토기의 제작을 주로 담당한 여성이었다. 이는 물론 모계 중심의 원시공동체사회의 모습이었다.
2.4.2. 청동기시대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주로 묘장에 반영되어 나타난 인간사회 불평등의 요소는 금속기인 청동기의 사용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석기에 비해 엄청난 살상능력을 갖춘 청동기의 사용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더욱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나타난 권력은 마침내 고대국가의 형성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농업은 효율적인 농구의 개발로 보다 발전했고, 식량 증산은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인간생활에 있어 필요 요소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분배의 불평등은 이를 더욱 자극하였다. 우리 나라 고유의 문화로 인정되고 있는 비파형청동단검문화는 당시 과학기술의 수준과 용도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세 부분을 조립하게 되어 있는 점이나, 검에 무게를 더해주는 가중기와 비파형 날에서 나오는 엄청난 살상력을 특징으로 하는 이 검문화는, 서기전 10세기를 전후한 동북아시아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은 · 주교체기와 춘추전국시대라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의 고조선이 가지는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토기인 무문토기는 그 제작 · 형태 · 종류 · 문양 등에서 전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하고 다양화되었다. 지배와 피지배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말의 사용과 그에 따른 각종 말갖춤도 이 시기의 과학기술 수준을 잘 나타내준다.
특히, 꼭지가 여럿 달린 잔줄무늬청동거울[多鈕細文鏡]은 당시의 뛰어난 기하학 수준이 반영된 기물로, 거울면에 새겨진 잔줄무늬는 오늘날의 과학기술로도 재현해내기 힘들 정도이다.
각종 문물에 반영된 과학기술 수준은 이 시기 문화가 가지는 개방성과 전파성과도 관계가 있다. 이는 민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정착되기 이전의 문화가 가지는 특성이다. 비파형청동단검에 반영된 중원적 요소와 북방민족의 요소,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낸 점은 이 시기 문화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
일본 야요이시대(彌生時代) 청동기의 원료가 상당 부분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라는 납의 동위원소 분석결과는 이 시기 문화의 전파성을 잘 말해준다.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초기 고대국가들은 서기전 4, 3세기 전후에 전파된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용도의 금속기인 철기의 사용으로 재편성기를 맞이한다.
중국은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거쳐 진 · 한에 의해 통일이 준비되어가고 있었고, 한국 고대국가를 대표하는 고조선은 이 국제질서 재편성의 와중에서 몰락하였다. 이러한 커다란 변동을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바로 철기라는 금속기의 사용인 것이다.
2.4.3. 삼국시대
철기라는 금속기의 도입으로 재편성된 한국의 국가체제는 이른바 삼국시대였다. 삼국은 각기 폐쇄적인 국가적 차원의 통로로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국가체제를 정비해나갔다. 이 시기의 과학기술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 전문적인 기술인이 육성되어 국가의 요구에 부응한 여러 물질문화를 창조해냈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여러 주변 민족들과 문물 교류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을 보유하였다. 벽화고분의 축조기술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뛰어났다. 석성의 축조 기술도 중국이나 백제 · 신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었다. 벽화에 보이는 생활 모습은 실생활에 과학의 원리를 잘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벽화천장의 성도(星圖)는 고구려의 천문과학의 단면을 보여주며, 주요 도로 · 건물 · 성곽 등이 치밀한 설계에 의해 축조되었다. 수학 · 건축 · 토목 등 각종 과학적 지식이 어우러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여러 문물이 고구려의 장인들에 의해 축조되었다.
백제의 과학기술은 무령왕릉의 출토유물들이 잘 보여준다. 정교하게 구워진 벽돌, 배수시설을 비롯한 수도시설이 갖추어졌음을 알려주는 토관 등은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적 감각 하에서 이루어진 백제인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준다.
삼국 중 가장 늦게 발전한 신라는 전통사상과 고등종교인 불교가 심한 갈등을 거친 끝에 국가의 이념체제를 정비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신라의 과학기술도 이러한 국가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발전하였다. 유리를 직접 만들 정도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소유하였다.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각종 토기도 신라의 기술수준을 잘 대변한다. 국가에서는 장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다. 오늘날까지 남아 전하는 금제 공예품에는 그것을 제작한 장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삼국의 과학기술은 농경문화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이는 관개수리사업은 농경과 관련된 토목기술의 개발을 의미한다. 우경기술(牛耕技術)도 개발되고, 벼농사기술도 발달되어 생활을 풍족하게 하였다. 삼국의 대치상황에서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 육성을 장려하였다.
통일신라의 과학기술이 한국적 과학기술 전통을 확고하게 다지면서도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수준을 보여준 데에는 삼국의 과학기술 장려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삼국시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장려함으로써 장인계층이라는 신분층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2.4.4. 통일신라와 발해
보다 넓어진 영토와 크게 늘어난 인구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통일신라는 전제왕권이라는 강력한 왕권체제 하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국가적인 투자를 기울였다. 석굴암 · 첨성대 · 불국사 · 금동불상 · 범종 · 목판인쇄술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물은 통일신라시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일신라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는가라는 의문도 없지 않다. 이는 신라사회가 폐쇄적인 골품제라는 신분체제에 의해 귀족들의 특권을 유지해왔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외세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계층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한 통일신라의 국가적 한계도, 과학기술의 진정한 발전을 방해한 요인이었다.
신라와 대치했던 발해의 과학기술의 실상을 제대로 밝혀줄 만한 자료가 지금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성당문화(盛唐文化)의 수용에 힘썼던 발해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떠했는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벽화무덤과 불교건축 및 그와 관련된 여러 문물은 당과 신라와 대치한 국제정세속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한 발해의 과학기술의 실상을 잘 나타내준다.
신라나 발해의 과학기술은 말기로 오면서 실생활과는 유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학기술이 귀족들의 사치향락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모습들이 후기 문물들 곳곳에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신라 말기에 수용된 선종의 개인주의적이고 관념적인 특성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과학기술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4.5. 고려
고려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쇄술 및 청자 등 도자기 제조기술면에서 두드러진다. 그 밖에도 의학 · 천문 · 역법 · 수학 등의 방면에서도 큰 발전을 보았다.
고려 말에는 중국의 강남농법과 같은 생산성 높은 경작기술이 도입되어 농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농업과 관련된 수리개간사업 및 농지측량은 진보된 과학기술 수준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2.4.6. 조선
신흥사대부계급이 주축이 되어 성립된 조선왕조는 농업경제를 최우선으로 안정시켜 농민들을 통제하면서 양반이 지배계급으로 형성된 사회였다. 기반이 넓어진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한 과학기술은 왕조 초기에 국가체제의 정비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세종대를 정점으로 하는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량은 한국 과학기술 수준의 최고봉을 이룬다. 여기에 훈민정음의 창제로 전달매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과학기술은 많은 사람의 실생활 속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상은 점차 초기 지배층이 수구화되고 지배이념인 성리학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임진왜란을 당하면서 커다란 변혁을 맞이한다. 전쟁은 일시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자극했지만 이것이 전쟁 후 일반민중의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정치는 정쟁으로 일관되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일어난 새롭고도 전반적인 신학문활동인 실학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의 배타적 관념체계를 부정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과학기술은 전쟁 후 일시적으로 발전한 의학 방면을 제외하고는 보잘것 없었다.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은 청으로부터 들어온 서학의 자극을 받아 충격 속에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 전환기가 자기의 길을 찾기 전에 봉건체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운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조선 후기부터 민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갔다. 이제 지배계층에 복무하는 수단이 아닌 민중의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것은 민중의 자각과 함께 강조되어 물질문화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인식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민중의 자각과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민족운동의 큰 틀 속에서 과학기술은 민중의 생활을 유용하게 만드는 작용점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과학기술의 본질이 바르게 이해되기 시작한 계기였다.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이나 현재의 통일운동 속에서의 과학기술의 의미도 과학기술이 인간 실생활 속에서 조화롭게 용해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생활
2.5.1. 복식생활
복식이란 인체 위에 표현되는 모든 것을 총괄해 말하는 것이다. 복(服)은 주로 몸통과 팔 다리를 감싸주는 의복을 말하고, 식(飾)은 머리에 쓰는 모자나 관, 발에 신는 신이나 허리에 두르는 띠 등 여러 가지 장식을 의미한다.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옷은 입고 벗음으로써 체온조절을 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쾌적한 상태로 피부온도가 조절되었을 때 인간은 자신의 활동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복식은 각 개인의 개성과 품격을 나타내준다.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사회집단에 소속감을 표시해주는 구실을 하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에 필요한 연대감과 예의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지역의 풍속이나 관습을 담은 민속복은 그 민족의 얼이 담겨 있어서 전통적인 민족의 연대감을 가지게 하며 민족의 뿌리를 마음 속에 간직하고 이어내려가는 민족애의 긍지를 심어주는 귀중한 구실을 한다.
복식의 발달과 변천은 그 시대의 생활양식의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향받게 되므로, 같은 자연적 조건을 가진 나라라도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조건이 다르면 생활양식이 변하고 복식도 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상고시대 복식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 문헌기록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피의(皮衣)를 입었다는 기록과 제주도 부근에서 가죽옷을 입되 윗옷만 있고 아래는 벌거벗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양잠이나 저(苧) · 마(麻) 등의 섬유류가 존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의료의 생산이 있었다고 보인다. 4, 5세기 고구려벽화는 당시의 복식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 복식은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구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유의할 점이다. 바지 · 저고리 · 포의 3분 구조는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고, 관모(冠帽)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오랜 전통이다. 상고복식의 전통으로서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지목되는 금관은 당시 왕이 샤먼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무관(巫冠)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복식의 특징은 관복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전형적인 복식 제도가 확립된 때라고 볼 수 있다. 관복의 경우 이중조직의 특색에 의해 관료계급에서 준수했고 그 나머지는 국제(國制)의 포의와 바지 · 저고리를 고집스럽게 입었다. 이와 같이 상고시대부터 변함없이 우리의 기본 복식구조를 고집해온 것은 세계 복식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개화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제까지 1,000년 이상 우리 복식의 골격을 이루었던 중국과의 이중조직의 복식이 서양복식과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화기 이후는 신분의 평등의식으로 복식의 간소화를 초래하였다.
1884년 5월의 갑신의복개혁이라는 교지는 모든 품계의 관리들이 흑단령을 입게 하고 다만 흉배로써 품계를 나타내게 하였다. 이는 신분 · 계급 타파에서 온 평등사상이 그대로 복식에 나타난 것이다. 이어 1895년의 문과복장식과 1900년의 <문관복장규칙>등으로 수천년을 내려오던 한복문화가 한복 · 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복식문화는 왕실에서 일반평민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본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 의복공급을 서두른 데 기인한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미군과 미국에 망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양복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다. 광복 전에 일인들에 의해 양복이 반강제적으로 입혀졌던 시기는 지나가고, 양복의 기능적이고 편리한 실용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높아져 자의에 의해 선택되어 보급되었다.
남자양복은 광복 이후 현재까지 깃과 바지의 너비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여성의 양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 복식은 역사적으로 알타이 복식의 일파에 속한다. 한복의 일차적 특색은 의고 분리의 의복이라는 점에 있다. 여성도 애초에는 바지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나중에는 치마를 입어 남성복과 달라진다.
복색은 중국문헌에서부터 백의를 숭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말에 이르도록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한민족은 백의민족이라고 하지만 백의는 서민의 의복이었을 뿐 관원들의 의복은 색복이 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경향은 백의라 해야 옳을 것이다.
복식은 풍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민족이 거처하는 기후에 알맞게 오랜 전통으로 습용되면서 그 실용적인 면과 아울러 각 민족대로의 미를 내재시키고 있다. 우리 복식의 미는 그 곡선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를 단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 당의와 버선의 곡선이라 할 수 있다. 배래의 선, 의거의 선, 버선 선의 흐름 등은 한국적 미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꼽힌다. 색의 미에 있어서는 옷에 그림을 그려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색의 천을 봉합해 복식을 구성해나간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후조건은 아한대에서 온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복식생활을 해왔다. 우선 저고리와 바지를 신체에 긴박하게 조이는 방식을 취하고,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발에는 버선과 신을 신었다.
즉 신체 전체를 피복하는 방식으로 보온하였다. 계절에 맞추어 동복 · 춘추복 · 하복으로 구별하였고, 솜옷 · 겹옷 · 홀옷 등으로도 구별하였다.
2.5.2. 식생활
우리의 음식문화 형성에는 동북방문화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일찍이 북방문화에 접하면서 잡곡농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중국계 문화가 유입되면서 따라 벼농사의 발달과 진전을 보게 된 이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벼농사를 주로 하게 되었다.
3면의 바다는 천혜의 어장을 형성해 농경 이전에는 주된 식량의 공급원이었다. 특히,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세계적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4계절이 분명해 식품의 산출이 다양하고 비철에 대비한 식품의 저장법과 가공법이 개발되었다. 계절의 명확한 구분은 식생활에서 절식과 시식의 풍속을 가져왔고, 저장식을 비축, 관리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하였다.
게다가 한반도를 남북으로 지른 태백산맥을 경계로 동서의 차이가 뚜렷해 비슷한 위도에서 서로 다른 풍토를 형성하게 하여 특성있는 향토음식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의례에 관한 음식에는 축의음식으로 출산 · 삼칠일 · 백일 · 첫돌 · 책례 · 혼례 · 폐백음식 등이 있다. 제의음식으로는 무속행의음식 · 개례봉사제물 및 사찰의 위령제공의 등이 있다. 제의음식은 기본적으로 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떡이 우리 겨레가 고유하게 개발한 음식임을 말해준다.
유교식 제사음식은 무(巫의) 음식과 기본양식은 같으나 그 내용이 많이 현세화되었다. 무의에서 백설기에 붉은 대추를 얹어 찌는 관습, 제사에 올리는 식혜 위에도 붉은 대추 저민 것, 또는 날고깃점을 얹어놓는 관습 등에서 음양의 조화의식이 뿌리 깊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제의음식은 상고형을 기본으로 해 여기에 불교와 유교가 접합된 양식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식생활 관리의 관습은 농업생활을 기저에 두고 계절의 순환성과 풍토상의 특성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여기에 우리의 가족형태와 가족관도 영향을 미쳤다.
음식의 맛을 내는 장류를 중시하고, 김치를 담가 겨울의 4,5개월 동안의 영양식으로 삼았다. 반주 · 빈객 · 제례에 대비해 계절과 시사에 따라 가양주를 담그고, 젓갈 · 장아찌 · 육포 · 어포 · 건어류 등 마른 반찬을 상비하였다.
우리 사회가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체제로 바뀌면서 식생활도 변화하였다. 해마다 채소 · 과일 · 어패류 · 수조육류 · 알류 등의 공급량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황은 우리의 식생활이 종래의 일상식 양식을 이어오면서도 밥의 의존도가 감소되고 기타 음식의 의존도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가공식품의 이용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장류를 비치할 공간이 없어지면서 2,000여년 간 이어져 내려오던 장의 가공이 공장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우리 식생활의 일대 변혁이다. 종래의 좌식 상차림의 양식이 입식 상차림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주거양식의 변화에 크게 기인한다.
식품 조리법은 뿌리 깊은 기호와 식습관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서양요리용 조미료 사용이 늘고 있고 서양요리 조리법의 수용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외식비 지출이 날로 늘고 있으며, 다양한 전자 · 전기 조리용구의 증대로 각 가정의 식생활 준비작업이 간소화되고 있다.
2.5.3. 주거생활
집의 개념은 가족구성원 · 거주지 · 건물 · 생활정도 · 동족 · 친족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신석기시대의 사람들은 해변과 강가, 호수가에 집을 마련하고 고기잡이와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며 주로 움집에서 생활하였다.
청동기시대에는 나지막한 구릉지대에 적을 때에는 여러 채, 많을 때에는 100여 채의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면서 농사 · 고기잡이 · 목축 생활을 하였다.
원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구릉지대에 살다가 점차 강구(江口)의 삼각주지방으로 진출해 농경생활과 목축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원시시대의 움집과 귀틀집 · 고상식주거 등 여러 형태의 주택들이 건축되었다. 지배계급에서는 낙랑 등을 통해 한나라의 좀더 발달된 목조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아 궁실건축이 이루어졌다.
삼국시대는 건축이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건축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주택을 계승해 목조가구식으로 귀족계급은 기와집이고 서민층은 초가였다.
서민주택은 고구려의 온돌구조가 그대로 계승, 발전되었다. 또한 신라의 마루구조도 고려에 널리 계승되었다. 고려시대는 음양오행론에 맞추어 단층을 하고, 고려 초부터 풍수설의 영향으로 택지 선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시대의 건축은 풍수지리의 양택론에 치중해 이루어 졌다. 이 시기에는 대가족제도에 따라 주택의 규모가 켰고, 별채들이 건축되었다. 남녀구별의식으로 인해 여자의 공간인 안채 · 내측, 남자의 공간인 사랑채 · 외측이 따로 구분되어 건축된다. 조선시대 주택의 배치 · 평면은 정치 · 경제 · 신분 · 민간신앙 · 기후 등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사회의 변혁은 신분적 한계를 벗어난 건축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다. 1900년대에 들어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래양식의 건축이다. 이와 더불어 시멘트 · 유리 · 벽돌 · 콘크리트 등의 새로운 재료들이 점차 보급되었고, 스팀난방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부터 6 · 25전쟁에 이르는 동안 해외귀환동포와 월남민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주택의 보급이 미치지 못해 주택난을 겪었다. 최근에는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대도시의 주택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주의 문화
한국문화를 개관함에 있어서 ‘가족주의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가족제도는 인류가 창조한 가장 오래된 제도이자 문화이며,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구조의 변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가족문화가 한 사회의 전체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것의 역사적 중요성만큼이나 크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가족주의문화’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주의란 개인이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개개의 가족성원보다 집[家]이 중시되는 경우, 그와 같은 가족적 인간관계가 가족 외의 모든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경우에 보이는 행동양식 · 사회관계 · 가치체계를 통칭한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원리도 한국 전통사회에서 가족 혹은 집의 중요성과 가족구조의 원리가 결합해 형성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이러한 문화적 문법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행동양식 · 사회관계, 나아가 사회구조로 재생산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의 인사규범은 초면의 타인에게 자기의 집안이나 가문 혹은 부모를 포함한 조상들, 그리고 가족사항에 관한 정보로 자신의 존재를 밝힌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자 할 때는 관향(貫鄕)과 고향을 이야기한다. 오늘날 향우회 · 동창회 · 친목계 등은 이러한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모임이다.
우리의 사회관계는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군사부일체’로 굳어져서 각각의 관계는 서로서로를 합리화하는 데 적절하게 이용되었다. 모든 사회관계의 시간적 · 공간적 서(序)와 별(別)의 적용도 바로 가족구조 내에서의 부자관계, 남녀관계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왔는가? 친족구조 · 향촌사회, 그리고 국가 등의 내부 조직과 그들간의 외적 관계는 시간적 · 공간적 상황에 따라 서와 별의 원리를 철저히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원리는 개인에게 자신의 수양을 통한 행위의 원리로 지켜져왔다. 오늘날에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가화만사성’ 등과 같은 고사성어가 쓰인 액자를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는 가족주의문화를 다시 창조해가고 있다.
가족주의문화가 창조적으로 발전해 친족조직 혹은 문중조직이 형성되었다. 친족구조는 가족주의문화의 산물이자, 동시에 가족 및 친족 구성원을 통제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친족제도는 ‘어른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우리 문화 속의 ‘어른’은 친족조직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친족조직이나 문중조직에서 어른은 가족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어른은 아이들과 대비개념으로 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친족조직이나 문중조직에서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집단을 지칭하였다.
이들은 모든 사회적 행위에서 아이들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문중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또한, 어른은 문중의 주손(主孫)인 종손을 중심으로 사회질서를 통제, 유지해왔다.
한국문화 속에서 어른은 사회질서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역으로 가족 내에서는 아버지가 어른이 되었다. 이러한 어른의 문화는 향촌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가족내에서의 아버지가 반드시 친족 내에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친족의 어른이 반드시 향촌사회의 어른은 아니었다.
향촌사회의 어른은 나이가 많고 무엇보다도 깊은 학식을 겸비해야 했다. 향촌사회에서 항렬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향촌사회의 어른은 모든 친족조직이나 문중조직에서 인정할 만한 지성과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 문중의 중요행사에 대표자로 참석하였다. 이들의 존재도 또한 향촌사회 질서의 상징이었다. 전통사회에서 향약이 향촌사회의 통제와 유지를 위한 법규였다면, 향촌사회의 어른은 그 법규를 실행하는 집단이었다.
가족이나 친족이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면 향촌사회는 혈연관계 · 지연관계 · 학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향촌사회는 가족주의문화를 ‘공동체문화’로 발전시킨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공동체문화는 오늘날의 국가공동체 · 민족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공동체문화는 농경문화와 결합해 ‘두레’라는 노동공동체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사농공상의 신분적 구분이 뚜렷했던 전통사회에서도 공동체문화는 다른 한편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로 재창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 탈춤 · 풋굿(호미젓이) · 두레 · 농악 · 계 등은 이러한 공동체문화의 산물이었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로 재창조된 공동체문화는 서와 별의 원리보다는 평등주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가족주의문화의 원리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구조적 원리를 발전시켜나갔다는 설도 있다.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가족주의문화와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공동체문화는 이미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학자에 따라서는 가족주의문화를 유교문화로, 노동공동체문화를 기층문화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문화의 구분이 상류층문화와 하류층문화, 혹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라는 서구식의 이분법적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위문화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는지 혹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주의문화와 공동체문화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양자가 같은 기층문화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의 특성
우리가 세상이나 우주를 이해한다거나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질서를 설정해서 부여해보는 것뿐이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자료들은 무한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간단한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질서를 세운다. 즉 혼돈을 질서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자체는 이미 ‘준비된 질서’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한 사회의 성원으로 어떻게 세상을 지각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우게 된다. 이른바 사회화 과정은 준비된 질서를 배우고 익히고 유지하려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수정해 보려고도 하는 것이다.
‘준비된 질서’ 또는 우리의 경험을 정리시켜주는 일련의 모델이 다름 아닌 한 사회의 문화인 것이다. 이리하여 문화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한국문화 분석상의 이념형을 ‘조선농민사회문화’와 ‘한국시민문화’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를 조선왕조사회의 농업 중심적 문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오늘날 한국민주사회의 상공업 중심적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조선농민사회문화의 모델은 ‘대대적 인지구조(對待的認知構造)’라고 규정할 수 있다. 대대(對待)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음양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음과 양은 이분법적 대(對)의 개념이다. 그리고 동시에 대대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다. 즉 상대하고 반대하는 대(對)이며, 대접하고 대우하는 대(待)이다. 어쩌면 시(是)비(非)의 논리의 세계이다.
이는 곧 음과 양의 이분법적 대(對)의 개념이요, 음과 양의 대(待)의 화합으로 만물을 화생시키는 개념이다. 이 동적인 관계에서 양은 음을, 음은 양을 상보하여 하나로 되려는 것이다. 대대는 다름아닌 이러한 상보적인 음양의 작용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대적 인지구조는 인간사고의 기본구조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조선시대 농민사회의 이데올로기는 고대 중국의 그러한 인지구조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즉, 유교 · 불교 · 도교 · 샤마니즘은 음양적 대대구조의 특성을 하나의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의 정치 · 사회 · 종교 · 예술 그 밖의 여러 가지 생활 영역에 있어 전통사회의 지도자들이 이를 ‘설명의 원리’로서 사용해 왔음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다.
음양원리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사(事)와 물(物)을 지각하고 관련짓고 해석하는 데 사용한,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조직원리이다. ‘한다’와 ‘된다’라는 이분법적 짝은 조선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짝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앞의 것이 능동이면 뒤의 것은 피동이다. 이러한 피동과 능동은 음과 양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양자는 서로에 대하여 모순 · 반대 · 주종 · 표리 · 상하 · 좌우 · 선후 등의 여러 관계로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관계에 여러 가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분법적 짝의 사고구조는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공통된 구조적 원리이다.
이를 ‘음양의 원리에 입각한 대대적 문화문법(對待的文化文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즉, 음과 양은 이원적이면서도 그 동태적 관계에서는 음양은 합일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원적이고, ‘분(分)하면 합(合)하고, 다시 합하면 분한다. ’는 논리까지 깃들여 이원적이면서도 일원적이고, 일원적이면서도 이원적이다.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 부자적(父子的) 인간관계는 한국인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준거 ‘형식’이다. 부자적 관계의 형식이 모든 인간관계 지각의 기본이 된다. 부(父)와 자(子)는 ‘대대적’ 관계에 있다. 부가 자(慈)의 태도로 자식을 대할 때, 자는 효(孝)의 태도로 부에 대하는 것으로 대대를 이룬다고 풀이된다.
이러한 대대적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對)’의 기‘대(待)’속에서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그것이 부가 되든, 자연이든 초자연이든 그 상대에 순응하고 복종하며 안녕과 질서를 찾고 세우며 살아가는 세계이다.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서 가족이란 부자적 대대관계 속에서 상대에 순응하고 복종하여 안녕과 질서를 제일로 여기며 생활하는 집단이다. 부는 조부(祖父)에 대하여 자로 존재하며, 자는 손자에 대하여 부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은 각기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부가 되고 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자적 관계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상하적 관계이다.
이러한 상하적 관계는 한국어의 언어적 표현에 잘 결정되어 있다. 존칭어와 비칭어라는 존비어는 사회 일반의 관계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이것의 원형은 가족관계에서 출발되고 있다.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존재하는 절대적 가부장의 위치나 신분계서(身分階序)의 엄격성, 동족 위주주의 등은 현존하는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문법은 문장과 달리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각종 인간관계의 호칭이 가족관계적인 표현이라는 점은 전통적인 가족주의문화가 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가족주의적 문화의 규칙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자. 첫째로, 한 개인은 개체로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 존재한다.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서만 정체성(正體性)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 가족은 다시 어떤 당내(堂內)의 성원이요, 그 당내는 다시 어떤 종파의 성원이요, 그 지파(支派: 종파)는 다시 문중의 성원으로 귀속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혈연적이 아닌 지연적인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것은 대체로 혈연적 집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자연과 관련되기 때문에 두가지 상이한 기준은 상호교체, 변화될 수 있다.
한 개인의 행동은 그가 속해 있는 집단 전체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도 일가친척의 공동체적 유대 속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집단은 규모가 클수록 좋은 것이다. 일가친척이 번성한다는 것은 곧 집단의 성원수가 확대됨을 말한다. 농경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의 협동에 있다. 농사에 있어서는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소망이다.
오늘날의 한국농촌에 있어서도 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도우느냐 하는 것이 그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고 있다. 시제(時祭)에서부터 혼상례 때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족성원의 참가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셋째로, 앞에서 부자적 관계를 설명할 때 언급한 상하적 서열의식이다. 이 상하의식은 ‘천존지비(天尊地卑)’라고도 표현된다. ‘천존지비’라는 『주역』의 일구는 어떤 의미에서 한자문화권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심층의식의 구조를 이룬다.
존비라는 두 글자 앞에 있는 천지라는 두 글자 대신에 여러 다른 수많은 대(對)의 글자를 넣을 수 있다. 관민과 남녀라는 글자를 존비 앞에 각각 놓고 보면 관존민비, 남존여비가 된다.
천존지비라는 표현은 한자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사물의 형식’의 표현이다. 천존지비라는 표현이 유의미한 한 남존여비를 없앨 수는 없다. 그것은 뿌리는 두고 가지만 바꾸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이 있다. 한자의 사용이 오늘날에 와서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옛날처럼 천존지비라는 말과 뜻이 깊은 뿌리처럼 통용되지 않고 있다.
관존민비나 남존여비의 단어가 막연히 과거 봉건적 잔재로만 여겨지는 낡은 것으로 이해되어가고 있다. 설혹 남아 있다 해도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질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경어법의 사용도 쉽게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경어법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면, 다만 경어 사용의 상황과 규칙이 보다 단순화 내지 생략되는 데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넷째로, 부자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부(父)는 자(慈)해야 하고 자(子)는 효(孝)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다.
천존지비가 존비의 상하관계로도 볼 수 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상호작용적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천(天)은 지(地)에 대하여 존경받을만해야 하고, 지는 천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비하함이 예(禮)다. ’라고도 할 수 있다. 천은 천다워야 하고, 지는 지다워야 한다.
‘상(上)은 상이고 하(下)은 하이다’라는 단순한 위치설정으로 정태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행동과 활동으로 상(上)은 상으로서 하(下)에 대한 소임을 다하고 하(下)는 하로서 상(上)에 대한 소임을 다할 때 천존지비가 완성된다는 동태적인 관계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은 위의 세번째 내용의 연속으로 보인다.
그리고 첫째 내용의 개인이 개체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도 셋째 · 넷째 내용에서 설명하는 ‘대대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천은 지가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지는 천이 없이 생각할 수 없다.
같은 논리로 부(父) 없이 자(子) 없고, 자 없이 부를 생각할 수 없다. 자에 대한 부는 부모요, 다시 그 부모는 동시에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뜻할 수 있고 그 부모의 형제자매들을 뜻할 수도 있다.
‘대대적’ 사고나 의식에 있어서는 구체적 ‘부’ 하나로 ‘자’를 뜻하지 않는다. ‘대(對)’가 될 수 있는 모든 내포가 각기 상황에 따라 확대 변환될 수 있는 것이 한자문화권의 인지적 구조이다.
두 번째로 지적한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것은 또한 ‘대대적’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부자자효(父慈子孝)할 수 있는 상‘대’관계가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연줄망은 많아지는 것이요, 그것이 많을 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양과 폭이 크다는 것이다. 부자적 관계로 파악될 수 없는 집단 간에 있어서는 자(慈)와 효(孝)를 행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자와 효를 행할 수 있는 친가의 폭은 외가의 폭보다 넓다. 이러한 점이 자(子)를 여(女)보다 귀히 여긴 이유일지도 모른다. 오늘날도 선생이 자기 제자를 많이 만들려는 것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하당원을 많이 거느리려는 것도 이에 기초한다. 여자 제자와 여자 당원을 기피하는 것도 부자관계 같은 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문화정체성(文化正體性)을 논할 때 ‘전통문화’와 ‘문화적 전통’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과거 전통사회의 문화라는 뜻이며, 후자는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축적된 문화양식으로서, 현재의 사회환경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문화’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고유문화로서 ‘과거에 속하는 것’과 ‘현재에 속하는 것’이 각각 ‘전통문화’와 ‘문화적 전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3분은 문화의 연속과 단절을 논할 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과거에 속하는 것과 현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고유문화는 이미 역사적 전통의 배경을 빼놓고서는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와 혼란이 제기되는 데는 문화란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각 학문마다의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에서도 경험론적 입장과 관념론적 입장에 따라 문화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
현대 한국사회문화 속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전통문화라고 본다. 앞에서 이러한 전통문화의 특성을 ‘대대적 인지구조’로 해석해 보고 다시 ‘가족주의적 문화’의 규칙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보았다.
가족주의적 문화의 성격을 다시 세 가지 분석적 차원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가 급수성(級數性)이요, 둘째가 집단성(集團性)이요, 셋째가 연극 · 의례성이다.
첫째로, 급수성은 바둑의 급수처럼 모든 인간관계를 등급별로 파악하는 성향이다. 가족관계에 있어 부자로부터 시작되는 촌수(寸數)의 항렬이며, 신분차등서열이며, 요즘 많이 논의되는 관료적 권위주의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말에 내재하는 존비어의 사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상하적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마음 속의 형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양반과 평민, 혼반(婚班), 지체, 그리고 일류학교와 이류학교, 대학입학 학력고사 등급 등은 우리 사회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마음 속의 형식’으로, 이러한 급수적 차등의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급수성에서 나타나는 상위지향은 우리 문화만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족주의적 문화전통에 있어서 항렬의식이 한국에서 수백년을 두고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현대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다 많이 변환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집단성은 한 개인이 가족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한다. 혈연으로 지연으로 한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소속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개인은 한 개인으로 평가되지 않고 개인의 평가가 곧 그가 속한 집단의 평가로 간주된다. 한 개인의 잘못은 그가 속한 집단 · 가족 · 문중 · 지방 등으로 확대되어간다. 이른바 공동체의식이 그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집안을 위하여’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이 흔쾌히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은 가족주의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한자문화권사회의 공통된 특성들이다.
동족(씨족)집단, 파족(派族), 우리 집안, 우리 고향사람, 학교동창, 그리고 최근에 와서 대기업들도 가족집단으로 집단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셋째로, 연극 · 의례성은 우리의 과거 전통사회로부터 오늘날 현대사회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차원의 문제성은 우리 언어의 문법처럼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적 문법이라는 데 있다.
앞에서 대대적 인지구조를 언급했지만, 음양합일에는 연극 · 의례성을 강요하는 면이 있다. 즉 음양적 관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설정되면 연극 · 의례적으로라도 합일해야 하는 문화적 규칙이다.
두 사람이 친형제 또는 친부자가 아니더라도 형뻘 · 동생뻘 사이라든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각자 자기 소임을 연극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라도 수행해야 하는 ‘마음 속의 형식’이다. 어르신네가 걱정하실까봐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회의할 때 내심으로는 안건에 반대하지만, “그 자리에서 ‘차마’ 반대할 수 있어야지?” 라는 입장에서 표결에서는 찬성해 놓고 나와서는 반대하는 것이다.
이른바 연극 · 의례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예’와 ‘아니오’가 체면상의 ‘예’와 ‘아니오’가 되기 쉽다. 찬반과 가부를 딱잘라 말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 같으면서도 반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시험답안지 ○ ×만이 분명할 뿐 찬반 양쪽 어느 집단에 대해서도 욕을 먹지 않는 연극과 의례를 해야 할 때가 많다. ‘만장일치’, ‘일사불란’ 등의 표현이 오늘날 한국 정당들의 협의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연극 · 의례성을 대변한다.
한국 농촌에서 이견 조정 및 분쟁 해결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도자나 중재자를 두고 마을 전체사람들의 ‘만장일치’를 공식적(표면상)으로 얻게 되며, 분쟁의 해결은 양편 다 ‘말이 된다’는 식으로 이끈다.
한국 전통문화에 있어 분쟁 해결의 대표적인 예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일 것이다. 시비와 분쟁이 있을 때, 그 해결이 양편 다 옳은 것으로 되는 동시에 양편 다 옳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어느 것도 용납 안 된다면 ‘없었던 것’으로 하는 방안밖에 없다. 황희정승의 명판결인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는 것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우기면 된다.”, “큰소리만 치면 안 될 것도 없다.” 더 나아가 “안 될 것도 없고 될 것도 없다”라는 등의 말이 뜻하는 바가 연극 · 의례성이다.
대표적으로 TV방송극 가운데 「풍란(風蘭)」과 「새벽」은 조선 중기와 광복 이후의 사회가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가를 실감하게 한다. 이 역시 권모술수와 모략중상에 생사를 걸고 ‘연극 · 의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극(史劇)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통문화는 현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시 재활성화, 재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의 · 식 · 주 문화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로 ‘의 · 식 · 주’의 삼대 요소를 꼽는다. 사람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옷 · 밥 · 집은 빠지지 않는 기본거리이다.
그러나 이를 학문으로 여기는 이는 드물며, 또 이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이조차 물질 그 자체에 천착하기 일쑤이다. 의식주는 인간사에 너무나 상식이라 논리를 요구하는 학문의 체계는 미치지 않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식주를 깊이 살펴보면, 그 물질을 있게 하는 관념, 즉 문법이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 의식주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문법을 찾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의식주에 대한 설명은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대대적 문화문법으로 이를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옷은 인간의 몸을 가리는 데 첫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몸의 치부를 가리는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를 발견한다. 자연환경에 따라 옷을 촘촘히 입기도 하고, 치부만 가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옷의 첫 의미에 불과하다. 우리네 옷입기의 역사는 이 첫 의미에만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상의와 하의를 엄격히 구별한 북방민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탕에서 불교, 몽고, 그리고 유교의 영향이 고루 어우러지는 가운데 우리의 전통 인간관이 옷에서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
우리 전래의 옷입기는 공식복 · 의례복 · 일상복으로 나눌 수 있다. 모두가 의례(儀禮)에 따라 정해져 있다. 동 · 서반의 차이에 따라 옷입기도 달랐다. 관직의 서열에 따라서도 복식의 모양과 색깔은 분명히 달랐다. 그 다름에는 음양 대대문화문법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
포(袍)는 상하가 하나로 된 겉옷으로 조선시대 양반이 외출할 때 입는 옷이다. 이 중에서 심의(深衣)는 유학자 간에 유가의 법복으로 숭상되고 애호된 포이다. 심의의 형태는 둥근소매와 모진깃을 가지고 있으며 의상(衣裳)을 나누어 마름하여 봉합하였다. 감은 백포로 만들며 의 4폭, 상 12폭을 허리에 연접해 만든다.
상의하상을 나누어 옷을 만드는 관념은 음양의 원칙을 따른 우리 전래의 문법이다. 이는 상의하상의 구별이 없는 심의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아래옷 12폭은 다시 6포씩 나누어 마름하는 게 기본이다. 심의에도 음양대대의 관념이 반영되어 하나의 완성된 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전통주거공간에서도 음과 양의 구분과 조화가 관통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의 구별이 분명한 남녀유별, 칸수의 차이에 따른 장유유서(長幼有序), 축대에도 층을 나눈 상하계층의 구별, 살림살이도 안과 바깥을 구분하여 공간을 나누었다.
우리네 상류가옥 건물 배치는 사랑채를 중심으로 여성공간인 안채와 남성공간인 사랑채가 분명히 나누어진다. 보통 남향인 집에서 사랑채는 동남쪽에, 사당채는 동북쪽에, 그리고 안채는 서북쪽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과 서를 좌우의 개념으로 대치시키면서 동은 오른쪽이요 서는 왼쪽이 된다. 오른쪽은 남성, 왼쪽은 여성의 자리이다. 그렇다고 부부가 별거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사랑채와 안채가 통하는 은밀한 통로가 있다.
집은 가족이 모여 대를 이어가는 공간이다. 안과 밖을 구별하여 살림을 꾸려나가면서도 동시에 사랑채는 안채에 비해서는 위요, 사당은 집의 제일 높은 곳이다. 상호관계 속에서 집안살림이 이루어진다. 집의 급수성, 연극 · 의례성은 상류가옥에서 안채나 사랑채를 지나치게 높이 세웠던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양반과 천민 사이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양반 사이에서도 가문이나 출신, 벼슬의 높낮이 또는 나이에 따라 엄격히 반영되었다. 문턱은 신분상의 경계선 구실을 한다. 급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대의 높이를 과도하게 2m가 넘게 한다든지, 문턱도 몇을 두어 사람을 대할 때마다 급수에 따라 체통과 위신을 세웠다. 유교의 급수적 인간관이 건물 배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음식의 전형은 뭐니뭐니 해도 상차림이다. 밥과 반찬을 기본 격식으로 한 3첩반상 · 5첩반상 · 7첩반상 · 9첩반상의 양식에는 조선시대 유교의 인간관이 완성한 상대적 조합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 음식은 밥이 주격음식(主格飮食)이요, 반찬이 부위격음식(副位格飮食)이다.
밥이 양이면, 반찬은 음이다. 밥은 밥만으로 제모습을 갖추지 못하며, 반찬은 반찬만으로 제격을 유지하지 못한다.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제각기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밥과 반찬은 이와 같이 서로 상대적이면서 동시에 대응 관계를 이룬다. 상차림은 밥과 반찬의 조화에서 성립된다. 우리 밥상의 대대적 문화문법이 상차림에서 구현되고 있다.
3첩반상을 예로 살펴보자. 밥 · 탕 · 김치 · 나물 · 생채, 그리고 구이 또는 조림과 간장종지가 3첩반상을 구성한다. 가장 간단한 상차림이지만 곡물음식, 생채와 숙채음식, 발효음식, 육류나 어패류가 고루 어우러진다.
상을 차릴 때도 밥을 왼쪽에, 탕을 오른쪽에 대치시키고, 간장종지를 가운데로 하여 반찬을 두 줄로 놓는다. 양이 적은 나물 · 생채 따위를 가운데 줄에, 김치를 바깥 줄에 대비하여 놓는다. 김치도 여름이면 열무김치와 깍두기를 하나씩 놓는다. 물김치와 보통 김치를 상대적으로 놓는 것은 맛을 돋우기 위해서이다.
완성된 상차림은 색깔의 조화를 이룬다. 흰색에서 빨간색까지 제각기의 색이 조화롭다. 밥-탕, 밥-김치, 밥-나물, 구이-간장 식으로 음양의 대대가 입 속에서 이루어진다. 영양에서도 고루 합한 것이 몸에 좋다.
첩수를 나눔에도 밥 · 탕 · 김치는 기본이다. 첩수가 늘어나면서 나물 · 구이 · 회 · 편육 · 장아찌 등이 늘어난다. 첩수에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기본 음식이요, 첩수에 들어가는 음식은 밥상을 풍성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첩수를 나누는 것에도 음양의 구분과 조화가 있다. 반상기나 수저에도 남녀의 구별이 있다. 남자용 밥그릇은 몸이 직선형이고, 여자용은 꼭지가 있는 둥근 뚜껑이 달리고 둥근 모양의 바리이다. 이렇듯 우리는 밥상에서도 유교의 대대적 인간관과 그 문화를 읽을 수 있다.
문화는 어떤 물질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사물의 형식들이며, 그 형식을 지각하고 관련짓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문법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대상들 사이에 내재한 관계의 체계를 발견하려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의 의식주 문화 연구 역시 이러한 문화의 문법에 주목해야 한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기본 사고체계인 음양의 대대적(對待的) 문화문법은 우리 의식주문화의 내면체계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그 자체에만 주목한 많은 연구자들이 문화를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상의하의의 대대, 안채와 사랑채의 대대, 밥과 반찬의 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 본질을 규명할 의무를 느낀다.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된 심리 및 정신적 관념, 의례 따위와 같은 심리정신복합체와 사회조직, 물질문화라는 문화의 중층적 구조 내지 범주에서 의식주문화를 연구해야 한다.
요즈음은 사정이 다를지도 모른다. 의식주가 서구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물질 그 자체가 변했다고 수백년간 이어온 문화의 문법이 몇 십년 사이에 뭉개졌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현대에도 우리의 생활문화에는 오랜 전통문화의 여러 규칙들이 암암리에, 또는 심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을 찾는 작업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래서 전통문화에서 우리의 문화문법을 찾아내고, 지금의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문법의 변이를 찾고 나아가 우리의 문법을 정리해서 표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의식주 문화를 물질의 축에만 버려두지 않고, 관념의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현황과 전망
2000년대를 앞둔 20세기 마지막 단계의 오늘, 한국 민족문화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달리 표현해서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기만 하면 또다시 황금기를 맞을 때가 온다는 뜻도 된다.
한국인은 한반도에서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 오면서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우리 나라 만세”를 언제나 노래하고 있다. 한국 민족의 나라 사랑은 이 땅의 백성이 한핏줄로 하나의 언어로, 그 동질성이 세계 어느 다른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반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독자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고루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독자적인 것은 반도라는 지리적인 조건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분명히 경계시켜 놓은 데서 온다.
즉, 한국인이 사는 땅은 경계가 분명해서 백의민족 또는 배달민족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현실적인 동질성이 뚜렷한 것이다. 그것은 가족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게 한 근원이다.
세계는 점차 하나의 지구촌으로 정보화시대의 한 울타리 속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없어지게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강한 독자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인간은 모두 각자의 역사가 있고, 그가 속한 민족집단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지혜를 쌓아왔다.
그 역사와 지혜가 곧 우리의 문화전통이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더 자세히 알고, 계속 재창조, 재생산해나가는 과제가 중요하다. 한국 문화는 한국인이 그 전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재창조해나가느냐에 따라 그 명맥이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