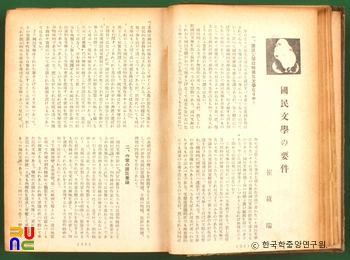불신시대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박경리(朴景利)가 지은 단편소설.
내용
이 작품은 한 여성의 눈을 통해 감지되는 현실 사회의 타락상을 그린 소설로, 『현대문학』1957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전쟁 때 남편을 잃은 진영은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놓여났지만 타락한 현실 앞에 무방비상태로 던져진다. ‘의사의 무관심’ 때문에 ‘도수장 속의 망아지’처럼 외아들 문수가 죽고, 중들은 돈을 좇아 종교를 팔고, 병원에서는 치료약의 함량을 속인다. 곳곳에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현실은 그녀의 예민한 영혼을 무자비하게 고문한다. ‘약탈적인 살인자들’의 세계 속에 그녀 혼자 외롭고 무기력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그녀의 상황은 세계의 폭력성에 노출되어 정신과 육체가 망가진 당대인들의 외로움과 무력함을 대변하는데, 이는 우리 전후 소설의 일반적 성격에 대응된다. 진영은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속물들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결연한 저항의지를 내보인다.
의의와 평가
이 작품은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보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당대 현실이 지닌 병폐를 고발하고 있다. 작중인물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피해의식과 감상주의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주인공은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고 인간에의 증오를 폭발시킴으로써 부정과 위선으로 가득찬 현실상황을 비판한다.
참고문헌
『한국소설사』(김윤식·정호웅, 예하, 1993)
「박경리 소설 연구-갈등 양상을 중심으로」(장미영,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2)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