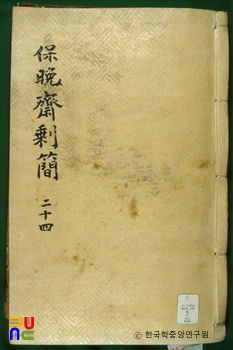성사답향 ()
『성사답향(星槎答響)』은 필담창화집으로, 1719년(숙종 45) 일본 중[僧] 가죽(可竹) 성담(性湛)이 8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의 습직(襲職)을 축하하는 제9차 조선 통신사와 오사카에서 나눈 필담과 창화를 모아 출판한 책이다.
일본 스님 성담이 1719년 6월 29일 쓰시마에서 관반사로 조선 사신을 만난 후 8월 19일 아카마가세키[赤間關]에서 그들과 주고받은 필담과 창화를 모아 『성사답향』을 편찬하였다. 이후 그는 귀국하는 조선통신사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자성다좌위문(茨城多左衛門)에게 판각하게 하여 10월 1일에 간행하였다. 간기에 ‘향보사맹동길단(享保四孟冬吉旦)’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향보사(享保四)는 1719년을 말한다.
이 책의 편찬자는 쓰시마에 있던 이정암(以酊庵) 소속 승려로, 이름은 성담, 자는 월심(月心), 호는 가죽이다. 이정암은 선종 사찰로, 성담은 이곳에 머물면서 조선과의 왕복 서간이나 사신 접대를 맡았다. 책의 서두에 정사(正使) 통정대부 이조참의 지제교 홍치중(洪致中)을 비롯하여 조선 사신 일행 475명을 수록하였다. 삼사(三使)에서 차상관(次上官)까지 55명은 관직과 성명을 기술하였으며, 중관 160명은 직책과 인원수만 기술하였고 하관 260명은 숫자만 표시하였다.
상권에는 성담이 정사 홍치중, 부사 황선(黃璿), 종사관 이명언(李明彦) 등 삼사와 주고받은 시, 제술관 신유한(申維翰)을 비롯하여 정사 서기 강백(姜栢), 부사 서기 성몽량(成夢良), 종사관 서기 장응두(張應斗) 등과 주고받은 시 등을 실었으며 특히 신유한과 주고받은 서신을 많이 수록하였다.
하권 역시 신유한 및 각 서기와 주고받은 시와 서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유한은 특히 ‘운수(雲水), 풍월, 초목, 어조(魚鳥)’ 등을 표제로 한 게(偈)를 지어 주기도 하였으며, 서한으로는 불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말미에 실은 아카마가세키 시편에는 성담과 일본 유자(儒者)인 호슈[芳洲], 아메노모리[雨森], 하소[霞沼], 마쓰우라[松浦] 등 일본인 사이에 주고받은 시편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선 사신과의 화답이 없어 쓰시마 유생과 창화하였다는 설명이 있다.
이 책은 1719년(숙종 45) 통신사의 쓰시마에서의 교유를 매우 상세히 기록하여 신유한의 『해유록(海遊錄)』 이해를 심화시켜 줄 뿐 아니라, 신유한과 성담의 불교관련 서한에서 조선 유학자의 불교 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