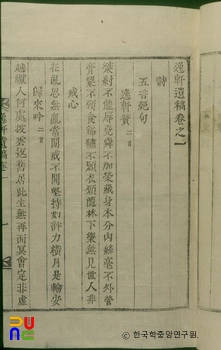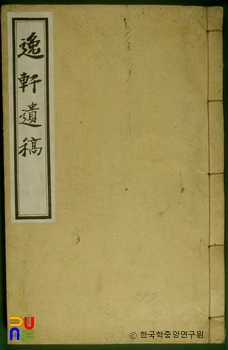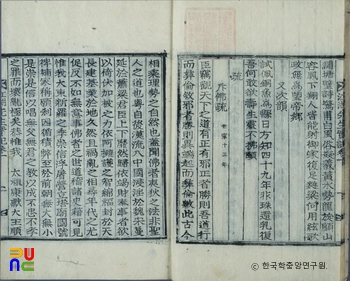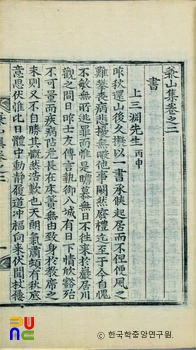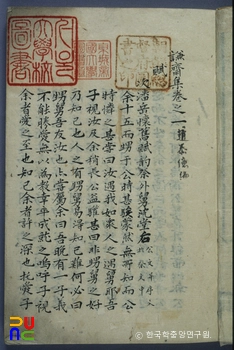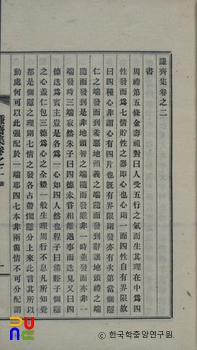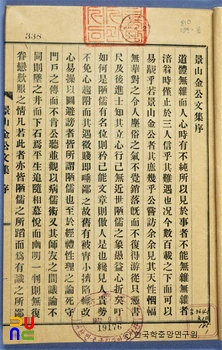일헌유고 ()
2권 1책. 목활자본. 1935년 후손 우권(遇權)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오준선(吳駿善)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고광선(高光善)과 후손 우현(遇炫)·우선(遇善) 등의 발문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287수, 권2에 기(記) 3편, 잡저 5편, 시 1수, 부(賦) 10편, 부록으로 행장·묘갈명·유사·행록(行錄) 각 1편, 문(文) 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양적으로 볼 때 이 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시의 형식도 고체(古體)·근체(近體) 등 다양한 면을 보인다. 사조(詞藻)가 아름답고 서정성이 두드러진다. 영물(詠物)이나 서경(敍景)에서도 대개 은일적 감회를 풍기는 것이 많아 한담(閒澹), 청아(淸雅)함을 느끼게 한다. 「영노자(詠老子)」 2수는 늙음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읊은 것으로 철학적 의경(意境)을 담고 있다.
「이화일지춘대우(梨花一枝春帶雨)」는 칠언고시의 장편으로 동원(東園)에 만발한 배꽃을 감상하며 서정적 감회를 읊고 있다. 부의 「위천하수재(爲天下守財)」는 부고(府庫)를 충적시켜 흉년에 헐어서 백성의 궁핍을 구제한다는 내용으로 인도주의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잡저의 「기고제봉창의막하(寄高霽峯倡義幕下)」는 임진왜란 당시 고경명(高敬命)의 막하에 보낸 글로, 백성들이 도륙되고 종사(宗社)가 다 타서 없어지는 등 처참한 상황을 한탄하면서 의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한편, 자기 자신은 노병이 들어 막하에 참여하지 못함을 탄식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