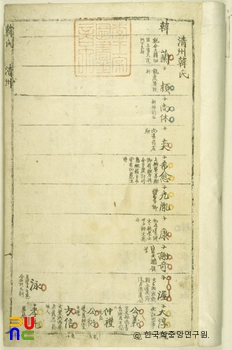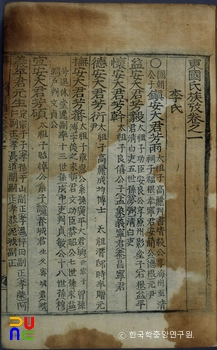대상 ()
대상은 명자(冥者)에 대한 두번째 제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 상을 벗으면 다음 주년(周年)부터는 정식 기제사(忌祭祀)로 바뀌게 된다. 소상(小祥)과 아울러 상례 중에서 가장 큰 행사로 일가친척은 물론, 명자의 친구와 복인(服人)의 친구들도 문상하러 오므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한다.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3년상을 치르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부모상 말고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절차가 따르게 된다. 즉, 조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고 없으면 승중(承重)이라 하여 장손자(長孫子)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3년상을 치르는 경우와, 증조부모 혹은 고조부모가 사망하였을 때도 역시 그 장자손이 모두 사망하고 없으면 장증손(長曾孫) 혹은 장고손(長高孫)이 대신 3년상을 치르는 경우이다.
대상을 지내는 절차는, 전날 상주 등 복인들이 목욕을 한 뒤 제기(祭器)를 진설하고 찬(饌)을 준비하는 것은 소상 때와 같지만, 새 신주를 부묘(祔廟)하겠다는 뜻을 사당에 고하는 절차가 있다. 그 다음날의 행사에서도 제사의 형식은 소상 때와 같지만, 사신(辭神) 이후 제물을 모두 물리고 난 다음부터는 다르다.
즉, 축관이 궤좌(跪坐)하여 “사당으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請入于祠堂).”라고 입으로 고한 뒤 신주를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면 상주 이하는 곡을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다가 사당 앞에 서서 곡을 멈춘다. 축관이 감실문(龕室門), 즉 신주를 모셔두는 사당문을 열고 신주를 동편에 서향(西向)하여 봉안(奉安)하면 모두 재배하고, 축관이 문을 닫으면 모두 그 곳을 물러나온다.
그 다음 궤연(几筵), 즉 영좌(靈座)를 철수하고 상장(喪杖)·짚베개·초석(草席) 등을 불에 살라 없앤다. 대상이 끝나면 젓갈·간장·포(脯)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교적 상례는 고려시대에 우리 나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당시 부모에 대해서도 백일상제도(百日喪制度)가 최고의 상으로 행하여졌고,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도 이 제도가 계속되다가 조선 중기에 이르러 3년상제도가 정착된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의 절차도 그때부터 지켜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근대화와 더불어 3년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새로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서 부모·조부모·배우자에 대한 상기(喪期)를 최장의 상기로 하되 모두 백일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상과 같은 형식을 갖춘 원칙적인 대상의 절차는 실제에 있어서나 공식적으로나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