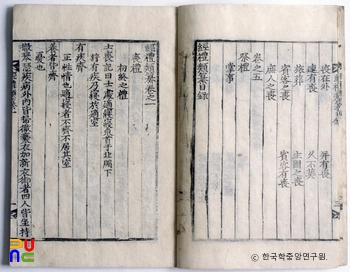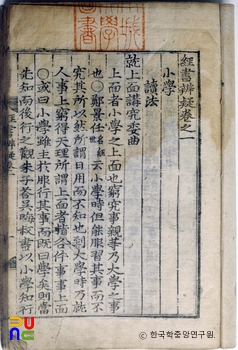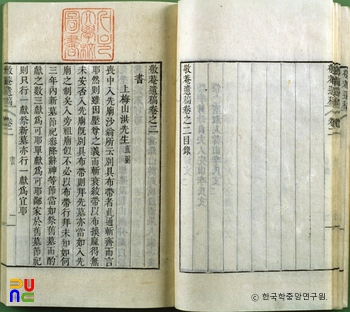소과괘 ()
과(過)는 ‘지나쳤다’는 뜻으로, ‘소과’는 ‘사소한 일이 지나쳤다’ 또는 ‘약간 지나쳤다’는 의미이다. 유학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중용(中庸)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지나치거나 모자란 것을 잘못으로 본다. 따라서 ‘과’는 ‘허물’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괘상으로 보면 음효가 4개이고 양효가 2개이다.
『주역』에서 소(小)는 음을 의미하므로 소과는 음효가 양효보다 많다는 것으로 대과(大過)와 반대가 되는 괘이다. 또한 양효 두 개가 가운데에 있고, 음효가 상하에 두 개씩 있어서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 새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힘이 들고 아래로 내려와야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을 규범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사치하고 오만한 양강(陽剛)한 행위와 지나치게 겸손하고 검소한 음유(陰柔)한 행위는 모두 중용을 잃어버린 것이지만, 공자가 “예(禮)는 사치스러운 것보다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고 했듯이 지나친 겸손, 검소한 행위, 즉 ‘소과’한 행위가 올바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괘사에서 “소과는 형통하니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작은 일은 해도 되지만 큰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르는 새가 소리는 남김에 올라가는 것은 옳지 않고 내려가는 것이 마땅하니 내려가면 크게 길할 것이다.”고 하여 아래로 내려가야 길하다고 한 것은 이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용이 최선이지만 때로는 이것을 벗어나 지나친 것이 올바른 경우가 있다. 「대상전(大象傳)」에서 “산위에 우뢰가 있는 것이 소과이니, 군자가(이것을) 본받아 행위에는 공손함에 지나치고 장례에는 슬픔에 지나치고 재물을 쓰는 것은 검소한 데에 지나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름에는 옷을 얇게 입고 겨울에는 두껍게 입는 것이 시중(時中)이다. 효사를 예로 들면 구삼은 ‘과강불중(過剛不中: 지나치게 강하고 중이 아님)’해 모든 음의 공격 대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강함만을 믿고 방비를 과하게 하지를 낳아 해를 당한다. 이런 경우는 정도에 지나치다고 여겨질만큼 철저히 방비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지나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때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중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