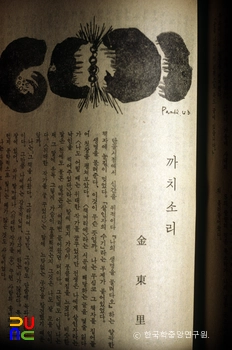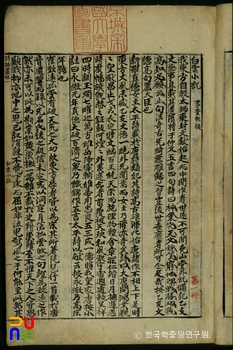소낙비
1935년 1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1석으로 당선된 작품으로, 원명에는 ‘따라지 목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삶의 안착을 찾지 못한 식민지시대의 유랑농민의 삶을 해학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흉작과 빚쟁이의 위협 때문에 주1를 한 춘호는 아무리 떠돌아다녀도 살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노름판에 뛰어들 생각을 한다. 그러나 밑천 2원이 없어 울화가 치민 춘호는 아내를 때리며 돈을 구해오라고 한다. 매를 맞고 뛰쳐나온 춘호의 처는 돈을 구할 방도를 생각하다가 마침 마을 부자인 이주사의 눈에 들어 팔자를 고친 쇠돌 어멈네 집으로 향한다. 가다가 소낙비를 만나 밤나무 밑에서 피하던 중 문득 아무도 없는 쇠돌 어멈집에 이주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몸을 맡기고는 다음날 2원을 받기로 한다. 다음날, 춘호는 2원을 얻어서 빚도 갚고 서울로 가서 아내와 함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아내를 곱게 치장시켜 이주사에게로 보낸다는 이야기이다.
돈에 대한 탐욕과 가난 때문에 아내에게 매춘 행위를 사주하거나 아내를 매매하는 경우는 작자의 작품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춘호처럼 돈에 대한 허망한 탐욕에 이끌린 남자들은 아내를 가축이나 물건으로 취급하거나 성(性)을 생계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하등의 도덕적인 수치감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만큼 돈은 도덕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돈만 소유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단순한 인물들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층적인 사실에 잠재된 주2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투영을 간과해버릴 수 없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알몸뚱이밖에 없기 때문에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극도의 가난 속에서 윤리나 도덕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작자의 「만무방」과 더불어 식민지 농촌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빈곤을 주3으로 그려낸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