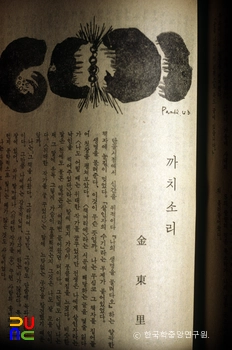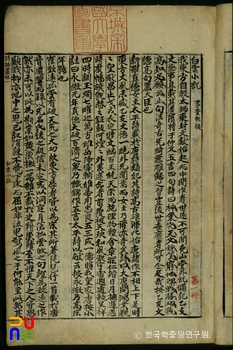산화 ()
김동리(金東里)가 지은 단편소설.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작품으로 1936년 1월 4일부터 18일까지 연재되었다. 그리고 1947년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에서 간행한 김동리의 단편집 『무녀도』에 다시 수록할 때 부분적으로 개작되었다. 이 작품은 숯을 구워서 겨우 살아가는 극도로 가난한 뒷골 마을 사람들의 기근과 천재적(天災的)인 재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묘사한 작품이다.
역천(逆天 : 천명을 거스름.)과 재앙의 땅 뒷골 마을은 지주로 군림하는 윤 참봉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철저하게 가난하다. 그들은 윤 참봉의 착취와 자연 재난의 이중고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기근 상태에 빠져 솔잎과 칡뿌리로 겨우 연명할 뿐이며, 이러한 숙명적인 재난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이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어떤 삶의 방법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그들의 재난과 기근의 원인이 윤 참봉의 인위적인 착취 행위에 있다기보다는 그들의 역천에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닫히고 격리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유일한 위안은 토속신앙인 하느님과 산신(山神)을 찾아 적극적으로 의존하면서 이 숙명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병으로 죽어 매장한 소를 윤 참봉이 선심을 쓰는 양 헐값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팔게 되는데, 이를 ‘귀물’로 사서 먹고 온 마을 사람들이 집단 괴질에 걸리게 된다. 또한, 산에서는 이들이 재난을 예고한다고 믿는 원인 모를 산불이 일어난다. 그리고 한쇠는 윤 참봉에게 빚 대신 가져다 바칠 숯을 몰래 내다 팔기도 하고, 매맞은 동생을 위하여 윤 참봉에게 반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이 모든 재난이 그저 산제(山祭)를 지내지 않은 자신들의 역천 때문이라고만 믿는다.
이 작품은 극도로 가난한 뒷골 마을 사람들이 기근과 재난에 시달리는 삶을 묘사한 것으로서, 김동리의 소설 중 가난의 실상을 가장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 마을의 화전민들은 모든 재난을 하늘과 산신이 내리는 천벌로 받아들이는 주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불의 상징적인 표상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충동과 반항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쇠네와 송아지네가 윤 참봉네와 빚는 마찰과 갈등이 장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작품의 종반에 나타난 산불은 불길한 운명의 예조적인 현상으로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고, 순박한 사람들의 심성 속에 내재하는 분노를 표상하는 의미로도 파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