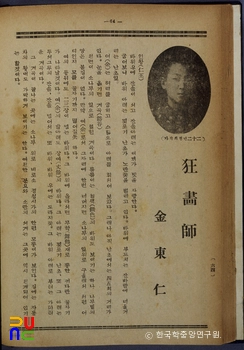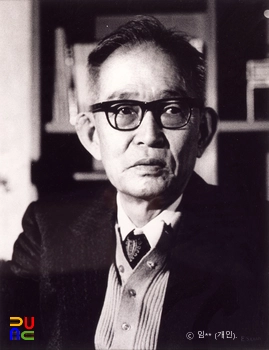암사지도 ()
서기원(徐基源)이 지은 단편소설. 1956년 ≪현대문학 現代文學≫ 11월호로 추천이 완료되어 문단에 등단하게 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50년대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삶의 훼손상이 규범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도덕적 논리와 삶의 논리가 어긋난 극심한 갈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상덕과 형남은 같은 부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제대하였다. 갈 곳이 없는 형남은 상덕이 그의 집으로 오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하면서도 가능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 헤매던 중 길에서 상덕을 만나 그의 집으로 가 기거하게 된다.
상덕은 가출한 윤주라는 처녀와 동거하는 중이었고, 중학관의 강사 생활을 하는 상덕의 수입으로 겨우겨우 세 사람이 살아간다.
그러다가 미술대학 중퇴생인 형남도 영화의 광고 간판을 그리는 일감이 생겨 수입을 가지게 된다. 그러던 중 상덕이 중학관이 폐쇄되어 실직하게 되면서, 매일 기원에 나가 소일하는 처지가 되어 형남의 수입에만 의지하게 된다. 상덕은 윤주와의 관계가 사랑의 의미가 아닌 관계임을 형남에게 알리며, 자유로운 생각으로 윤주를 대하게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세 사람은 이른바 삼각관계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끝내는 윤주가 임신하게 됨을 알리자, 상덕은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할 것을 무심하였다고 윤주를 공격한다.
형남도 중절할 것을 권한다. 이러한 갈등의 와중에서 윤주는 상덕이나 형남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두 남자로부터 무거운 몸을 하고 저물어가는 거리로 떠나간다.
이러한 결말에서 이 작품은 여성의 단호한 결심을 통하여 도덕적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두 남성의 황폐화된 도덕의식은 1950년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이야기의 우의적 의미를 본다면 두 동강이 난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 1950년대의 삶과 역사적 의미가 투시되게 한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