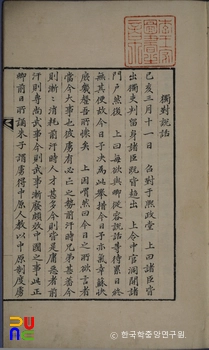이득제 ()
이득제는 조선후기 금위대장, 여영대장, 훈련대장 등을 역임한 무신이다. 효령대군의 13대손으로 아버지는 현감 이명오인데 훈련대장 이장오에게 입양되었다. 무과를 거쳐 선전관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1775년 승지에 특별 임명되고 이후 평안도병마사, 삼도수군통제사, 좌·우포도대장, 어영대장, 총융사를 역임하였고 순조 즉위 이후 금위대장을 지냈다. 순조 연간에 시파 입장을 취해 김조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적 행위를 많이 해 관력의 부침이 심하였다. 아들 이석구는 금위대장과 포도대장을, 이철구는 총융사와 포도대장을 역임하여 무장 집안을 이루었다.
본관은 전주(全州). 효령대군(孝寧大君)의 13대손이다. 아버지는 현감 이명오(李明吾)이며, 훈련대장 이장오(李章吾)에게 입양되었다.
아버지도 훈련대장을, 아들 이석구(李石求)는 금위대장과 포도대장을, 이철구(李鐵求)는 총융사와 포도대장을 역임해 무장 집안을 이루었다.
무과를 거쳐 선전관(宣傳官)으로 재직하던 중 1775년(영조 51) 승지에 특별 임명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영의정 신회(申晦)가 올려 쓰도록 추천해 이후 병사를 역임하였다.
1776년 훈련도감 재정에 관계된 노비의 모리 행위를 감쌌다는 죄명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노비의 이름을 빌린 자신의 불법 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관작을 빼앗기고 조정에서 축출당했다가 이듬 해 풀려났다.
1780년(정조 4) 홍충도병마절도사로 나갔다가 관내 포흠(逋欠: 포는 조세 포탈, 흠은 官物의 사적인 소비로 부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함)이 많다는 이유로 이듬 해 고신을 빼앗기고, 1782년에는 중국 사신의 영접에 쓰일 돈을 유용한 죄로 충주에 유배되었다.
그 뒤 풀려나 금군별장(禁軍別將)으로 재직 중, 1785년 관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 자신의 집을 은언군 이인(恩彦君 李裀)의 집으로 쓰기 위해 사려하자, 그 집을 불지른 죄로 다시 유배당하였다.
그 뒤 1790년 평안도병마사로 나갔는데 진장(鎭將)의 포폄에 착오가 있어 파직당했다가 곧 용서받았다. 그러나 이듬 해에 재주가 없는 자를 궁술에 뛰어난 인물로 천거한 죄로 평안도관찰사 심이지(沈頤之)와 함께 충군(充軍: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서 군역에 충정하는 것)의 처벌을 받았다가 경감되어 중화(中和)에 유배당하였다.
그 뒤 풀려나 금군별장(禁軍別將)을 거쳐 1794년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에 임명되어 둔토(屯土)를 늘리는 데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러다가 1797년 관할 지역의 소나무 남벌을 막지 못한 죄로 파직되었다가 곧 우포도대장에 임명되었다.
왕권 강화책에 대한 무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아장층(亞將層)에게 친위 군문인 장용영(壯勇營)의 관직을 거치게 한 정조의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장용영의 별장(別將)을 거쳤다. 그러다가 1799년 경기수군절도사를 거쳐 9월에 군영대장에 처음 천망되어 어영대장에 임명되었다.
이듬 해 잠시 좌포도대장을 거쳐 어영대장으로 재직중, 병조판서 조진관(趙鎭寬)과 분란을 일으켜 파직되었으나 곧 용서받고 총융사에 임명되었다. 1800년 순조 즉위 후 우포도대장이 되었으며, 금위대장 등 군영대장을 역임하면서 1804년(순조 4), 1807년 등 여러 차례 좌·우포도대장을 겸임하였다.
1801년 벽파(僻派)가 정조의 근신이었던 윤행임(尹行恁)을 공격할 때 일파로 몰려 탄핵받았으며, 근무 소홀로 경성(鏡城)에 유배되었다가 1803년 어영대장으로 복귀하였다. 1806년에는 조득영(趙得永)·박종경(朴宗慶) 등과 함께 영조대 사도세자의 잘못을 지적했던 인물들의 포장을 주장해, 벽파 세력의 명분을 재확립하려 한 김달순(金達淳)을 처형하라는 공격에 깊이 참여하였다.
1807년 어영대장으로서 병조판서 한만유(韓晩裕)의 인사를 비난했다가 삭직되었으나 다음 해 금위대장으로 복귀하였다. 1809년에는 오랫동안 훈련도감을 장악하던 국구 김조순(金祖淳)에 이어 훈련대장에 임명되었고, 우포도대장을 겸임하였다. 이후 1811년, 1812년, 1817년에 훈련대장을 지냈다.
또한, 1811년 금위대장을 거쳐 1812년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진압된 뒤 가자되었다. 그 해 훈련대장으로서 형조판서를 겸하던 중 한시유(韓始裕)로부터 권세를 좇고 군문의 재정을 마음대로 한다는 공격을 받았으나 순조의 두둔으로 무사하였다.
무장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노골적인 정치적 행위를 많이 해 관력에 부침이 심하였다. 순조 연간의 시파·벽파 대립에서는 시파의 입장을 취해 김조순으로부터 군문대장직을 몇 차례 이어받는 등 그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