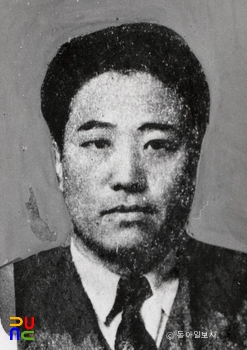이상로 전시집 ( )
B6판. 442면. 모든 시를 집성한 것으로, 1970년 보문각(普文閣)에서 출간하였다. 장정은 이응로(李應魯)가 맡아서 했고, 제자(題字)는 이기우(李基雨)의 글씨로 되어 있다. 책머리에는 지은이의 서문이 있고 총 167편의 시작품을 4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다.
제1부 귀로집(歸路集)은 1953년에 나온 시집 『귀로(歸路)』의 수록분 25편을 ‘귀로’(「귀로」·「해변초」 등 4편), ‘인동(忍冬)의 시(詩)’(「인동서(忍冬序)」·「혼구(昏衢)에서」 등 6편), ‘실낙원(失樂園)’(「결별(訣別)」·「한가위에 부치는 노래」 등 8편), ‘경사(傾斜)의 영상(影像)’(「문(門)」·「밤이 새면」 등 7편) 등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제2부 불온서정집(不穩抒情集)은 1957년에 출간된 시집 『불온서정(不穩抒情)』의 수록분 36편을 ‘도정(道程)의 시(詩)’(「오욕(汚辱)의 낯으로」·「봄뚝에서」 등 7편), ‘분할지대(分割地帶)’(「칠월(七月)」·「하나의 의지(意志)」 등 9편), ‘고원(故園)의 장(章)’(「고원」·「소」 등 6편), ‘랍소디’(「월하(月下)의 영상(影像)」·「새해의 시(詩)」 등 6편), ‘불온서정(不穩抒情)’(「벽지(僻地)의 기도(祈禱)」·「육조(六曹) 앞 네거리」 등 4편), ‘백조(白鳥)의 숙제(宿題)’(「도마뱀」·「참새떼」 등 4편)등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제3부 모체귀토집(母體歸土集)에는 1961년에 나온 세 번째 시집 『세월(歲月) 속에서』의 일부와 그 뒤의 시작을 합해서 「너와 나」·「존재(存在)의 시(詩)」·「하늘을 우러르면」·「두고 온 꽃밭」 등 3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4부 꾀꼬리의 잠언집(箴言集)은 「무료초(無聊抄)」·「한간초(閑間抄)」·「꾀꼬리의 잠언(箴言)」·「증서장(憎序章)」·「옛 이야기 삼아」·「기러기」 등 72편의 시작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싣고 있다.
이상로의 시적 특색은 관념적(觀念的) 현실추구와 동양적 서정(抒情)을 바탕으로 한 시작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 정치 사회의 타락상과 부정부패에 대하여 신랄하게 풍자하는 시작들도 상당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