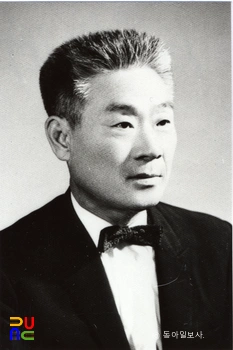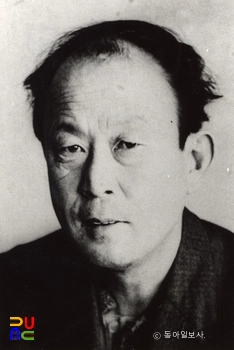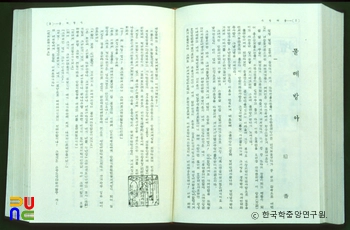인두지주 ()
계용묵(桂鎔默)이 지은 단편소설. 1928년 2월 ≪조선지광 朝鮮之光≫에 발표되었다. 작가의 초기 시대를 장식하는 작품의 하나로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궁핍과 고난을 다룬 현실의식이 짙은 작품이다.
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S시의 광장에서 경수는 일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남양 인도산 사람거미’를 구경하게 된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몸통은 거미인 이 괴물의 정체를 궁금해하다가 경수는 그가 자신의 친구인 창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간 창오의 지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경수와 창오는 어릴 적부터의 친구로서 소작인 노릇을 하다가 그것조차 여의하지 못하여 ××으로 함께 건너가 노동이라도 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자리는 구해보지도 못한 채 ×××××통에 서로 행방을 모르게 된 것이다.
이후 경수는 간신히 고국에 돌아왔으나 창오는 경찰에 잡혀 고생한 뒤 겨우 나와서 탄광에 취직하였다가 탄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랫도리를 치었다고 한다.
두 다리를 절단하고 죽음만은 모면하였으나 위로금 한푼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되자 창오는 이렇게 인간거미 행각을 하며 호구지책을 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경수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에 함께 가자고 권유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최서방 崔書房>과 함께 흔히 동반자 작가적인 입장에서 써진 것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특히, 결말의 경수의 제의가 피압박자들의 집단적인 저항 자세를 암시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반항조차 사실감이 결여된 채 추상적으로 처리됨으로써 현실의식의 소극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작품은 굳이 경향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일본의 침탈로 인하여 가난하여지고 괴로움 받는 한국 사람들의 참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작품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