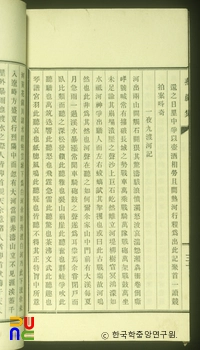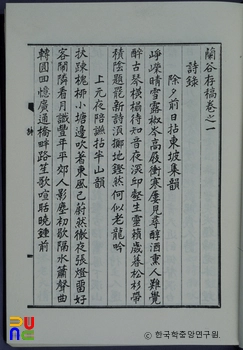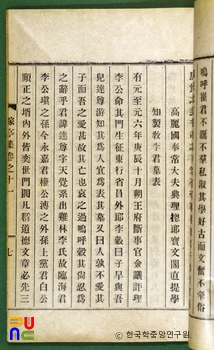조칙 ()
대개 왕의 말을 조(詔), 황후 · 태자의 말을 영(令)이라고 한다. 이들이 문서로 발포하는 것을 총칭하여 조령이라 한다. 고(誥) · 조(詔) · 영(令) · 유(諭) · 새서(璽書) · 교(敎) · 책명(策命) 등은 명칭은 비록 다르지만 모두 조령에 속한다.
조(詔)는 본래 고(告)의 뜻으로 신분적 구분이 없이 위아래가 통용해 썼다. ≪장자 莊子≫ 도척편(盜跖篇)에 “남의 아버지가 된 이는 반드시 그 아들에게 조(詔)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진시황(秦始皇) 26년 영을 조로 고친 뒤로는 천자의 말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문체가 되었다.
조령은 본래 문체가 순후하고 전아하였다. 육조시대(六朝時代)에 변려문(騈儷文)이 성행하면서 전아한 맛이 없어지고 화미(華美)한 변려문을 쓰게 되었다. 칙(勅)도 본시는 경계의 의미로 썼다. 송대(宋代)부터 권유(勸諭)의 뜻으로 쓰게 되어 경계라는 처음의 뜻은 상실하고 대신 제고의 뜻으로 쓰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송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조칙을 지었기 때문에 중국과 문체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무명씨(無名氏)의 <정종포장왕식렴조 定宗褒奬王式廉詔>와 이계전(李季甸)의 <당나라 산인 이필에게 시모군국 천하 부원수부 행군장사를 제수하는 모의 조칙 擬唐授山人李泌侍謀軍國天下副元帥府行軍長史勅> 등이 ≪동문선≫에 있다. 내용은 대체로 포양(褒揚)하는 뜻이 많고 문체는 변려문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지배에 들어가기 전과 대한제국시대에만 조칙이라 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고려 후기에서 조선시대에 걸쳐서는 조칙이 허용되지 않았다. 조칙은 왕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지어 바친 다음에 왕의 열람 또는 청문(聽問)을 거치는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현전하는 조칙류 작품들의 작자가 왕이 아닌 당대 문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