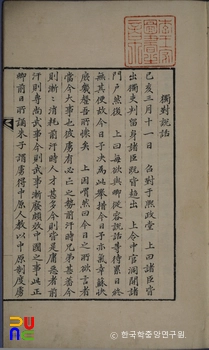창원괘서사건 ()
이 사건은 “문무(文武)에 재주가 있으나 권세가 없어 출세하지 못하는 자들은 따르라.”는 내용의 글을 흰 명주에 써서 경상도 하동 두치장(斗峙場)에 내건 하동 괘서사건(河東掛書事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동의 괘서 사건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평소에 요언(妖言)을 퍼뜨리던 이호춘(李好春)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방실(李邦實)이 지방민의 차별에 불만을 지닌 부유한 진사 정양선(鄭陽善)에게 부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그 지방에 크게 전파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당시 의령에 살고 있던 소작농민 전지효는 하동괘서의 내용을 부연해 글을 써서 진주에 사는 매형 이진화(李震化)를 시켜 창원에 내걸었다가 떼어오게 하고는 이임(里任)을 통해 관에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매형 배진경(裵縉慶)에게도 글을 써서 걸게 하였다.
또한, 배진경의 아우 배윤경(裵綸慶)에게도 글을 써서 걸게 하는 등 전지효가 주도해 전후 세 차례에 걸쳐 괘서하였다. 이 괘서의 내용은 대개 “천하의 지모와 힘이 있는 자는 모두 북소리에 맞추어 뒤를 따르라. 능력에 따라 관직을 주겠다. 수령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안핵사 한용탁(韓用鐸)을 파견해 관찰사 김이영(金履永)과 함께 처리하게 하였다. 전지효는 이 괘서를 정양선의 소행이라 조작하였으나 사실이 밝혀져, 이진화 · 배윤경 등과 함께 범상부도죄(犯上不道罪)로 처형되었다. 또한, 정광선(鄭光善) · 최광한(崔光漢) · 이방실 · 정철손 · 김맹용(金孟用) · 정양선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되었다.
이 사건은 하동괘서사건과 더불어 영남괘서사건으로 통칭되었다. 전지효 개인의 의도는 괘서를 신고함으로써 상을 받으려 하였다는 것이지만, 여러 면에서 19세기 초반의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사건이다.
특히, 긴밀한 관계가 아닌 인물들 사이에서 평소의 선동, 괘서 내용의 교묘한 해석, 그 내용의 전파와 선동, 괘서부착의 사주와 실행, 범인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 괘서로 인한 피난 등의 행위가 비교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