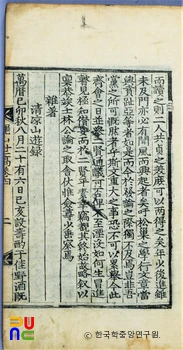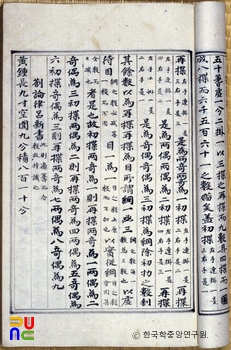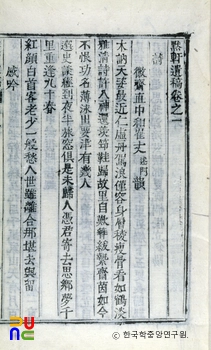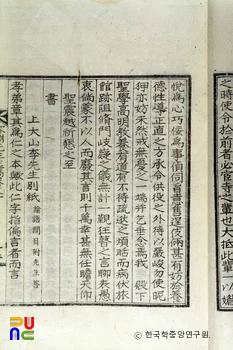호암유집 ()
1958년 김항중의 8대손 김두태(金斗台)·김두영(金斗永)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김회진(金晦鎭)의 서문, 권말에 김두태와 김두영의 발문이 있다.
2권 1책. 석인본.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81수, 권2에 상언(上言) 1편, 서(書) 9편, 잡저 1편, 부록으로 묘갈명·묘지명·가장·행장·만사·제문·증유(贈遺)·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나그네의 여수(旅愁)를 읊은 것이 많다. 「기사(羈思)」·「향수(鄕愁)」·「객중한식(客中寒食)」·「견감(遣感)」·「사귀(思歸)」 등은 모두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유사(幽事)」에서는 은일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입보선사작(入普先寺作)」에서는 산사(山寺)의 그윽한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영물(詠物)로는 「매화(梅花)」·「만매(晩梅)」·「월계(月桂)」·「백설화(白雪花)」 등이 있는데, 서정적이며 표현이 섬세하다. 그밖에 「상춘(賞春)」은 계절적 감각과 서정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상언의 「청가대인년팔십가자상언(請家大人年八十加資上言)」은 아버지 김영진의 80수(壽)에 가자를 상신(上伸)한 글이다. 이에 대해 노인직의 벼슬인 동지중추부사로 가자됨을 알리는 이조의 회계(回啓)가 첨부되어 있다. 김영진의 두 아들이 과거에 급제해 지방의 곤수(閫守)로 재직하는 등, 이전(吏典)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언급하고 있어, 당시의 법제 운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서(書)는 친지에게 보낸 문후(問候)가 대부분이나, 그 가운데 「서시이제사웅사정차아정구(書示二弟士雄士貞次兒正龜)」는 저자의 두 동생과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지방의 현재(縣宰)가 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수기·치인의 요체를 훈계한 것이다. 선교화(宣敎化)·행덕혜(行德惠)·체상의(體上意)·찰민은(察民隱)·상청백(尙淸白)·계탐오(戒貪汚)·거활리(去猾吏)·신원목왕(伸寃木王) 등 8개 항목에 걸쳐 자세히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