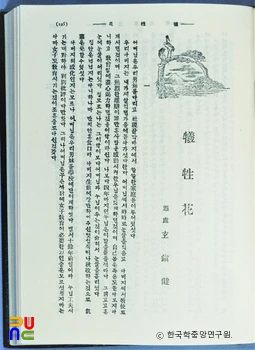희생화 ()
1920년 11월 『개벽(開闢)』 5호에 발표되었다. 현진건의 등단작이나, 감상적이고 미숙한 습작 정도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신식 교육을 받는 젊은 남녀 K와 S는 학교에서 서로 알아가며 점차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으나 K의 봉건적 가문에 의하여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설은 K의 도피와 S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따라서 이 작품이 말하는 것은 자유연애를 배척하는 ‘썩은 관습’이다.
즉,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야요. 그 묵고 썩은 관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헤어질 때 S가 하는 말로, 사실상 이 소설의 핵심 부분이다.
그러나 소설의 대부분을 상투적 표현의 남발 속에서 자유연애에 대한 감상적 묘사가 차지하고 있다. K와 S는 감상적 도피자와 감상적 희생화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사회 제도에 대응하는 작가 의식의 나약함은 사건 자체를 상투적이고 관념적인 신파조로 이끌고 갔으며, 감상적 기법 또한 소설을 더욱 미숙하게 만들고 말았다.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사실주의를 개척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는 현진건의 첫 작품이지만 발표 당시의 평가는 냉정했다. 현진건은 이 소설에서 비중 있는 풍경 묘사나 관찰자 시점을 사용한 서술 방식의 시도 등 나름의 새로운 실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주인공의 동생을 화자인 ‘나’로 내세운 것은 오히려 감정선을 어린 학생의 수준으로 제약하여, 소설이 실제 사실의 기록도 되지 못 한 채 허위와 과장이 강한 감상문에 그쳤다는 혹평을 받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작가가 의도하는 참된 사랑이 우스꽝스러운 영탄조의 표현에 실려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셈이다.
특히 사건 자체의 진행, 즉 ‘연애, 부모의 반대, 이별, 죽음’이 도식적인 신파 형태를 취하여 그 변화가 현실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황석우(黃錫禹)는 「희생화」가 “소설이 아니다.”라고까지 단언하였다. 훗날인 1930년, 잡지 『별건곤(別乾坤)』의 지면에서 현진건 본인도 황석우의 비판에 분노했던 기억과 함께 「희생화」의 미숙함을 회고한 바 있다. 이 회고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첫 작품을 「희생화」 다음에 나온 「빈처」로 꼽았다. 작가 역시 「희생화」를 습작으로 간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