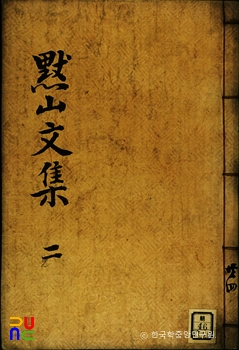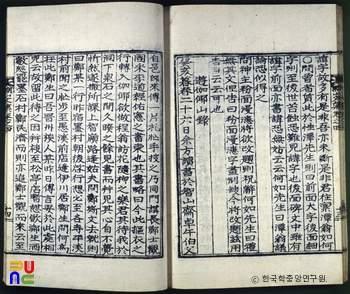묵산문집 ()
문해구(文海龜, 1776-1849)는 조선 후기 유학자로 자는 경낙(景洛)이고, 호는 묵산(默山)이며, 초명은 문해대(文海大)이다. 본관은 남평(南平)이며, 경상남도 합천(陜川) 출신이다. 증조부는 문중소(文重素), 조부는 신천(信天) 문필용(文必龍)이다. 아버지 지산(智山) 문석순(文錫純)과 어머니 전주김씨(全州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효행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19세에는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와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에게 사사(師事)하여 학문을 배웠다.
8권 4책, 석판본(석인).
저자의 유문은 문재기(文在璣)가 수습, 주1 류원중(柳遠重, 18611943)에게 묘갈명을 부탁하여 받은 다음, 권재규(權載奎, 18701952)에게 서문을 부탁하여 성책하였다. 이를 문경엽이 1937년에 간행한 것이다.
8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 권재규가 1936년에 지은 서문이 있다.
권1~2는 시 194제로 이 가운데 스승 송환기, 이의조, 이수호(李遂浩) 등 70명에 대한 만시가 포함되어 있다. 시는 주로 서원이나 정사(精舍) 등을 방문하고 감회를 읊었거나 동문이나 지인을 방문하고 지은 차운시(次韻詩), 증시(贈詩)가 대부분이다. 「회산서원십이경(會山書院十二景)」은 삼가에 있는 회산서원의 12경을 읊은 것이다.
권3은 서(書) 55편으로 스승 송환기, 이의조, 김양순(金陽淳), 강정환(姜鼎煥), 송환장(宋煥章) 등에게 보낸 것이다.
권4~5는 잡저이다. 「담호기문(潭湖記聞)」은 스승 송환기와 이의조의 문하에서 학문의 요체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경서(經書)를 비롯하여 이기(理氣)·성명(性命)·호락론(湖洛論) 등을 기록하고 있다.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은 1803년(순조 3) 봄에 정국채(鄭國采)·이우헌(李佑憲)과 함께 가야산을 두루 돌아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문으로 묘사하고, 고적을 소개한 기행문이다. ‘강규(講規)’는 저자가 살고 있던 합천에서 원생(院生)의 훈도 책임을 맡게 되자 만든 학칙으로, 9개 항을 각 조항마다 소상하게 해설하고 있다. 또한 심성도(心性圖)·권형도(權衡圖)·신자도(身字圖)·안택도(安宅圖)와 사서(四書)의 주요골자인 『중용』의 성(誠), 『대학』의 경(敬), 『논어』의 인(仁), 『맹자』의 알욕존리(遏欲存理) 등에 대하여 각각 도식을 만들어 알기 쉽게 하고, 또 도식에 나열된 문구를 문답식으로 소상하게 해설을 가한 글이 있다. 이외에 잠(箴) 4편과 한상규(韓相圭) 등 5인의 자설(字說) 등이 있다.
권6은 서(序) 5편, 기(記) 4편, 명(銘) 2편, 축문(祝文) 2편, 제문(祭文) 12편, 가술(家述) 6편이다. ‘지산재기(智山齋記)’는 누대의 선영이 있는 지산에 부친 문석순이 만년에 지은 서재로 ‘지산유거(智山幽居)’라는 편액은 송환기의 주2이다. 축문은 ‘화암서원중수봉안문(華巖書院重修奉安文)’과 ‘제묵촌주산문(祭墨村主山文)’이고, 제문은 송환기, 이의조, 이규록(李圭祿) 등에 대한 것이고, 가술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인 9대조 문회지(文繪地)부터 자신의 부친 문석순에 이르기까지 행록(行錄)이나 유사(遺事)를 지은 것이다.
권7~8은 부록으로 천목(薦目) 5편, 통문(通文) 5편, 장(狀) 11편, 행록, 행장, 묘지명, 묘갈명, 묘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천목과 통문, 장(狀)은 문해구가 16살 되는 해인 1793년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시묘하는 등 효행을 알리는 것으로 1793년부터 1915년에 이르기까지 거창, 고령향교 유생 등이 올린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행장 및 묘도문자는 문광찬(文光瓚)(행록), 윤우학(尹禹學)(행장), 이현주(李鉉周)(묘지명), 류원중(묘갈명), 정기(鄭琦)(묘표)가 각각 지은 것이다.
송환기의 문인인 저자의 잡저들은 철학적인 주3을 비롯하여 사서에 이르기까지 주4의 요체만을 발췌, 도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어 유학사상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